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박씨전>과 박완서의 <해산 바가지>의 줄거리
1-1. <박씨전>의 줄거리
1-2. <해산 바가지>의 줄거리
2. <박씨전>과 <해산 바가지>에 드러난 여성 수난의 양상
2-1. 여성의 가치에 대한 편견(추한 여성)
1. <박씨전>의 `박씨의 외모적 추함`과 <해산 바가지>의 `시어머니의 외적 추함(노망)에 대한 인식`
2-2. 남녀 불평등 의식
1. <박씨전>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의식과 <해산 바가지>의 남아 선호사상
Ⅲ. 결론
Ⅱ. 본론
1. <박씨전>과 박완서의 <해산 바가지>의 줄거리
1-1. <박씨전>의 줄거리
1-2. <해산 바가지>의 줄거리
2. <박씨전>과 <해산 바가지>에 드러난 여성 수난의 양상
2-1. 여성의 가치에 대한 편견(추한 여성)
1. <박씨전>의 `박씨의 외모적 추함`과 <해산 바가지>의 `시어머니의 외적 추함(노망)에 대한 인식`
2-2. 남녀 불평등 의식
1. <박씨전>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의식과 <해산 바가지>의 남아 선호사상
Ⅲ. 결론
본문내용
다른 면도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박씨부인의 외모적 추함은 여성 수난의 원인적인 측면이 강하며, 시어머니의 외모적 추함은 여성 수난의 결과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여성 수난 의식의 두 번째로 <박씨전>과 <해산 바가지>에 드러난 남녀 불평등 의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 남녀 불평등 의식
1.<박씨전>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의식과 <해산 바가지>의 남아 선호 사상
<박씨전>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당대의 일반적 통념과 달리 오히려 여성을 남성보다 우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품에서 실질적인 국사나 전쟁은 외형상 남성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만, 실질적 결정과 지휘는 배후의 여성(박씨부인)이 하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조종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전쟁의 승패 역시 여성(박씨부인)들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고,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논리와도 통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여성에 대한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바라보는 작자의 기본 시각은 전통적 그것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작품 초반부에 나타난 박씨의 남편의 여성관에 대한 아버지와의 대화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자 본대 다른 아우 없삽고 다만 남매뿐이라, 요조가인(窈窕佳人)의 배필을 만나, 부모를 편히 봉양하옵고, 자녀를 갖초두어 후사를 이음이 여자의 행도어늘...\"
따라서 <박씨전>에서의 여성(박씨부인)은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되어 그것은 관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남성보다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박씨부인의 \'외모\'를 액운으로 설정하여 외모로 인한 고통을 운명적인 것으로 돌림으로써, 외모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이를 체념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외모와 덕행을 겸비한 완벽한 인간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무리한 기대 위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던 부당한 대우까지도 그들이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보여 준다. 즉 <박씨전>의 여성에 대한 의식은 비록 여성의 우월성과 남성에 비해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 이면에 바탕된 기본적인 정신은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존재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해산 바가지>는 초반부에 나의 친구를 통하여 남아 선호사상, 즉 남성 우월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너무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딸에 이어 둘째도 딸을 낳은 친구의 며느리와 사돈에게 친구는 상당한 서운함과 불만을 표하고 또한 아들을 낳은 어느 산모의 축하객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들이 대학의 교수라는 신진 인텔리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에 대한 전통적인 선호사상은 내면에 뿌리깊게 존재하여 남아 선호에 대한 적극적 표현을 하고 있다.
\"...\'정말 딸 낳을 건 아냐. 헛수고 중에도 그렇게 고약한 헛수고는 없을걸...\"
\"...\'자넨 모를 걸세, 그 공주님이에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가 된 남자의 속이 얼마나 철썩 내려 앉나를...\"
\"...\'이번에 또 딸 낳은 것 가지고 뭐라지 않아요. 이 친구는 딸을 넷 낳고 기어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딸 둘이 흉 될 것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대를 끊어 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건 안 될 말이죠...\"
이처럼 <박씨전>에서는 박씨부인의 영웅적인 요소를 부각하기 위해 관념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의 신이한 능력의 발휘를 통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의 의식을 종식시켜려는 듯 하지만 그의 주의 사람들의(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정서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의 의식, 남성 우월의 의식이 바탕이 되고 있어 여성의식의 향상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해산 바가지>에서는 주인공 나의 친구와 병원에서의 축하객들을 통해 남아 선호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나의 시어머니의 입장은 이들과 대조적인 입장으로 내가 딸만 연속해서 낳을 때에도 생명의 해산 바가지라는 사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간접적으로 나타내어 주어 훗날 나를 일깨워주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친구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남성에 대한 집착력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박씨전>과 <해산 바가지>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의 가슴속에 전통적으로 뿌리박힌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의식과 남아에 대한 선호의식으로 나타난 남녀의 불평등 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러함은 전통적으로 한국 여성 수난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박씨전>과 <해산 바가지>에 드러난 여성 수난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양상으로 여성의 가치에 대한 편견(추한 여성)을 <박씨전>의 박씨부인의 흉악한 외모와 <해산 바가지>에서의 시어머니의 외적 추함(노망)을 통해 비교해서 살펴보았고, 남녀 불평등의 의식을 <박씨전>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의식과 <해산 바가지>의 남아 선호사상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전통적인 여성수난의 모습이나 현대의 여성 수난의 모습이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교적인 관습이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본질적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를 훨씬 뛰어 넘은 지금에서도 여성의 이러한 전통적인 수난의 양상은 수정되어지지 아니하는 현실이 못내 아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여성의 수난의 가장 중요하고 항구적인 문제인 여성의 미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인한 여성의 수난과 남녀의 불평등 사상이 초래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제한과 남아 선호사상의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현재에도 여권 신장을 위한 여러 사회단체와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학적인 견지에서 살펴볼 때 이러한 사회적인 일련의 활동과 노력들이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훗날 우리의 문학 작품에서 여성의 수난에 대한 위와 같은 양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해석되는 지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란다.
다음의 여성 수난 의식의 두 번째로 <박씨전>과 <해산 바가지>에 드러난 남녀 불평등 의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 남녀 불평등 의식
1.<박씨전>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의식과 <해산 바가지>의 남아 선호 사상
<박씨전>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당대의 일반적 통념과 달리 오히려 여성을 남성보다 우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품에서 실질적인 국사나 전쟁은 외형상 남성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만, 실질적 결정과 지휘는 배후의 여성(박씨부인)이 하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조종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전쟁의 승패 역시 여성(박씨부인)들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고,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논리와도 통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여성에 대한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바라보는 작자의 기본 시각은 전통적 그것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작품 초반부에 나타난 박씨의 남편의 여성관에 대한 아버지와의 대화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자 본대 다른 아우 없삽고 다만 남매뿐이라, 요조가인(窈窕佳人)의 배필을 만나, 부모를 편히 봉양하옵고, 자녀를 갖초두어 후사를 이음이 여자의 행도어늘...\"
따라서 <박씨전>에서의 여성(박씨부인)은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되어 그것은 관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남성보다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박씨부인의 \'외모\'를 액운으로 설정하여 외모로 인한 고통을 운명적인 것으로 돌림으로써, 외모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이를 체념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외모와 덕행을 겸비한 완벽한 인간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무리한 기대 위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던 부당한 대우까지도 그들이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을 보여 준다. 즉 <박씨전>의 여성에 대한 의식은 비록 여성의 우월성과 남성에 비해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 이면에 바탕된 기본적인 정신은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존재라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해산 바가지>는 초반부에 나의 친구를 통하여 남아 선호사상, 즉 남성 우월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너무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딸에 이어 둘째도 딸을 낳은 친구의 며느리와 사돈에게 친구는 상당한 서운함과 불만을 표하고 또한 아들을 낳은 어느 산모의 축하객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들이 대학의 교수라는 신진 인텔리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에 대한 전통적인 선호사상은 내면에 뿌리깊게 존재하여 남아 선호에 대한 적극적 표현을 하고 있다.
\"...\'정말 딸 낳을 건 아냐. 헛수고 중에도 그렇게 고약한 헛수고는 없을걸...\"
\"...\'자넨 모를 걸세, 그 공주님이에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가 된 남자의 속이 얼마나 철썩 내려 앉나를...\"
\"...\'이번에 또 딸 낳은 것 가지고 뭐라지 않아요. 이 친구는 딸을 넷 낳고 기어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딸 둘이 흉 될 것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대를 끊어 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건 안 될 말이죠...\"
이처럼 <박씨전>에서는 박씨부인의 영웅적인 요소를 부각하기 위해 관념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의 신이한 능력의 발휘를 통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의 의식을 종식시켜려는 듯 하지만 그의 주의 사람들의(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정서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의 의식, 남성 우월의 의식이 바탕이 되고 있어 여성의식의 향상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해산 바가지>에서는 주인공 나의 친구와 병원에서의 축하객들을 통해 남아 선호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나의 시어머니의 입장은 이들과 대조적인 입장으로 내가 딸만 연속해서 낳을 때에도 생명의 해산 바가지라는 사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간접적으로 나타내어 주어 훗날 나를 일깨워주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친구와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남성에 대한 집착력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박씨전>과 <해산 바가지>를 통해 우리는 한국인의 가슴속에 전통적으로 뿌리박힌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의식과 남아에 대한 선호의식으로 나타난 남녀의 불평등 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러함은 전통적으로 한국 여성 수난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박씨전>과 <해산 바가지>에 드러난 여성 수난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양상으로 여성의 가치에 대한 편견(추한 여성)을 <박씨전>의 박씨부인의 흉악한 외모와 <해산 바가지>에서의 시어머니의 외적 추함(노망)을 통해 비교해서 살펴보았고, 남녀 불평등의 의식을 <박씨전>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 의식과 <해산 바가지>의 남아 선호사상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전통적인 여성수난의 모습이나 현대의 여성 수난의 모습이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교적인 관습이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본질적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를 훨씬 뛰어 넘은 지금에서도 여성의 이러한 전통적인 수난의 양상은 수정되어지지 아니하는 현실이 못내 아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여성의 수난의 가장 중요하고 항구적인 문제인 여성의 미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인한 여성의 수난과 남녀의 불평등 사상이 초래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제한과 남아 선호사상의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현재에도 여권 신장을 위한 여러 사회단체와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학적인 견지에서 살펴볼 때 이러한 사회적인 일련의 활동과 노력들이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훗날 우리의 문학 작품에서 여성의 수난에 대한 위와 같은 양상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해석되는 지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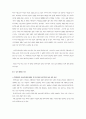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