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 후한의 건립과 통일
Ⅲ. 후한의 호족정권
Ⅳ. 호족세력의 발전
Ⅴ. 외척과 환관
Ⅵ. 사회모순의 심화
Ⅶ. 청의와 당고
Ⅷ. 황건의 난
Ⅸ. 후한의 멸망
Ⅹ. 결론
Ⅱ. 후한의 건립과 통일
Ⅲ. 후한의 호족정권
Ⅳ. 호족세력의 발전
Ⅴ. 외척과 환관
Ⅵ. 사회모순의 심화
Ⅶ. 청의와 당고
Ⅷ. 황건의 난
Ⅸ. 후한의 멸망
Ⅹ. 결론
본문내용
을 계기로 반란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7천에서 2∼3만명에 이르는 크고 작은 민중폭동이 각지에서 빈발하고 張飛燕이 이끌던 하북의 黑山賊과 같은 경우는 백만의 세력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세는 황건군의 잔당이 다시 세력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Ⅸ. 後漢의 滅亡
황건의 주력군이 평정되자 중앙에서는 권력투쟁이 여지없이 재개되었다. 189년 영제가 죽고 황태자 弁이 즉위하자 외척 何進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禁軍의 장군 袁紹와 환관주멸계획을 세워 산서로 진군하고 있던 맹장 董卓에게 낙양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계획이 누설되어 하진이 환관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원소는 병을 이끌고 궁중에 들어가 환관 2천여명을 모조리 죽여 환관을 일소했다. 뒤늦게 달려온 동탁은 少帝를 폐하고 憲帝를 옹립하고 정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극에 달한 포학한 정치를 했다.
당시 황건의 난이 일어나자 각지의 호족은 종족이나 賓客, 소작인을 조직하여 자위를 위한 무장집단을 만들었는데 지방의 州牧이나 태수는 군민의 전권을 장악하고 이들 무장집단을 규합해 점차 群雄化했다. 동탁이 그러했고 원소나 袁術, 孫堅이나 劉表 그리고 曹操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들은 동탁의 횡포를 알고 190년 원소를 맹주로 삼아 동탁토벌의 군대를 일으켰다.
동탁은 헌제를 옹립해 견고한 장안으로 천도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낙양시가에 불을 놓았다. 약 170년에 걸쳐 천하의 중심이었던 수도 낙양은 무참하게도 재로 돌아가버렸다. 이것은 동시에 후한제국의 말로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장안에서 동탁은 더욱더 흉폭해졌는데 192년 마침내 부하의 손에 살해되자, 군웅은 각기 자기의 지반확보와 세력권의 확대를 둘러싸고 서로 맹열히 싸웠다. 이러한 군웅할거 속에서 헌제는 이름뿐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동탁이 멸망한 후 헌제는 조조에게 끌려 위(魏)의 발전을 위해 이용되다 220년에는 조조의 아들 曹丕(魏의 文帝)에게 `쫑겨나 마침내 자리를 양도했다. 광무제 이래 196년, 고조 즉위로부터 세면 422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통일 정권을 유지해 온 한 제국은 여기에서 막을 내리고 역사는 魏, 蜀, 吳 3국 정립시대로 돌입하게된다.
Ⅹ. 結論
漢의 통일제국이 붕괴한 후 중국은 지방에 세력을 둔 호족의 발전과 주변 이민족의 자립운동에 의해 단명한 왕조가 각지에서 어지럽게 흥망하는 분열상태에 빠지고 만다.
한의 멸망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환관과 태후 및 외척과 붕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역사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멸망 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던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한왕조의 패망의 지엽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한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의 정치체제에 있다. 지방호족은 그 자체는 反漢的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호족이야말로 한나라의 통일정치에 가장 많이 의존하여, 한 왕조에 의한 비교적 평화적인 지배 아래에서 그 세력을 육성시켜 온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이 성정하면서 호족은 위로는 중앙정권에 접근해서 귀족이 되고 싶어하고, 아래로는 토지를 겸병하고 인민을 예속시키고자 하였다. 호족세력이 뿌리를 내리면서 토지, 인민이 호족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고, 한나라조정의 정치력이 하층의 인민에게 관철될 힘을 상실하였다. 한 왕조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졌고, 새로운 해법을 구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분열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재차 중국을 통일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세계를 형성한 것은 6세기 말의 隋, 그리고 7세기 초의 唐의 출현까지 기다려야했다. 후한의 멸망 후 대략 4백년을 중국은 새로운 질서원리를 모색하면서 고뇌와 시련의 긴 도정을 걷게 된다.
參 考 文 獻
― 이춘식, 『중국 고대사의 전개』, 신서원, 1996.
― 이근명, 『중국역사 上』, 신서원, 1993.
― 윤내현, 『중국사 1』, 민음사, 1991.
― 전락성 著·신승하 譯, 『중국통사 上』, 우종사, 1981.
― 송환도웅外 著·조성을 譯, 『중국사개설』, 한울아카데미, 1989.
― 서윤달 外, 『중국통사』, 청년사, 1989.
― 이춘직,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1991.
― 박건주 譯,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1』, 신서원, 1996.
― 신승하, 『중국사』, 대한교과서, 1989
― 김철희, 「황건난의 고찰」『檀史學報(창간호)』, 단국대학교, 1985 3月.
Ⅸ. 後漢의 滅亡
황건의 주력군이 평정되자 중앙에서는 권력투쟁이 여지없이 재개되었다. 189년 영제가 죽고 황태자 弁이 즉위하자 외척 何進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禁軍의 장군 袁紹와 환관주멸계획을 세워 산서로 진군하고 있던 맹장 董卓에게 낙양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계획이 누설되어 하진이 환관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원소는 병을 이끌고 궁중에 들어가 환관 2천여명을 모조리 죽여 환관을 일소했다. 뒤늦게 달려온 동탁은 少帝를 폐하고 憲帝를 옹립하고 정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극에 달한 포학한 정치를 했다.
당시 황건의 난이 일어나자 각지의 호족은 종족이나 賓客, 소작인을 조직하여 자위를 위한 무장집단을 만들었는데 지방의 州牧이나 태수는 군민의 전권을 장악하고 이들 무장집단을 규합해 점차 群雄化했다. 동탁이 그러했고 원소나 袁術, 孫堅이나 劉表 그리고 曹操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들은 동탁의 횡포를 알고 190년 원소를 맹주로 삼아 동탁토벌의 군대를 일으켰다.
동탁은 헌제를 옹립해 견고한 장안으로 천도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낙양시가에 불을 놓았다. 약 170년에 걸쳐 천하의 중심이었던 수도 낙양은 무참하게도 재로 돌아가버렸다. 이것은 동시에 후한제국의 말로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장안에서 동탁은 더욱더 흉폭해졌는데 192년 마침내 부하의 손에 살해되자, 군웅은 각기 자기의 지반확보와 세력권의 확대를 둘러싸고 서로 맹열히 싸웠다. 이러한 군웅할거 속에서 헌제는 이름뿐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동탁이 멸망한 후 헌제는 조조에게 끌려 위(魏)의 발전을 위해 이용되다 220년에는 조조의 아들 曹丕(魏의 文帝)에게 `쫑겨나 마침내 자리를 양도했다. 광무제 이래 196년, 고조 즉위로부터 세면 422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통일 정권을 유지해 온 한 제국은 여기에서 막을 내리고 역사는 魏, 蜀, 吳 3국 정립시대로 돌입하게된다.
Ⅹ. 結論
漢의 통일제국이 붕괴한 후 중국은 지방에 세력을 둔 호족의 발전과 주변 이민족의 자립운동에 의해 단명한 왕조가 각지에서 어지럽게 흥망하는 분열상태에 빠지고 만다.
한의 멸망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환관과 태후 및 외척과 붕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역사의 진행 과정을 살펴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멸망 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던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한왕조의 패망의 지엽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한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의 정치체제에 있다. 지방호족은 그 자체는 反漢的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호족이야말로 한나라의 통일정치에 가장 많이 의존하여, 한 왕조에 의한 비교적 평화적인 지배 아래에서 그 세력을 육성시켜 온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이 성정하면서 호족은 위로는 중앙정권에 접근해서 귀족이 되고 싶어하고, 아래로는 토지를 겸병하고 인민을 예속시키고자 하였다. 호족세력이 뿌리를 내리면서 토지, 인민이 호족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고, 한나라조정의 정치력이 하층의 인민에게 관철될 힘을 상실하였다. 한 왕조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졌고, 새로운 해법을 구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분열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재차 중국을 통일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세계를 형성한 것은 6세기 말의 隋, 그리고 7세기 초의 唐의 출현까지 기다려야했다. 후한의 멸망 후 대략 4백년을 중국은 새로운 질서원리를 모색하면서 고뇌와 시련의 긴 도정을 걷게 된다.
參 考 文 獻
― 이춘식, 『중국 고대사의 전개』, 신서원, 1996.
― 이근명, 『중국역사 上』, 신서원, 1993.
― 윤내현, 『중국사 1』, 민음사, 1991.
― 전락성 著·신승하 譯, 『중국통사 上』, 우종사, 1981.
― 송환도웅外 著·조성을 譯, 『중국사개설』, 한울아카데미, 1989.
― 서윤달 外, 『중국통사』, 청년사, 1989.
― 이춘직,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1991.
― 박건주 譯,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1』, 신서원, 1996.
― 신승하, 『중국사』, 대한교과서, 1989
― 김철희, 「황건난의 고찰」『檀史學報(창간호)』, 단국대학교, 1985 3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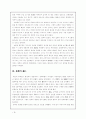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