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목차
제1장 총론
한국 문학사의 쟁점 개관
제2장 유학자의 소설관과 소설사의 시대구분
제3장 작자시비와 작품구조<홍길동전,춘향전,화사>
제4장 설화해석의 제문제<헌화가 설화 ,목주가와 사모곡,춘향전의 근원설화등>
제5장 성리학과 문학인식
한국 문학사의 쟁점 개관
제2장 유학자의 소설관과 소설사의 시대구분
제3장 작자시비와 작품구조<홍길동전,춘향전,화사>
제4장 설화해석의 제문제<헌화가 설화 ,목주가와 사모곡,춘향전의 근원설화등>
제5장 성리학과 문학인식
본문내용
어머님의 사랑이 더욱 지중함을 읊었다고는 볼 수 없다. 가람 이병기는 안정복이 抄 한 『목천읍지』의 본 설화 다음에 <사모곡>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고려사』에 전하는 목주효녀의 설화내용만 기록되어 있을뿐 이병기가 증언한 바 목주설화 다음에 <사모곡>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류이고 안죽향의 효행설화가 기록되어있을 뿐이다. 이병기의 주장은 아마 피상적인 고증에서 온 오류라 생각된다. 이병기의 설이 오류이고 <목주가>와 <사모곡>이 별개의 작품임이 증명되었으므로 <목주가>에서 <엇노리>로, 다시<사모곡>이 되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3.목주가 설화와 사모곡과의 상치점
1)<목주가>는 『고려사』권 71악지 <삼국속악>조에 신라의 노래로 분류해 둔 것만을 신빙하여 신라시대의 작품이라 간주하여 왔으나 앞에서 논증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보아 신라대의 작품은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는 어느 시대 어떤 종류의 작품일까? 이에 대해서는 작품 자체가 전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논증은 불가능하나 우선 목주에 사는 어느 효녀가 스스로를 원망한 것이라는 기록을 보아 이는 고려대의 작품으로 짐작된다. 만약 『고려사』의 기록대로 신라시대의 작품이라 한다면 전술한 지명 연혁의 변천상에 의하여 <목주가>가 아닌 <대록가>라야 옳았을 것이다. 그리고 작품자체가 전하지 않으므로 <목주가>가 과연 민요인가 아니면 가사인가를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목주가>의 창작동기로 미루어 보아 목주 요녀의 자원가였으니 이는 고려시대부터 구전되어 오면서 목주 지방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즐겨 불리던 민요라고 짐작할 수 있다.
2)<목주가>는 전항의 검토결과, 신라시대의 작품이며<사모곡>의 별칭이라는 증언은 부정되었다. 따라서<목주가>와 사모곡>은 다같이 고려대의 민요이며 거의 동시대의 작품으로 짐작되고 <목주가>의 가사가 현존한다면 고려가요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3)<목주가>가 <엇노리>로, 이것이 다시 <사모곡>이 되었다는 명칭 변천상은 논증한 바로써 불가능함이 증명되었다.
이상 논의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목주가>는 지금까지 『고려사』의 피상적인 기록만 보고 신라대의 작품으로 기왕의 연구자들은 믿고 있었으나 논증한 바와 같이 목주라는 지명 연혁의 고증에서 고려대의 작품으로 목주지방의 한 효녀가 지음 민요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는 지명을 따서 작품의 제목을 지었을 경우 지명이 변했다 해서 제목이 변한 예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가람 이병기의 설인 <목주가>와 <사모곡>를 별칭으로 다룬 것은 피상적인 고증에서 온 오류였다. 양자간에는 어머니를 소재로 하되 <목주가>에서는 작자 자신이 자원한 것으로 보아 효녀 자신의 원사이며 자탄가인데 반하여,<사모곡>은 어버이의 사랑 중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 지중하고 자상함을 그린 것으로 양자는 상호 별개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셋째,<목주가>가 신라 시대의 작품이라 하여 <목주가>에서 엇노리로 다시 사모곡이 되었다는 추론은 논증한 바와 같이 <목주가>가 신라시대의 작품이 아니고 동시에<사모곡>의 별칭일 수도 없음에 따라 명칭변천상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넷째,<목주가>는 고려시대 목주에 살았던 한 효녀가 자기의 기구한 운명에 몸부림치다 자원한 탄식류의 민요로서 지금은 흩어져 없어졌거나 아니면 사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존한다면 고려 가요로서 <사모곡>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다섯째,<목주가>가 발굴된다면 이에 대한 새로운 작품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는 불가하여 작품연구가 아닌 문제점 연구에서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Ⅲ.시조 신화의 양상
신화가 우리 문학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서사문학의 논자들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신화가 지닌 상징성, 어구해석, 외국 신화와의 관계 등, 신화에 대해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화적인 인물, 신화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밝혀 신화의 외연적인 문제에 한한 시조 신화의 양상을 구현해 내고 이것으로 하여금 시조 신화의 변이 과정과 당시인의 세계관을 탐색하여 후대 서사문학에 미친 영향을 추구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래서 신화적인 질서가 비교적 정연하다고 생각되는 시조 신화에 한하고 이들 시조 신화를 건국 시조 신화와 성씨시조신화로 양분하였다.
1.건국시조신화
건국 시조신화란 신화 가운데도 건국시조들에 관한 신화를 지칭함이고 건국시조가 곧 성씨시조를 겸하는 것이다. 성씨시조 모두가 건국시조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국 시조 신화에 관계되는 성씨시조 신화는 건국시조 신화로만 간주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탐색을 위한 편의상의 분류다.
1)단군신화
천제(天帝)인 환인(桓因)의 서자(庶子:衆子의 뜻)이며 단군의 아버지이다. 환인으로부터 천부인(天符印) 3개를 받아 무리 3,000을 거느리고 세상에 내려왔다. 태백산(太白山)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신시(神市)를 열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사람이 되고자 간청하므로, 쑥과 마늘을 주고 어두운 굴속에서 수도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였더니, 호랑이는 참지 못해 뛰어나오고 곰은 참아낸 끝에 여자가 되었다. 환웅은 그 웅녀(熊女)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단군왕검이라 일컬었다. 그가 도읍을 조선이라 하니 치국1908년이었다.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단군은 아사달에 돌아와 신선이 되었다.
2)동명왕신화
북부여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 가고, 해부루가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하려는데 말이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려 돌을 굴려보니 금빛개구리 모양이라서 금와라 하고 장성함에 태자로 삼았다. 그리고 해부루가 돌아가자 금와가 왕위를 이었다.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발水)에서 만나 물으니, 자신은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花)인데 동생들과 놀러 나왔다가 해모수를 만나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는 가서 돌아오지 않고 부모에게
3.목주가 설화와 사모곡과의 상치점
1)<목주가>는 『고려사』권 71악지 <삼국속악>조에 신라의 노래로 분류해 둔 것만을 신빙하여 신라시대의 작품이라 간주하여 왔으나 앞에서 논증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보아 신라대의 작품은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는 어느 시대 어떤 종류의 작품일까? 이에 대해서는 작품 자체가 전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논증은 불가능하나 우선 목주에 사는 어느 효녀가 스스로를 원망한 것이라는 기록을 보아 이는 고려대의 작품으로 짐작된다. 만약 『고려사』의 기록대로 신라시대의 작품이라 한다면 전술한 지명 연혁의 변천상에 의하여 <목주가>가 아닌 <대록가>라야 옳았을 것이다. 그리고 작품자체가 전하지 않으므로 <목주가>가 과연 민요인가 아니면 가사인가를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목주가>의 창작동기로 미루어 보아 목주 요녀의 자원가였으니 이는 고려시대부터 구전되어 오면서 목주 지방의 부녀자들 사이에서 즐겨 불리던 민요라고 짐작할 수 있다.
2)<목주가>는 전항의 검토결과, 신라시대의 작품이며<사모곡>의 별칭이라는 증언은 부정되었다. 따라서<목주가>와 사모곡>은 다같이 고려대의 민요이며 거의 동시대의 작품으로 짐작되고 <목주가>의 가사가 현존한다면 고려가요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3)<목주가>가 <엇노리>로, 이것이 다시 <사모곡>이 되었다는 명칭 변천상은 논증한 바로써 불가능함이 증명되었다.
이상 논의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목주가>는 지금까지 『고려사』의 피상적인 기록만 보고 신라대의 작품으로 기왕의 연구자들은 믿고 있었으나 논증한 바와 같이 목주라는 지명 연혁의 고증에서 고려대의 작품으로 목주지방의 한 효녀가 지음 민요였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는 지명을 따서 작품의 제목을 지었을 경우 지명이 변했다 해서 제목이 변한 예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가람 이병기의 설인 <목주가>와 <사모곡>를 별칭으로 다룬 것은 피상적인 고증에서 온 오류였다. 양자간에는 어머니를 소재로 하되 <목주가>에서는 작자 자신이 자원한 것으로 보아 효녀 자신의 원사이며 자탄가인데 반하여,<사모곡>은 어버이의 사랑 중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 지중하고 자상함을 그린 것으로 양자는 상호 별개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셋째,<목주가>가 신라 시대의 작품이라 하여 <목주가>에서 엇노리로 다시 사모곡이 되었다는 추론은 논증한 바와 같이 <목주가>가 신라시대의 작품이 아니고 동시에<사모곡>의 별칭일 수도 없음에 따라 명칭변천상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넷째,<목주가>는 고려시대 목주에 살았던 한 효녀가 자기의 기구한 운명에 몸부림치다 자원한 탄식류의 민요로서 지금은 흩어져 없어졌거나 아니면 사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존한다면 고려 가요로서 <사모곡>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다섯째,<목주가>가 발굴된다면 이에 대한 새로운 작품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는 불가하여 작품연구가 아닌 문제점 연구에서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Ⅲ.시조 신화의 양상
신화가 우리 문학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서사문학의 논자들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신화가 지닌 상징성, 어구해석, 외국 신화와의 관계 등, 신화에 대해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화적인 인물, 신화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밝혀 신화의 외연적인 문제에 한한 시조 신화의 양상을 구현해 내고 이것으로 하여금 시조 신화의 변이 과정과 당시인의 세계관을 탐색하여 후대 서사문학에 미친 영향을 추구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래서 신화적인 질서가 비교적 정연하다고 생각되는 시조 신화에 한하고 이들 시조 신화를 건국 시조 신화와 성씨시조신화로 양분하였다.
1.건국시조신화
건국 시조신화란 신화 가운데도 건국시조들에 관한 신화를 지칭함이고 건국시조가 곧 성씨시조를 겸하는 것이다. 성씨시조 모두가 건국시조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국 시조 신화에 관계되는 성씨시조 신화는 건국시조 신화로만 간주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탐색을 위한 편의상의 분류다.
1)단군신화
천제(天帝)인 환인(桓因)의 서자(庶子:衆子의 뜻)이며 단군의 아버지이다. 환인으로부터 천부인(天符印) 3개를 받아 무리 3,000을 거느리고 세상에 내려왔다. 태백산(太白山)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신시(神市)를 열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사람이 되고자 간청하므로, 쑥과 마늘을 주고 어두운 굴속에서 수도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였더니, 호랑이는 참지 못해 뛰어나오고 곰은 참아낸 끝에 여자가 되었다. 환웅은 그 웅녀(熊女)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단군왕검이라 일컬었다. 그가 도읍을 조선이라 하니 치국1908년이었다.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단군은 아사달에 돌아와 신선이 되었다.
2)동명왕신화
북부여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 가고, 해부루가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하려는데 말이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려 돌을 굴려보니 금빛개구리 모양이라서 금와라 하고 장성함에 태자로 삼았다. 그리고 해부루가 돌아가자 금와가 왕위를 이었다.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발水)에서 만나 물으니, 자신은 하백(河伯)의 딸로 이름은 유화(柳花)인데 동생들과 놀러 나왔다가 해모수를 만나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는 가서 돌아오지 않고 부모에게
추천자료
 고전문학총정리 완결판
고전문학총정리 완결판 [고전문학] 경기체가· 시조· 가사의 형성
[고전문학] 경기체가· 시조· 가사의 형성 [고전문학분석] 고소설에 나타난 부·자 분리의 형식과 제양상
[고전문학분석] 고소설에 나타난 부·자 분리의 형식과 제양상 [고전문학]조웅전 - 연구사, 작품분석, 문학사적 위상
[고전문학]조웅전 - 연구사, 작품분석, 문학사적 위상 고전문학의 재 해석 - 두껍전
고전문학의 재 해석 - 두껍전 [고전문학]만복사저포기 - 문학사적 의의, 작품분석
[고전문학]만복사저포기 - 문학사적 의의, 작품분석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고전문학 - 조명희의 ‘낙동강’ 작품분석
고전문학 - 조명희의 ‘낙동강’ 작품분석 [고전문학 교육론] 슬견설
[고전문학 교육론] 슬견설 [고전문학 교육론] 토의학습을 통한 가사교육 -관동별곡-
[고전문학 교육론] 토의학습을 통한 가사교육 -관동별곡- [고전문학 교육론] 희곡으로서의 봉산탈춤 - 음악 수업과의 공유형 교육과정 측면에서
[고전문학 교육론] 희곡으로서의 봉산탈춤 - 음악 수업과의 공유형 교육과정 측면에서 [고전문학 교육론] 허생전 수업 지도안
[고전문학 교육론] 허생전 수업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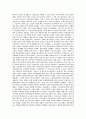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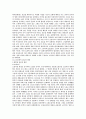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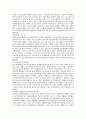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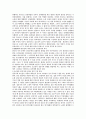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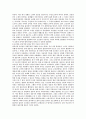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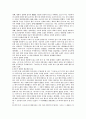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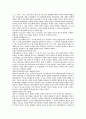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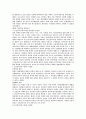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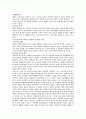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