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업내 복수노조가 있다. 체크오프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 조합원의 체크오프 조합비를 사용자가 다른 조합에 인도한 경우의 지급 내지는 반환의무가 문제된 판례를 소개한다.
_ 사용자가 체크오프 조합비를 다른 조합에 건네 준 경우에는 사용자 다른 조합과 함께 지급 내지는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는 全金東洋시트지부사건(廣島地判 1984.2.29.)이다. 이는 사용자가 산업별 단일조합(=全金) 탈퇴결의를 계기로 탈퇴하여 설립된 신조합(=東洋시트노조)에 구 조합 전체 조합원의 체크오프 조합비 등을 인도한 것에 대하여 잔류조합(=全金東洋시트支部)이 사용자와 신 조합을 피고로 하여 자기 조합 원분의 체크오프 조합비 등의 지급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주82)
주82) 勞動判例 제437호.
_ 또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체크오프 조합비를 다른 조합에 건네 준 경우 사용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있지만 다른 조합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는 全金東洋시트支部사건(廣島高判 1988.6.28.)이다. 이는 \"피항소인 조합은 항소인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체크오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지만, 피항소인 조합은 항소인회사에게 소로서 부적법한 장래의 청구부분을 제외하고, 체크오프협정에 근거한 이행으로서 그 주장의 체크오프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설시한대로이고, 피항소인조합이 앞에서 기술한 대로 항소인회사에서 체크오프[467] 금을 수령하였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 당연히 피항소인조합이 항소인회사에 대한 체크오프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피항소인조합에는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해서 판단할 필요까지 없이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피항소인조합은 항소인조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앞에 기술 …… 의 상당액의 지불을 구하는가. 마찬가지 이유로 피항소인조합에는 그 손해가 생기지 않으므로 피항소인조합과의 관계에서는 부당이득은 아니고, 그 다른 점에 관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당이득에 근거한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주83)
주83) 勞動判例 제529호.
VI. 결 론
_ (1) 체크오프제가 원만하게 행해진 대기업에서도 격렬한 노동쟁의가 일어나거나 조합내에서 조직적 대립이 생긴 경우에는 체크오프의 계속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데 노사간의 단체협약 절차의 면에서도 일정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사용자의 체크오프의 중지라는 행위자체가 직접적으로 조합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체크오프가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고 노사간의 협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체크오프 중지가 기타 조합에 대한 적대적(antagonism) 언동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당노동행위의 판단문제는 사례별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하며, 그 판단기준은 노동위원회(법원)의 재량이 중요한 것이 된다. 또한 체크오프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는 거의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오히려 체크오프가 노조 자주성을 지탱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_ 그리고 노사는 체크오프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조 관행을 인정하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즉, 조합비징수는 조합 자체가 하는 것[468] 이 원칙이고, 노사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각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체크오프하여 일괄적으로 노조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물론 노사협정외에도 근로자인 조합원 개별적 동의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_ 또한 조합원 개인이 체크오프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체크오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조합비 체크오프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조합비는 사용자가 체크오프할 권한이 없다. 이에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이 체크오프에 반대하여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공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말미에 삽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_ 체크오프에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프랑스는 체크오프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고, 영국은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상 조합비공제의 중지를 요구할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체크오프를 부당노동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_ (2) 오늘날에도 여전히 체크오프가 노동조합에서 갖는 의의는 조합비가 확실히 노동조합의 수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조합재정이 안정되고, 조합비 징수사무의 복잡함에서 해방되어 노조의 본래적인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조합비를 자동징수함으로써 조합비미납에 의한 조합원의 탈퇴 제명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조합원의 수를 용이하게 유지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조자주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조합비를 직접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아 노조와 조합원의 사이의 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체크오프가 노조에서의 원래적인 기능은 아니다. 그러나 가령 이러한 결과는 그 원인을 체크오프 자체에서 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물론 노조가 체크오프에 의해 확보된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노조의 재량에 달려있다. 오히려 체크오프가 지금도 보급되고 노조 자주성을 보장한 것이 기업 합리화가 진행되는 시기와 중복주84) 됨은 체크오프의 조합활동 시간 창설기능의 의의에 착안한 것이다. 확실히 노조가 조합비를 노력하지 않고서[469] 인수하는 체크오프제가 가져올 조합활동 시간의 창설이라는 효과가 현실적으로 가치우위성을 갖는 승인으로 가령 반대 조합원에게도 강제되어 체크오프의 의의가 실제상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84) 橫井芳弘, \"チェツク オフ協定と相計\", 「勞動旬報」, 제856호, 37면 이하 참조.
_ (3) 마지막으로 체크오프협정도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하며, 이 때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여후효가 문제되지만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여후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체크오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노사는 또한 유념해야하지 않나 여겨진다.
_ 사용자가 체크오프 조합비를 다른 조합에 건네 준 경우에는 사용자 다른 조합과 함께 지급 내지는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는 全金東洋시트지부사건(廣島地判 1984.2.29.)이다. 이는 사용자가 산업별 단일조합(=全金) 탈퇴결의를 계기로 탈퇴하여 설립된 신조합(=東洋시트노조)에 구 조합 전체 조합원의 체크오프 조합비 등을 인도한 것에 대하여 잔류조합(=全金東洋시트支部)이 사용자와 신 조합을 피고로 하여 자기 조합 원분의 체크오프 조합비 등의 지급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주82)
주82) 勞動判例 제437호.
_ 또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체크오프 조합비를 다른 조합에 건네 준 경우 사용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있지만 다른 조합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는 全金東洋시트支部사건(廣島高判 1988.6.28.)이다. 이는 \"피항소인 조합은 항소인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체크오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지만, 피항소인 조합은 항소인회사에게 소로서 부적법한 장래의 청구부분을 제외하고, 체크오프협정에 근거한 이행으로서 그 주장의 체크오프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설시한대로이고, 피항소인조합이 앞에서 기술한 대로 항소인회사에서 체크오프[467] 금을 수령하였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 당연히 피항소인조합이 항소인회사에 대한 체크오프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피항소인조합에는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근거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해서 판단할 필요까지 없이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피항소인조합은 항소인조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앞에 기술 …… 의 상당액의 지불을 구하는가. 마찬가지 이유로 피항소인조합에는 그 손해가 생기지 않으므로 피항소인조합과의 관계에서는 부당이득은 아니고, 그 다른 점에 관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당이득에 근거한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주83)
주83) 勞動判例 제529호.
VI. 결 론
_ (1) 체크오프제가 원만하게 행해진 대기업에서도 격렬한 노동쟁의가 일어나거나 조합내에서 조직적 대립이 생긴 경우에는 체크오프의 계속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데 노사간의 단체협약 절차의 면에서도 일정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사용자의 체크오프의 중지라는 행위자체가 직접적으로 조합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체크오프가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고 노사간의 협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체크오프 중지가 기타 조합에 대한 적대적(antagonism) 언동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당노동행위의 판단문제는 사례별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하며, 그 판단기준은 노동위원회(법원)의 재량이 중요한 것이 된다. 또한 체크오프가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는 거의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오히려 체크오프가 노조 자주성을 지탱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_ 그리고 노사는 체크오프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조 관행을 인정하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즉, 조합비징수는 조합 자체가 하는 것[468] 이 원칙이고, 노사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각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체크오프하여 일괄적으로 노조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물론 노사협정외에도 근로자인 조합원 개별적 동의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_ 또한 조합원 개인이 체크오프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체크오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조합비 체크오프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조합비는 사용자가 체크오프할 권한이 없다. 이에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이 체크오프에 반대하여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공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말미에 삽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_ 체크오프에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프랑스는 체크오프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고, 영국은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상 조합비공제의 중지를 요구할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체크오프를 부당노동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_ (2) 오늘날에도 여전히 체크오프가 노동조합에서 갖는 의의는 조합비가 확실히 노동조합의 수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조합재정이 안정되고, 조합비 징수사무의 복잡함에서 해방되어 노조의 본래적인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조합비를 자동징수함으로써 조합비미납에 의한 조합원의 탈퇴 제명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조합원의 수를 용이하게 유지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조자주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조합비를 직접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아 노조와 조합원의 사이의 결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체크오프가 노조에서의 원래적인 기능은 아니다. 그러나 가령 이러한 결과는 그 원인을 체크오프 자체에서 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물론 노조가 체크오프에 의해 확보된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노조의 재량에 달려있다. 오히려 체크오프가 지금도 보급되고 노조 자주성을 보장한 것이 기업 합리화가 진행되는 시기와 중복주84) 됨은 체크오프의 조합활동 시간 창설기능의 의의에 착안한 것이다. 확실히 노조가 조합비를 노력하지 않고서[469] 인수하는 체크오프제가 가져올 조합활동 시간의 창설이라는 효과가 현실적으로 가치우위성을 갖는 승인으로 가령 반대 조합원에게도 강제되어 체크오프의 의의가 실제상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84) 橫井芳弘, \"チェツク オフ協定と相計\", 「勞動旬報」, 제856호, 37면 이하 참조.
_ (3) 마지막으로 체크오프협정도 그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하며, 이 때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여후효가 문제되지만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여후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체크오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노사는 또한 유념해야하지 않나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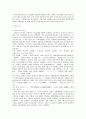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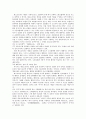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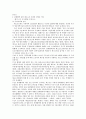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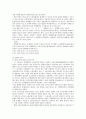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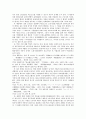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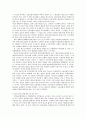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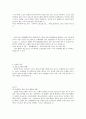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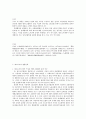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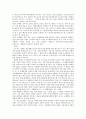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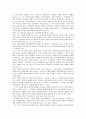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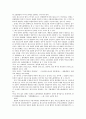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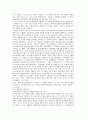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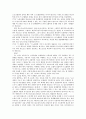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