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귀족제 이해의 시각
Ⅱ. 귀족의 존재형능
Ⅲ. 황제․귀족․한인
Ⅳ. 향촌과 귀족
맺음말
Ⅱ. 귀족의 존재형능
Ⅲ. 황제․귀족․한인
Ⅳ. 향촌과 귀족
맺음말
본문내용
로 현자, 혹은 유덕자로서 향론의 지지를 얻게된다. 이 향론은 제 1차, 2차, 3차 향론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이 구조를 기초로 해서 전국적인 향론의 연결망을 갖게된다. 이 구조는 후한말부터 형성되어 그들의 인물비평을 통해 정부관료 서열과는 별개의 명사서열을 만들어낸다. 이는 후한 정부가 임명한 관료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으며, 청류파를 중심으로 정부와는 별개의 독자 세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들 청류 세력들은 자기의 이상 실현을 위해 각자 군벌에 참여하였고, 결국 3국 정립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청류파 사대부들은 곧 삼국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들 대표적 사대부가로부터 위진귀족이 형성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이다.
이런 향론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 구품관인법이었다. 서진시대 주대중정제의 설치로 본연의 구조원칙을 잃고 귀족의 세습화 현상을 조장시켰고,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귀족제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진 이후, 북래 교성귀족들에게는 향당 사회와의 분열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귀족과 향당 사회 사이에 직접적 연결이 끊어진 후에도 향당 사회는 일종의 관념형태로 남아 귀족들에게 규제력을 발휘하여. 황제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질서를 상대화시켰다. 이처럼 귀족에게는 여전히 ‘향당’이라는 것이 그 형성의 모태가 되고, 귀족으로서 존립을 보증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남조귀족의 무학식, 무능력, 비도덕성은 향당의 상실로 연결되었다. 북쪽의 산동귀족들이 북위말 혼란기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향당의 세력을 업고 군벌과 동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향촌에 세력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사람됨 자체도 호협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위기극복능력을 상실한 남조의 소멸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맺음말
필자의 결론은‘봉건제’의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시킨다면 이 시대는 중세 봉건제사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 귀족은 스스로 사회적으로 일반민과 격리된 우월한 존재로서 자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황제측으로서도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귀족의 정치적 지위는 초왕조적으로 그 보장의 권한은 기층사회인 향론에 있었다. 위진남조 귀족은 점차 학문적 능력, 경제력, 행정능력과 치자의식을 잃어감으로서 향론의 기대를 잃어갔다. ‘향당의 상실’이야말로 그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던 것이다. 거기에 일퇴를 가한 것이 바로 후경(候景)의 난(亂)이었다.
이런 향론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 구품관인법이었다. 서진시대 주대중정제의 설치로 본연의 구조원칙을 잃고 귀족의 세습화 현상을 조장시켰고,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귀족제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동진 이후, 북래 교성귀족들에게는 향당 사회와의 분열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귀족과 향당 사회 사이에 직접적 연결이 끊어진 후에도 향당 사회는 일종의 관념형태로 남아 귀족들에게 규제력을 발휘하여. 황제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질서를 상대화시켰다. 이처럼 귀족에게는 여전히 ‘향당’이라는 것이 그 형성의 모태가 되고, 귀족으로서 존립을 보증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남조귀족의 무학식, 무능력, 비도덕성은 향당의 상실로 연결되었다. 북쪽의 산동귀족들이 북위말 혼란기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향당의 세력을 업고 군벌과 동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향촌에 세력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사람됨 자체도 호협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위기극복능력을 상실한 남조의 소멸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맺음말
필자의 결론은‘봉건제’의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시킨다면 이 시대는 중세 봉건제사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 귀족은 스스로 사회적으로 일반민과 격리된 우월한 존재로서 자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황제측으로서도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귀족의 정치적 지위는 초왕조적으로 그 보장의 권한은 기층사회인 향론에 있었다. 위진남조 귀족은 점차 학문적 능력, 경제력, 행정능력과 치자의식을 잃어감으로서 향론의 기대를 잃어갔다. ‘향당의 상실’이야말로 그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던 것이다. 거기에 일퇴를 가한 것이 바로 후경(候景)의 난(亂)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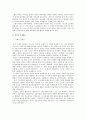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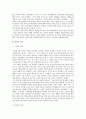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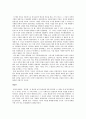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