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야곡(이육사)
▲삼수갑산(김소월)
▲산(김광섭)
▲이어도(IYEU도)(정한숙)
▲홍길동전(허균)
▲봉산탈춤
▲딸각발이(이희승)
▲치숙(채만식)
▲어져 내일이야(시조)
▲심산에 밤이 드니(시조)
▲천만리 머나먼(시조)
▲삼수갑산(김소월)
▲산(김광섭)
▲이어도(IYEU도)(정한숙)
▲홍길동전(허균)
▲봉산탈춤
▲딸각발이(이희승)
▲치숙(채만식)
▲어져 내일이야(시조)
▲심산에 밤이 드니(시조)
▲천만리 머나먼(시조)
본문내용
고 있음
○ 배경
* 시대적 배경 -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 사회적 배경 - 봉건 질서의 해체에 따른 신분 질서 와해
○ 전승 지역 : 황해도 봉산
○ 형성 시기 : 조선 후기(18세기)
○ 공연 주체 : 주로 상인과 이속(吏屬)들
○ 의의
① 짙은 해학과 풍자를 통한 근대적 시민 의식을 표현
② 대표적 민속극으로 중요 무형 문화재 17호
◎ 구성
* 발단 : 등장 인물 소개(p130:처음 ∼ p130:11)
* 전개 : ①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재담과 조롱(p130:12 ∼ p137:16)
* 양반 신분에 대한 조롱과 비하 (p130:12 ∼ p132:11)
* 담배를 소재로한 재담 (p132:12 ∼ p133:4)
* 장단을 소재로한 재담 (p133:5 ∼ p133:12)
* 양반을 찾으러 다니는 말뚝이의 재담 (p133:13 ∼ p136:10)
* 새처를 소재로한 재담 및 담배 축여 놓기 (p136:11 ∼ p137:16)
② 양반의 무지와 허세 폭로(p137:17 ∼ p139:8)
* 양반들의 시조 읊기 (p136:12 ∼ p138:2)
* 양반들의 한시 짓기 (p138:3 ∼ p138:21)
* 양반들의 파자 놀이 (p138:22 ∼ p139:8)
* 전환 : 양반의 비리 비판과 시대적 현실 풍자(p139:9 ∼ p140:5)
* 결말 : 인물 퇴장(p140:5 ∼p140:끝)
◎ 대화의 진행 방식
① 양반의 허세(위엄) → ② 말뚝이의 조롱 → ③ 양반의 질책 → ④ 말뚝이의 변명 → ⑤ 양반의 안심
◎ <봉산탈춤> \'양반과장\'의 등장 인물
① 샌님(생원) : 양반 삼 형제 중 맏이로, 두 줄 언청이이며 흰 창옷에 관을 썼음. 어색한 춤을 추며 등장함. 양반이기는 하나 학식과 교양이 모자람.
② 서방님 : 양반 삼 형제 중 둘째로, 한 줄 언청이이며, 흰 창옷에 관을 썼음. 어색한 춤을 추며 등장함. 무식하고 무능함.
③ 도련님 : 양반 삼 형제 중 막내로, 입이 삐뚤어졌고,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음. 대사가 없어 성격을 알 수는 없으나, 방정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양반의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인물임.
④ 말뚝이 :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말을 끄는 하인임. 천민이기는 하나 양반의 무능력과 이중 인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물임.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도 속으로는 등지거나 배반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의 행동을 보임. 이러한 말뚝이의 성격은 우리 나라의 가면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춘향전\'의 \'방자\'와도 통한다.
⑤ 취발이 : 상인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신흥 중산층 계급임. 나랏돈을 횡령하고 양반에게 잡혀오지만 돈으로 양반과 타협하여 징치(懲治)를 면함.
@ 벽공(碧空) -이희승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 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청정무구(淸淨無垢)를
드리우고 있건만.
핵심정리
갈래: 현대시조. 구별 배행 시조. 연시조
성격: 시각적, 청각적, 관조적,
제재: 푸른 하늘
주제 : 하늘의 티 없이 맑고 깨끗함 예찬하고 그렇지 못한 인간세계 비판.
출전: 박꽃(1947)
해설 1
1936년 \'현대 문학\'에 발표한 연작 시조로서, 가을 하늘의 맑음을 예찬한 서정적 노래이다. 자연을 대하는 작가의 마음이 청신한 비유를 통해 명경지수(明鏡止水)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3장 6구, 4음보의 현대 시조로서, \'추삼제(秋三題)\'라는 연시조의 하나이다. 이 시의 묘사적 성격은 한 폭의 수채화의 회화미를 보이고 있다. 가을 하늘을 제재로 하여, 원관념은 나타내지 않고 보조 관념만으로써, 티없이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을 예찬하였다. 현대 시조 특징의 하나인 4음보의 파격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시각·청각·촉각 등의 감각적 수법이 뛰어나다.
시행의 끝마다 미종결 종지법을 사용하여 함축미를 한껏 발산하고 있는 이 작품은 가을하늘에 대한 찬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에 따르지 못하는 인간 세계의 저속함을 개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2
이 시조는 푸른 하늘의 한없는 맑음을 노래하면서, 지극히 섬세한 감각을 보여주고 간결한 형식과 맛을 느끼게 한다. 하늘은 손톱으로 가볍게 튀겨도 깨질 것 같은 맑음과 출렁일 듯한 푸른 물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맑고 깨끗하여 청정 무구(淸淨無垢),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있건만\' 이라는 말로 여운을 남긴다.
@ 멋 -이희승
우리의 <멋>에 대해 이토록 깊고 너르고 다양하고 활달한 정의를 내릴 줄 아는 이가 바로 이희승 선생이다. 한민족의 문화와 의식 속에 스며있는 멋의 개념과 가치와 기능에 대해 이렇게 해박한 지식과 통찰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일까.
문명비평적인 이 글에서 지은이는 멋을 <흥청거림>과 <필요이상>의 두 단어로 간결하게 정의한다. 중국의 풍류와 서양의 유머와 일본의 사비와 우리의 멋이 어떻게 다른 지를 짚어내는 부분에서 지은이는 독자를 미학적 기쁨 속으로 빠뜨린다. 옷고름과 기와집의 추녀와 고려자기 물주전자의 귓대와 인두코까지 들먹이는 폭넓은 예시를 통해 우리의 멋이 <불편의 괴로움을 이기고도 남는 쾌감>을 주는 것임을 증명하는 그의 눈썰미는 귀하고 소중하기만하다.
멋을 잃어버린 과학시대, 과학병을 고칠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글의 말미는 <잃어버린 우리의 멋을 되찾아야 한다.>는 외침이 역설적으로 담겨 있다.
⑦ 딸깍발이 -이희승
<요점정리>
작자 : 이희승(李熙昇;1896∼1989)
형식 : 중수필, 서사적 수필
성격 : 교훈적, 비판적, 해학적, 설득적, 사회적
문체 : 한문투의 문체
제재 : 남산골 샌님(딸깍발이)의 \'선비정신\'
주제 : 현대인이 배워야 할 선비들의 의기와 강직
구성 :
① 딸깍발이의 유래
·나막신 끄는 소리
② 딸깍발이의 성격
· 자존심, 고지식, 지조
③ 딸깍발이의 의기와 정신
·선비 정신
④ 딸깍발이의 정신 계승
· 현대인에 대한 개탄
출전 : \'벙어리 냉가슴\'(1956)
⑨ 치숙 -채만식
무능한 인텔리의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아저씨는 일본에 가서 대학에도 다녔고 나이가 서른 셋이나 되는데도 철이 들지 않아 딱하다. 착한 아주머니를 친가로
○ 배경
* 시대적 배경 -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 사회적 배경 - 봉건 질서의 해체에 따른 신분 질서 와해
○ 전승 지역 : 황해도 봉산
○ 형성 시기 : 조선 후기(18세기)
○ 공연 주체 : 주로 상인과 이속(吏屬)들
○ 의의
① 짙은 해학과 풍자를 통한 근대적 시민 의식을 표현
② 대표적 민속극으로 중요 무형 문화재 17호
◎ 구성
* 발단 : 등장 인물 소개(p130:처음 ∼ p130:11)
* 전개 : ① 양반에 대한 말뚝이의 재담과 조롱(p130:12 ∼ p137:16)
* 양반 신분에 대한 조롱과 비하 (p130:12 ∼ p132:11)
* 담배를 소재로한 재담 (p132:12 ∼ p133:4)
* 장단을 소재로한 재담 (p133:5 ∼ p133:12)
* 양반을 찾으러 다니는 말뚝이의 재담 (p133:13 ∼ p136:10)
* 새처를 소재로한 재담 및 담배 축여 놓기 (p136:11 ∼ p137:16)
② 양반의 무지와 허세 폭로(p137:17 ∼ p139:8)
* 양반들의 시조 읊기 (p136:12 ∼ p138:2)
* 양반들의 한시 짓기 (p138:3 ∼ p138:21)
* 양반들의 파자 놀이 (p138:22 ∼ p139:8)
* 전환 : 양반의 비리 비판과 시대적 현실 풍자(p139:9 ∼ p140:5)
* 결말 : 인물 퇴장(p140:5 ∼p140:끝)
◎ 대화의 진행 방식
① 양반의 허세(위엄) → ② 말뚝이의 조롱 → ③ 양반의 질책 → ④ 말뚝이의 변명 → ⑤ 양반의 안심
◎ <봉산탈춤> \'양반과장\'의 등장 인물
① 샌님(생원) : 양반 삼 형제 중 맏이로, 두 줄 언청이이며 흰 창옷에 관을 썼음. 어색한 춤을 추며 등장함. 양반이기는 하나 학식과 교양이 모자람.
② 서방님 : 양반 삼 형제 중 둘째로, 한 줄 언청이이며, 흰 창옷에 관을 썼음. 어색한 춤을 추며 등장함. 무식하고 무능함.
③ 도련님 : 양반 삼 형제 중 막내로, 입이 삐뚤어졌고,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음. 대사가 없어 성격을 알 수는 없으나, 방정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 양반의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인물임.
④ 말뚝이 :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말을 끄는 하인임. 천민이기는 하나 양반의 무능력과 이중 인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물임.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도 속으로는 등지거나 배반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의 행동을 보임. 이러한 말뚝이의 성격은 우리 나라의 가면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춘향전\'의 \'방자\'와도 통한다.
⑤ 취발이 : 상인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신흥 중산층 계급임. 나랏돈을 횡령하고 양반에게 잡혀오지만 돈으로 양반과 타협하여 징치(懲治)를 면함.
@ 벽공(碧空) -이희승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 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청정무구(淸淨無垢)를
드리우고 있건만.
핵심정리
갈래: 현대시조. 구별 배행 시조. 연시조
성격: 시각적, 청각적, 관조적,
제재: 푸른 하늘
주제 : 하늘의 티 없이 맑고 깨끗함 예찬하고 그렇지 못한 인간세계 비판.
출전: 박꽃(1947)
해설 1
1936년 \'현대 문학\'에 발표한 연작 시조로서, 가을 하늘의 맑음을 예찬한 서정적 노래이다. 자연을 대하는 작가의 마음이 청신한 비유를 통해 명경지수(明鏡止水)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3장 6구, 4음보의 현대 시조로서, \'추삼제(秋三題)\'라는 연시조의 하나이다. 이 시의 묘사적 성격은 한 폭의 수채화의 회화미를 보이고 있다. 가을 하늘을 제재로 하여, 원관념은 나타내지 않고 보조 관념만으로써, 티없이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을 예찬하였다. 현대 시조 특징의 하나인 4음보의 파격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시각·청각·촉각 등의 감각적 수법이 뛰어나다.
시행의 끝마다 미종결 종지법을 사용하여 함축미를 한껏 발산하고 있는 이 작품은 가을하늘에 대한 찬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에 따르지 못하는 인간 세계의 저속함을 개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2
이 시조는 푸른 하늘의 한없는 맑음을 노래하면서, 지극히 섬세한 감각을 보여주고 간결한 형식과 맛을 느끼게 한다. 하늘은 손톱으로 가볍게 튀겨도 깨질 것 같은 맑음과 출렁일 듯한 푸른 물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맑고 깨끗하여 청정 무구(淸淨無垢),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있건만\' 이라는 말로 여운을 남긴다.
@ 멋 -이희승
우리의 <멋>에 대해 이토록 깊고 너르고 다양하고 활달한 정의를 내릴 줄 아는 이가 바로 이희승 선생이다. 한민족의 문화와 의식 속에 스며있는 멋의 개념과 가치와 기능에 대해 이렇게 해박한 지식과 통찰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일까.
문명비평적인 이 글에서 지은이는 멋을 <흥청거림>과 <필요이상>의 두 단어로 간결하게 정의한다. 중국의 풍류와 서양의 유머와 일본의 사비와 우리의 멋이 어떻게 다른 지를 짚어내는 부분에서 지은이는 독자를 미학적 기쁨 속으로 빠뜨린다. 옷고름과 기와집의 추녀와 고려자기 물주전자의 귓대와 인두코까지 들먹이는 폭넓은 예시를 통해 우리의 멋이 <불편의 괴로움을 이기고도 남는 쾌감>을 주는 것임을 증명하는 그의 눈썰미는 귀하고 소중하기만하다.
멋을 잃어버린 과학시대, 과학병을 고칠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글의 말미는 <잃어버린 우리의 멋을 되찾아야 한다.>는 외침이 역설적으로 담겨 있다.
⑦ 딸깍발이 -이희승
<요점정리>
작자 : 이희승(李熙昇;1896∼1989)
형식 : 중수필, 서사적 수필
성격 : 교훈적, 비판적, 해학적, 설득적, 사회적
문체 : 한문투의 문체
제재 : 남산골 샌님(딸깍발이)의 \'선비정신\'
주제 : 현대인이 배워야 할 선비들의 의기와 강직
구성 :
① 딸깍발이의 유래
·나막신 끄는 소리
② 딸깍발이의 성격
· 자존심, 고지식, 지조
③ 딸깍발이의 의기와 정신
·선비 정신
④ 딸깍발이의 정신 계승
· 현대인에 대한 개탄
출전 : \'벙어리 냉가슴\'(1956)
⑨ 치숙 -채만식
무능한 인텔리의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아저씨는 일본에 가서 대학에도 다녔고 나이가 서른 셋이나 되는데도 철이 들지 않아 딱하다. 착한 아주머니를 친가로
추천자료
 55개월 된 아동(또는 아동들)에게 개별 또는 집단 언어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하기 영역 활...
55개월 된 아동(또는 아동들)에게 개별 또는 집단 언어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하기 영역 활... 111215 수능어휘분석(12년수능) - 2012학년도 수능 외국어영역 기출문제 어휘 분석
111215 수능어휘분석(12년수능) - 2012학년도 수능 외국어영역 기출문제 어휘 분석 영유아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갖기 위한 언어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각 ...
영유아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갖기 위한 언어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각 ... 유치원 언어생활 영역과 표준보육과정 의사소통영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유치원 언어생활 영역과 표준보육과정 의사소통영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영역)에...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영역)에... 몬테소리 교육과정에 소개된 5개 영역(일상, 감각, 수, 언어, 문화)에 속하는 각각의 활동리...
몬테소리 교육과정에 소개된 5개 영역(일상, 감각, 수, 언어, 문화)에 속하는 각각의 활동리... 음성언어의 발달단계(일어문, 이어문, 다어문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을 두 가지씩 ...
음성언어의 발달단계(일어문, 이어문, 다어문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을 두 가지씩 ... (감상문) 잠들 때 들려주는 5분 구연동화 100가지 이야기, 무슨뜻이지(아이과학2단계-생물영...
(감상문) 잠들 때 들려주는 5분 구연동화 100가지 이야기, 무슨뜻이지(아이과학2단계-생물영... (언어지도 과제)영역별 언어지도 방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말하기 지도, 듣기 지도, 읽기 지...
(언어지도 과제)영역별 언어지도 방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말하기 지도, 듣기 지도, 읽기 지... [총체적언어교육] 총체적언어교육(언어접근법, 언어학습)의 개관, 발달, 접근방향, 원칙, 영...
[총체적언어교육] 총체적언어교육(언어접근법, 언어학습)의 개관, 발달, 접근방향, 원칙, 영... [보육학개론(保育學槪論)] 걸음마 유아를 위한 보육 환경의 영역별 구성 (기저귀 가는 곳, 식...
[보육학개론(保育學槪論)] 걸음마 유아를 위한 보육 환경의 영역별 구성 (기저귀 가는 곳, 식... [언어지도]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을 개요, 내용범주, 지도원리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
[언어지도]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을 개요, 내용범주, 지도원리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 만 2세 영아의 발달영역별 (신체, 정서, 인지, 언어, 사회성)놀이의 효과를 기술하고, 발달영...
만 2세 영아의 발달영역별 (신체, 정서, 인지, 언어, 사회성)놀이의 효과를 기술하고, 발달영... [만 2세 영아의 발달영역별 (신체, 정서, 인지, 언어, 사회성)놀이의 효과를 기술하고, 발달...
[만 2세 영아의 발달영역별 (신체, 정서, 인지, 언어, 사회성)놀이의 효과를 기술하고,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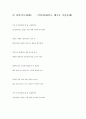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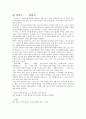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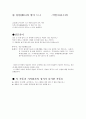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