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명예 훼손죄의 일반론
1. 관련조문
2. 의의
3. 보호법익
Ⅱ구성요건 등의 검토
1.구성요건
2.공연성의 개념 정리
Ⅵ.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판시 사항
2. 판결 요지
3. 판결 이유
4. 이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5.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6.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7.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Ⅴ.공연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검토
1. 전파성 이론
2. 직접인식가능성설
3. 견해의 검토
Ⅵ.결어
1. 관련조문
2. 의의
3. 보호법익
Ⅱ구성요건 등의 검토
1.구성요건
2.공연성의 개념 정리
Ⅵ.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판시 사항
2. 판결 요지
3. 판결 이유
4. 이 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5.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6.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7.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Ⅴ.공연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검토
1. 전파성 이론
2. 직접인식가능성설
3. 견해의 검토
Ⅵ.결어
본문내용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분명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 전파가능성이론을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전파가능성이론은 명예훼손죄의 성격을 오해한 문제점이 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태범이기 때문에 행위의 태양이 그 범죄의 해석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살인죄와 같은 침해범에서는 살해라는 행위보다는 사람이라는 행위의 객체와 사망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고, 살해행위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살해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특별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태범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결과발생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위태범에서는 행위의 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형벌권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형법 제 307조가 공연히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실적시행위가 처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이 처벌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형벌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의 해석은 형법해석의 한계를 일탈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 전파가능성이론은 이러한 형법규정상의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역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파가능성유무를 따지기보다는 행위자의 사실적시행위의 성격을 그대로 분석하여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공연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전파가능성이론은 형법의 통일적 해석을 저해한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모욕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모욕죄의 공연성을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피고인이 특정 소수인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에도 특정 소수인이 피고인의 모욕행위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 특정소수인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별론
으로 하고 ----- 피고인의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부당함은 물론이다.
다섯째, 전파가능성이론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법률 해석시 문리해석에 의해도 큰 문제점이 없으면 문리해석에 그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리해석에 의할 경우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만 논리해석을 해야 한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명확한 문언에 따르더라도 별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논리해석을 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또한 논리해석을 하더라도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문언을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이다. 공연히를 문리 해석한다면 결국은 불특정 도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아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취자가 사실을 유포시킬 것을 미리 인식, 의욕하고 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행위자가 청취자를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면 된다. 이 이외의 사적인 전달행위에 대해서까지 가벌성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의 논리해석이 필요 없는 것이다. 전파가능성이론은 불필요하게 공연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유추해석, 그 중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된다.
이처럼 전파가능성이론은 공연성에 대한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우라 나라의 통설 또한 공연성을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여, 전파가능성이론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김일수, 형법 각론, 남양사, 1996,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 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 각론, 홍대사, 1994,
임 웅, 형법 각론, 법문사, 2001
신호진, 형법 요 론Ⅱ(각론), 한국서원,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인터넷 검색 사이트 www. scourt. go. kr
※ 대법원 판례 정리
○ 공연성을 긍정한 판례
대판 1955, 4. 22 4287 형상 36
대판 1968, 12, 24, 68도 1596
대판 1979, 8, 14, 79도 1517
대판 1981, 8, 25, 81도 149
대판 1983, 10, 11, 83도 2222
대판 1984, 2, 28, 83도 3124
대판 1985, 4, 23, 85도 431
대판 1985, 12, 10, 84도 2380
대판 1968, 9, 23, 86도 556
대판 1990, 7, 24, 90도 1167
대판 1990, 12, 26, 90도 2473
대판 1991, 6, 25, 91도 347
대판 1984, 2, 28, 83도 3292
대판 1990, 9, 25, 90도 847
○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대판 1966. 4. 1. 66도 179
대판 1967. 5. 16. 66도 787
대판 1978. 4. 25. 75도 473
대판 1981. 10. 27. 81도 1023
대판 1982. 2. 9. 81도 2152
대판 1982. 3. 23. 81도 2491
대판 1982. 4. 27. 82도 371
대판 1983. 9. 27. 83도 2040
대판 1983. 10. 25. 83도 2190
대판 1984. 2. 28. 83도 891
대판 1984. 3. 27. 84도 86
대판 1984. 4. 10. 83도 49
대판 1985. 11. 26. 85도 2037
대판 1986. 10. 14. 86도 1341
대판 1988. 9. 27. 88도 1008
대판 1989. 7. 11. 89도 886
대판 1990. 4. 27. 89도 1467
대판 1992. 5. 26. 92도 445
셋째, 전파가능성이론은 명예훼손죄의 성격을 오해한 문제점이 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태범이기 때문에 행위의 태양이 그 범죄의 해석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살인죄와 같은 침해범에서는 살해라는 행위보다는 사람이라는 행위의 객체와 사망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고, 살해행위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살해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특별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태범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결과발생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위태범에서는 행위의 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형벌권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형법 제 307조가 공연히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실적시행위가 처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이 처벌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형벌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의 해석은 형법해석의 한계를 일탈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 전파가능성이론은 이러한 형법규정상의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역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파가능성유무를 따지기보다는 행위자의 사실적시행위의 성격을 그대로 분석하여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공연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전파가능성이론은 형법의 통일적 해석을 저해한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모욕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모욕죄의 공연성을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피고인이 특정 소수인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에도 특정 소수인이 피고인의 모욕행위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 특정소수인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별론
으로 하고 ----- 피고인의 모욕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부당함은 물론이다.
다섯째, 전파가능성이론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법률 해석시 문리해석에 의해도 큰 문제점이 없으면 문리해석에 그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리해석에 의할 경우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만 논리해석을 해야 한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명확한 문언에 따르더라도 별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논리해석을 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또한 논리해석을 하더라도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문언을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이다. 공연히를 문리 해석한다면 결국은 불특정 도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아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취자가 사실을 유포시킬 것을 미리 인식, 의욕하고 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행위자가 청취자를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면 된다. 이 이외의 사적인 전달행위에 대해서까지 가벌성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의 논리해석이 필요 없는 것이다. 전파가능성이론은 불필요하게 공연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유추해석, 그 중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된다.
이처럼 전파가능성이론은 공연성에 대한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우라 나라의 통설 또한 공연성을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여, 전파가능성이론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김일수, 형법 각론, 남양사, 1996,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 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 각론, 홍대사, 1994,
임 웅, 형법 각론, 법문사, 2001
신호진, 형법 요 론Ⅱ(각론), 한국서원,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회, 형사판례연구, 박영사, 1993
인터넷 검색 사이트 www. scourt. go. kr
※ 대법원 판례 정리
○ 공연성을 긍정한 판례
대판 1955, 4. 22 4287 형상 36
대판 1968, 12, 24, 68도 1596
대판 1979, 8, 14, 79도 1517
대판 1981, 8, 25, 81도 149
대판 1983, 10, 11, 83도 2222
대판 1984, 2, 28, 83도 3124
대판 1985, 4, 23, 85도 431
대판 1985, 12, 10, 84도 2380
대판 1968, 9, 23, 86도 556
대판 1990, 7, 24, 90도 1167
대판 1990, 12, 26, 90도 2473
대판 1991, 6, 25, 91도 347
대판 1984, 2, 28, 83도 3292
대판 1990, 9, 25, 90도 847
○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대판 1966. 4. 1. 66도 179
대판 1967. 5. 16. 66도 787
대판 1978. 4. 25. 75도 473
대판 1981. 10. 27. 81도 1023
대판 1982. 2. 9. 81도 2152
대판 1982. 3. 23. 81도 2491
대판 1982. 4. 27. 82도 371
대판 1983. 9. 27. 83도 2040
대판 1983. 10. 25. 83도 2190
대판 1984. 2. 28. 83도 891
대판 1984. 3. 27. 84도 86
대판 1984. 4. 10. 83도 49
대판 1985. 11. 26. 85도 2037
대판 1986. 10. 14. 86도 1341
대판 1988. 9. 27. 88도 1008
대판 1989. 7. 11. 89도 886
대판 1990. 4. 27. 89도 1467
대판 1992. 5. 26. 92도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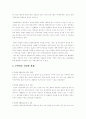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