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II. 본론
1. 생애
1.1 최치원(崔致遠)의 생애
1.2 최치원(崔致遠)의 전설․설화
① 출생 설화
② 문헌 설화
③ 지역에 관련된 전설
1.3 이규보의 생애
2. 문학관 및 성과
2.1 최치원(崔致遠)의 문학
2.2 이규보의 문학
① 고려말의 시대배경을 통한 문학적 배경
② 문화적인 특징과 동명왕편
3. 사상적배경
3.1 최치원의 사상적 배경
① 유교사상과 화엄사상과의 관계
② 불교의 선종과 노장사상 내지 도교 사상 사이의 관계
3.2 이규보의 사상적 배경
① 유교사상
② 도교 사상
③ 불교 사상
Ⅲ. 결론
II. 본론
1. 생애
1.1 최치원(崔致遠)의 생애
1.2 최치원(崔致遠)의 전설․설화
① 출생 설화
② 문헌 설화
③ 지역에 관련된 전설
1.3 이규보의 생애
2. 문학관 및 성과
2.1 최치원(崔致遠)의 문학
2.2 이규보의 문학
① 고려말의 시대배경을 통한 문학적 배경
② 문화적인 특징과 동명왕편
3. 사상적배경
3.1 최치원의 사상적 배경
① 유교사상과 화엄사상과의 관계
② 불교의 선종과 노장사상 내지 도교 사상 사이의 관계
3.2 이규보의 사상적 배경
① 유교사상
② 도교 사상
③ 불교 사상
Ⅲ. 결론
본문내용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설화의 내용에서 혼교설화재생설화애정설화 등의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이 설화가 중국 육조시대, 그리고 당 나라시대 신괴류의 전기적 설화소설에서 다분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하는 예이다. 이 설화의 성립연대는 주인공인 그의 연대로 보아 고려 초기나 적어도 중기 이전으로 추측된다. 신라 말엽 이후 많은 설화가 생성, 구전되면서 이 설화도 생성되었고, 이것이 처음 《수이전》에 수록되었다가 《태평통재》 그리고《대동운부군옥》의 순서로 전개되었으며, 이야기 중의 혼교설화와 재생설화적 요소는 <금오신화> 나 기타 많은 조선시대 국문소설의 혼교적재생적 요소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설화의 내용 중 주인공들의 의사표시가 대부분 한시로 나타나 있어 전체적으로 대략 20여수의 시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설화소설 속의 삽입시는 후대 한문소설류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데에서 이 설화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소설로 《최치원전》 또는 《최고운전》《최문헌전》등의 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있는데 ‘최치원설화’와 공통되는 점은 별로 없다.
③ 지역에 관련된 전설
③-1 상림 숲
그가 기울어져가는 신라를 어찌할 수 없음을 느끼고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조그마한 고을에서 여생을 마치기로 작정하고 지원하여 태수로 부임하였는데 그의 치적 중에서 상림은 함양을 대표하여 내세울 수 있는 곳이다.
풍치가 아름다운 상림 숲에는 뱀이나 개미같은 해충이 전혀 없는데, 이는 그의 지극한 효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그가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어머님에 대한 불편은 조금도 없게 해 드릴려고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혼자서 바람을 쏘일 겸 상림숲에 산책을 나가서 풀숲에 않아 놀다가 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는 상림 숲으로 달려가서 숲을 향해 \"이후로는 상림 숲에는 뱀이나 개미같은 모든 해충은 일체 없어져라. 그리고 다시는 이 숲에 들지 말라.\" 고 주문을 외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그의 지극한 효성으로 인한 주문 때문에 모든 해충이 사라지고 모여들지를 않았다고 한다. 그런 지극한 효성에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하고 심지어 하찮은 미물도 감동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그를 하늘이 낸 효자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외에도 그가 상림숲의 조림을 마치고 숲속 어디엔가 나무 가지에 조림하던 금호미를 걸어두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다. 그리고 숲을 만들고 떠나면서 상림 숲에 뱀이나 개미가 나타나고 숲속에 설죽이 침범하면 내가 죽은 줄 알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 뱀은 나타나지 않지만 가끔 개미가 보이고 숲속에는 설죽이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최치원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라고들 한다.
③-2 해운대
이 해운대란 이름은 그가 가야산 입산길에 이곳을 지나다가 주변자연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바다와 구름, 달과 산을 음미하면서 주변을 소요하다가 선생의 자이기도 한 해운을 바위에다 ‘海雲臺’란 세글자로 음각하므로써 이곳의 지명이 해운대가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 ‘해운대’란 석각은 동백섬 남쪽 끝 부분 바다와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룬 해안 바위 위에 음각되어 있다. 한국일보사, 한국의 여로 ―부산, 한국일보사, 1982, pp.63.
③-3 우이도 상산봉
신라 말 그가 제주도에서 중국으로 유람가던 중에 우이도 상산에 도착했다. 때 마침 우이도에는 가뭄이 극심하였는데 고운 선생을 본 주민들은 가뭄을 물리치고 비를 내려주도록 간청했다. 그는 즉시 북해 용왕을 불러서 가뭄을 해결하라고 했으나 옥황상제의 명령이 아니면 용왕의 마음대로 비를 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용왕의 말을 듣고 그는 화를 벌컥 내면서 속히 비를 내리라고 호령했다. 기가 꺽인 용왕은 하는 수 없이 명령대로 비를 내려 가뭄을 해결했다.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얼굴에 경련이 일도록 화를 내면서 용왕을 잡아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을 도마뱀으로 만들어 선생의 무릎밑에 감추어 죽음을 면하게 했다.
그 후 그는 중국으로 떠났으나 그가 머물면서 상산봉 제2봉에 있는 바위에다 바둑판을 만들어 바둑을 두면서 즐겼다는 전설도 전해지며, 또한 그 바둑판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③-4 삼신동
지리산 삼신동이라 새겨진 각자와 그가 신선이 되어 조선시대에 나타났다는 전설이 있다. 삼신동은 그가 이상향으로 설정했던 곳이다. 그는 당시 삼신동으로 들어가면서 속세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는 심정으로 귀를 씻었다고 전해져 그 곳의 바위를 세이암이라고 부른다. 또 지팡이를 꽂아 둔 것이 지금은 거목으로 변해 있다는 도나무 전설도 있다. 모두가 그의 신선설을 뒷받침하는 전설과 유적들이다. 한국일보사, 한국의 여로 ―지리산, 한국일보사, 1983.
1.3 이규보의 생애
고려 후기의 대문인이자 다인이었던 이규보는 고려 의종 22년 지금의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다. 이규보의 아버지 이윤수는 개성에서 관리 생활을 한 인물로서 이규보의 일가는 향리계층이라고 하겠다. 이규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민첩하여, 아홉 살 때 이미 글을 잘 지어 당시에 신동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 삼교의 깊은 뜻에 두루 통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경사와 백가서를 한 번만 보면 기억하고 시를 빨리 짓기로 유명하므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16, 18, 20세 때에 세 차례에 걸쳐 사마시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다. 이는 소년 시절에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고 방봉한 생활을 하면서 시 짓기만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3세 때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방종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랫동안 출세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24세 때 부모를 여의고 천마산에 우거하면서 백운거사라고 자호하였다. 그 이듬해 <백운거사어록>, <백운거사전> 그리고 그 다음해에 <동명왕편>을 지었다. 이규보는 최씨 정권에 시문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신임을 얻어 32세 대부터 관계에 진출하여 최씨 정권의 두터운 비호 아래 출세가도를 달려 66세에는 상서에 이르렀다.
해동의 공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또, 설화의 내용에서 혼교설화재생설화애정설화 등의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이 설화가 중국 육조시대, 그리고 당 나라시대 신괴류의 전기적 설화소설에서 다분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하는 예이다. 이 설화의 성립연대는 주인공인 그의 연대로 보아 고려 초기나 적어도 중기 이전으로 추측된다. 신라 말엽 이후 많은 설화가 생성, 구전되면서 이 설화도 생성되었고, 이것이 처음 《수이전》에 수록되었다가 《태평통재》 그리고《대동운부군옥》의 순서로 전개되었으며, 이야기 중의 혼교설화와 재생설화적 요소는 <금오신화> 나 기타 많은 조선시대 국문소설의 혼교적재생적 요소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설화의 내용 중 주인공들의 의사표시가 대부분 한시로 나타나 있어 전체적으로 대략 20여수의 시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설화소설 속의 삽입시는 후대 한문소설류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데에서 이 설화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 소설로 《최치원전》 또는 《최고운전》《최문헌전》등의 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있는데 ‘최치원설화’와 공통되는 점은 별로 없다.
③ 지역에 관련된 전설
③-1 상림 숲
그가 기울어져가는 신라를 어찌할 수 없음을 느끼고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조그마한 고을에서 여생을 마치기로 작정하고 지원하여 태수로 부임하였는데 그의 치적 중에서 상림은 함양을 대표하여 내세울 수 있는 곳이다.
풍치가 아름다운 상림 숲에는 뱀이나 개미같은 해충이 전혀 없는데, 이는 그의 지극한 효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그가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어머님에 대한 불편은 조금도 없게 해 드릴려고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혼자서 바람을 쏘일 겸 상림숲에 산책을 나가서 풀숲에 않아 놀다가 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는 상림 숲으로 달려가서 숲을 향해 \"이후로는 상림 숲에는 뱀이나 개미같은 모든 해충은 일체 없어져라. 그리고 다시는 이 숲에 들지 말라.\" 고 주문을 외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그의 지극한 효성으로 인한 주문 때문에 모든 해충이 사라지고 모여들지를 않았다고 한다. 그런 지극한 효성에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하고 심지어 하찮은 미물도 감동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그를 하늘이 낸 효자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외에도 그가 상림숲의 조림을 마치고 숲속 어디엔가 나무 가지에 조림하던 금호미를 걸어두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다. 그리고 숲을 만들고 떠나면서 상림 숲에 뱀이나 개미가 나타나고 숲속에 설죽이 침범하면 내가 죽은 줄 알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 뱀은 나타나지 않지만 가끔 개미가 보이고 숲속에는 설죽이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최치원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라고들 한다.
③-2 해운대
이 해운대란 이름은 그가 가야산 입산길에 이곳을 지나다가 주변자연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바다와 구름, 달과 산을 음미하면서 주변을 소요하다가 선생의 자이기도 한 해운을 바위에다 ‘海雲臺’란 세글자로 음각하므로써 이곳의 지명이 해운대가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 ‘해운대’란 석각은 동백섬 남쪽 끝 부분 바다와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룬 해안 바위 위에 음각되어 있다. 한국일보사, 한국의 여로 ―부산, 한국일보사, 1982, pp.63.
③-3 우이도 상산봉
신라 말 그가 제주도에서 중국으로 유람가던 중에 우이도 상산에 도착했다. 때 마침 우이도에는 가뭄이 극심하였는데 고운 선생을 본 주민들은 가뭄을 물리치고 비를 내려주도록 간청했다. 그는 즉시 북해 용왕을 불러서 가뭄을 해결하라고 했으나 옥황상제의 명령이 아니면 용왕의 마음대로 비를 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용왕의 말을 듣고 그는 화를 벌컥 내면서 속히 비를 내리라고 호령했다. 기가 꺽인 용왕은 하는 수 없이 명령대로 비를 내려 가뭄을 해결했다.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얼굴에 경련이 일도록 화를 내면서 용왕을 잡아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을 도마뱀으로 만들어 선생의 무릎밑에 감추어 죽음을 면하게 했다.
그 후 그는 중국으로 떠났으나 그가 머물면서 상산봉 제2봉에 있는 바위에다 바둑판을 만들어 바둑을 두면서 즐겼다는 전설도 전해지며, 또한 그 바둑판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③-4 삼신동
지리산 삼신동이라 새겨진 각자와 그가 신선이 되어 조선시대에 나타났다는 전설이 있다. 삼신동은 그가 이상향으로 설정했던 곳이다. 그는 당시 삼신동으로 들어가면서 속세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는 심정으로 귀를 씻었다고 전해져 그 곳의 바위를 세이암이라고 부른다. 또 지팡이를 꽂아 둔 것이 지금은 거목으로 변해 있다는 도나무 전설도 있다. 모두가 그의 신선설을 뒷받침하는 전설과 유적들이다. 한국일보사, 한국의 여로 ―지리산, 한국일보사, 1983.
1.3 이규보의 생애
고려 후기의 대문인이자 다인이었던 이규보는 고려 의종 22년 지금의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다. 이규보의 아버지 이윤수는 개성에서 관리 생활을 한 인물로서 이규보의 일가는 향리계층이라고 하겠다. 이규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민첩하여, 아홉 살 때 이미 글을 잘 지어 당시에 신동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 삼교의 깊은 뜻에 두루 통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경사와 백가서를 한 번만 보면 기억하고 시를 빨리 짓기로 유명하므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16, 18, 20세 때에 세 차례에 걸쳐 사마시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다. 이는 소년 시절에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고 방봉한 생활을 하면서 시 짓기만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3세 때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방종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랫동안 출세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24세 때 부모를 여의고 천마산에 우거하면서 백운거사라고 자호하였다. 그 이듬해 <백운거사어록>, <백운거사전> 그리고 그 다음해에 <동명왕편>을 지었다. 이규보는 최씨 정권에 시문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신임을 얻어 32세 대부터 관계에 진출하여 최씨 정권의 두터운 비호 아래 출세가도를 달려 66세에는 상서에 이르렀다.
해동의 공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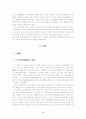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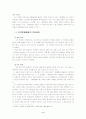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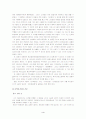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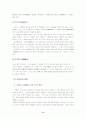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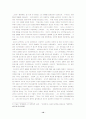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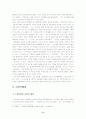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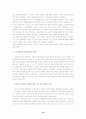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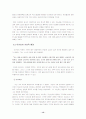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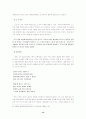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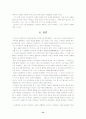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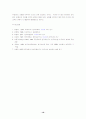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