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목차
I. 머리말
Ⅱ. 대가야와 가야제국의 관계
Ⅲ. 대가야의 국제관계
1. 4세기 말의 국제관계
2. 5세기 초의 국제관계
3. 5세기 후반의 국제관계
4. 6세기 전반의 국제관계
5. 6세기 중엽의 국제관계
Ⅱ. 대가야와 가야제국의 관계
Ⅲ. 대가야의 국제관계
1. 4세기 말의 국제관계
2. 5세기 초의 국제관계
3. 5세기 후반의 국제관계
4. 6세기 전반의 국제관계
5. 6세기 중엽의 국제관계
본문내용
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대가야왕이 우륵에게 작곡시켰던 가야금십이곡의 곡명을 대가야연맹에 소속된 가야제국명으로 파악하여 함안(안라국)과 김해(가락국)를 제외한 서부경남일대를 연맹의 권역으로 추정하였다.
영역국가설’ 李熙濬, 토기로 본 大加耶의 圈域과 그 변천 (慶尙北道 加耶史硏究 1995).
金世基, 大加耶 墓制의 變遷 (慶尙北道 加耶史硏究 1995).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야제국의 독립적 성격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닌 다음에야, 대가야는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던 가야제국들과의 관계를 먼저 의식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대가야는 시기 및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가야문화권 이외의 정치세력들, 백제 고구려 신라 중국 왜 등과의 다양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대부분은 전쟁과 외교의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광개토왕릉비 일본서기 삼국사기 남제서 등에 그 편린을 전하고 있다.
한편 전기가야(1 ~ 4세기)의 단계에 있어서 고령지역의 가야(半路國 弁韓 十二國의 하나로 보이는 半路國의 위치를 초계, 성주, 합천 등지로 비정하였던 견해도 있었으나, 日本書紀 繼體紀 梁職貢圖의 기술에 加羅와 동일한 정치세력으로 半跛國이 보이는 것과 半路國의 표기가 半跛國과 아주 근사한 점을 고려한다면, 半路國은 加羅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국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金泰植, 앞의 책, 78 ~ 79, 95 ~ 105 쪽.
)에 관한 문헌자료나 고고학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연구조건에서 그 국제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낙동강 수계를 통한 남부가야나 왜와의 교류 또는 육로를 통한 한군현과의 교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시도가 제시된 바는 있지만, 李文基, 大加耶의 對外關係 (慶尙北道 加耶史硏究 1995).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헌 및 고고학 자료가 없는 지금 더 이상의 추론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한다.
海岸지역에서 內陸지역으로, 南에서 北으로 라는 가야사의 일반적인 전개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三國志> 魏書 東夷 倭人傳에 보이는 3세기 경의 해상교통로에 관한 서술은 가야사가 전개되었던 특징을 이와 같이 파악하는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 帶方郡(황해도)에서 倭國(일본열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는 당시의 선진문물이 이동하던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동경로의 일부인 남해로 문호가 개방되어 있던 김해함안고성사천진주 등의 입지는 남부의 가야제국들이 관문사회(GateWay Society)적 성격을 바탕으로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조건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상교통로상에 김해지역이 중간거점으로 특별히 기술되었던 것과 전기가야에서 가락국(김해)이 중심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다. 김해지역에서 출토되는 銅鼎 後漢鏡을 비롯한 중국계 문물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 주는 물적증거가 된가. 이에 비해 고령합천거창함양산청 등은 내륙이라는 입지조건으로 말미암아 남쪽의 해안보다는 뒤늦은 발전을 보이게 되었으며, 후기가야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삼국지 위서 변진전에 半路國(고령)이 남부가야의 狗邪國(김해)이나 安邪國(함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위상을 보이는 것을 참고로 한다면, <三國志> 魏書 東夷 韓傳과 弁辰傳을 보면, 半路國이 弁韓 십이國의 국명이 나열되는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 것에 비해, 安邪國(함안)과 狗邪國(김해)은 나열국명에 포함되면서도 辰王의 칭호와 관련하여 특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기가야의 고령은 아직 국제관계의 기술에 등장할 수 없었던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전동 알터암각화 고인돌 무문토기 및 와질토기 산포지 등을 중심으로 전기가야 단계의 半路國史 자체를 복원해 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金世基, 앞의 논문, 352 ~ 357 쪽.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가야의 半路國이 후기가야의 半跛國 또는 加羅國의 이름으로 국제관계의 기술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4세기 후반에서 최종적으로 신라에 의해 병합되는 6세기 중엽의 기간을 대상으로 대가야의 국제관계를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고령지역의 가야세력이 대가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는 것도 이러한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Ⅱ. 대가야와 가야제국의 관계
대가야는 가야제국들에 대해 進出과 交涉의 양면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교섭의 관계는 기원전후의 半路國 단계부터 562년의 대가야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단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근원거리 교역과 백제나 신라의 영역적 잠식에 대한 공동대응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추정 또는 확인할 수 있다.
교역을 통한 교섭의 적극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전기가야에서 半路國이 弁韓으로 묶여질 수 있었던 점, 전기가야 단계의 가락국 건국신화에서 고령이 인식되고 있었던 점, 후기가야에서 북부내륙의 대가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 남부해안의 가야제국에서 공급되어진 선진문물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낙동강 수계를 통한 교역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야제국들과의 교섭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전기가야의 반로국의 가야제국과의 관계는 추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론을 지양하고 관련자료의 축적을 기다리기로 한다.
이에 비해 4세기 말 이후의 백제나 신라의 영역적 잠식에 대한 공동대응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던 가야제국들과의 교섭은 日本書紀 欽明紀의 ‘임나부흥회의’ 관련기사, 를 중심으로 추출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뒤에 백제 신라 왜와의 관계를 논하는 항목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진출의 관계는 5세기 중후엽 경부터 전북일부와 서부경남의 가야제국에 대한 進出과 交涉을 통한 공동대응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進出의 예는 日本書紀 繼體紀의 관련기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대가야의 건국신화, 토기를 중심으로 한 대가야계 문물의 확산과정, 대가야의 嘉實王이 于勒을 시켜 제작케 한 가야금 십이곡의 정치적 의미, 대가야왕 荷知가 중국의 남제에 외교사절을 파견할
영역국가설’ 李熙濬, 토기로 본 大加耶의 圈域과 그 변천 (慶尙北道 加耶史硏究 1995).
金世基, 大加耶 墓制의 變遷 (慶尙北道 加耶史硏究 1995).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야제국의 독립적 성격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닌 다음에야, 대가야는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던 가야제국들과의 관계를 먼저 의식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대가야는 시기 및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가야문화권 이외의 정치세력들, 백제 고구려 신라 중국 왜 등과의 다양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대부분은 전쟁과 외교의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광개토왕릉비 일본서기 삼국사기 남제서 등에 그 편린을 전하고 있다.
한편 전기가야(1 ~ 4세기)의 단계에 있어서 고령지역의 가야(半路國 弁韓 十二國의 하나로 보이는 半路國의 위치를 초계, 성주, 합천 등지로 비정하였던 견해도 있었으나, 日本書紀 繼體紀 梁職貢圖의 기술에 加羅와 동일한 정치세력으로 半跛國이 보이는 것과 半路國의 표기가 半跛國과 아주 근사한 점을 고려한다면, 半路國은 加羅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국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金泰植, 앞의 책, 78 ~ 79, 95 ~ 105 쪽.
)에 관한 문헌자료나 고고학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연구조건에서 그 국제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낙동강 수계를 통한 남부가야나 왜와의 교류 또는 육로를 통한 한군현과의 교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시도가 제시된 바는 있지만, 李文基, 大加耶의 對外關係 (慶尙北道 加耶史硏究 1995).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헌 및 고고학 자료가 없는 지금 더 이상의 추론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한다.
海岸지역에서 內陸지역으로, 南에서 北으로 라는 가야사의 일반적인 전개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三國志> 魏書 東夷 倭人傳에 보이는 3세기 경의 해상교통로에 관한 서술은 가야사가 전개되었던 특징을 이와 같이 파악하는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 帶方郡(황해도)에서 倭國(일본열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는 당시의 선진문물이 이동하던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동경로의 일부인 남해로 문호가 개방되어 있던 김해함안고성사천진주 등의 입지는 남부의 가야제국들이 관문사회(GateWay Society)적 성격을 바탕으로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조건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상교통로상에 김해지역이 중간거점으로 특별히 기술되었던 것과 전기가야에서 가락국(김해)이 중심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다. 김해지역에서 출토되는 銅鼎 後漢鏡을 비롯한 중국계 문물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 주는 물적증거가 된가. 이에 비해 고령합천거창함양산청 등은 내륙이라는 입지조건으로 말미암아 남쪽의 해안보다는 뒤늦은 발전을 보이게 되었으며, 후기가야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삼국지 위서 변진전에 半路國(고령)이 남부가야의 狗邪國(김해)이나 安邪國(함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위상을 보이는 것을 참고로 한다면, <三國志> 魏書 東夷 韓傳과 弁辰傳을 보면, 半路國이 弁韓 십이國의 국명이 나열되는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 것에 비해, 安邪國(함안)과 狗邪國(김해)은 나열국명에 포함되면서도 辰王의 칭호와 관련하여 특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기가야의 고령은 아직 국제관계의 기술에 등장할 수 없었던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전동 알터암각화 고인돌 무문토기 및 와질토기 산포지 등을 중심으로 전기가야 단계의 半路國史 자체를 복원해 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金世基, 앞의 논문, 352 ~ 357 쪽.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가야의 半路國이 후기가야의 半跛國 또는 加羅國의 이름으로 국제관계의 기술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4세기 후반에서 최종적으로 신라에 의해 병합되는 6세기 중엽의 기간을 대상으로 대가야의 국제관계를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고령지역의 가야세력이 대가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는 것도 이러한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Ⅱ. 대가야와 가야제국의 관계
대가야는 가야제국들에 대해 進出과 交涉의 양면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교섭의 관계는 기원전후의 半路國 단계부터 562년의 대가야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단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근원거리 교역과 백제나 신라의 영역적 잠식에 대한 공동대응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추정 또는 확인할 수 있다.
교역을 통한 교섭의 적극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전기가야에서 半路國이 弁韓으로 묶여질 수 있었던 점, 전기가야 단계의 가락국 건국신화에서 고령이 인식되고 있었던 점, 후기가야에서 북부내륙의 대가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 남부해안의 가야제국에서 공급되어진 선진문물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낙동강 수계를 통한 교역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야제국들과의 교섭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전기가야의 반로국의 가야제국과의 관계는 추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론을 지양하고 관련자료의 축적을 기다리기로 한다.
이에 비해 4세기 말 이후의 백제나 신라의 영역적 잠식에 대한 공동대응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던 가야제국들과의 교섭은 日本書紀 欽明紀의 ‘임나부흥회의’ 관련기사, 를 중심으로 추출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뒤에 백제 신라 왜와의 관계를 논하는 항목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진출의 관계는 5세기 중후엽 경부터 전북일부와 서부경남의 가야제국에 대한 進出과 交涉을 통한 공동대응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進出의 예는 日本書紀 繼體紀의 관련기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대가야의 건국신화, 토기를 중심으로 한 대가야계 문물의 확산과정, 대가야의 嘉實王이 于勒을 시켜 제작케 한 가야금 십이곡의 정치적 의미, 대가야왕 荷知가 중국의 남제에 외교사절을 파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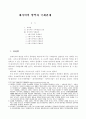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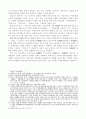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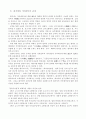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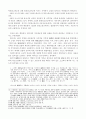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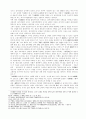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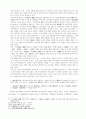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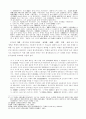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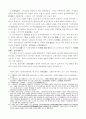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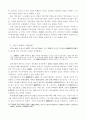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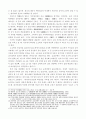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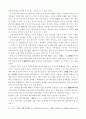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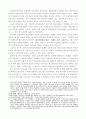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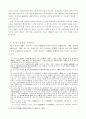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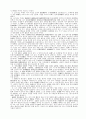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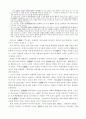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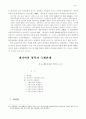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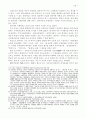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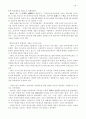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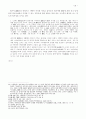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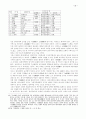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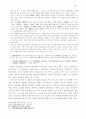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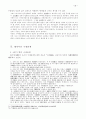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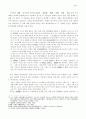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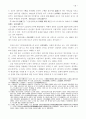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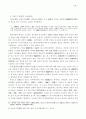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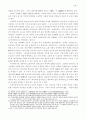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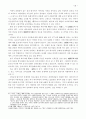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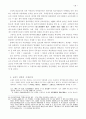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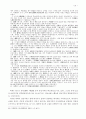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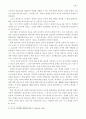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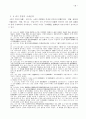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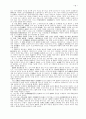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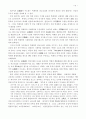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