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1. 작가 김현승의 생애 2
Ⅱ. 본 론 2
1. 김현승 시세계의 일반적 특징 3
1) 기독교적인 특징 3
2) 자연친화적 특징 3
2. 김현승의 시세계의 시기별 특징 4
1) 제1기(30년대-8.15해방까지)-자연예찬과 민족주의 4
2) 제2기(8.15해방 ~ 60년대 중반) - 양심과 기도 5
3) 제3기(60년대 중반 이후) - 신과 고독 7
4) 제4기(70년대 초반 이후) - 고독의 극복 8
Ⅲ. 결 론 10
1. 작가 김현승의 생애 2
Ⅱ. 본 론 2
1. 김현승 시세계의 일반적 특징 3
1) 기독교적인 특징 3
2) 자연친화적 특징 3
2. 김현승의 시세계의 시기별 특징 4
1) 제1기(30년대-8.15해방까지)-자연예찬과 민족주의 4
2) 제2기(8.15해방 ~ 60년대 중반) - 양심과 기도 5
3) 제3기(60년대 중반 이후) - 신과 고독 7
4) 제4기(70년대 초반 이후) - 고독의 극복 8
Ⅲ. 결 론 10
본문내용
그의 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김현승의 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그의 시에 나타나는 기독교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김현승의 시를 기독교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의 시세계가 지닌 의미를 한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의 시세계를 탐색하는 일은 기독교 문학의 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못지않게 서정시 본질을 검토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그의 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검토도 몇몇 논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의 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독’의 관념이 지닌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성과는 관련 없이 분석하고 평가한 작업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그의 시에 나타나는 고독이 오히려 기독교적인 신의 개념을 부정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의 시가 일관되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이러한 논의를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 많은 논자의 지적처럼 그의 시는 종교성의 표현에 있어서 몇 번의 굴곡을 겪는다. 주로 고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1960년대의 시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 시기에 그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을 부정하면서 자아의 내면 속으로 침잠해 간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기독교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상태로 전환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세계관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본 제출자는 김현승의 시세계의 시기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2. 김현승 시세계의 일반적 특징
1) 기독교적인 특징
그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기독교계 학교에서 수학했고 마지막까지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다는 전기적 측면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의 시에 나타나는 주도적인 세계관은 분명히 기독교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현승 자신이 기독교문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독교 문학과 관련된 몇 편의 소론들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김현승의 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그의 시에 나타나는 기독교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종교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앙시와 양심의 시를 개척했는데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관념의 세계를 신앙적 정면대결 정신으로 극복하였고, 윤리적으로는 인간의 실존적 자아 탐구에 고뇌, 끝내는 신의 절대주의적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시의 중심 사상이 된 고독은 신을 잃어 버렸기 때문인데 그는 여기에서 절망이나 회의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는 자아 탐색을 통하여 인간 생명과 진실을 노래,보편적 진리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그는 사상이 없는 시는 무정란이라는 시론까지 전개하며 사상과 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종교와 철학의 추상과 관념을 물화하여 형이상성으로 시를 감각화했다. 투명한 언어의 엄격성,함축미,간결한 정제미 등은 그의 시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2) 자연친화적 특징
김현승이 1930년대에 발표한 초기 시는 단순히 자연을 예찬한 시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일제 식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연을 예찬하고 동경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민족적 정신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자연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나는 인간의 삶 자체를 자연의 流露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비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연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에다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가하고 주관에 의하여 변형시키기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동양적인 아니고 서구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性善說에 입각한 생활이 아니고 原罪說에 뿌리박은 생활임을 나 자신이 언제나 인식하고 있다. 김현승, 나의 文學白書, 월간문학 1970. 9.
인용문은 김현승이 자신의 인간관을 밝힌 글이다. 그는 성선설을 믿지 않고 원죄설을 믿으며, ‘자연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에다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가하고 주관에 의하여 변형시키기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현승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인간관은 동양적이기보다는 차라리 서구적이며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적이다. 동시에 그의 자연과 역시 동양적이기보다는 서구적이며, 또한 기독교적이다. 이 글 외에 다른 글에서 그는 1930년 무렵 자신의 시에는 자연미에 대한 예찬과 동경이 짙게 풍기는데, 그것은 당시의 한 경향이며, 현실에서 빼앗긴 자유를 천상에서 찾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다형의 시를 1기(30년대-8.15해방까지), 2기(8.15해방부터 60년대 중반까지),3기(60년대 중반 이후), 4기(70년대) 등으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고찰, 시의 본체를 구명하고자 한다.
3. 김현승의 시세계의 시기별 특징
1) 제 1기(30년대-8.15해방까지)-자연예찬과 민족주의
김현승의 30년도 초기 시는 일제 식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연을 예찬하고 동경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민족적 센티멘탈리즘이 짙게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무렵 나의 시에는 자연미에 대한 예찬과 동경이 짙게 풍기고 있었다. 이점 또한 그 당시의 한 경향이었다. 불행한 현실과 고초의 현실에 처한 시인들에게 저들의 국토에서 자유로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거기서는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연뿐이었다.
----중 략----
그러므로 그 당시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흉악한 인간-일인들과 같은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지향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고, 지상에서 빼앗긴 자유를 광대 무변한 천상에서 찾는 의미로 함축되어 있었다.
그의 이와 같은 진술은 30년대가 망국민족이라는 일제하의 암울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로맨티시즘이나 센티멘탈리즘으로 나타낸 것이다. 불행한 현실 아래에서 자유롭게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자연뿐이고 그 자연을 통해서 민족의 염원이나 미래의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 있어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현실극복과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가장 친근한 존재였던 것이다.
해를
그런데 김현승의 시를 기독교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의 시세계가 지닌 의미를 한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의 시세계를 탐색하는 일은 기독교 문학의 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 못지않게 서정시 본질을 검토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그의 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검토도 몇몇 논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의 시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독’의 관념이 지닌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성과는 관련 없이 분석하고 평가한 작업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그의 시에 나타나는 고독이 오히려 기독교적인 신의 개념을 부정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의 시가 일관되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이러한 논의를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 많은 논자의 지적처럼 그의 시는 종교성의 표현에 있어서 몇 번의 굴곡을 겪는다. 주로 고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1960년대의 시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이 시기에 그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을 부정하면서 자아의 내면 속으로 침잠해 간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기독교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상태로 전환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세계관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본 제출자는 김현승의 시세계의 시기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2. 김현승 시세계의 일반적 특징
1) 기독교적인 특징
그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기독교계 학교에서 수학했고 마지막까지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다는 전기적 측면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의 시에 나타나는 주도적인 세계관은 분명히 기독교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현승 자신이 기독교문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독교 문학과 관련된 몇 편의 소론들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김현승의 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그의 시에 나타나는 기독교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종교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앙시와 양심의 시를 개척했는데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관념의 세계를 신앙적 정면대결 정신으로 극복하였고, 윤리적으로는 인간의 실존적 자아 탐구에 고뇌, 끝내는 신의 절대주의적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시의 중심 사상이 된 고독은 신을 잃어 버렸기 때문인데 그는 여기에서 절망이나 회의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는 자아 탐색을 통하여 인간 생명과 진실을 노래,보편적 진리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그는 사상이 없는 시는 무정란이라는 시론까지 전개하며 사상과 시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종교와 철학의 추상과 관념을 물화하여 형이상성으로 시를 감각화했다. 투명한 언어의 엄격성,함축미,간결한 정제미 등은 그의 시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2) 자연친화적 특징
김현승이 1930년대에 발표한 초기 시는 단순히 자연을 예찬한 시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일제 식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연을 예찬하고 동경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민족적 정신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자연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나는 인간의 삶 자체를 자연의 流露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비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연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에다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가하고 주관에 의하여 변형시키기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동양적인 아니고 서구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性善說에 입각한 생활이 아니고 原罪說에 뿌리박은 생활임을 나 자신이 언제나 인식하고 있다. 김현승, 나의 文學白書, 월간문학 1970. 9.
인용문은 김현승이 자신의 인간관을 밝힌 글이다. 그는 성선설을 믿지 않고 원죄설을 믿으며, ‘자연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에다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가하고 주관에 의하여 변형시키기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현승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인간관은 동양적이기보다는 차라리 서구적이며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적이다. 동시에 그의 자연과 역시 동양적이기보다는 서구적이며, 또한 기독교적이다. 이 글 외에 다른 글에서 그는 1930년 무렵 자신의 시에는 자연미에 대한 예찬과 동경이 짙게 풍기는데, 그것은 당시의 한 경향이며, 현실에서 빼앗긴 자유를 천상에서 찾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다형의 시를 1기(30년대-8.15해방까지), 2기(8.15해방부터 60년대 중반까지),3기(60년대 중반 이후), 4기(70년대) 등으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고찰, 시의 본체를 구명하고자 한다.
3. 김현승의 시세계의 시기별 특징
1) 제 1기(30년대-8.15해방까지)-자연예찬과 민족주의
김현승의 30년도 초기 시는 일제 식민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연을 예찬하고 동경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민족적 센티멘탈리즘이 짙게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무렵 나의 시에는 자연미에 대한 예찬과 동경이 짙게 풍기고 있었다. 이점 또한 그 당시의 한 경향이었다. 불행한 현실과 고초의 현실에 처한 시인들에게 저들의 국토에서 자유로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거기서는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연뿐이었다.
----중 략----
그러므로 그 당시 자연을 사랑한다는 것은 흉악한 인간-일인들과 같은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지향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고, 지상에서 빼앗긴 자유를 광대 무변한 천상에서 찾는 의미로 함축되어 있었다.
그의 이와 같은 진술은 30년대가 망국민족이라는 일제하의 암울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로맨티시즘이나 센티멘탈리즘으로 나타낸 것이다. 불행한 현실 아래에서 자유롭게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자연뿐이고 그 자연을 통해서 민족의 염원이나 미래의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 있어 자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현실극복과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가장 친근한 존재였던 것이다.
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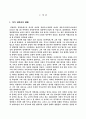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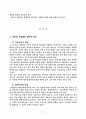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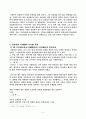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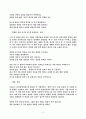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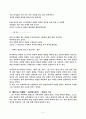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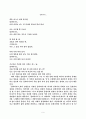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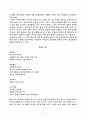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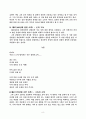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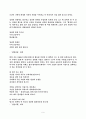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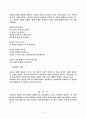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