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농업
3. 한국 농업의 기원
4. 한국 벼농사의 기원
5. 한국농업의 어제와 오늘
6. 결 론
2.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농업
3. 한국 농업의 기원
4. 한국 벼농사의 기원
5. 한국농업의 어제와 오늘
6. 결 론
본문내용
않았는데, 그 한 예로서 논의 면적은 1919년경에도 전체농지의 3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작물 가운데서 벼는 가장 많이 재배되었고, 그 때문에 화폐를 대신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실제로 한국 농업은 잡곡과 벼를 기본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삼국지 위지 변진전의 ‘오곡(五穀)과 벼를 재배하였다’는 기록으로도 뒷받침된다.
괭이농법에서 보습농법으로 발전한 우리 초기의 농업은 4세기경부터는 관개농업으로 발전해나갔다. 아직 벼농사는 저습지대를 중심으로 잡초방제와 지력유지를 위해 휴한할 수밖에 없는 초보적인 직파법으로 영위되었다. 또한 휴한제는 통일신라 때의 기록인 전남 담양의 ‘개선사 석등기(開仙寺石燈記)’와 고려말의 ‘고성 삼일포 매향비(1309)’의 단계에까지도 잔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휴한제는 고려후기부터 점차 매년 농사를 짓는 상경(常耕) 연작화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가장 오랜 우리 농서인 [농사직설]과 [세종실록지리지]를 바탕으로 15세기 초의 농업모습을 살펴보자. 이 시대에 있어 가장 널리 재배된 작물은 기장 조 콩 벼였고, 그 다음이 맥류 피 삼(麻) 등이었다. 또한 조선전기 농업은 이러한 다양한 작물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기술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넓은 토지를 비교적 적은 인구가 경작하는 조방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벼농사에서는 벼의 직파연작기술이 세계 최초로 완성된 기술체계로 확립되었다. 이 시대의 벼농사는 주로 볍씨를 물이 있는 논과 마른 논에 직파하는 직파법(水耕, 乾耕)이 중심이었으며, 이앙법은 예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무엇보다 먼저 벼농사가 급속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앙법이 크게 확산되면서 벼농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논의 작부체계도 크게 변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지주제가 주요한 경제제도로 정착하였다. 18세기에 이르면 이앙법은 천수답에까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생산성에 주목하는 집약농업이 벼농사와 밭농사에 각각 정착하였다. 또한, 종래의 전통적인 벼농사법인 직파법과 건경법도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마른 논에 벼를 재배하는 특수한 벼농사 기술인 건경(乾耕)법은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세계 농업사에서 가장 특이한 축력일관 작업을 완성하였다. 한편 밭농사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시비법이 개선되고 [2년3작]식의 농법이 개발되었으며, 호박 고추 담배 감자 등의 신작물들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휴한제’를 극복하고 중경제초 기술의 발달로 높은 수준의 작부체계를 갖춘 ‘연작(連作)농업’으로 나아가는 발전방향을 우선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넓은 토지를 적은 인구가 경작하던 처음의 ‘조방농업’에서 좁은 면적에 집중적인 노동투입으로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집약농업’을 실현하는 또 다른 방향도 찾아낼 수 있다. 더구나 산이 많고 남북으로 긴 우리의 지형조건은 화폐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상업작물들의 재배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심지어 그러한 조건은 아메리카 원산의 신작물까지
괭이농법에서 보습농법으로 발전한 우리 초기의 농업은 4세기경부터는 관개농업으로 발전해나갔다. 아직 벼농사는 저습지대를 중심으로 잡초방제와 지력유지를 위해 휴한할 수밖에 없는 초보적인 직파법으로 영위되었다. 또한 휴한제는 통일신라 때의 기록인 전남 담양의 ‘개선사 석등기(開仙寺石燈記)’와 고려말의 ‘고성 삼일포 매향비(1309)’의 단계에까지도 잔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휴한제는 고려후기부터 점차 매년 농사를 짓는 상경(常耕) 연작화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가장 오랜 우리 농서인 [농사직설]과 [세종실록지리지]를 바탕으로 15세기 초의 농업모습을 살펴보자. 이 시대에 있어 가장 널리 재배된 작물은 기장 조 콩 벼였고, 그 다음이 맥류 피 삼(麻) 등이었다. 또한 조선전기 농업은 이러한 다양한 작물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기술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넓은 토지를 비교적 적은 인구가 경작하는 조방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벼농사에서는 벼의 직파연작기술이 세계 최초로 완성된 기술체계로 확립되었다. 이 시대의 벼농사는 주로 볍씨를 물이 있는 논과 마른 논에 직파하는 직파법(水耕, 乾耕)이 중심이었으며, 이앙법은 예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무엇보다 먼저 벼농사가 급속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앙법이 크게 확산되면서 벼농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논의 작부체계도 크게 변하였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지주제가 주요한 경제제도로 정착하였다. 18세기에 이르면 이앙법은 천수답에까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생산성에 주목하는 집약농업이 벼농사와 밭농사에 각각 정착하였다. 또한, 종래의 전통적인 벼농사법인 직파법과 건경법도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마른 논에 벼를 재배하는 특수한 벼농사 기술인 건경(乾耕)법은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세계 농업사에서 가장 특이한 축력일관 작업을 완성하였다. 한편 밭농사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시비법이 개선되고 [2년3작]식의 농법이 개발되었으며, 호박 고추 담배 감자 등의 신작물들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휴한제’를 극복하고 중경제초 기술의 발달로 높은 수준의 작부체계를 갖춘 ‘연작(連作)농업’으로 나아가는 발전방향을 우선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넓은 토지를 적은 인구가 경작하던 처음의 ‘조방농업’에서 좁은 면적에 집중적인 노동투입으로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집약농업’을 실현하는 또 다른 방향도 찾아낼 수 있다. 더구나 산이 많고 남북으로 긴 우리의 지형조건은 화폐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상업작물들의 재배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심지어 그러한 조건은 아메리카 원산의 신작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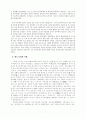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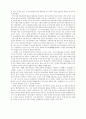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