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제도.
이 다 늦어간다.”
한 놈은 산타령을 하는데,
“동 개골(皆骨)서 구월남 지리북 향산(香山), 육로(陸路) 천리 수로(水路) 천리 이 천리 들어가니 탐라국(耽羅國)이 생기려고 한라산(漢拏山)이 둘러 있다. 정읍(井邑) 내장(內藏), 장성(長城) 입암(笠岩), 고창(高敞) 반등(半登), 고부(古阜) 두승(斗升), 서해 수구(水口) 막으려고 부안(扶安), 변산(邊山) 둘러 있다.”
한 놈은 농부가를 하는데,
“선리건곤(仙李乾坤) 선리건곤 : 이씨의 조선 천지.
태평시절(太平時節) 도덕 높은 우리 성상(聖上) 강구미복(康衢微服) 동요(童謠) 강구미복 동요 : 큰길에서 효의 덕을 구가하는 동요를 남몰래 듣는다는 말.
듣던 요(堯)임금의 버금이라. 네 다리 빼여라 내다리 박자. 좌수춘광(左手春光)을 우수이(右手移) 좌수춘광 우수이 : 춘광이 빠름.
. 여보소, 동무들아, 앞 남산(南山)에 소나기 졌다. 삿갓 쓰고 도롱이 입자.”
한 놈은 목동가를 부르는데,
“갈퀴 메고 낫 갈아 가지고서 지리산으로 나무하러 가자. 얼럴. 쌓인 낙엽 부러진 장목(長木) 긁고 주워 엄뚱여 엄뚱여 : 얽어 묶어.
지고 석양산로(夕陽山路) 내려올 제, 손님 보고 절을 하니 품안에 있는 산과(山果) 땍때굴 다 떨어진다. 얼럴. 비 맞고 갈(渴)한 손님 술집이 어디 있노. 저 건너 행화촌(杏花村) 손을 들어 가리키자. 얼럴. 뿔 굽은 소를 타고 단적(短笛)을 불고 가니 유황숙(劉皇叔) 유황숙 : 유비(劉備). 중국 삼국시대 유나라의 소열제(昭烈帝). 西南장에서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고 탄식함.
이 보았으면 나를 오죽 부러워하리. 얼럴.”
강쇠가 다 들은 후, 제 신세를 제 보아도 어린 것들 한가지로 갈키나무 할 수 있나. 도끼 빼어 들어 메고 이 봉 저 봉 다니면서 그 중 큰 나무는 한두 번씩 찍은 후에 나무 내력(來歷) 말을 하며, 제가 저를 꾸짖는다.
“오동나무 베자 하니 순(舜)임금의 오현금(五弦琴) 오현금 : 중국 순임금이 타던 다섯줄의 거문고.
. 살구나무 베자 하니 공부자(孔夫子)의 강단(講壇). 소나무 좋다마는 진시황(秦始皇)의 오대부(五大夫) 오대부 :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 귀로에 비를 피하게 한 소나무를 봉하여 오대부라 한 고사.
. 잣나무 좋다마는 한 고조 덮은 그늘, 어주축수애산춘(漁舟逐水愛山春) 어주축수애산춘 : 고깃배 물을 따르며 산춘을 즐긴다는 말.
홍도(紅桃)나무 사랑옵고. 위성조우읍경진(渭城朝雨邑輕塵) 위성조우읍경진 : 위성이 아침비는 가벼운 먼지를 적신다는 말.
버드나무 좋을씨고. 밤나무 신주(神主) 신주 : 죽은 사람의 위패.
감, 전나무 돗대 재목(材木). 가시목 단단하니 각 영문(營門) 곤장(棍杖)감. 참나무 꼿꼿하나 배 짓는 데 못감. 중나무, 오시목(烏木)과 산유자(山柚子), 용목(榕木) 용목 : 열대에서 나는 상록수 교목.
, 검팽 검팽 : 검팽나무.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갈잎 큰 키 나무.
은 목물방(木物房)에 긴(緊)한 문목(紋木)이니 화목(火木)되기 아깝도다.”
이리저리 생각하니 벨 나무 전혀 없다.
산중의 동천맥(動泉脈) 동천맥 : 생수가 나는 곳.
우물가 좋은 곳에 점심 구럭 풀어 놓고 단단히 먹은 후에 부쇠를 얼른 쳐서 담배 피어 입에 물고, 솔 그늘 잔디밭에 돌을 베고 누우면서 당음(唐音) 한 귀 읊어 보아,
“우래송수하(偶來松樹下)에 고침석두면(高枕石頭眠) 우래송수하 고침석두면 : 우연히 소나무 밑에 와서 베개를 높이고 석두에 잠잔다는 말.
이 나로 두고 한 말이라, 잠자리 장히 좋다.”
말하며, 고는 코가 산중이 들썩들썩, 한소금 한소금 : ‘한숨’의 사투리.
질근 자다 낯바닥이 선뜻선뜻 비슥이 눈 떠 보니 하늘에 별이 총총, 이슬이 젖는구나. 게을리 일어나서 기지개 불끈 켜고 뒤꼭지 뚜드리며 혼잣말로 두런거려,
“요새 해가 그리 짧아 빈 지게 지고 가면 계집년이 방정 떨새.”
사면을 둘러보니 둥구마천 가는 길에 어떠한 장승 하나 산중에 서 있거늘 강쇠가 반겨하여,
“벌목정정(伐木丁丁) 벌목정정 : 나무를 베는 소리.
애 안 쓰고 좋은 나무 저기 있다. 일모도궁(日暮途窮) 일모도궁 : 해가 지고 갈 길이 멀다는 말.
이내 신세 불로이득(不勞而得) 좋을씨고.”
지게를 찾아 지고 장승 선 데 급히 가니 장승이 화를 내어 낯에 핏기 올리고서 눈을 딱 부릅뜨니 강쇠가 호령(號令)하여,
”너 이놈, 누구 앞에다 색기(色氣)하여 눈망울 부릅뜨니. 삼남(三南) 설축 설축 : 말이 몹시 거칠고 성격이 포악한 놈.
변강쇠를 이름도 못 들었느냐. 과거(科擧), 마전(馬廛), 파시평(波市坪)과 사당(寺黨) 노름, 씨름판에 이내 솜씨 사람 칠 제 선취(先取) 복장(腹腸) 후취(後取) 덜미 선취복장 후취덜미 : 씨름을 할 때 먼저 배를 차고 다음에 뒷덜미를 치는 법.
, 가래딴죽 가래딴죽 : 가랑이에 발을 넣어 내동댕이치는 법.
, 열 두 권법(拳法). 범강(范彊), 장달(張達) 범강 장달 : 중국 삼국시대 장비의 부하 장수로 장비를 암살한 자들. 장비의 목을 베어 오나라로 달아났음.
, 허저(許저) 허저 :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초인(초인). 힘이 매우 세었고 우직해서 호치(虎癡)라 불림.
라도 모두 다 둑 안에 떨어지니 수족(手足) 없는 너만 놈이 생심(生心)이나 방울쏘냐 방울쏘냐 : 당해내겠느냐.
.”
달려들어 불끈 안고 엇둘음 쑥 빼내어 지게 위에 짊어지고 유대군(留待軍) 유대군 : 포도청에 소속으로 상여를 메던 이.
소리 하며 제 집으로 돌아와서 문 안에 들어서며, 호기(豪氣)를 장히 핀다.
“집안 사람 거기 있나. 장작 나무 하여 왔네.”
뜰 가운데 턱 부리고, 방문 열고 들어가니 강쇠 계집 반겨라고 급히 나서 손목 잡고 어깨를 주무르며,
“어찌 그리 저물었나. 평생 처음 나무 가서 오죽 애를 썼겠는가. 시장한 데 밥 자십쇼.”
방 안에 불 켜 놓고, 밥상 차려 드린 후에 장작 나무 구경 차로 불 켜 들고 나와 보니, 어떠한 큰 사람이 뜰 가운데 누웠으되 조관(朝官)을 지냈는지 사모(紗帽) 품대(品帶) 갖추고 방울눈 주먹코에 채수염 채수염 : 숱은 많지 않으나 긴 수염.
이 점잖으다. 여인이 깜짝 놀라 뒤로 팍 주
이 다 늦어간다.”
한 놈은 산타령을 하는데,
“동 개골(皆骨)서 구월남 지리북 향산(香山), 육로(陸路) 천리 수로(水路) 천리 이 천리 들어가니 탐라국(耽羅國)이 생기려고 한라산(漢拏山)이 둘러 있다. 정읍(井邑) 내장(內藏), 장성(長城) 입암(笠岩), 고창(高敞) 반등(半登), 고부(古阜) 두승(斗升), 서해 수구(水口) 막으려고 부안(扶安), 변산(邊山) 둘러 있다.”
한 놈은 농부가를 하는데,
“선리건곤(仙李乾坤) 선리건곤 : 이씨의 조선 천지.
태평시절(太平時節) 도덕 높은 우리 성상(聖上) 강구미복(康衢微服) 동요(童謠) 강구미복 동요 : 큰길에서 효의 덕을 구가하는 동요를 남몰래 듣는다는 말.
듣던 요(堯)임금의 버금이라. 네 다리 빼여라 내다리 박자. 좌수춘광(左手春光)을 우수이(右手移) 좌수춘광 우수이 : 춘광이 빠름.
. 여보소, 동무들아, 앞 남산(南山)에 소나기 졌다. 삿갓 쓰고 도롱이 입자.”
한 놈은 목동가를 부르는데,
“갈퀴 메고 낫 갈아 가지고서 지리산으로 나무하러 가자. 얼럴. 쌓인 낙엽 부러진 장목(長木) 긁고 주워 엄뚱여 엄뚱여 : 얽어 묶어.
지고 석양산로(夕陽山路) 내려올 제, 손님 보고 절을 하니 품안에 있는 산과(山果) 땍때굴 다 떨어진다. 얼럴. 비 맞고 갈(渴)한 손님 술집이 어디 있노. 저 건너 행화촌(杏花村) 손을 들어 가리키자. 얼럴. 뿔 굽은 소를 타고 단적(短笛)을 불고 가니 유황숙(劉皇叔) 유황숙 : 유비(劉備). 중국 삼국시대 유나라의 소열제(昭烈帝). 西南장에서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고 탄식함.
이 보았으면 나를 오죽 부러워하리. 얼럴.”
강쇠가 다 들은 후, 제 신세를 제 보아도 어린 것들 한가지로 갈키나무 할 수 있나. 도끼 빼어 들어 메고 이 봉 저 봉 다니면서 그 중 큰 나무는 한두 번씩 찍은 후에 나무 내력(來歷) 말을 하며, 제가 저를 꾸짖는다.
“오동나무 베자 하니 순(舜)임금의 오현금(五弦琴) 오현금 : 중국 순임금이 타던 다섯줄의 거문고.
. 살구나무 베자 하니 공부자(孔夫子)의 강단(講壇). 소나무 좋다마는 진시황(秦始皇)의 오대부(五大夫) 오대부 :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 귀로에 비를 피하게 한 소나무를 봉하여 오대부라 한 고사.
. 잣나무 좋다마는 한 고조 덮은 그늘, 어주축수애산춘(漁舟逐水愛山春) 어주축수애산춘 : 고깃배 물을 따르며 산춘을 즐긴다는 말.
홍도(紅桃)나무 사랑옵고. 위성조우읍경진(渭城朝雨邑輕塵) 위성조우읍경진 : 위성이 아침비는 가벼운 먼지를 적신다는 말.
버드나무 좋을씨고. 밤나무 신주(神主) 신주 : 죽은 사람의 위패.
감, 전나무 돗대 재목(材木). 가시목 단단하니 각 영문(營門) 곤장(棍杖)감. 참나무 꼿꼿하나 배 짓는 데 못감. 중나무, 오시목(烏木)과 산유자(山柚子), 용목(榕木) 용목 : 열대에서 나는 상록수 교목.
, 검팽 검팽 : 검팽나무.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갈잎 큰 키 나무.
은 목물방(木物房)에 긴(緊)한 문목(紋木)이니 화목(火木)되기 아깝도다.”
이리저리 생각하니 벨 나무 전혀 없다.
산중의 동천맥(動泉脈) 동천맥 : 생수가 나는 곳.
우물가 좋은 곳에 점심 구럭 풀어 놓고 단단히 먹은 후에 부쇠를 얼른 쳐서 담배 피어 입에 물고, 솔 그늘 잔디밭에 돌을 베고 누우면서 당음(唐音) 한 귀 읊어 보아,
“우래송수하(偶來松樹下)에 고침석두면(高枕石頭眠) 우래송수하 고침석두면 : 우연히 소나무 밑에 와서 베개를 높이고 석두에 잠잔다는 말.
이 나로 두고 한 말이라, 잠자리 장히 좋다.”
말하며, 고는 코가 산중이 들썩들썩, 한소금 한소금 : ‘한숨’의 사투리.
질근 자다 낯바닥이 선뜻선뜻 비슥이 눈 떠 보니 하늘에 별이 총총, 이슬이 젖는구나. 게을리 일어나서 기지개 불끈 켜고 뒤꼭지 뚜드리며 혼잣말로 두런거려,
“요새 해가 그리 짧아 빈 지게 지고 가면 계집년이 방정 떨새.”
사면을 둘러보니 둥구마천 가는 길에 어떠한 장승 하나 산중에 서 있거늘 강쇠가 반겨하여,
“벌목정정(伐木丁丁) 벌목정정 : 나무를 베는 소리.
애 안 쓰고 좋은 나무 저기 있다. 일모도궁(日暮途窮) 일모도궁 : 해가 지고 갈 길이 멀다는 말.
이내 신세 불로이득(不勞而得) 좋을씨고.”
지게를 찾아 지고 장승 선 데 급히 가니 장승이 화를 내어 낯에 핏기 올리고서 눈을 딱 부릅뜨니 강쇠가 호령(號令)하여,
”너 이놈, 누구 앞에다 색기(色氣)하여 눈망울 부릅뜨니. 삼남(三南) 설축 설축 : 말이 몹시 거칠고 성격이 포악한 놈.
변강쇠를 이름도 못 들었느냐. 과거(科擧), 마전(馬廛), 파시평(波市坪)과 사당(寺黨) 노름, 씨름판에 이내 솜씨 사람 칠 제 선취(先取) 복장(腹腸) 후취(後取) 덜미 선취복장 후취덜미 : 씨름을 할 때 먼저 배를 차고 다음에 뒷덜미를 치는 법.
, 가래딴죽 가래딴죽 : 가랑이에 발을 넣어 내동댕이치는 법.
, 열 두 권법(拳法). 범강(范彊), 장달(張達) 범강 장달 : 중국 삼국시대 장비의 부하 장수로 장비를 암살한 자들. 장비의 목을 베어 오나라로 달아났음.
, 허저(許저) 허저 :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초인(초인). 힘이 매우 세었고 우직해서 호치(虎癡)라 불림.
라도 모두 다 둑 안에 떨어지니 수족(手足) 없는 너만 놈이 생심(生心)이나 방울쏘냐 방울쏘냐 : 당해내겠느냐.
.”
달려들어 불끈 안고 엇둘음 쑥 빼내어 지게 위에 짊어지고 유대군(留待軍) 유대군 : 포도청에 소속으로 상여를 메던 이.
소리 하며 제 집으로 돌아와서 문 안에 들어서며, 호기(豪氣)를 장히 핀다.
“집안 사람 거기 있나. 장작 나무 하여 왔네.”
뜰 가운데 턱 부리고, 방문 열고 들어가니 강쇠 계집 반겨라고 급히 나서 손목 잡고 어깨를 주무르며,
“어찌 그리 저물었나. 평생 처음 나무 가서 오죽 애를 썼겠는가. 시장한 데 밥 자십쇼.”
방 안에 불 켜 놓고, 밥상 차려 드린 후에 장작 나무 구경 차로 불 켜 들고 나와 보니, 어떠한 큰 사람이 뜰 가운데 누웠으되 조관(朝官)을 지냈는지 사모(紗帽) 품대(品帶) 갖추고 방울눈 주먹코에 채수염 채수염 : 숱은 많지 않으나 긴 수염.
이 점잖으다. 여인이 깜짝 놀라 뒤로 팍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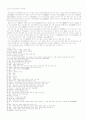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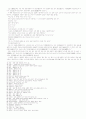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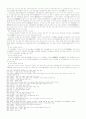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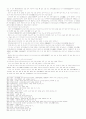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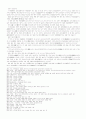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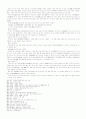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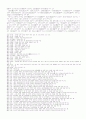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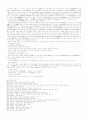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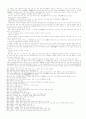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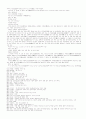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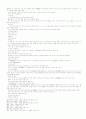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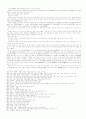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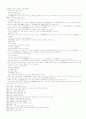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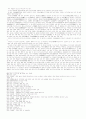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