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우리의 떡
(1) 떡의 의미
(2) 떡 문화론
2.역사속의 떡
(1) 떡의 유래
(2) 떡의 어원
(3) 떡의 역사
(4) 옛 음식책 속의 떡
3.다양한 우리 떡
(1) 떡의 분류
(2) 팔도 별미 떡
(3) 궁중의 떡
4.떡의 쓰임새
(1) 절기와 떡
(2) 통과의례와 떡
5.떡과 영양
(1) 떡의 의미
(2) 떡 문화론
2.역사속의 떡
(1) 떡의 유래
(2) 떡의 어원
(3) 떡의 역사
(4) 옛 음식책 속의 떡
3.다양한 우리 떡
(1) 떡의 분류
(2) 팔도 별미 떡
(3) 궁중의 떡
4.떡의 쓰임새
(1) 절기와 떡
(2) 통과의례와 떡
5.떡과 영양
본문내용
만들었고, 「동국세시기」에서는 찹쌀·콩·쑥·꿀로 만들어 10월의 음식으로 먹었다고 되어 있으며, 「이조 궁중음식연회고」에서 찹쌀·팥·깨·밤·대추·잣·쑥·승검초·계피·꿀로 만들었다.
각색단자병은 「18세기 궁중연회음식고」에서는 찹쌀·밤·대추·잣·쑥·석이·건강·계피로 만들었다고 하며, 승검초단자는 「규합총서」·「부인필지」·「시의전서」에서는 찹쌀·팥·잣·승검초·꿀로, 「이조 궁중음식연회고」에서는 찹쌀·팥·흑두·깨·밤·대추·잣·승검초·후추·꿀로 만들었다.
도행단자는 「규합총서」·「부인필지」에서 찹쌀가루에 도·행즙 넣은 멥쌀가루 말린 것을 섞고 대추·잣·호도·계피로 만든다고 하였다.
유자단자는 「규합총서」에서 찹쌀가루에 꿀버무려 당귀가루를 조금 섞고 곶감, 유자가루를 섞어 찐 후 황률 삶은 것에 꿀·후추·계피를 소를 만들어 넣고 달게 볶은 거피팥을 묻히라 하였으니 「부인필지」에서는 팥고물에 사용되지 않았다.
토란단자는 「동국세시기」에서 찹쌀과 토란·꿀로 밤단자 만들 듯이 만들라고 했다.
밤단자는 「동국세시기」·「시의전서」에서 찹쌀·밤·꿀로 만들었는데 「시의전서」에서는 계피를 사용했다.
건시단자는 「시의전서」에서 건시를 얇게 저며 꿀에 쟀다가 황률소를 넣어 반듯반 듯 틈없이 싸 잣가루를 묻히라고 했다.
각색단자는 「이조 궁중음식연회고」에서 찹쌀·팥·깨·밤·대추·잣·승검초·석이·쑥·계피·생강·꿀로 만들었다고 했다.
지지는 떡
지지는 떡은 찹쌀가루 반죽을 기름에 지진 것으로 꽃전, 주악, 부꾸미, 산승, 기타 전병류 등이 있다. 계절에 다라 진달래, 장미, 국화꽃 등을 섞어 반죽하고 위에도 장식한다. 속에 소를 넣고 접은 것을 부꾸미라 하며, 찹쌀가루에 석이, 대추, 은행 등을 다진 것을 섞어 반죽하고 작은 송편모양으로 빚어 기름에 지진 것을 주악이라 한다. 차수수가루 반죽으로 만든 병은 고려시대의 문신 이색의 「목은집」에 점서란 제목으로 읊어져 있다. 지금의 빈대떡이 조선중기까지는 지지는 떡의 한 품목이었다.
꽃전류
꽃전 전화법·유전병으로 「도문대작」에서 처음 기록되었으며, 「음식디미방」·「주방문」에서는 찹쌀가루에 모밀을 섞었으나 「증보산림경제」이후의 문헌에서는 찹쌀가루만으로 만들었고, 「동국세시기」에서는 녹두가루를 사용했다. 두견화·장미화·단화·국화 등의 꽃과 꿀, 기름 등을 썼으며, 「증보산림경제」·「18세기 궁중연회음식고」·「규합총서」·「시의전서」·「이조 궁중음식연회고」에서는 밤·대추·잣 등을 썼다. 「경도잡지」·「동국세시기」의 화전은 삼짓날의 시절음식이라 만드는 법은 두견화를 찹쌀가루에 같이 넣어 주물러 반죽하였다 하였으나 현재는 꽃 한 잎을 찹쌀 반죽의 위에 놓고 지지므로 꽃의 향기가 그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주악류
주악은 조악전·조각병이라 기록되었고, 「수문사설」에서 조악전(造堊煎)은 백미가루를 설탕물로 반죽하여 설탕소를 넣어 기름에 지진 것이며, 「임원십육지」의 조각병(造角餠)은 \"지금 사람은 가장 귀중히 여기며 손님 대접과 제사의 음식에는 반드시 이것을 병품(餠品)의 상에 둔다\"라 하여 찹쌀가루에 거피팥소를 넣은 주악을 상품(上品)떡류로 하였고, 「18세기 궁중음식연회고」·「이조 궁중음식연회고」의 각색주악은 찹쌀·팥·콩·흑두·감태 ·깨·밤·대추·잣·은행·쑥·송고·계피·치자·꿀·진유 등으로 만들었다.
「성호사설」에 주악을 설명하는데, \"동쪽 풍속(우리 풍속)에 밀가루를 기름에 지져서 나뭇잎처럼 하고, 여기에 고기, 채소 들을 써서 양귀가 나게 떡을 만든다. <중략> 지금의 풍속에 쌀가루에 팥소를 싸서 양각이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지져서 조각을 한다\"라고 하여 당시에 두 종류의 조각형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밀전병에 고기·채소볶음으로 속을 넣고 반으로 접어 싸서 양각이 나게끔 만든 것과 또 하나는 찹쌀가루 반죽에 속을 넣고 두뿔이 나도록 빚어서 기름에 지져 만든 주악이다. 이것은 각서의 가짜라 하여 조각이라고 하였으며, 다시 각(角)의 음이 악(岳)이 되어 조악(造岳)이 되고, 이것이 지금의 조악(주악)이라고 하였다.
대추주악은 「규합총서」에서는 \"날반죽하여야 연하고 좋으며, 익반죽하면 질기고 빛이 엷다\"고 했으며, 「시의전서」에서는 대추를 가루같이 곱게 다져 생반죽하여 빚는다고 했다. 「이조궁중음식연회고」에서는 찹쌀, 팥, 대추, 잣, 계피, 후추, 꿀, 진유로 만든다고 했다.
밤주악은「부인필지」와 「시의전서」에서 찹쌀, 밤, 잣, 건강, 계피, 물로 만든다고 했고, 메밀주악은 「부인필지」에서 메밀, 밀, 잣, 석이, 후추, 기름으로 만들며, 흰주악은 「시의전서」에서 찹쌀, 잣, 계피, 꿀, 기름으로 만들고, 치자주악은 황주악이라고조 하며 흰주악에 치자물을 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조 궁중음식연회고」의 양색주악은 찹쌀, 팥, 감태, 잣, 계피, 후추, 꿀, 진유로 만들었고, 삼색주악은 찹쌀, 팥, 감태, 대추, 치자, 꿀, 진유로 하였다.
생산승은 「시의전서」에서 \"주악반죽같이 하여 화전같이 얇게 하되 오봉지게 하고 쪽집게로 줄기를 집고 옆으로도 집어 주악처럼 지져 집청해서 잣가루를 묻혀쓴다\"고 했다.
부꾸미
부꾸미는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떡으로, 1943년도의 문헌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 \'북?미\'란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1958년도의 문헌인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 비로소 \'부꾸미\'라는 이름으로 표기되고 있다.
찹쌀가루나 차수수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빚어 지지다가 팥소를 놓고 반달 모양으로 접어 붙인 떡으로, 수수를 곱게 갈아 앙금을 가라앉혀 말린 뒤 녹말을 해 두었다가 쓰기도 한다.
산승
찹쌀가루에 꿀을 넣고 익반죽한 뒤 새뿔 모양으로 빚어 기름에 지진 떡이다. 산승은 독특한 형태의 전병으로, 「음식디미방」,「시의전서」등에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문헌에 따르면 \"잔치산승은 작게 한다\"고 하여 각종 잔치에 산승이 널리 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현대로 내려오면서 이 떡은 거의 만들지 않게 되었다. 큰상차림에는 갖은 편 위의 가장자리를 주악으로 네 줄 돌리고, 가운데 산승을 놓는데, 산승은 주악처럼 여러 가지 색으로 하기도 하며, 웃기떡으로 주로 쓰인다.
기타 전병류
각색단자병은 「18세기 궁중연회음식고」에서는 찹쌀·밤·대추·잣·쑥·석이·건강·계피로 만들었다고 하며, 승검초단자는 「규합총서」·「부인필지」·「시의전서」에서는 찹쌀·팥·잣·승검초·꿀로, 「이조 궁중음식연회고」에서는 찹쌀·팥·흑두·깨·밤·대추·잣·승검초·후추·꿀로 만들었다.
도행단자는 「규합총서」·「부인필지」에서 찹쌀가루에 도·행즙 넣은 멥쌀가루 말린 것을 섞고 대추·잣·호도·계피로 만든다고 하였다.
유자단자는 「규합총서」에서 찹쌀가루에 꿀버무려 당귀가루를 조금 섞고 곶감, 유자가루를 섞어 찐 후 황률 삶은 것에 꿀·후추·계피를 소를 만들어 넣고 달게 볶은 거피팥을 묻히라 하였으니 「부인필지」에서는 팥고물에 사용되지 않았다.
토란단자는 「동국세시기」에서 찹쌀과 토란·꿀로 밤단자 만들 듯이 만들라고 했다.
밤단자는 「동국세시기」·「시의전서」에서 찹쌀·밤·꿀로 만들었는데 「시의전서」에서는 계피를 사용했다.
건시단자는 「시의전서」에서 건시를 얇게 저며 꿀에 쟀다가 황률소를 넣어 반듯반 듯 틈없이 싸 잣가루를 묻히라고 했다.
각색단자는 「이조 궁중음식연회고」에서 찹쌀·팥·깨·밤·대추·잣·승검초·석이·쑥·계피·생강·꿀로 만들었다고 했다.
지지는 떡
지지는 떡은 찹쌀가루 반죽을 기름에 지진 것으로 꽃전, 주악, 부꾸미, 산승, 기타 전병류 등이 있다. 계절에 다라 진달래, 장미, 국화꽃 등을 섞어 반죽하고 위에도 장식한다. 속에 소를 넣고 접은 것을 부꾸미라 하며, 찹쌀가루에 석이, 대추, 은행 등을 다진 것을 섞어 반죽하고 작은 송편모양으로 빚어 기름에 지진 것을 주악이라 한다. 차수수가루 반죽으로 만든 병은 고려시대의 문신 이색의 「목은집」에 점서란 제목으로 읊어져 있다. 지금의 빈대떡이 조선중기까지는 지지는 떡의 한 품목이었다.
꽃전류
꽃전 전화법·유전병으로 「도문대작」에서 처음 기록되었으며, 「음식디미방」·「주방문」에서는 찹쌀가루에 모밀을 섞었으나 「증보산림경제」이후의 문헌에서는 찹쌀가루만으로 만들었고, 「동국세시기」에서는 녹두가루를 사용했다. 두견화·장미화·단화·국화 등의 꽃과 꿀, 기름 등을 썼으며, 「증보산림경제」·「18세기 궁중연회음식고」·「규합총서」·「시의전서」·「이조 궁중음식연회고」에서는 밤·대추·잣 등을 썼다. 「경도잡지」·「동국세시기」의 화전은 삼짓날의 시절음식이라 만드는 법은 두견화를 찹쌀가루에 같이 넣어 주물러 반죽하였다 하였으나 현재는 꽃 한 잎을 찹쌀 반죽의 위에 놓고 지지므로 꽃의 향기가 그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주악류
주악은 조악전·조각병이라 기록되었고, 「수문사설」에서 조악전(造堊煎)은 백미가루를 설탕물로 반죽하여 설탕소를 넣어 기름에 지진 것이며, 「임원십육지」의 조각병(造角餠)은 \"지금 사람은 가장 귀중히 여기며 손님 대접과 제사의 음식에는 반드시 이것을 병품(餠品)의 상에 둔다\"라 하여 찹쌀가루에 거피팥소를 넣은 주악을 상품(上品)떡류로 하였고, 「18세기 궁중음식연회고」·「이조 궁중음식연회고」의 각색주악은 찹쌀·팥·콩·흑두·감태 ·깨·밤·대추·잣·은행·쑥·송고·계피·치자·꿀·진유 등으로 만들었다.
「성호사설」에 주악을 설명하는데, \"동쪽 풍속(우리 풍속)에 밀가루를 기름에 지져서 나뭇잎처럼 하고, 여기에 고기, 채소 들을 써서 양귀가 나게 떡을 만든다. <중략> 지금의 풍속에 쌀가루에 팥소를 싸서 양각이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기름에 지져서 조각을 한다\"라고 하여 당시에 두 종류의 조각형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밀전병에 고기·채소볶음으로 속을 넣고 반으로 접어 싸서 양각이 나게끔 만든 것과 또 하나는 찹쌀가루 반죽에 속을 넣고 두뿔이 나도록 빚어서 기름에 지져 만든 주악이다. 이것은 각서의 가짜라 하여 조각이라고 하였으며, 다시 각(角)의 음이 악(岳)이 되어 조악(造岳)이 되고, 이것이 지금의 조악(주악)이라고 하였다.
대추주악은 「규합총서」에서는 \"날반죽하여야 연하고 좋으며, 익반죽하면 질기고 빛이 엷다\"고 했으며, 「시의전서」에서는 대추를 가루같이 곱게 다져 생반죽하여 빚는다고 했다. 「이조궁중음식연회고」에서는 찹쌀, 팥, 대추, 잣, 계피, 후추, 꿀, 진유로 만든다고 했다.
밤주악은「부인필지」와 「시의전서」에서 찹쌀, 밤, 잣, 건강, 계피, 물로 만든다고 했고, 메밀주악은 「부인필지」에서 메밀, 밀, 잣, 석이, 후추, 기름으로 만들며, 흰주악은 「시의전서」에서 찹쌀, 잣, 계피, 꿀, 기름으로 만들고, 치자주악은 황주악이라고조 하며 흰주악에 치자물을 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조 궁중음식연회고」의 양색주악은 찹쌀, 팥, 감태, 잣, 계피, 후추, 꿀, 진유로 만들었고, 삼색주악은 찹쌀, 팥, 감태, 대추, 치자, 꿀, 진유로 하였다.
생산승은 「시의전서」에서 \"주악반죽같이 하여 화전같이 얇게 하되 오봉지게 하고 쪽집게로 줄기를 집고 옆으로도 집어 주악처럼 지져 집청해서 잣가루를 묻혀쓴다\"고 했다.
부꾸미
부꾸미는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떡으로, 1943년도의 문헌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 \'북?미\'란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가 1958년도의 문헌인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에 비로소 \'부꾸미\'라는 이름으로 표기되고 있다.
찹쌀가루나 차수수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글납작하게 빚어 지지다가 팥소를 놓고 반달 모양으로 접어 붙인 떡으로, 수수를 곱게 갈아 앙금을 가라앉혀 말린 뒤 녹말을 해 두었다가 쓰기도 한다.
산승
찹쌀가루에 꿀을 넣고 익반죽한 뒤 새뿔 모양으로 빚어 기름에 지진 떡이다. 산승은 독특한 형태의 전병으로, 「음식디미방」,「시의전서」등에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문헌에 따르면 \"잔치산승은 작게 한다\"고 하여 각종 잔치에 산승이 널리 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현대로 내려오면서 이 떡은 거의 만들지 않게 되었다. 큰상차림에는 갖은 편 위의 가장자리를 주악으로 네 줄 돌리고, 가운데 산승을 놓는데, 산승은 주악처럼 여러 가지 색으로 하기도 하며, 웃기떡으로 주로 쓰인다.
기타 전병류
추천자료
 서양 사관 및 동양 사관 종류에 대해서
서양 사관 및 동양 사관 종류에 대해서 여행상품의 개념및 정의,구성요소,특성,종류에 대해서
여행상품의 개념및 정의,구성요소,특성,종류에 대해서 [사회과학] 뉴미디어 광고의 정의와 종류, 특징, 현황, 전망에 대해서
[사회과학] 뉴미디어 광고의 정의와 종류, 특징, 현황, 전망에 대해서 면역제제 및 백신과 면역의 종류에 대해서(사용법, 부작용, 주의사항)
면역제제 및 백신과 면역의 종류에 대해서(사용법, 부작용, 주의사항) 골다공증의 임상적 특성 및 종류, 위험요인, 관리와 간호중재에 대해서
골다공증의 임상적 특성 및 종류, 위험요인, 관리와 간호중재에 대해서 위험물의 종류 및 품명, 지정수량과 일반성질에 대해서
위험물의 종류 및 품명, 지정수량과 일반성질에 대해서 스킨스쿠버에 대해서 - 유래 및 역사, 장비종류, 다이빙 기술,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고려사...
스킨스쿠버에 대해서 - 유래 및 역사, 장비종류, 다이빙 기술,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고려사... PLC의 출현배경과 정의, 공압유압차이, 밸브의 종류에 대해서
PLC의 출현배경과 정의, 공압유압차이, 밸브의 종류에 대해서 뉴미디어 광고의 정의와 종류, 특징, 현황, 전망에 대해서
뉴미디어 광고의 정의와 종류, 특징, 현황, 전망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DBMS 언어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조사.
데이터베이스 DBMS 언어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조사. 4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식중독 종류에 대해서 각각의 중독명 증상 대처방안 1가지 사례
4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식중독 종류에 대해서 각각의 중독명 증상 대처방안 1가지 사례 아동 대상 사회복지실천과정 즉 아동상담 중 개입단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방법 중 하나인 놀이...
아동 대상 사회복지실천과정 즉 아동상담 중 개입단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방법 중 하나인 놀이... ①표본추출(표집)방법의 종류와 ②사회복지조사절차(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①표본추출(표집)방법의 종류와 ②사회복지조사절차(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교육철학에 대해서 {철학의 분류, 진리의 종류, 교육철학의 의미, 교육철학의 기능, 지식의 ...
교육철학에 대해서 {철학의 분류, 진리의 종류, 교육철학의 의미, 교육철학의 기능, 지식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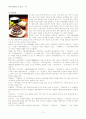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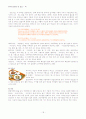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