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옛 그림 감상의 두 원칙
2. 옛 그림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
3. 옛 그림으로 살펴본 조선의 역사와 문화
3. 감상
2. 옛 그림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
3. 옛 그림으로 살펴본 조선의 역사와 문화
3. 감상
본문내용
행차이다. 왕이 능행차를 할 때는 60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움직이게 되며 종묘에 갈 때에는 법가라고 해서 만 명까지 동원된다. 그런데 이렇듯 장엄한 국왕의 행렬을 일반 국민이 막아서서 원통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고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격쟁’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감옥에 갇히게 되나, 수일 내로 시급히 일을 해결하여 그 결과를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기실 왕은 이런 격쟁의 기회, 즉 민원 처리의 기회를 백성들에게 많이 주기 위해서 굳이 여기저기 행차를 많이 벌였던 것이라고도 추측된다.
영조와 같은 임금은 5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는데, 왕이지만 평소엔 무명옷을 입고 그 옷이 해지면 또 기워입고, 농사가 흉년이 든 해에는 금주령을 내렸다. 바로 ‘백성들이 먹을 곡식을 녹여 가지고 독주를 만들어 마시는 것을 어떻게 참 선비라 하겠는가?’ 하는 뜻에서였다. 백성은 성리학 국가에서는 하늘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선이 훌륭한 나라였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현존하는 유물을 살펴보면 명확하다. 숙종 때의 대학자 이재의 손자 이채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검버섯뿐 아니라 병색까지 있는 사실 그대로가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런 극사실 초상화에 보이는 회화 정신을 옛 사람들은 ‘일호불사一毫不似 편시타인便是他人’이라고 하였다. 즉 ‘터럭 한 오라기가 달라도 남이다’ 라는 것이다. 참으로 엄정한 회화정신이다. 보기 싫은 검버섯이나 부종 같은 환부까지 왜 그토록 정확하게 그렸는가? 진선미 가운데 예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 바로 참된 모습을 그리려 했기 때문이다. 즉 외면이 아닌 정신을 그리려고 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늘 아름다운 것보다는 참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초상화를 그릴 때 곰보면 검버섯이며, 커다란 혹까지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드러냈는데, 그런 정신을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많이 빼앗겼다. 김은호 화백이 그린 <논개>나 <춘향><이순신 장군> 이런 그림은 겉보기에는 좋은 듯하지만 그저 예쁘기만 한 것은 장식품이지 예술품이 아니다. 더구나 작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명분이 없는 사람이었다.
혜원 신윤복의 <연당의 여인>에는 전성기를 지나 쓸쓸하고 처량 맞은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화가는 화면 하반부의 연꽃을 화면의 반이나 차지하도록 높게 그렸다. 이것은 화가가 ‘여인의 눈에, 그 쓸쓸한 눈에 하나 가득 보이는 것은 오직 연꽃뿐이었으려니’ 하는 의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애초 그리기 전부터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 작품이 겉보기에는 수월하게 척척 그려낸 듯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화가의 깊은 마음이 담긴 그림이라 하겠다.
찬문을 보면 ‘기진자사其眞自寫’, 즉 참 진眞 자, 그릴 사寫 자를 써서 초상화 그리는 걸 ‘사진寫眞’이라 표현했다. 옛 사람들은 초상肖像이라고, 닮을 초肖자를 쓰지 않고 ‘사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참의 어원은 ‘차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즉 내면에서부터 차 오른 것, 즉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을 그린다는 뜻이다. 즉 옛날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학문과 수양, 그리고 벼슬아치가 된 다음에 백성들에게 훌륭한 정치를 펼쳤던 경륜, 이 세 가지를 보여주려고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이다. 겉껍데기, 즉 현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어디서 들어오고 그늘이 어디 생기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옛 산수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산수 자연의 기운을 옮겨 그리고자 하기 때문에 나무 그림자는 그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참된 정신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 점이 관건인 것이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젊은 시절의 꽃다운 얼굴을 그리지 않았는데 이는 젊은이가 학문도, 수양도, 경륜도 아직 이루어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진행형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릴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깊은 뜻이 ‘사진’이란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임금의 초상은 ‘어진御眞’이 된다.
조선시대 건축 가운데 나라 안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축물은 ‘종묘’이다. 조상을 모시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로 채택된 종묘는 엄숙하고 단정한 정신미가 깃들여있다. 그런데 종묘에 가 보면 맞배지붕으로 단촐한 구조로 지어 놓고, 또 화려한 오색 단청을 쓰는 대신 그저 갈색과 녹색으로 간략히 보색대비만 시켜놓았다. 월대의 단을 돋우는 장대석도 일정하지 않은 길고 짧은 돌로 반듯하게만 쌓았다. 임금이 제사 지내는 마당의 돌, 박석을 보면 네모반듯하게 다듬지도 않고 물갈이도 안한 채 그저 까뀌로만 툭툭 쳐서 깔았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검소함을 표방한 것이다. 국왕과 삼정승 육판서가 엄숙한 의례를 행하는 종묘 마당을 이렇게 소박하게 마무리한 나라였기 때문에 500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종묘는 애초 선왕 일곱을 모시게끔 일곱 칸을 지었으나 나라가 오래가면서 자꾸 선왕이 늘어나게 되자 그래도 잇대어 증축을 했다. 그러고도 부족하자 영녕전永寧殿이란 건물을 하나 더 지었다. 외형이 아닌 정신의 문화, 그리고 높은 안목의 문화, 이게 바로 조선의 정신이었다. 그래서 종묘에 실제로 가 보면 별 것 없는 듯 하면서도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미가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의 문화상황은 종묘 칸칸이 신실神室의 문을 모두 미제 밀워키 회사 자물쇠가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복궁 역시 음양오행 관념에 따라 정면 칸수는 세 개, 즉 홀수로 되어 있다. 절의 대웅전이거나 궁궐 건물이거나 권위 있는 건축들은 모두 중아에 어칸이 있고 조우에 협칸이 있다. 가운데 어칸으로 임금이 드나들고, 그 동편과 서편에 작은 문이 두 개 있어 신하들이 통행하는데 동쪽 문은 봄에 해당되고 그래서 덕으로는 어질 인仁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신文臣들이 이리로 드나들었고, 서쪽 문으로는 무신들이 드나들었다. 동쪽 문은 ‘일화문日華門’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해의 정화’, 그러니까 햇빛문이라는 뜻이다. 서쪽 문은 ‘월화문月華門’, 즉 ‘달의 정화’, ‘달빛문’이다. 조선 궁궐의 현판은 모양이 다 온화하고 점
영조와 같은 임금은 5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는데, 왕이지만 평소엔 무명옷을 입고 그 옷이 해지면 또 기워입고, 농사가 흉년이 든 해에는 금주령을 내렸다. 바로 ‘백성들이 먹을 곡식을 녹여 가지고 독주를 만들어 마시는 것을 어떻게 참 선비라 하겠는가?’ 하는 뜻에서였다. 백성은 성리학 국가에서는 하늘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선이 훌륭한 나라였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현존하는 유물을 살펴보면 명확하다. 숙종 때의 대학자 이재의 손자 이채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검버섯뿐 아니라 병색까지 있는 사실 그대로가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런 극사실 초상화에 보이는 회화 정신을 옛 사람들은 ‘일호불사一毫不似 편시타인便是他人’이라고 하였다. 즉 ‘터럭 한 오라기가 달라도 남이다’ 라는 것이다. 참으로 엄정한 회화정신이다. 보기 싫은 검버섯이나 부종 같은 환부까지 왜 그토록 정확하게 그렸는가? 진선미 가운데 예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 바로 참된 모습을 그리려 했기 때문이다. 즉 외면이 아닌 정신을 그리려고 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늘 아름다운 것보다는 참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초상화를 그릴 때 곰보면 검버섯이며, 커다란 혹까지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드러냈는데, 그런 정신을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많이 빼앗겼다. 김은호 화백이 그린 <논개>나 <춘향><이순신 장군> 이런 그림은 겉보기에는 좋은 듯하지만 그저 예쁘기만 한 것은 장식품이지 예술품이 아니다. 더구나 작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명분이 없는 사람이었다.
혜원 신윤복의 <연당의 여인>에는 전성기를 지나 쓸쓸하고 처량 맞은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화가는 화면 하반부의 연꽃을 화면의 반이나 차지하도록 높게 그렸다. 이것은 화가가 ‘여인의 눈에, 그 쓸쓸한 눈에 하나 가득 보이는 것은 오직 연꽃뿐이었으려니’ 하는 의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애초 그리기 전부터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 작품이 겉보기에는 수월하게 척척 그려낸 듯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화가의 깊은 마음이 담긴 그림이라 하겠다.
찬문을 보면 ‘기진자사其眞自寫’, 즉 참 진眞 자, 그릴 사寫 자를 써서 초상화 그리는 걸 ‘사진寫眞’이라 표현했다. 옛 사람들은 초상肖像이라고, 닮을 초肖자를 쓰지 않고 ‘사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참의 어원은 ‘차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인데, 즉 내면에서부터 차 오른 것, 즉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을 그린다는 뜻이다. 즉 옛날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학문과 수양, 그리고 벼슬아치가 된 다음에 백성들에게 훌륭한 정치를 펼쳤던 경륜, 이 세 가지를 보여주려고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이다. 겉껍데기, 즉 현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어디서 들어오고 그늘이 어디 생기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옛 산수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산수 자연의 기운을 옮겨 그리고자 하기 때문에 나무 그림자는 그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참된 정신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 점이 관건인 것이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젊은 시절의 꽃다운 얼굴을 그리지 않았는데 이는 젊은이가 학문도, 수양도, 경륜도 아직 이루어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진행형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릴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깊은 뜻이 ‘사진’이란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임금의 초상은 ‘어진御眞’이 된다.
조선시대 건축 가운데 나라 안에서 가장 소중했던 건축물은 ‘종묘’이다. 조상을 모시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로 채택된 종묘는 엄숙하고 단정한 정신미가 깃들여있다. 그런데 종묘에 가 보면 맞배지붕으로 단촐한 구조로 지어 놓고, 또 화려한 오색 단청을 쓰는 대신 그저 갈색과 녹색으로 간략히 보색대비만 시켜놓았다. 월대의 단을 돋우는 장대석도 일정하지 않은 길고 짧은 돌로 반듯하게만 쌓았다. 임금이 제사 지내는 마당의 돌, 박석을 보면 네모반듯하게 다듬지도 않고 물갈이도 안한 채 그저 까뀌로만 툭툭 쳐서 깔았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검소함을 표방한 것이다. 국왕과 삼정승 육판서가 엄숙한 의례를 행하는 종묘 마당을 이렇게 소박하게 마무리한 나라였기 때문에 500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종묘는 애초 선왕 일곱을 모시게끔 일곱 칸을 지었으나 나라가 오래가면서 자꾸 선왕이 늘어나게 되자 그래도 잇대어 증축을 했다. 그러고도 부족하자 영녕전永寧殿이란 건물을 하나 더 지었다. 외형이 아닌 정신의 문화, 그리고 높은 안목의 문화, 이게 바로 조선의 정신이었다. 그래서 종묘에 실제로 가 보면 별 것 없는 듯 하면서도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미가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의 문화상황은 종묘 칸칸이 신실神室의 문을 모두 미제 밀워키 회사 자물쇠가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복궁 역시 음양오행 관념에 따라 정면 칸수는 세 개, 즉 홀수로 되어 있다. 절의 대웅전이거나 궁궐 건물이거나 권위 있는 건축들은 모두 중아에 어칸이 있고 조우에 협칸이 있다. 가운데 어칸으로 임금이 드나들고, 그 동편과 서편에 작은 문이 두 개 있어 신하들이 통행하는데 동쪽 문은 봄에 해당되고 그래서 덕으로는 어질 인仁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신文臣들이 이리로 드나들었고, 서쪽 문으로는 무신들이 드나들었다. 동쪽 문은 ‘일화문日華門’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해의 정화’, 그러니까 햇빛문이라는 뜻이다. 서쪽 문은 ‘월화문月華門’, 즉 ‘달의 정화’, ‘달빛문’이다. 조선 궁궐의 현판은 모양이 다 온화하고 점
추천자료
 (독서감상문)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독서감상문)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 (독서감상문)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포트폴리오를 읽고
(독서감상문)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포트폴리오를 읽고 [독후감/서평/요약] (독서감상문) 시크릿을 읽고
[독후감/서평/요약] (독서감상문) 시크릿을 읽고  (독서감상문) 우리는 마이크로소사이어티로 간다를 읽고
(독서감상문) 우리는 마이크로소사이어티로 간다를 읽고 (독서감상문) 위대한 나를 읽고
(독서감상문) 위대한 나를 읽고 (독서감상문)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만나다
(독서감상문)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만나다 (독서감상문) 자원전쟁을 읽고
(독서감상문) 자원전쟁을 읽고 (독서감상문) 제휴마케팅을 읽고
(독서감상문) 제휴마케팅을 읽고 (독서감상문) 경제학 패러독스를읽고
(독서감상문) 경제학 패러독스를읽고 [독후감/서평/요약] (독서감상문)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를 읽고
[독후감/서평/요약] (독서감상문)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를 읽고 (독서감상문) 디테일의 힘을 읽고나서
(독서감상문) 디테일의 힘을 읽고나서  [독서감상문]C. R.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독서감상문]C. R.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독서감상문]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를 읽고..)
[독서감상문]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를 읽고..) 독서의 유용성과 올바른 독서 방법
독서의 유용성과 올바른 독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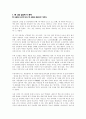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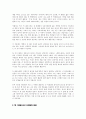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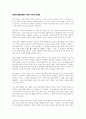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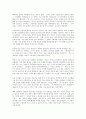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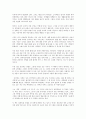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