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신학적 주지
1. 하나님의 주권
2. 상징적 형태로서의 그리스도
3. 교회공동체
4. 책임윤리
5. 교회와 세상
Ⅲ. 문화 유형론
Ⅳ. 문화 유형론의 비판적 고찰
Ⅴ. 나오는 말
Ⅱ. 신학적 주지
1. 하나님의 주권
2. 상징적 형태로서의 그리스도
3. 교회공동체
4. 책임윤리
5. 교회와 세상
Ⅲ. 문화 유형론
Ⅳ. 문화 유형론의 비판적 고찰
Ⅴ. 나오는 말
본문내용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타자들은 도덕적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니버의 윤리는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다. 그래서 거스 탑슨은 니버의 모델을 직관적(intuitive)이라 간주하면서, 더욱 규정적인(prescriptive) 윤리가 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James Gustafson, Can Ethics Be Christian?, p. 158.
이것은 그의 일관된 상대주의적 태도에서 야기된 구체적인 도덕적 선택과 판단에서 초래된 도덕기준의 문제일 것이다. 김영철, “리챠드 니버의 상관주의와 책임”, 「믿음과 삶의 윤리학」(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4), pp. 163-34
환언하면, 적합한 응담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목적론적 윤리가 의무론적 윤리와 상보적 관계에 있듯이 책임 윤리도 규범적 윤리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임성빈, “리챠드 니버의 ‘응답의 윤리’”,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동향」(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p.48
그러나 디펜탈러(Jon Diefenthaler)는 니버가 윤리적 구체성을 결여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니버는 자신의 변혁주의적 노선을 원칙적으로 따르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상황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유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Diefenthaler, H. Richard Niebuhr, p. 90.
니버의 응답 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적이 될 것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할 것을 촉구하려는 니버 나름대로의 방식이다. “책임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은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 행동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응답하라는 것이다.” H. Richard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p.126
윤리를 숙고함에 있어서 니버는 윤리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행위를 개인과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나서 응답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책임 윤리의 강점은 개인의 존엄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개인 자신과 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인간으로 서게 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5. 교회와 세상
니버에게 결정적으로 주요한 주제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다. 회드메이커에 따르면, 니버 사상의 전체는 복음과 그것이 속해 있고, 기능하는 문화 사이의 관계를 관통하고 있으며, 그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삶의 변혁에 있었다는 것이다. Libertus A. Hoedemaker, The Theology of H. Richard Niebuhr, p. ⅹⅶ; jon Diefenthaler, H. //richard Niebuhr, pp.~ⅹⅲ.
갓세이(Jon D. Godsey)도 니버의 사상은 언제나 기독교 신앙과 불신앙의 세상 사이에 있는 날카로운 긴장 속에 머물러 있어서,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을 사수할 것을 요청하고, 또 어떤 때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세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교회와 세상은 항상 대화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John d. Godsey, The Promise of H. Richard Niebuhr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Co, 1970), p 18; Jon Diefenthaler, Ibid., p. ⅹⅲ.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출판이 되었지만 니버의 저서들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교파주의의 사회적 원인」(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모든 교파들이 계급, 인종, 국가, 등과 같은 인간적 구분 논리에 자신들을 적응시키려는 경향성을 보인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발전이 미국 문화를 통합할 수 있다는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Jon Diefenthaler, Ibid., p. ⅵ
「세상과 투쟁하는 교회」(The Church Against the World)에서는 사회악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무능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깊이 연루된 것 같은 미국 교회의 현실을 보았다. 그런 시각은 미국 교회가 문화가 지나치게 동일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통찰에서 기인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와 문화를 혼돈하는 자유주의적 개신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기도 했다. Ibid.
교회와 세상에 대한 주제는 「미국에서의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in America)에서도 계속된다. 그것은 삼백년 동안의 미국 개신교의 발전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미국 개신교의 발전과 그 유전과정(transmission)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운동(move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것은 문화 형성에 미치는 신학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기독교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갖는 다섯 가지 유형들을 고찰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였다. 사람과 사회들이 자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그러나 언제나 문화의 틀 내에서, 메타노이아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급진적 유일신론과 서구문화」(Radial Monotheism and Western Culture)에서는 니버 자신이 서구문화에서 목격한 단일신론적(monotheistic), 그리고 다신론적(polytheistic) 신앙형태를 분석했다. 이 두 가지 신앙형태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적 신뢰와 충성의 왜곡된 형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문화자체로부터 하나의 신을 만들어 내든가 아니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정치적, 과학적, 종교적 인물이나 이념에게 헌신하기 때문이다. Ibid., p. ⅶ.
니버의 관심이 흔히 교회의 내적인 개혁에 집중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사실 그의 형 라인홀드 니버는 문화 변혁에 책임의식을 가
이것은 그의 일관된 상대주의적 태도에서 야기된 구체적인 도덕적 선택과 판단에서 초래된 도덕기준의 문제일 것이다. 김영철, “리챠드 니버의 상관주의와 책임”, 「믿음과 삶의 윤리학」(서울 :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4), pp. 163-34
환언하면, 적합한 응담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목적론적 윤리가 의무론적 윤리와 상보적 관계에 있듯이 책임 윤리도 규범적 윤리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임성빈, “리챠드 니버의 ‘응답의 윤리’”,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동향」(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p.48
그러나 디펜탈러(Jon Diefenthaler)는 니버가 윤리적 구체성을 결여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니버는 자신의 변혁주의적 노선을 원칙적으로 따르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상황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유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Diefenthaler, H. Richard Niebuhr, p. 90.
니버의 응답 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적이 될 것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할 것을 촉구하려는 니버 나름대로의 방식이다. “책임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은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 행동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응답하라는 것이다.” H. Richard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p.126
윤리를 숙고함에 있어서 니버는 윤리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행위를 개인과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나서 응답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책임 윤리의 강점은 개인의 존엄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개인 자신과 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인간으로 서게 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5. 교회와 세상
니버에게 결정적으로 주요한 주제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다. 회드메이커에 따르면, 니버 사상의 전체는 복음과 그것이 속해 있고, 기능하는 문화 사이의 관계를 관통하고 있으며, 그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삶의 변혁에 있었다는 것이다. Libertus A. Hoedemaker, The Theology of H. Richard Niebuhr, p. ⅹⅶ; jon Diefenthaler, H. //richard Niebuhr, pp.~ⅹⅲ.
갓세이(Jon D. Godsey)도 니버의 사상은 언제나 기독교 신앙과 불신앙의 세상 사이에 있는 날카로운 긴장 속에 머물러 있어서,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을 사수할 것을 요청하고, 또 어떤 때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세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교회와 세상은 항상 대화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John d. Godsey, The Promise of H. Richard Niebuhr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Co, 1970), p 18; Jon Diefenthaler, Ibid., p. ⅹⅲ.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출판이 되었지만 니버의 저서들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교파주의의 사회적 원인」(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모든 교파들이 계급, 인종, 국가, 등과 같은 인간적 구분 논리에 자신들을 적응시키려는 경향성을 보인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발전이 미국 문화를 통합할 수 있다는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Jon Diefenthaler, Ibid., p. ⅵ
「세상과 투쟁하는 교회」(The Church Against the World)에서는 사회악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무능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깊이 연루된 것 같은 미국 교회의 현실을 보았다. 그런 시각은 미국 교회가 문화가 지나치게 동일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통찰에서 기인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와 문화를 혼돈하는 자유주의적 개신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기도 했다. Ibid.
교회와 세상에 대한 주제는 「미국에서의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in America)에서도 계속된다. 그것은 삼백년 동안의 미국 개신교의 발전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미국 개신교의 발전과 그 유전과정(transmission)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운동(move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이것은 문화 형성에 미치는 신학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기독교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갖는 다섯 가지 유형들을 고찰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였다. 사람과 사회들이 자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그러나 언제나 문화의 틀 내에서, 메타노이아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급진적 유일신론과 서구문화」(Radial Monotheism and Western Culture)에서는 니버 자신이 서구문화에서 목격한 단일신론적(monotheistic), 그리고 다신론적(polytheistic) 신앙형태를 분석했다. 이 두 가지 신앙형태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적 신뢰와 충성의 왜곡된 형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문화자체로부터 하나의 신을 만들어 내든가 아니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정치적, 과학적, 종교적 인물이나 이념에게 헌신하기 때문이다. Ibid., p. ⅶ.
니버의 관심이 흔히 교회의 내적인 개혁에 집중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사실 그의 형 라인홀드 니버는 문화 변혁에 책임의식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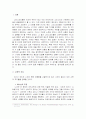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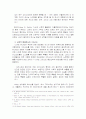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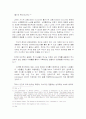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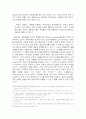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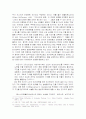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