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훈민시조의 명칭과 시대적 배경
2. 훈민시조의 특징
1. 형식상 특징 : 훈민시조 종장의 특이성
1) 종장 제1음보 정형성 파괴
2) 종장 제4음보 정형성 파괴
2. 향유(享有)의 방식
3. 훈민시조의 작가와 작품
1. 지방행정관료
1) 주세붕(周世鵬)의 「五倫歌」
2) 宋純의 <五倫歌>
3) 정철(鄭澈)의 <訓民歌>
2. 재지사족의 훈민시조
1) 박선장의 오륜가
2) 김상용의 오륜가
3) 박인로의 오륜가
4. 조선후기 훈민시조의 변모
Ⅲ. 결 론
Ⅱ. 본 론
1. 훈민시조의 명칭과 시대적 배경
2. 훈민시조의 특징
1. 형식상 특징 : 훈민시조 종장의 특이성
1) 종장 제1음보 정형성 파괴
2) 종장 제4음보 정형성 파괴
2. 향유(享有)의 방식
3. 훈민시조의 작가와 작품
1. 지방행정관료
1) 주세붕(周世鵬)의 「五倫歌」
2) 宋純의 <五倫歌>
3) 정철(鄭澈)의 <訓民歌>
2. 재지사족의 훈민시조
1) 박선장의 오륜가
2) 김상용의 오륜가
3) 박인로의 오륜가
4. 조선후기 훈민시조의 변모
Ⅲ. 결 론
본문내용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나갔다. 한국사 연구회 편, 한국사강의. PP.161~162, 재인용
당대의 향촌은 군현 단위로 묶인 재지사족의 연합(이는 주로 향회, 유향소, 향약, 혹은 서원의 형태로 나타난다)에 농민이 편재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훈민시조의 작자들이 추구한 창작동기(모순된 현실을 이념에 의해 시정해 보려는 노력)와 이러한 당대 향촌 사회의 동향을 고려해 볼 때 훈민시조가 직접 가해진 대상은 향촌이고, “民”에 속하는 계층은 사족과 농민을 함께 어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훈민시조는 향촌의 사족에게 일차 전달되어 그들 사이에서 유통된 후 다시 농민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대 지주사족이 문자를 장악하고 있던 현실에서 훈민시조와 같은 글은 문자를 알고 있는 계층을 일차적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훈민시조가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사족의 입장에서 본 배경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시대적 배경으로는 당대에는 사림파에 의해 소학의 철저한 실천이 강조되었으나, 이들 윤리에 대한 사족의 실천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학은 어린아이들이나 보는 책이라 하여 무시되었고, 향교 교육 또한 기피하여 교생(敎生)이 양인 농민 중에서 채워지는 형편이었다. 주자가례의 실천도는 극히 낮아 아직도 불교식 장제(葬祭)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재산 분배를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농민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과 소학의 낮은 실천도를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훈민시조가 창작된 것이다.
한편 농민이 향유계층이라는 점에서 본 훈민시조의 시대적 배경은 사족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과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사전개혁(私田改革)으로 인해 15세기에는 광범위한 자영농이 창출되었는데, 세종대에는 전체 농민의 70%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왕실과 훈척들에 의한 토지의 광점(廣占)과 더불어 지주-전호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영농이 몰락하여 전호농으로 바뀌어 갔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의 가혹한 부세와 함께 끊임없이 닥쳐오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 및 자체 재생산마저 위협받고 있던 당대 농민의 현실이 놓여 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농민은 유망(流亡)이나 항조(抗租)라는 소극적인 저항과 함께 군도나 농민반란과 같은(임꺽정의 난이 대표적인데) 적극적인 저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급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에는 당대의 소농민과 함께 수공업자, 노비, 상인 등이 결부되어 있었다. 이러한 향촌의 동향을 위기로 파악한 재지사족은 향촌을 재정비하는 한편 성리학 윤리의 보급을 통해 이를 막아보려는 노력을 벌이게 되는데 훈민시조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되었던 것이다.
2. 훈민시조의 특징
1. 형식상 특징 : 훈민시조 종장의 특이성
시조는 ‘4음보격 3행시’ 형식의 정형시이다. 시조의 형식을 생각할 때는 종장을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종장의 형식과 율격은 초중장의 그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면이 있으며, 이러한 종장의 특이성이 바로 시조의 시적 완결성을 보장하는 시조의 정형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시조 시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조를 시조답게 하는 시조의 형식적 특성은 종장의 특이성에 있으며, 이 종장의 형식은 바로 시조 시형의 정형성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조동일은 시조 종장의 율격을 음보의 첨가와 결합에 의한 변현규칙으로 설명하면서 종장의 율격의 특성에 따라 ‘광의의 시조’와 ‘협의의 시조’로 구분하여 파악한 적이 있다.
(조동일,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서울 : 한길사, 1982)
이러한 종장의 정형성을 김흥규는 종장의 율격과 통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음보의 구성 자질을 음절수에 두고, 한 음보를 이루는 기중 음절수를 4음절로 설정하여 4음절로 된 음보를 ‘평음보’, 3음절 이하로 된 것을 ‘소음보’라하고, 5음절 이상으로 된 것을 ‘과음보’라 이름하면서 종장의 지배적인 정형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김흥규「평시조 종장의 율격통사적 정형과 그 기능」,『음률』(김대행 편), 문학과 지성사, 1984.
① <소음보 - 과음보 - 평음보 - 소음보>의 구조 (ac
③ a는 상당수는 감탄적 어사(語辭)
④ d는 대부분 감탄적 종결형
이에 따르면 시조의 초장과 중장은 ‘소음보 - 평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율격상의 개방성을 가지는 반면 종장은 이와 달리 규칙 ①에 나타난 바와 같은 독특한 율격구조를 가짐으로써 초중장에서 이어지던 규칙적 연속을 차단하고 율격상의 개방성을 거부하는 폐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종장 첫머리는 감탄사호격명령형그리고 감탄의 뜻을 내포한 부사어 등이 많이 사용되어 감탄적 어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장 제 4음보의 감탄적 종결사와 결합하여 서정적 완결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시조라는 시는 이 종장 형식의 특이성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시조란 장르를 형성하게 된 것’ 고정옥,『國語國文學要綱』, 대학출판사, 1948.
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시조의 형식에서 종장은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지금부터 훈민시조가 이러한 시조 종장의 정형성에서 어떻게 벗어나 있으며 또 그 벗어남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1) 종장 제1음보 정형성 파괴
일반적으로 시조의 종장은 한국 시가의 기본 이념인 전후절 분단의 후소절에 해당되며, 종장의 제1구는 전후절 분단의 사이에 개재되었던 감탄사의 성격을 계승한 것 최동원, 『고시조론』, 서울 : 삼영사, 1980.
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이 시조 종장의 제1음보는 그 유래에서부터 감탄사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 현전하는 시조 작품에서도 종장의 제1음보에는 감탄적 어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훈민시조의 종장 제1음보에는 이같은 ‘감탄적 어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훈민시조 60수에 나타난 종장 제1음보에 오는 어사는 다음과 같다.
그려도(3) 一生애(3) 날마다(2) 진실로(2) 사이(2)
이몸은(2) 아모려(2) 하 어제 올길
이덕을 우린 쇼 적곳 매
당대의 향촌은 군현 단위로 묶인 재지사족의 연합(이는 주로 향회, 유향소, 향약, 혹은 서원의 형태로 나타난다)에 농민이 편재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훈민시조의 작자들이 추구한 창작동기(모순된 현실을 이념에 의해 시정해 보려는 노력)와 이러한 당대 향촌 사회의 동향을 고려해 볼 때 훈민시조가 직접 가해진 대상은 향촌이고, “民”에 속하는 계층은 사족과 농민을 함께 어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훈민시조는 향촌의 사족에게 일차 전달되어 그들 사이에서 유통된 후 다시 농민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대 지주사족이 문자를 장악하고 있던 현실에서 훈민시조와 같은 글은 문자를 알고 있는 계층을 일차적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훈민시조가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사족의 입장에서 본 배경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시대적 배경으로는 당대에는 사림파에 의해 소학의 철저한 실천이 강조되었으나, 이들 윤리에 대한 사족의 실천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학은 어린아이들이나 보는 책이라 하여 무시되었고, 향교 교육 또한 기피하여 교생(敎生)이 양인 농민 중에서 채워지는 형편이었다. 주자가례의 실천도는 극히 낮아 아직도 불교식 장제(葬祭)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재산 분배를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농민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과 소학의 낮은 실천도를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훈민시조가 창작된 것이다.
한편 농민이 향유계층이라는 점에서 본 훈민시조의 시대적 배경은 사족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과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사전개혁(私田改革)으로 인해 15세기에는 광범위한 자영농이 창출되었는데, 세종대에는 전체 농민의 70%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왕실과 훈척들에 의한 토지의 광점(廣占)과 더불어 지주-전호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영농이 몰락하여 전호농으로 바뀌어 갔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의 가혹한 부세와 함께 끊임없이 닥쳐오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 및 자체 재생산마저 위협받고 있던 당대 농민의 현실이 놓여 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농민은 유망(流亡)이나 항조(抗租)라는 소극적인 저항과 함께 군도나 농민반란과 같은(임꺽정의 난이 대표적인데) 적극적인 저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급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에는 당대의 소농민과 함께 수공업자, 노비, 상인 등이 결부되어 있었다. 이러한 향촌의 동향을 위기로 파악한 재지사족은 향촌을 재정비하는 한편 성리학 윤리의 보급을 통해 이를 막아보려는 노력을 벌이게 되는데 훈민시조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되었던 것이다.
2. 훈민시조의 특징
1. 형식상 특징 : 훈민시조 종장의 특이성
시조는 ‘4음보격 3행시’ 형식의 정형시이다. 시조의 형식을 생각할 때는 종장을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종장의 형식과 율격은 초중장의 그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면이 있으며, 이러한 종장의 특이성이 바로 시조의 시적 완결성을 보장하는 시조의 정형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시조 시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조를 시조답게 하는 시조의 형식적 특성은 종장의 특이성에 있으며, 이 종장의 형식은 바로 시조 시형의 정형성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조동일은 시조 종장의 율격을 음보의 첨가와 결합에 의한 변현규칙으로 설명하면서 종장의 율격의 특성에 따라 ‘광의의 시조’와 ‘협의의 시조’로 구분하여 파악한 적이 있다.
(조동일,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서울 : 한길사, 1982)
이러한 종장의 정형성을 김흥규는 종장의 율격과 통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음보의 구성 자질을 음절수에 두고, 한 음보를 이루는 기중 음절수를 4음절로 설정하여 4음절로 된 음보를 ‘평음보’, 3음절 이하로 된 것을 ‘소음보’라하고, 5음절 이상으로 된 것을 ‘과음보’라 이름하면서 종장의 지배적인 정형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김흥규「평시조 종장의 율격통사적 정형과 그 기능」,『음률』(김대행 편), 문학과 지성사, 1984.
① <소음보 - 과음보 - 평음보 - 소음보>의 구조 (ac
③ a는 상당수는 감탄적 어사(語辭)
④ d는 대부분 감탄적 종결형
이에 따르면 시조의 초장과 중장은 ‘소음보 - 평음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율격상의 개방성을 가지는 반면 종장은 이와 달리 규칙 ①에 나타난 바와 같은 독특한 율격구조를 가짐으로써 초중장에서 이어지던 규칙적 연속을 차단하고 율격상의 개방성을 거부하는 폐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종장 첫머리는 감탄사호격명령형그리고 감탄의 뜻을 내포한 부사어 등이 많이 사용되어 감탄적 어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장 제 4음보의 감탄적 종결사와 결합하여 서정적 완결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시조라는 시는 이 종장 형식의 특이성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시조란 장르를 형성하게 된 것’ 고정옥,『國語國文學要綱』, 대학출판사, 1948.
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시조의 형식에서 종장은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지금부터 훈민시조가 이러한 시조 종장의 정형성에서 어떻게 벗어나 있으며 또 그 벗어남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1) 종장 제1음보 정형성 파괴
일반적으로 시조의 종장은 한국 시가의 기본 이념인 전후절 분단의 후소절에 해당되며, 종장의 제1구는 전후절 분단의 사이에 개재되었던 감탄사의 성격을 계승한 것 최동원, 『고시조론』, 서울 : 삼영사, 1980.
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같이 시조 종장의 제1음보는 그 유래에서부터 감탄사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 현전하는 시조 작품에서도 종장의 제1음보에는 감탄적 어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훈민시조의 종장 제1음보에는 이같은 ‘감탄적 어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훈민시조 60수에 나타난 종장 제1음보에 오는 어사는 다음과 같다.
그려도(3) 一生애(3) 날마다(2) 진실로(2) 사이(2)
이몸은(2) 아모려(2) 하 어제 올길
이덕을 우린 쇼 적곳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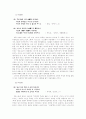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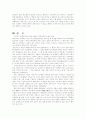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