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가시리
2)동동
3)만전춘
4)사모곡
5)상저가
6)서경별곡
7)쌍화점
8)유구곡
9)이상곡
10)정과정
11)정석가
12)정읍사
13)청산별곡
14)처용가
2)동동
3)만전춘
4)사모곡
5)상저가
6)서경별곡
7)쌍화점
8)유구곡
9)이상곡
10)정과정
11)정석가
12)정읍사
13)청산별곡
14)처용가
본문내용
김유신이 소시에 모부인이 날마다 엄한 훈계를 하여 함부로 남과 사귀어 놀지 않더니, 하루는 우연히 계집종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어머니가 교훈하기를 나는 이미 늙었다. 낮이나 밤이나 네가 성장하여 공명을 세우고 임금과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네가 친한 아이들과 더불어 음탕한 방과 술집에서 논다는 말이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니 유신이 즉시 어머니 앞에서 다시는 그 집 문을 지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하루는 술이 취하여 집에 돌아오는데 말이 전일에 다니던 길을 따라 그릇 창녀의 집에 이르렀다. 창녀가 한편으로 반기고 한편으로 원망하여 울면서 나와 맞이하였다. 유신이 이미 깨닫고 타고 온 말을 베이고 안장을 버린 채 돌아갔다. 그 여자가 원망하는 노래 한 곡조를 지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절은 바로 그 여자의 집이며 천관은 그 여자의 이름이다.”
<원사>는 김유신과 창가의 여인 천관과의 이별장면을 배경으로 불러어지 노래로 지난날 늘 찾았던 관행에 따라 창가를 찾아든 말의 머리를 베고 돌아서는 유신 앞에서 여인이 부르는 애끓는 이 노래는 가시리의 정서와 크게 어긋남이 없다. 천관녀의 원사는 고려시기까지 노래되었음이 밝혀졌다.
[작품해석]
<가시리>는 민족의 전통적인 정한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노래로 쓰라린 이별의 심정을 절묘하고 표현해내고 있다. 이러한 <가시리>에서 나타난 이별의 심정은 국문학의 여성적 정조의 원류를 이루어 왔다. 후에 나온 황진이의 시조‘어져 내일이야 그릴줄을 모로냐’와 <아리랑>,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으로 <가시리>는 한국적 정조의 대표적 작품이라 불리고 있다.
1.<가시리>에서 나타난 여인상
일반적으로 <가시리>에서 나타난 여인상을 <서경별곡>에 비해서 임에 대한 원망, 하소연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여인으로 보아 떠난 임에 대해 순응하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가시리 전편에서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 ‘나’가 아닌 ‘님’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나’가 주체가 되는 행은 적고 님-님-나-님-나-님-나-님으로 교대로 말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님은 말없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행위로 일관되고 오로지 떠난 님의 일에 순응하는 것으로 일관된다. 그래서 가시리의 이별에서는 님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인 대응 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분명 <가시리>의 내용에서는 적극적으로 님을 붙잡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떠나려는 서러운 님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별과 재회라는 대립적 이중구조를 통해 재회의 기약을 더욱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는 노래로 보면 적극적 대응방식과 다른 고결한 인품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지닌 여인을 그릴 수 있다.
화자는 ‘심하게 굴면 영원히 아니올까’라는 두려운 마음 앞에 은근히 내면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임이 일방적으로 떠난다고 하더라도 님과의 재회를 화자는 믿기에 임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리>에서 나타난 여인의 행위는 언뜻 보기에 체념의 행위로 단정할 수 있겠지만 <가시리>에서의 체념은 ‘가시 도셔오쇼셔’에서 보이듯이 희망의 재회의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가시리>에 나타난 여인은 단순히 순응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별 뒤의 재회라는 돌파구를 찾음으로써 현실세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희망의지를 가지고 있는 끈기 있는 여성의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시리>에 나타난 후렴구.
<가시리>에 사용된 후렴구는‘위 증즐가 대평셩(太平盛代)’로 악기의 구음으로 구성된 고려가요의 후렴구와는 구별되는 유의적 어사이다. ‘위’는 한림별곡에서 보듯 감탄사이며 ‘증즐가’는 조율음으로 ‘~즐가’형이다. 의성적인 장단으로 볼 수 있다. ‘태평성대’는 악률에 맞추기 위한 첨입구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던져주는 후렴구이다.
이러한 후렴구가 쓰이게 된 연유로는 <가시리>가 궁중의 아악으로 채용되면서 원시에는 없던 이 부분이 덧들어간 결과로 해석된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즐겁고 흥겨운 후렴구는 절망적 이별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궁중연희의 즐거운 분위기, 자리에 맞추어 군왕의 은덕을 칭송하는 신하들의 기쁨을 표현한 구절로 보여진다.
한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가시리의 임을 여읜 이의 원통함의 정서와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의 후렴구를 사용함으로서 서로 다른 정서의 대조를 통해 가시리의 슬픔의 효과를 극에 달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세상은 태평한데 어찌 된 일로 나에게 이런 참을 수 없는 이별의 원통함과 슬픔이 닥쳐왔는가’로 보는 것이다.
3. <가시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양주동: 고금동서에 별리를 제재로 한 시가 중 별장의 압권이라 칭찬하면서 소박미함축미절절한 애원면면한 정한장법을 따를만한 노래가 없다.
정병욱: <가시리>에서 우리는 비교적 유려한 운율 이외에 별로 시적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가시리>가 거의 산문과 다름없는 표현방법을 썼으며 표현기교가 극히 낮다.
전규태: <가시리>는 한국시의 원형으로서 서정적 풍토를 간직한 시이다.
장덕순: <가시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닌 재회의 희망을 안고 있는 희망가이다.
2) 동동
전문풀이
德으란 곰예 받고 덕은 뒤에 바치옵고
福으란 림예 받고 복은 앞에 바치오니
德이여 福이라 호 덕과 복이라 하는 것을
나라 오소이다 드디러 오십시오
아으 動動다리
正月ㅅ 나릿 므른 정월 냇물은
아으 어져 녹져 논 아아, 녹아 봄이 오려고 하는데
누릿 가온 나곤 세상에 태어나서
몸하 올로 녈셔 이 몸은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 動動다리
二月ㅅ 보로매 2월 보름에 ⇒연등일
아으 노피 현 아아, 높이 켠
燈ㅅ 블 다호라 등불 같구나
비취실 즈샷다 온 백성을 비추실 모습이로구나
아으 動動다리
三月ㅅ 나며 開 3월 지나면서 핀
아으 滿春 욋고지여 아아, 늦봄의 진달래꽃이여
브롤 즈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디녀 나샷다 지녔구나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4월 아니 잊고
아으 오실셔 곡고리새여 아아, 왔구나 꾀꼬리새여
므습다 綠事니 어찌하여 녹사님은
<원사>는 김유신과 창가의 여인 천관과의 이별장면을 배경으로 불러어지 노래로 지난날 늘 찾았던 관행에 따라 창가를 찾아든 말의 머리를 베고 돌아서는 유신 앞에서 여인이 부르는 애끓는 이 노래는 가시리의 정서와 크게 어긋남이 없다. 천관녀의 원사는 고려시기까지 노래되었음이 밝혀졌다.
[작품해석]
<가시리>는 민족의 전통적인 정한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노래로 쓰라린 이별의 심정을 절묘하고 표현해내고 있다. 이러한 <가시리>에서 나타난 이별의 심정은 국문학의 여성적 정조의 원류를 이루어 왔다. 후에 나온 황진이의 시조‘어져 내일이야 그릴줄을 모로냐’와 <아리랑>,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으로 <가시리>는 한국적 정조의 대표적 작품이라 불리고 있다.
1.<가시리>에서 나타난 여인상
일반적으로 <가시리>에서 나타난 여인상을 <서경별곡>에 비해서 임에 대한 원망, 하소연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여인으로 보아 떠난 임에 대해 순응하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가시리 전편에서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 ‘나’가 아닌 ‘님’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나’가 주체가 되는 행은 적고 님-님-나-님-나-님-나-님으로 교대로 말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님은 말없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행위로 일관되고 오로지 떠난 님의 일에 순응하는 것으로 일관된다. 그래서 가시리의 이별에서는 님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인 대응 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분명 <가시리>의 내용에서는 적극적으로 님을 붙잡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떠나려는 서러운 님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별과 재회라는 대립적 이중구조를 통해 재회의 기약을 더욱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는 노래로 보면 적극적 대응방식과 다른 고결한 인품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지닌 여인을 그릴 수 있다.
화자는 ‘심하게 굴면 영원히 아니올까’라는 두려운 마음 앞에 은근히 내면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임이 일방적으로 떠난다고 하더라도 님과의 재회를 화자는 믿기에 임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리>에서 나타난 여인의 행위는 언뜻 보기에 체념의 행위로 단정할 수 있겠지만 <가시리>에서의 체념은 ‘가시 도셔오쇼셔’에서 보이듯이 희망의 재회의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가시리>에 나타난 여인은 단순히 순응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별 뒤의 재회라는 돌파구를 찾음으로써 현실세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희망의지를 가지고 있는 끈기 있는 여성의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시리>에 나타난 후렴구.
<가시리>에 사용된 후렴구는‘위 증즐가 대평셩(太平盛代)’로 악기의 구음으로 구성된 고려가요의 후렴구와는 구별되는 유의적 어사이다. ‘위’는 한림별곡에서 보듯 감탄사이며 ‘증즐가’는 조율음으로 ‘~즐가’형이다. 의성적인 장단으로 볼 수 있다. ‘태평성대’는 악률에 맞추기 위한 첨입구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던져주는 후렴구이다.
이러한 후렴구가 쓰이게 된 연유로는 <가시리>가 궁중의 아악으로 채용되면서 원시에는 없던 이 부분이 덧들어간 결과로 해석된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즐겁고 흥겨운 후렴구는 절망적 이별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궁중연희의 즐거운 분위기, 자리에 맞추어 군왕의 은덕을 칭송하는 신하들의 기쁨을 표현한 구절로 보여진다.
한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가시리의 임을 여읜 이의 원통함의 정서와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의 후렴구를 사용함으로서 서로 다른 정서의 대조를 통해 가시리의 슬픔의 효과를 극에 달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세상은 태평한데 어찌 된 일로 나에게 이런 참을 수 없는 이별의 원통함과 슬픔이 닥쳐왔는가’로 보는 것이다.
3. <가시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양주동: 고금동서에 별리를 제재로 한 시가 중 별장의 압권이라 칭찬하면서 소박미함축미절절한 애원면면한 정한장법을 따를만한 노래가 없다.
정병욱: <가시리>에서 우리는 비교적 유려한 운율 이외에 별로 시적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가시리>가 거의 산문과 다름없는 표현방법을 썼으며 표현기교가 극히 낮다.
전규태: <가시리>는 한국시의 원형으로서 서정적 풍토를 간직한 시이다.
장덕순: <가시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닌 재회의 희망을 안고 있는 희망가이다.
2) 동동
전문풀이
德으란 곰예 받고 덕은 뒤에 바치옵고
福으란 림예 받고 복은 앞에 바치오니
德이여 福이라 호 덕과 복이라 하는 것을
나라 오소이다 드디러 오십시오
아으 動動다리
正月ㅅ 나릿 므른 정월 냇물은
아으 어져 녹져 논 아아, 녹아 봄이 오려고 하는데
누릿 가온 나곤 세상에 태어나서
몸하 올로 녈셔 이 몸은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 動動다리
二月ㅅ 보로매 2월 보름에 ⇒연등일
아으 노피 현 아아, 높이 켠
燈ㅅ 블 다호라 등불 같구나
비취실 즈샷다 온 백성을 비추실 모습이로구나
아으 動動다리
三月ㅅ 나며 開 3월 지나면서 핀
아으 滿春 욋고지여 아아, 늦봄의 진달래꽃이여
브롤 즈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디녀 나샷다 지녔구나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4월 아니 잊고
아으 오실셔 곡고리새여 아아, 왔구나 꾀꼬리새여
므습다 綠事니 어찌하여 녹사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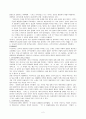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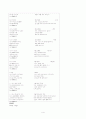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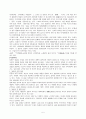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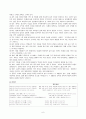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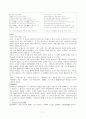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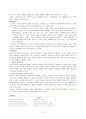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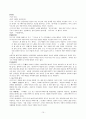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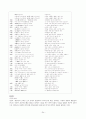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