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서론
2. 진도는 과연 어떤 곳인가?
3. 진도의 상징
4. 진도의 문화와 예술
5. 진도의 전설
6. 진도의 관광지
7. 진도의 자랑
8. 마치면서
*참고자료
1. 서론
2. 진도는 과연 어떤 곳인가?
3. 진도의 상징
4. 진도의 문화와 예술
5. 진도의 전설
6. 진도의 관광지
7. 진도의 자랑
8. 마치면서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니 바다를 건너가라\"는 선몽이 있어 모도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나가 기도하고 있던 중 갑자기 호동의 뿔치와 모도 뿔치 사이에 무지개처럼 치등이 나타났다. 그 길로 모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뽕할머니를 찾기 위해 징과 꽹과리를 치면서 호동에 도착하니 뽕할머니는 \"나의 기도로 바닷길이 열려 너희들을 만났으니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면서 기진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를 본 주민들은 뽕할머니의 소망이 치등으로 변하였고 영이 등천 하였다하여 영등살이라 칭하고 이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그 후 자식이 없는 사람,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7. 진도안의 역사
진도는 계레의 삶과 죽음이 교차했던 피흘린 섬이다. 진도대교 밑 울돌목의 흰 갈기를 휘날리며 물살 속에서는 일본 수군과 치열하게 싸우다 전사한 이순신 함대의 함성을 들을 수 있고, 요장산성 같은 삼별초 항쟁의 성지에는 고려인들의 한 맺힌 가슴을 느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평화로운 진도 산하에 몸을 기대고 정치적 불운을 처절한 음풍농월로 전환한 유배자들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있다.
1)이순신과 명량해전(탈정치성의 승리)
진도읍에서 동편으로 12km 떨어진 고군면 벽파리 682-4번지에 위치한 이 비석은 1956년 11월 29일 제막식을 가졌으며, 노산 이은상이 글을 짓고 진도 출신 서예가 소전 손재형 선생이 걸작의 글씨를 남겼다. 진도대교가 놓여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진도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으며, 명량해협의 길목이기도 하다.
이 비석은 진도 군민들의 성금을 모아 세워졌으며,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에 대한 당시의 역사(歷史)가 적혀있다. 일본 대마도를 굽어보며 장엄하게 세워진 이 비석은 가로 14m, 세로 18m의 넓이로 암석을 다듬고 석축을 쌓아 이충무공의 넋을 담고 있으며 11m의 웅장한 높이를 지니고 있다. 또 비석의 주추는 2.72m의 길이에 3.33m의 폭과 1.81m의 높이를 한 거북이는 바위를 깍아 만들어 그 등허리에 비석을 세웠다. 머리에는 쌍용이 휘감은 채 양편으로 머리를 내놓고 있는데 높이 1.21m, 가로 2.12m, 세로 1.21m로 9톤이나 되는 중량을 싣고 있다.
아침이면 햇살이 비쳐 눈이 부시고 석양이 지면 비석의 그림자가 바닷물까지 와닿는다.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는 이충무공전첩비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넋을 담고 있으며, 군민들의 정성을 모아 세웠기 때문에 더 값진 의미가 담겨져 있다.\"
2)진도의 유배자
진도는 전국에서 단일 지역으로서는 가장 많은 유배인들이 머물다가 간 곳이다. 고려 중기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 까지 50여 명의 왕족과 선비들이 진도에 유배되었다. 진도로 유배된 선비들은 제주도나 흑산도나 삼수갑산이나 북청으로 유배된 선비들에 비할진대 복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진도의 포근한 산하는 외지인들에게도 타향이라는 느낌을 주지않는다. 여러 유배지들 중에서 진도는 가장 복된 땅이었을 것이다. 진도의 산하는 사람을 찌를 듯이 달겨들지 않고, 사람을 가두듯이 협착하지 않다. 진도의 풍광은 수려하고 현안하다. 진도의 산하의 이평화는 유배자들의 정서와 예술 속으로 무리없이 녹아들어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인종때 왕권을 위협하면서 세상을 농단하던 이자겸이 실각하자 이자겸의 아들 공의(公儀)는 진도로 유배되었다. 이것이 문헌에 남이 있는 진도 유배의 시초이다(1126).
고려 의종때 무인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정중부는 임금을 거제도로 태자 기(祈)를 진도로 유배 보냈다.(1170)
이주(李 ?~1504)는 조선 연산군 시대의 문신이다. 무호사화 때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진도에 유배되어 왔다(1498년)
그 외에도 노수신, 조선 선조의 장남 임해군(臨海君 1574~1609), 인현왕후의 폐위를 극구 반대했던 박태보, 조선 영조시대의 명필 이광사, 조선 고종시대의 문신 정만조 선생님들이 진도에 유배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지금은 진도대교가 놓아져 있어서 육지와 다름없지만 그 이전엔 분명 고립된 섬이었다. 이 때문에 진도가 유배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3)삼별초 유적지(벽파진 용장산성 남도석성)
삼별초가 남긴 역사적 의의는 고려의 정치적 내부 갈등에 관계없이 우리 만족의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용기와 그 엄청난 국난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저항하고 최후까지 초지를 관철하려 했던 의기에 둘 수 있다.
삼별초의 난은 1195년 장군 최충헌이 크고 작은 정권 야혹을 근절시키고 정권을 잡아 이른바 정방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싹이 튼다. 이 무렵 중국에 몽고가 일어나 닥치는 대로 사방 인접국을 정벌하더니 고종 18년인 1231년에 드디어 개경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이에 집권자 최우가 마침내 국왕을 모시고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후 몽고 세력과의 항전을 무려 40년이나 계속했다. 하지만 1258년, 조정 내의 반대파에 의해 최씨 일파는 마침내 타도되었고,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문신파가 주동이 되어 40년간이나 대항해 온 몽고에 굽히기로 정책을 바꾸고 태자를 몽고에 보내어 화의를 청하는 한편 1270년 5월 서울을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옮기게 된다.
강화로 옮긴 지 38년 만의 일이다. 왕과 권신들이 강화에 숨어들어 지내는 동안 육지의 백성은 수없이 죽어 갔고 20여 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황룡사의 9층 목탑이 불타는 등 쑥대밭이 되었다. 당시 강화도 수비를 맡고 있던 삼별초군을 지도하던 임연이 죽고 그의 아들 유무마저 죽게 된다. 삼별초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지도자를 잃은 지 십 여일도 안됐는데 그들의 근거지를 떠나라는 왕명에 반발한다.
배중손, 노영희, 김통정, 유존섭 등 중심인물은 항몽 투쟁에 의한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를 주장한다. 그래서 1270년 그들은 몽고와 화친한 조정을 괴로 정부로 취급하여 왕족인 온을 정통 민족 정부의 왕으로 추대한 뒤 장기전을 예상하여 천여 척이 넘는 배를 이끌고 새로운 근거지인 진도로 향하여 떠났다고 한다.
삼별초는 벽파진 바로 인근인 용장산에 둘레 13Km, 높이 5척의 산성을 쌓고 왕궁을 지었으며 오랑이라는 연호까지 사용하였으나, 여몽연합군에 의하여 겨우 9개월 만에 이곳을 버리고
7. 진도안의 역사
진도는 계레의 삶과 죽음이 교차했던 피흘린 섬이다. 진도대교 밑 울돌목의 흰 갈기를 휘날리며 물살 속에서는 일본 수군과 치열하게 싸우다 전사한 이순신 함대의 함성을 들을 수 있고, 요장산성 같은 삼별초 항쟁의 성지에는 고려인들의 한 맺힌 가슴을 느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평화로운 진도 산하에 몸을 기대고 정치적 불운을 처절한 음풍농월로 전환한 유배자들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있다.
1)이순신과 명량해전(탈정치성의 승리)
진도읍에서 동편으로 12km 떨어진 고군면 벽파리 682-4번지에 위치한 이 비석은 1956년 11월 29일 제막식을 가졌으며, 노산 이은상이 글을 짓고 진도 출신 서예가 소전 손재형 선생이 걸작의 글씨를 남겼다. 진도대교가 놓여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진도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으며, 명량해협의 길목이기도 하다.
이 비석은 진도 군민들의 성금을 모아 세워졌으며,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에 대한 당시의 역사(歷史)가 적혀있다. 일본 대마도를 굽어보며 장엄하게 세워진 이 비석은 가로 14m, 세로 18m의 넓이로 암석을 다듬고 석축을 쌓아 이충무공의 넋을 담고 있으며 11m의 웅장한 높이를 지니고 있다. 또 비석의 주추는 2.72m의 길이에 3.33m의 폭과 1.81m의 높이를 한 거북이는 바위를 깍아 만들어 그 등허리에 비석을 세웠다. 머리에는 쌍용이 휘감은 채 양편으로 머리를 내놓고 있는데 높이 1.21m, 가로 2.12m, 세로 1.21m로 9톤이나 되는 중량을 싣고 있다.
아침이면 햇살이 비쳐 눈이 부시고 석양이 지면 비석의 그림자가 바닷물까지 와닿는다.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는 이충무공전첩비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넋을 담고 있으며, 군민들의 정성을 모아 세웠기 때문에 더 값진 의미가 담겨져 있다.\"
2)진도의 유배자
진도는 전국에서 단일 지역으로서는 가장 많은 유배인들이 머물다가 간 곳이다. 고려 중기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 까지 50여 명의 왕족과 선비들이 진도에 유배되었다. 진도로 유배된 선비들은 제주도나 흑산도나 삼수갑산이나 북청으로 유배된 선비들에 비할진대 복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진도의 포근한 산하는 외지인들에게도 타향이라는 느낌을 주지않는다. 여러 유배지들 중에서 진도는 가장 복된 땅이었을 것이다. 진도의 산하는 사람을 찌를 듯이 달겨들지 않고, 사람을 가두듯이 협착하지 않다. 진도의 풍광은 수려하고 현안하다. 진도의 산하의 이평화는 유배자들의 정서와 예술 속으로 무리없이 녹아들어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 인종때 왕권을 위협하면서 세상을 농단하던 이자겸이 실각하자 이자겸의 아들 공의(公儀)는 진도로 유배되었다. 이것이 문헌에 남이 있는 진도 유배의 시초이다(1126).
고려 의종때 무인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정중부는 임금을 거제도로 태자 기(祈)를 진도로 유배 보냈다.(1170)
이주(李 ?~1504)는 조선 연산군 시대의 문신이다. 무호사화 때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진도에 유배되어 왔다(1498년)
그 외에도 노수신, 조선 선조의 장남 임해군(臨海君 1574~1609), 인현왕후의 폐위를 극구 반대했던 박태보, 조선 영조시대의 명필 이광사, 조선 고종시대의 문신 정만조 선생님들이 진도에 유배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지금은 진도대교가 놓아져 있어서 육지와 다름없지만 그 이전엔 분명 고립된 섬이었다. 이 때문에 진도가 유배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3)삼별초 유적지(벽파진 용장산성 남도석성)
삼별초가 남긴 역사적 의의는 고려의 정치적 내부 갈등에 관계없이 우리 만족의 정통성을 지키려 했던 용기와 그 엄청난 국난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저항하고 최후까지 초지를 관철하려 했던 의기에 둘 수 있다.
삼별초의 난은 1195년 장군 최충헌이 크고 작은 정권 야혹을 근절시키고 정권을 잡아 이른바 정방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싹이 튼다. 이 무렵 중국에 몽고가 일어나 닥치는 대로 사방 인접국을 정벌하더니 고종 18년인 1231년에 드디어 개경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이에 집권자 최우가 마침내 국왕을 모시고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후 몽고 세력과의 항전을 무려 40년이나 계속했다. 하지만 1258년, 조정 내의 반대파에 의해 최씨 일파는 마침내 타도되었고,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문신파가 주동이 되어 40년간이나 대항해 온 몽고에 굽히기로 정책을 바꾸고 태자를 몽고에 보내어 화의를 청하는 한편 1270년 5월 서울을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옮기게 된다.
강화로 옮긴 지 38년 만의 일이다. 왕과 권신들이 강화에 숨어들어 지내는 동안 육지의 백성은 수없이 죽어 갔고 20여 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황룡사의 9층 목탑이 불타는 등 쑥대밭이 되었다. 당시 강화도 수비를 맡고 있던 삼별초군을 지도하던 임연이 죽고 그의 아들 유무마저 죽게 된다. 삼별초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지도자를 잃은 지 십 여일도 안됐는데 그들의 근거지를 떠나라는 왕명에 반발한다.
배중손, 노영희, 김통정, 유존섭 등 중심인물은 항몽 투쟁에 의한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를 주장한다. 그래서 1270년 그들은 몽고와 화친한 조정을 괴로 정부로 취급하여 왕족인 온을 정통 민족 정부의 왕으로 추대한 뒤 장기전을 예상하여 천여 척이 넘는 배를 이끌고 새로운 근거지인 진도로 향하여 떠났다고 한다.
삼별초는 벽파진 바로 인근인 용장산에 둘레 13Km, 높이 5척의 산성을 쌓고 왕궁을 지었으며 오랑이라는 연호까지 사용하였으나, 여몽연합군에 의하여 겨우 9개월 만에 이곳을 버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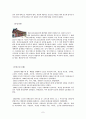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