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조의 개념과 정의
2. 시조의 명칭
3. 시조의 발생과 기원
4. 시조의 문체
5. 시조의 형식
6. 시조의 내용과 작가 및 시조집
7. 시조의 변화와 발전
8. 시조 결론
9. 연시조 서론
10. 연시조의 개념
11. 연시조의 시대적 구분
12. 연시조의 종류
13. 연시조의 결론
2. 시조의 명칭
3. 시조의 발생과 기원
4. 시조의 문체
5. 시조의 형식
6. 시조의 내용과 작가 및 시조집
7. 시조의 변화와 발전
8. 시조 결론
9. 연시조 서론
10. 연시조의 개념
11. 연시조의 시대적 구분
12. 연시조의 종류
13. 연시조의 결론
본문내용
1. 시조의 개념과 정의
어떤 사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처럼 시조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조에 대한 정의를 내린 몇몇 선학(先學)의 견해를 토대로 정리해 본다면, 시조(時調)란 고려 말엽에 그 형태가 완성된 3장(章) 6구(句) 45자(字) 내외로 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단형시(短形詩)로서 현재도 창작되고 있는 시가(詩歌)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태극이 내린 시조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통 시조라면 단시조(평시조)를 말하는데, 그 단시조라는 것은 신라의 향가나 고려의 별곡 등의 영향에 힘입어 고려 중ㆍ말엽경에 그 형태가 확립된 우리나라 고유시가의 하나다. 그 형식은 3장 6구요, 한 구의 구성 자수는 7자 내외가 되고, 4율박의 등시(等時)율을 갖춘 정형시요, 자수율 44자(보통 42자에서 46자로 된 것이 대부분임) 중심으로 된 조선조 시가의 대표가 되는 단형시로서 오늘에도 그 형식의 시조가 창작되고 있다. 이태극, 시조개설, 반도출판사, 1992
고 하여 ‘단시조형인 평시조가 향가나 속요의 영향을 받아 고려말경에 그 형식이 정립된 우리나라 고유시’임을 밝혔다. 시조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언술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특별하게 그 근원적인 차이는 없이 유사하게 내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고려 말엽부터 발달하여 온 한국 고유의 정형시로서 보통 초장 343(4)4, 중장 343(4)4, 종장 3543 등의 격조로 되었으나 자수론은 구구한 바가 있고, 그 형식에 따라 평시조ㆍ엇시조ㆍ사설시조ㆍ연시조로 나뉘며, 보통은 평시조를 이른다’고 되어 있어 이태극이 밝힌 것과 비슷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조는 한국시가문학사상에 나타난 양식 가운데 최단형의 정형시이다. 중국은 한시(漢詩), 일본은 화가(和歌)가 전통시로 존재하듯이 우리 민족은 시조를 전통시로 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또한 시조는 현존하는 한국 고시가의 어느 양식보다도 작품수가 가장 많다. 박을수가 시조를 체계적으로 정돈한 한국시조대사전(韓國時調大事典)(1991)에 의하면 5,492수에 달한다.
2. 시조의 명칭
어떤 문학의 형태도 그 형식의 발생과 동시에 그를 부르는 명칭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시조도 흔히 고려 중엽에 그 형태가 시작되어 말엽에 와서 형식이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명칭은 상당히 후대에 와서 붙여진 것이다.
시조의 명칭은 조성 영조때 시인 신광수가 지은 관서악부(關西樂府)에 의하여 알려진 것이며, 그렇게 불리어진 것이다. 곧 이에 따르면 ‘일반으로 시조의 장단을 배한 것은 장안에서 온 이세춘’ 일반적으로 시조는 장단을 베풀어 부르는 것인데 / 장안에 사는 이세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一般時調排長短 / 來自長安李世春
이라 한 것이 문헌상으로 나타난 최초의 기록이며 명칭이다. 그 후부터는 시조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정조 때의 시인 이학규가 쓴 시 감사(感事) 장에 의하면 ‘그 누가 꽃 피는 달밤을 애
어떤 사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처럼 시조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조에 대한 정의를 내린 몇몇 선학(先學)의 견해를 토대로 정리해 본다면, 시조(時調)란 고려 말엽에 그 형태가 완성된 3장(章) 6구(句) 45자(字) 내외로 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단형시(短形詩)로서 현재도 창작되고 있는 시가(詩歌)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태극이 내린 시조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통 시조라면 단시조(평시조)를 말하는데, 그 단시조라는 것은 신라의 향가나 고려의 별곡 등의 영향에 힘입어 고려 중ㆍ말엽경에 그 형태가 확립된 우리나라 고유시가의 하나다. 그 형식은 3장 6구요, 한 구의 구성 자수는 7자 내외가 되고, 4율박의 등시(等時)율을 갖춘 정형시요, 자수율 44자(보통 42자에서 46자로 된 것이 대부분임) 중심으로 된 조선조 시가의 대표가 되는 단형시로서 오늘에도 그 형식의 시조가 창작되고 있다. 이태극, 시조개설, 반도출판사, 1992
고 하여 ‘단시조형인 평시조가 향가나 속요의 영향을 받아 고려말경에 그 형식이 정립된 우리나라 고유시’임을 밝혔다. 시조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언술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특별하게 그 근원적인 차이는 없이 유사하게 내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고려 말엽부터 발달하여 온 한국 고유의 정형시로서 보통 초장 343(4)4, 중장 343(4)4, 종장 3543 등의 격조로 되었으나 자수론은 구구한 바가 있고, 그 형식에 따라 평시조ㆍ엇시조ㆍ사설시조ㆍ연시조로 나뉘며, 보통은 평시조를 이른다’고 되어 있어 이태극이 밝힌 것과 비슷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조는 한국시가문학사상에 나타난 양식 가운데 최단형의 정형시이다. 중국은 한시(漢詩), 일본은 화가(和歌)가 전통시로 존재하듯이 우리 민족은 시조를 전통시로 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또한 시조는 현존하는 한국 고시가의 어느 양식보다도 작품수가 가장 많다. 박을수가 시조를 체계적으로 정돈한 한국시조대사전(韓國時調大事典)(1991)에 의하면 5,492수에 달한다.
2. 시조의 명칭
어떤 문학의 형태도 그 형식의 발생과 동시에 그를 부르는 명칭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시조도 흔히 고려 중엽에 그 형태가 시작되어 말엽에 와서 형식이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명칭은 상당히 후대에 와서 붙여진 것이다.
시조의 명칭은 조성 영조때 시인 신광수가 지은 관서악부(關西樂府)에 의하여 알려진 것이며, 그렇게 불리어진 것이다. 곧 이에 따르면 ‘일반으로 시조의 장단을 배한 것은 장안에서 온 이세춘’ 일반적으로 시조는 장단을 베풀어 부르는 것인데 / 장안에 사는 이세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一般時調排長短 / 來自長安李世春
이라 한 것이 문헌상으로 나타난 최초의 기록이며 명칭이다. 그 후부터는 시조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정조 때의 시인 이학규가 쓴 시 감사(感事) 장에 의하면 ‘그 누가 꽃 피는 달밤을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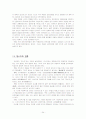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