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국가의례의 의의와 종류
종묘
종묘 방문기
종묘 제례
종묘제례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국가의례의 의의와 종류
종묘
종묘 방문기
종묘 제례
종묘제례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때 어목욕청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어목욕청은 정면 3칸, 측면2칸의 맞배지붕 형식이다. 정면 세 칸 모두가 청으로 되어있다. 기와로 지붕마루를 올렸으며, 용마루에는 취두 장식을 두었다.
5) 판위
- 어숙실의 서쪽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면 길은 다시 정전의 동문 앞의 판위로 이어진다. 판위는 제향시 종묘의 길 중간 중간에 임금과 세자가 잠시 머무르는 곳을 표시한 장소이다. 돌로 네모반듯하게 외벌대의 틀을 짜고 그 위에 검은색의 민무늬 방전을 깔았다.
사용자에 따라 구분하여 전하판위, 세자판위, 부알판위, 소차등을 각각 마련하였다.판위는 신주가 모셔지지 않은 빈 신위와 동일한 격을 지녔다. 제향준비가 끝나면 동문을 통해 정전의 행례공간으로 들어간다.
6) 전하판위
- 어재실 일곽에서 나와서 정전의 동문 앞에 다다르면 삼도형식의 길 한 가운데 판위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것을 전하판위라고 한다. 의례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임금이 머무르는 곳이다.
전하판의 우측에 삼도형식의 길에서 한 켠으로 물러나서 있는 판위는 세자판위로 세자가 의례의 시작전에 머무르도록 조성한 것이다.
7) 전사청
① 전사청
- 전사청은 종묘 대제에 사용하는 제물 ,제기 , 그 외의 기물과 진찬을 준비하던 곳이다. 가운데 마당을 두고 ㅁ자형태로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행랑이 있는 남쪽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면 전면에 보이는 건물이 부엌이다.
정면 7칸, 측면2칸의 납도리 맞배집 형식으로 안쪽에는 전돌을 깔았고, 앞뒤로 판문을 두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부엌의 좌우 측으로는 각각 창고와 제수간을 배치하였는데, 제수간에는 방과 대청을 두었다. ‘춘관통고’의 종묘그림에는 전사청의 북쪽에 살가와 북동쪽에 재살청이 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사청의 남쪽, 수복방의 동쪽에는 제물을 심사하던 찬막단이 있다. 이것은 정방형의 단으로서 장대석을 돌리고 위에 방전을 깐 형태이다. 이 찬막단 동편에는 희생대가 있다.
② 찬막단
- 찬막단은 전사청의 남쪽, 수복방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것은 정방형의 단으로 두벌의 장대석을 돌리고 위에 방전을 깐 형태를 하고 있다.
전사청에서 만든 제수를 진설해 놓고 잘못된 곳이 있는 지를 전사관이 살표보기 위한 시설이다.
③ 성생판
- 성생판은 전사청 앞, 찬막단 옆에 위치한다. 외벌의 장대석으로 경계석을 삼고 검은색 방전을 깔은 판위 형생을 하고 있다.
대제에 사용할 삼생( 소, 양,돼지)를 놓고 제수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살표보기 위한 곳이다.
④ 재생방
- 재생방은 제물로 쓰이는 소, 양, 돼지를 잡기 위한 용도의 건물이다. 1416년(태종 16년) 7월에 제기고와 함께 처음 종묘에 만들어졌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으며, 정조 때의 ‘춘관통고’를 보면 전사청의 북쪽과 북동쪽에 각각 살가, 재살청의 명칭이 나온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8) 수복방
- 수복방은 제사를 담당하는 노비와 관원들이 거처하는 방이다.
정전의 동북쪽 담장의 일부에 집이 연결된 형태로써 정전 묘정의 안과 밖 모두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다. 두 벌의 장대 기단 위에 높인 정면 4칸, 측면 1칸의 맞배집으로 , 남쪽 한칸은 흙바닥으로 되어있다.
9) 제정
- 전사청의 동쪽에는 제정이 있다. 향제때 사용하는 우물로 신정이라고도 한다. 깊이 4m정도의 우물인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나 지금은 물이 말라있다.
우물은 원형으로 돌을 다듬어 설치했고 , 제정주변의 마당은 전돌을 깔아 정리했다. 또한 제정 주위에는 정방형으로 담장을 둘렀으며, 서쪽 담장 밑으로는 배수구를 두어 넘친 물을 빠지게 했다.
8. 정전
1) 정전
- 정전은 조선왕조의 역대 임금 중 공덕이 높은 임금과 비의 신위만을 모신 건물로 현재 조선 왕조의 임금 중 19분의 신위와 비 30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국보 227호로 지정되어있으며 크게볼 때 월대를 앞에 둔 ‘ㄷ\'자 형태의 건물이다. 몸체에 직각방향으로 되어 있는 동서의 월랑을 제외하고도 정면이 25칸의 규모로서 100미터 가까이나 된다.
정전은 정중실,익실,월랑의 세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가운데 제일 큰 몸체를 가진 것이 정중실이고 그 좌우로 용마루를 높여서 하얗게 회를 바른 양성이 한 단 낮게 연접한 것이 익실이다. 그리고 양쪽 익실의 끝에 직각 방향으로 한 단 더 낮은 건물이 월랑이다. 특히 동쪽의 기둥만 있는 월랑을 배례청이라고 하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임금이 동쪽의 문과 하월대를 통하여 처음 정전에 올라서는 곳이다.
정전의 정중실은 종묘의 중심 건물이다. 역대로 중요한 공덕이 있는 임금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정전의 정면은 19칸이고 측면은 앞의 퇴칸을 합하여 총 4칸이다. 전퇴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삼면은 전벽돌로 되어있다. 이렇게 전벽돌을 쌓아 방화성능을 높인 형식의 벽을 화방벽이라고 한다. 정전의 화방벽은 중간에 끊임이 없는 형태로 삼면을 싸고 있다.
정전은 태조 4년(1395)에 7칸 규모로 창건하였으나 그 후로 11칸,15칸등으로 증축을 거듭하여 현재는 19칸에 이른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증축할 때는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두고 연접시키고, 부속시설은 옮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세 시기 건물이 공존하는 셈이다. 세월이 다르면 도구와 재료를 다루는 사람들의 기술이 바뀌는 법이다. 서쪽에서부터 11칸까지가 광해군 대에 복구된 부분이고, 12칸부터 15칸까지가 영조 대에 증축한 부분이며 나머지가 현종 대에 증축한 부분이다. 세 부분을 유심히 보면, 기둥의 배흘림이 없어지기도 하고 익공의 형상이 시기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등 세부적인 곳에서 증축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종묘의 지붕선은 보통의 건물들보다도 경사가 급하다. 정면에서 봤을 때 몸체부와 지붕을 거의 같은 비례를 가지도록 높였기 때문이다. 물매를 보통의 집처럼 했다면 수평선이 강조된 건물에서는 지붕이 납작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 높였다. 또한 전퇴칸을 두었기 때문에 전면에서 볼 때 내부의 음영이 깊어지고 열주들만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암수의 기와들과 양성 바름을 한 용마루 지붕에 의하여 강조된
어목욕청은 정면 3칸, 측면2칸의 맞배지붕 형식이다. 정면 세 칸 모두가 청으로 되어있다. 기와로 지붕마루를 올렸으며, 용마루에는 취두 장식을 두었다.
5) 판위
- 어숙실의 서쪽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면 길은 다시 정전의 동문 앞의 판위로 이어진다. 판위는 제향시 종묘의 길 중간 중간에 임금과 세자가 잠시 머무르는 곳을 표시한 장소이다. 돌로 네모반듯하게 외벌대의 틀을 짜고 그 위에 검은색의 민무늬 방전을 깔았다.
사용자에 따라 구분하여 전하판위, 세자판위, 부알판위, 소차등을 각각 마련하였다.판위는 신주가 모셔지지 않은 빈 신위와 동일한 격을 지녔다. 제향준비가 끝나면 동문을 통해 정전의 행례공간으로 들어간다.
6) 전하판위
- 어재실 일곽에서 나와서 정전의 동문 앞에 다다르면 삼도형식의 길 한 가운데 판위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것을 전하판위라고 한다. 의례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임금이 머무르는 곳이다.
전하판의 우측에 삼도형식의 길에서 한 켠으로 물러나서 있는 판위는 세자판위로 세자가 의례의 시작전에 머무르도록 조성한 것이다.
7) 전사청
① 전사청
- 전사청은 종묘 대제에 사용하는 제물 ,제기 , 그 외의 기물과 진찬을 준비하던 곳이다. 가운데 마당을 두고 ㅁ자형태로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행랑이 있는 남쪽의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면 전면에 보이는 건물이 부엌이다.
정면 7칸, 측면2칸의 납도리 맞배집 형식으로 안쪽에는 전돌을 깔았고, 앞뒤로 판문을 두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부엌의 좌우 측으로는 각각 창고와 제수간을 배치하였는데, 제수간에는 방과 대청을 두었다. ‘춘관통고’의 종묘그림에는 전사청의 북쪽에 살가와 북동쪽에 재살청이 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사청의 남쪽, 수복방의 동쪽에는 제물을 심사하던 찬막단이 있다. 이것은 정방형의 단으로서 장대석을 돌리고 위에 방전을 깐 형태이다. 이 찬막단 동편에는 희생대가 있다.
② 찬막단
- 찬막단은 전사청의 남쪽, 수복방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것은 정방형의 단으로 두벌의 장대석을 돌리고 위에 방전을 깐 형태를 하고 있다.
전사청에서 만든 제수를 진설해 놓고 잘못된 곳이 있는 지를 전사관이 살표보기 위한 시설이다.
③ 성생판
- 성생판은 전사청 앞, 찬막단 옆에 위치한다. 외벌의 장대석으로 경계석을 삼고 검은색 방전을 깔은 판위 형생을 하고 있다.
대제에 사용할 삼생( 소, 양,돼지)를 놓고 제수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살표보기 위한 곳이다.
④ 재생방
- 재생방은 제물로 쓰이는 소, 양, 돼지를 잡기 위한 용도의 건물이다. 1416년(태종 16년) 7월에 제기고와 함께 처음 종묘에 만들어졌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으며, 정조 때의 ‘춘관통고’를 보면 전사청의 북쪽과 북동쪽에 각각 살가, 재살청의 명칭이 나온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8) 수복방
- 수복방은 제사를 담당하는 노비와 관원들이 거처하는 방이다.
정전의 동북쪽 담장의 일부에 집이 연결된 형태로써 정전 묘정의 안과 밖 모두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다. 두 벌의 장대 기단 위에 높인 정면 4칸, 측면 1칸의 맞배집으로 , 남쪽 한칸은 흙바닥으로 되어있다.
9) 제정
- 전사청의 동쪽에는 제정이 있다. 향제때 사용하는 우물로 신정이라고도 한다. 깊이 4m정도의 우물인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나 지금은 물이 말라있다.
우물은 원형으로 돌을 다듬어 설치했고 , 제정주변의 마당은 전돌을 깔아 정리했다. 또한 제정 주위에는 정방형으로 담장을 둘렀으며, 서쪽 담장 밑으로는 배수구를 두어 넘친 물을 빠지게 했다.
8. 정전
1) 정전
- 정전은 조선왕조의 역대 임금 중 공덕이 높은 임금과 비의 신위만을 모신 건물로 현재 조선 왕조의 임금 중 19분의 신위와 비 30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국보 227호로 지정되어있으며 크게볼 때 월대를 앞에 둔 ‘ㄷ\'자 형태의 건물이다. 몸체에 직각방향으로 되어 있는 동서의 월랑을 제외하고도 정면이 25칸의 규모로서 100미터 가까이나 된다.
정전은 정중실,익실,월랑의 세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가운데 제일 큰 몸체를 가진 것이 정중실이고 그 좌우로 용마루를 높여서 하얗게 회를 바른 양성이 한 단 낮게 연접한 것이 익실이다. 그리고 양쪽 익실의 끝에 직각 방향으로 한 단 더 낮은 건물이 월랑이다. 특히 동쪽의 기둥만 있는 월랑을 배례청이라고 하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임금이 동쪽의 문과 하월대를 통하여 처음 정전에 올라서는 곳이다.
정전의 정중실은 종묘의 중심 건물이다. 역대로 중요한 공덕이 있는 임금의 신위를 모신 건물이다. 정전의 정면은 19칸이고 측면은 앞의 퇴칸을 합하여 총 4칸이다. 전퇴칸을 제외하고 나머지 삼면은 전벽돌로 되어있다. 이렇게 전벽돌을 쌓아 방화성능을 높인 형식의 벽을 화방벽이라고 한다. 정전의 화방벽은 중간에 끊임이 없는 형태로 삼면을 싸고 있다.
정전은 태조 4년(1395)에 7칸 규모로 창건하였으나 그 후로 11칸,15칸등으로 증축을 거듭하여 현재는 19칸에 이른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증축할 때는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두고 연접시키고, 부속시설은 옮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세 시기 건물이 공존하는 셈이다. 세월이 다르면 도구와 재료를 다루는 사람들의 기술이 바뀌는 법이다. 서쪽에서부터 11칸까지가 광해군 대에 복구된 부분이고, 12칸부터 15칸까지가 영조 대에 증축한 부분이며 나머지가 현종 대에 증축한 부분이다. 세 부분을 유심히 보면, 기둥의 배흘림이 없어지기도 하고 익공의 형상이 시기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등 세부적인 곳에서 증축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종묘의 지붕선은 보통의 건물들보다도 경사가 급하다. 정면에서 봤을 때 몸체부와 지붕을 거의 같은 비례를 가지도록 높였기 때문이다. 물매를 보통의 집처럼 했다면 수평선이 강조된 건물에서는 지붕이 납작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 높였다. 또한 전퇴칸을 두었기 때문에 전면에서 볼 때 내부의 음영이 깊어지고 열주들만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암수의 기와들과 양성 바름을 한 용마루 지붕에 의하여 강조된
추천자료
 조선시대 왕복 및 왕비복의 유래와 복식 구성
조선시대 왕복 및 왕비복의 유래와 복식 구성 경복궁(景福宮)에 대해
경복궁(景福宮)에 대해 한국의 민속종교. 종교민속에 관한 조사
한국의 민속종교. 종교민속에 관한 조사 한국 무교에 대한 이해
한국 무교에 대한 이해 한중일 차문화 비교 -tea
한중일 차문화 비교 -tea 시경이란 무엇인가?
시경이란 무엇인가? 중국문화의 이해(시경)
중국문화의 이해(시경) [궁궐][궁][궁궐의 개념][궁궐의 형성][궁궐의 기원][경복궁][창덕궁][덕수궁]궁궐의 개념과 ...
[궁궐][궁][궁궐의 개념][궁궐의 형성][궁궐의 기원][경복궁][창덕궁][덕수궁]궁궐의 개념과 ... [결혼관][혼인관][기독교]결혼관(혼인관)의 의미, 결혼관(혼인관)의 변화, 결혼관(혼인관)과 ...
[결혼관][혼인관][기독교]결혼관(혼인관)의 의미, 결혼관(혼인관)의 변화, 결혼관(혼인관)과 ... [제주대] <한자의 이해> 요약, 족보
[제주대] <한자의 이해> 요약, 족보 (제주대) <한자의 이해> 요약, 족보
(제주대) <한자의 이해> 요약, 족보 [한국문화사] <조선시대 의복> 조선시대 의복의 특징과 남자 의복 및 여자 의복, 조선시대 수...
[한국문화사] <조선시대 의복> 조선시대 의복의 특징과 남자 의복 및 여자 의복, 조선시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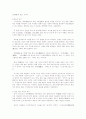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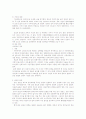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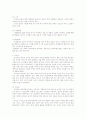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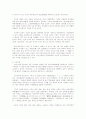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