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
 2
2
-
 3
3
-
 4
4
-
 5
5
-
 6
6
-
 7
7
-
 8
8
-
 9
9
-
 10
10
-
 11
11
-
 12
12
-
 13
13
-
 14
14
-
 15
15
-
 16
16
-
 17
17
-
 18
18
-
 19
19
-
 20
20
-
 21
21
-
 22
22
-
 23
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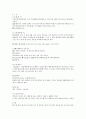 24
24
-
 25
25
-
 26
26
-
 27
27
-
 28
28
-
 29
29
-
 30
30
-
 31
31
-
 32
32
-
 33
33
-
 34
34
-
 35
35
-
 36
36
-
 37
37
-
 38
38
-
 39
39
-
 40
40
-
 41
41
-
 42
42
-
 43
43
-
 44
44
-
 45
45
-
 46
46
-
 47
47
-
 48
48
-
 49
49
-
 50
50
-
 51
51
-
 52
52
-
 53
53
-
 54
54
-
 55
55
-
 56
56
-
 57
57
-
 58
58
-
 59
59
-
 60
60
-
 61
61
-
 62
62
-
 63
63
-
 64
64
-
 65
65
-
 66
66
-
 67
67
-
 68
68
-
 69
69
-
 70
70
-
 71
71
-
 72
72
-
 73
73
-
 74
74
-
 75
75
-
 76
76
-
 77
77
-
 78
78
-
 79
79
-
 80
80
-
 81
81
-
 82
82
-
 83
83
-
 84
84
-
 85
85
-
 86
86
-
 87
87
-
 88
88
-
 89
89
-
 90
90
-
 91
91
-
 92
92
-
 93
93
-
 94
94
-
 95
95
-
 96
96
-
 97
97
-
 98
98
-
 99
99
-
 100
100
-
 101
101
-
 102
102
-
 103
103
-
 104
104
-
 105
105
-
 106
106
-
 107
107
-
 108
108
-
 109
109
-
 110
110
-
 111
111
-
 112
112
-
 113
113
-
 114
114
-
 115
115
-
 116
116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본문내용
巫(무당무)
소전은 여자가 두 개의 소매에 걸친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어 신을 내리게 하는 것을 그렸다고 한다. 즉 본의는 신을 섬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무장이라고 한다.
갑골문은 무자가 사용하는 법기라고 한다.
覡(박수격)
覡(박수격)에서 견을 따른 것은 능히 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칭할 때는 남자 무당도 巫(무)라고 부를 수 있으나 , 여자는 覡(박수격)이라고 부를 수 없다.
5-3강
150 甘(달 감)
一은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씹어 맛보는 형상을 본뜸으로써 음식물의 단맛을 상징한다고 한다.
일 도야 라고한 설문해자는 의심스럽다.
甛(달 첨), (물릴염) , 甚(심할 심)
厭()(물릴염)
厭은 원래 이라고 쓰는 것이 옳은데, 모르고 으로 썼다가, 厭이 쓰이게 되자 을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설문해자에서는 甘 甘 종감 종감 이라고 하였으니 개고기(개고기연)가 달콤하여(甘)배불리 먹는 것을 나타내므로, 본의는 ‘배부르게 먹다’라고 할 수 있고, 개고기가 달콤하여 배부르도록 먹는다는 것은, 곧 물리도록 먹는것과 관련되므로 ‘물리다’라는 뜻으로 인신되었다고 할 수 있다.
甚(심할 심)
설문해자 에서는 “甚은 아주 안락한 것이다. 甘과 匹(짝필)(나란히 갈 우)의 匹(짝필)을 따른다” 라고 하였다. 즉, 匹(짝필)(나란히 갈 우)는 처를 말하는 것이며, 부부가 화합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안락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금문(甚)은 윗부분은 감이고 아래 부분은 음식물이 담겨있는 큰 국자를 그린 것이며 의미가 확장되어‘심하다’,‘과분하다’가 되었다고 한다.
151.曰(가로왈)
사람의 입으로부터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렸으므로 본의는 ‘말하다’라고 한다.
혹자는 本(본)鐸(방울탁)이 뒤집어져 놓인 형태는 목탁의 몸체를. 一은 목탁의 혀를 그린 것으로, 목탁을 흔드는 사람이 곧 말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한다.
沓(유창할답)
말이 흐르는 물과 같이 매우 유창하다.
曹(짝, 우리, 관아, 마을 조)
설문해자에서는 “관에 소송을 하는 원고와 피고이다. 모두 법정의 동쪽에 있다. 조를 따르고, 〔조은 소송을 관리하는 사람이다.〕왈을 따른다”고 했다.
재판을 하는 두 당사자가 모두 동쪽에 있기 때문에 조이라고 했고, 아래의 왈은 변론한다는 뜻이다. 원래 호출된 원고와 피고를 말 하였으나 나중에 법정, 재판관의 뜻이 되었다. 즉, 문관의 전형을 맡아보던 사조와 무관을 맡아보던 형조의 부서명에 조가 쓰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152 乃(이에 내)
여인의 유방의 측면 형태를 그린 것으로 (젖 내)의 초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모태안에서 아직 손발은 불분명하지만 몸을 웅크리고 있는 태아의 모습을 그려 孕(아이밸잉)의 초문이라고도 한다.
또 한 가닥의 노끈 모양을 그린 것으로 (당길잉)의 초문이라고도 한다.
152 (공고할 교)
설문해자에서는 “숨이 위로 흩어져 나오려 함이며, 위는 一로 가로 막혀졌다”라고 하고 있으나, 자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혹자는 斤의 갑골문과 부분적으로 유사하여 柯(도끼자루 가)의 초문이라고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人을 따르고, 戈(창과)를 따르는 것으로 사람이 창을 메고 있는 모양을 그린 것이므로 何(하)(짐을 짊어지다는 荷(연하)의 본래글자이다)로 의심된다고 하였다.
寧(편안할 녕)
혹자는 원래 (녕)와 같은 글자로 먹을 것과 거주할 곳이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다라는 것이 그 본의라고 한다.
154 可(옳을가)
설문해자에서는 “사람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입에서 평평하고 평온한 기운이 방출되기 때문에” 可(가)는 승낙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혹자는 도끼의 모양과 비슷하여 柯(자루 가)의 초문이라고 한다.
奇(기이할 기)
설문해자에서는 “l야, 일왈불우. (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로 짝구를 이루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본의는. ‘무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선秦(진)화폐문편》의 글자체인에서 위의 글자는 ‘한발로 서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므로, (절뚝발이 기)의 초문이었으며, 나중에 奇偶(기우)의 뜻으로 인신되었다고 한다.
哥(노래 가)
설문해자에서는 “노래 소리이다. 두 개의 可(가)를 따른다. 고문에서는 노래라고 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 뜻으로 쓰이는 예를 찾을 수 없고, 오늘날에는 兄(형)을 이른다.
155 兮(어조사혜)
설문해자에서는 “말이 잠시 머무르는 것이다. 교를 따르고, 八은 가 〔막혀있던 곳에서〕나뉘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렸다”고 한다.
혹자는 갑골문에서 아랫부분의 (공교할 교)는 柯(자루가)의 초문으로 소리를 나타내고 윗부분의 두 세로선은 소리가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어 감탄을 나타내는 어기詞(사)로 쓰였다고 한다.
156 (부르짖을 호)
설문해자에서는 “아파하는 소리이다.” 口가 (공교할 교)의 위에 있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공교할 교)란 기운이 퍼져 오르려고 하지만 막히는 것이다. 비록 막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을 벌려 그 소리를 보내므로 입口(구)이 의 위에 있으며, 울부짖는 형상이다. 라고 하였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부르짖을 호)는 號(부르짖을 호)의 초문이라고 할 것이다. 號(부르짖을 호)는 사람이 애통한 일을 당하여 우는 소리이며, 범이 咆哮(포효)하는 소리가 사납기 때문에 두 글자를 합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57 (于)(어조사 우)
설문해자에서는 어야, 상기지舒(펼서)우, 종우, 종일, 일자 기기호지야, 금변(종례)작우
(어이다. 기가 위로 퍼져 올라가는 것을 본뜬 것이다. 우와 일을 따른다. 일은 기가 평평하게 된 것이다. 종서로는 우로 쓴다)고 하였다.
혹자는 설문해자의 설명과 같이, 기운이 흐르는 모양이 변한 것으로 (탄식할 우)의 초문이고 본의는 ‘기운이 흐른다’라고 하였다.
혹자는 본의는 마땅히 迂曲(멀우)곡 이지만 사람이 탄식할 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이 의성가차된 것이라고 하였다.
혹자는 우자 모양의 물길 옆으로 빙 둘러진 굽은 선이 하나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굽을 우) 또는 迂(멀 우)의 초문이라고도 한다.
平(
소전은 여자가 두 개의 소매에 걸친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어 신을 내리게 하는 것을 그렸다고 한다. 즉 본의는 신을 섬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무장이라고 한다.
갑골문은 무자가 사용하는 법기라고 한다.
覡(박수격)
覡(박수격)에서 견을 따른 것은 능히 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칭할 때는 남자 무당도 巫(무)라고 부를 수 있으나 , 여자는 覡(박수격)이라고 부를 수 없다.
5-3강
150 甘(달 감)
一은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씹어 맛보는 형상을 본뜸으로써 음식물의 단맛을 상징한다고 한다.
일 도야 라고한 설문해자는 의심스럽다.
甛(달 첨), (물릴염) , 甚(심할 심)
厭()(물릴염)
厭은 원래 이라고 쓰는 것이 옳은데, 모르고 으로 썼다가, 厭이 쓰이게 되자 을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설문해자에서는 甘 甘 종감 종감 이라고 하였으니 개고기(개고기연)가 달콤하여(甘)배불리 먹는 것을 나타내므로, 본의는 ‘배부르게 먹다’라고 할 수 있고, 개고기가 달콤하여 배부르도록 먹는다는 것은, 곧 물리도록 먹는것과 관련되므로 ‘물리다’라는 뜻으로 인신되었다고 할 수 있다.
甚(심할 심)
설문해자 에서는 “甚은 아주 안락한 것이다. 甘과 匹(짝필)(나란히 갈 우)의 匹(짝필)을 따른다” 라고 하였다. 즉, 匹(짝필)(나란히 갈 우)는 처를 말하는 것이며, 부부가 화합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안락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금문(甚)은 윗부분은 감이고 아래 부분은 음식물이 담겨있는 큰 국자를 그린 것이며 의미가 확장되어‘심하다’,‘과분하다’가 되었다고 한다.
151.曰(가로왈)
사람의 입으로부터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렸으므로 본의는 ‘말하다’라고 한다.
혹자는 本(본)鐸(방울탁)이 뒤집어져 놓인 형태는 목탁의 몸체를. 一은 목탁의 혀를 그린 것으로, 목탁을 흔드는 사람이 곧 말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한다.
沓(유창할답)
말이 흐르는 물과 같이 매우 유창하다.
曹(짝, 우리, 관아, 마을 조)
설문해자에서는 “관에 소송을 하는 원고와 피고이다. 모두 법정의 동쪽에 있다. 조를 따르고, 〔조은 소송을 관리하는 사람이다.〕왈을 따른다”고 했다.
재판을 하는 두 당사자가 모두 동쪽에 있기 때문에 조이라고 했고, 아래의 왈은 변론한다는 뜻이다. 원래 호출된 원고와 피고를 말 하였으나 나중에 법정, 재판관의 뜻이 되었다. 즉, 문관의 전형을 맡아보던 사조와 무관을 맡아보던 형조의 부서명에 조가 쓰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152 乃(이에 내)
여인의 유방의 측면 형태를 그린 것으로 (젖 내)의 초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모태안에서 아직 손발은 불분명하지만 몸을 웅크리고 있는 태아의 모습을 그려 孕(아이밸잉)의 초문이라고도 한다.
또 한 가닥의 노끈 모양을 그린 것으로 (당길잉)의 초문이라고도 한다.
152 (공고할 교)
설문해자에서는 “숨이 위로 흩어져 나오려 함이며, 위는 一로 가로 막혀졌다”라고 하고 있으나, 자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혹자는 斤의 갑골문과 부분적으로 유사하여 柯(도끼자루 가)의 초문이라고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人을 따르고, 戈(창과)를 따르는 것으로 사람이 창을 메고 있는 모양을 그린 것이므로 何(하)(짐을 짊어지다는 荷(연하)의 본래글자이다)로 의심된다고 하였다.
寧(편안할 녕)
혹자는 원래 (녕)와 같은 글자로 먹을 것과 거주할 곳이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다라는 것이 그 본의라고 한다.
154 可(옳을가)
설문해자에서는 “사람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입에서 평평하고 평온한 기운이 방출되기 때문에” 可(가)는 승낙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혹자는 도끼의 모양과 비슷하여 柯(자루 가)의 초문이라고 한다.
奇(기이할 기)
설문해자에서는 “l야, 일왈불우. (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로 짝구를 이루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본의는. ‘무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선秦(진)화폐문편》의 글자체인에서 위의 글자는 ‘한발로 서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므로, (절뚝발이 기)의 초문이었으며, 나중에 奇偶(기우)의 뜻으로 인신되었다고 한다.
哥(노래 가)
설문해자에서는 “노래 소리이다. 두 개의 可(가)를 따른다. 고문에서는 노래라고 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 뜻으로 쓰이는 예를 찾을 수 없고, 오늘날에는 兄(형)을 이른다.
155 兮(어조사혜)
설문해자에서는 “말이 잠시 머무르는 것이다. 교를 따르고, 八은 가 〔막혀있던 곳에서〕나뉘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렸다”고 한다.
혹자는 갑골문에서 아랫부분의 (공교할 교)는 柯(자루가)의 초문으로 소리를 나타내고 윗부분의 두 세로선은 소리가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어 감탄을 나타내는 어기詞(사)로 쓰였다고 한다.
156 (부르짖을 호)
설문해자에서는 “아파하는 소리이다.” 口가 (공교할 교)의 위에 있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공교할 교)란 기운이 퍼져 오르려고 하지만 막히는 것이다. 비록 막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을 벌려 그 소리를 보내므로 입口(구)이 의 위에 있으며, 울부짖는 형상이다. 라고 하였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부르짖을 호)는 號(부르짖을 호)의 초문이라고 할 것이다. 號(부르짖을 호)는 사람이 애통한 일을 당하여 우는 소리이며, 범이 咆哮(포효)하는 소리가 사납기 때문에 두 글자를 합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57 (于)(어조사 우)
설문해자에서는 어야, 상기지舒(펼서)우, 종우, 종일, 일자 기기호지야, 금변(종례)작우
(어이다. 기가 위로 퍼져 올라가는 것을 본뜬 것이다. 우와 일을 따른다. 일은 기가 평평하게 된 것이다. 종서로는 우로 쓴다)고 하였다.
혹자는 설문해자의 설명과 같이, 기운이 흐르는 모양이 변한 것으로 (탄식할 우)의 초문이고 본의는 ‘기운이 흐른다’라고 하였다.
혹자는 본의는 마땅히 迂曲(멀우)곡 이지만 사람이 탄식할 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이 의성가차된 것이라고 하였다.
혹자는 우자 모양의 물길 옆으로 빙 둘러진 굽은 선이 하나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굽을 우) 또는 迂(멀 우)의 초문이라고도 한다.
平(
추천자료
 어린이 학습지 분석을 통한 이해
어린이 학습지 분석을 통한 이해 제 1장 사회교육의 이해
제 1장 사회교육의 이해 숫자의 횡포 (철학의 이해)
숫자의 횡포 (철학의 이해) [성의 의미] 성의 어원과 특성 및 성욕의 이해와 원인
[성의 의미] 성의 어원과 특성 및 성욕의 이해와 원인 [A+보장]컴퓨터의이해 핵심요약정리(방송통신대)
[A+보장]컴퓨터의이해 핵심요약정리(방송통신대) 다이어트(Diet)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이어트(Diet)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2강 상담의 이해.ppt
제2강 상담의 이해.ppt 2013년 하계계절시험 언어의이해 시험범위 핵심체크
2013년 하계계절시험 언어의이해 시험범위 핵심체크 [남북한 언어 이해] 남북한언어의 의미, 특징 남북한언어의 이질화, 남북한언어의 차이 비교 ...
[남북한 언어 이해] 남북한언어의 의미, 특징 남북한언어의 이질화, 남북한언어의 차이 비교 ... [방송통신대] 언어의 이해(B형) 표의문자, 음절문자, 표음문자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
[방송통신대] 언어의 이해(B형) 표의문자, 음절문자, 표음문자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 [방송대] 방통대 언어의 이해 A형 한글의 창제 원리
[방송대] 방통대 언어의 이해 A형 한글의 창제 원리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한국한문학의이해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국어국문학과 한국한문학의이해 기말시험 핵심체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