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수의 발달 과정
2. 디오판투스(Diophantus)
3. 비에트(Viete)
4. 데카르트(Descartes)
4. 오일러의 기호법
★ 17세기 이후의 대수학 ★
1. 대수방정식의 해법의 발전
2. 라그랑지와 가우스
3. 대수적 구조의 발견
4. 새로운 대수적 구조의 출현
2. 디오판투스(Diophantus)
3. 비에트(Viete)
4. 데카르트(Descartes)
4. 오일러의 기호법
★ 17세기 이후의 대수학 ★
1. 대수방정식의 해법의 발전
2. 라그랑지와 가우스
3. 대수적 구조의 발견
4. 새로운 대수적 구조의 출현
본문내용
의 새로운 대수적 구조가 탄생하였다. 또한 데데킨트는 이데알 개념을 창안하였다.
(참고) “대수학자들은 산술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 곧, 연산의 대상과 연산 규칙 가운데
후자가 본질적인 것임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대수의 발달과정을 사례로 설명
듀돈네(Dieudonne)는 대수의 추상적인 본질을 대수적 구조의 역사발생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처음에 생활의 필요에 의해 나온 수 개념은, 산술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추상화 된 개념으로서 기호화하게 된다.
그 이후, 방정식의 풀이와 관련하여 간략한 형식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 문자의 사용을 생각해 낸다. 즉, 디오판투스(Diophantus)의 거듭제곱에 대한 기호나 방법, 비에트(Viete)가 상수뿐만 아니라 계수까지도 문자로 나타내게 된 것은 보다 추상적인 대수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풀 수 없는’ 일차 방정식에 당면하여 형식적인 수의 확장으로서 ‘음수’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호규칙도 생각해 내게 된다. 3차 방정식의 해법이 발견되면서 음수의 제곱근을 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기서 ‘수가 아닌 것(가상적인 량)’을 수처럼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허수의 발견’은 추상화를 위한 진보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새로운 대상의 발견으로 인해, 그에 대해 새로운 계산을 창안하는 힘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복소수 이론에서 비롯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변환의 산술에서 기본적인 연산규칙을 수정하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계산의 대상이 수가 아니고 산술규칙이 보통 규칙과 다른 ‘부분 산술’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보다 광대한 대수를 인식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대수의 발달과정은 계산의 대상은 거의 불확정적인 것이고 그러한 대상이 어떤 연산규칙을 만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수적 본질임을 깨닫는 역사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대수학의 역사발생과정과 심리발생과정의 비교(Piaget)
Piaget는 발생적 인식론에 따라 개념 구성의 역사적 순서와 심리 발생의 순서 사이의 대응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대수학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대신 역사상의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의 변환을 중재하는 메커니즘이 심리발생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변이를 중재하는 메커니즘의 특징을 내(intra)조작적 단계 - 간(inter)조작적 단계 - 초(trans)조작적 단계의 순서로 설명하였다.
내조작적 단계는 서로 별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내조작적 관계가 그 특징이며, 내적 요소들은 서로 결합될 수 없고, 변환도 불변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 대수학의 예 - 비에트, 데카르트
간조작적 단계는 이전 수준에서 별개로 나타나는 형태 중에서 대응과 변환 그리고 그러한 변환에 의해 요구되는 불변성이 특징이다.
→ 대수학의 예 - 라그랑지, 가우스
초조작적 단계는 그 내적 관계가 간조작적 변환에 대응하는 구조의 발견과 발전이 특징이다.
→ 대수학의 예 - 갈루아, 데데킨트
(참고) “대수학자들은 산술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 곧, 연산의 대상과 연산 규칙 가운데
후자가 본질적인 것임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대수의 발달과정을 사례로 설명
듀돈네(Dieudonne)는 대수의 추상적인 본질을 대수적 구조의 역사발생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처음에 생활의 필요에 의해 나온 수 개념은, 산술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추상화 된 개념으로서 기호화하게 된다.
그 이후, 방정식의 풀이와 관련하여 간략한 형식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 문자의 사용을 생각해 낸다. 즉, 디오판투스(Diophantus)의 거듭제곱에 대한 기호나 방법, 비에트(Viete)가 상수뿐만 아니라 계수까지도 문자로 나타내게 된 것은 보다 추상적인 대수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풀 수 없는’ 일차 방정식에 당면하여 형식적인 수의 확장으로서 ‘음수’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호규칙도 생각해 내게 된다. 3차 방정식의 해법이 발견되면서 음수의 제곱근을 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기서 ‘수가 아닌 것(가상적인 량)’을 수처럼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허수의 발견’은 추상화를 위한 진보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새로운 대상의 발견으로 인해, 그에 대해 새로운 계산을 창안하는 힘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복소수 이론에서 비롯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변환의 산술에서 기본적인 연산규칙을 수정하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계산의 대상이 수가 아니고 산술규칙이 보통 규칙과 다른 ‘부분 산술’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보다 광대한 대수를 인식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대수의 발달과정은 계산의 대상은 거의 불확정적인 것이고 그러한 대상이 어떤 연산규칙을 만족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수적 본질임을 깨닫는 역사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대수학의 역사발생과정과 심리발생과정의 비교(Piaget)
Piaget는 발생적 인식론에 따라 개념 구성의 역사적 순서와 심리 발생의 순서 사이의 대응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대수학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대신 역사상의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의 변환을 중재하는 메커니즘이 심리발생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변이를 중재하는 메커니즘의 특징을 내(intra)조작적 단계 - 간(inter)조작적 단계 - 초(trans)조작적 단계의 순서로 설명하였다.
내조작적 단계는 서로 별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내조작적 관계가 그 특징이며, 내적 요소들은 서로 결합될 수 없고, 변환도 불변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 대수학의 예 - 비에트, 데카르트
간조작적 단계는 이전 수준에서 별개로 나타나는 형태 중에서 대응과 변환 그리고 그러한 변환에 의해 요구되는 불변성이 특징이다.
→ 대수학의 예 - 라그랑지, 가우스
초조작적 단계는 그 내적 관계가 간조작적 변환에 대응하는 구조의 발견과 발전이 특징이다.
→ 대수학의 예 - 갈루아, 데데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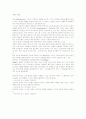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