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방론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대성 비판에서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문제 제기를 좀 더 정교화 할 실마리를 발견한다. 여성해방론은 이 근대성 패러다임이 곧 남성 중심적 패러다임이라는 것, 즉 ‘남근 이성 중심주의’라는 것을 부각시킨다. 주체 타자, 이성 감성, 문명 자연 등 일련의 이항 대립에서 여성은 늘 ‘타자, 감성적 존재, 자연’으로 주변화 대상화 되어왔다는 것이다.
3. 해결책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한다.
첫째, 타자로서의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이다. 여성성은 지배적 사회 질서에 의해 억압당해 왔으며, 따라서 이 질서에 침입하여 교란시킬 잠재력을 지닌 ‘타자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여성성을 긍정적 가치로 보는 후기 급진주의와 자연스럽게 만난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공통된 특징인 일체의 이항 대립과 근대적 주체에 대한 비판을 ‘여성’에게 적용하여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하는 경향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란 어디까지나 구성된 범주이지 어떤 특정한 본질이나 주어진 공통점을 지닌 실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여성범주를 구성해 내는 사회 문화적 언어적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이 범주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남녀 이항 대립은 물론이고, 주체를 내부균열이 없고 자율적인 것으로 보는 근대적 주체관을 그대로 재연하는 본질주의에 빠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논자들은 남성과 대립된 ‘여성’보다는 ‘여성들’ 내부의 차이, 그리고 여성의 삶이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들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3. 해결책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한다.
첫째, 타자로서의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이다. 여성성은 지배적 사회 질서에 의해 억압당해 왔으며, 따라서 이 질서에 침입하여 교란시킬 잠재력을 지닌 ‘타자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여성성을 긍정적 가치로 보는 후기 급진주의와 자연스럽게 만난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공통된 특징인 일체의 이항 대립과 근대적 주체에 대한 비판을 ‘여성’에게 적용하여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하는 경향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란 어디까지나 구성된 범주이지 어떤 특정한 본질이나 주어진 공통점을 지닌 실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여성범주를 구성해 내는 사회 문화적 언어적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이 범주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남녀 이항 대립은 물론이고, 주체를 내부균열이 없고 자율적인 것으로 보는 근대적 주체관을 그대로 재연하는 본질주의에 빠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논자들은 남성과 대립된 ‘여성’보다는 ‘여성들’ 내부의 차이, 그리고 여성의 삶이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들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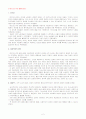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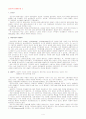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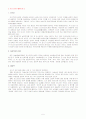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