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
-
 2
2
-
 3
3
-
 4
4
-
 5
5
-
 6
6
-
 7
7
-
 8
8
-
 9
9
-
 10
10
-
 11
11
-
 12
12
-
 13
13
-
 14
14
-
 15
15
-
 16
16
-
 17
17
-
 18
18
-
 19
19
-
 20
20
-
 21
21
-
 22
22
-
 23
23
-
 24
24
-
 25
25
-
 26
26
-
 27
27
-
 28
28
-
 29
29
-
 30
30
-
 31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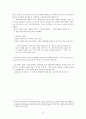 32
32
-
 33
33
-
 34
34
-
 35
35
-
 36
36
-
 37
37
-
 38
38
-
 39
39
-
 40
40
-
 41
41
-
 42
42
-
 43
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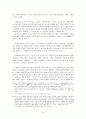 44
44
-
 45
45
-
 46
46
-
 47
47
-
 48
48
-
 49
49
-
 50
50
-
 51
51
-
 52
52
-
 53
53
-
 54
54
-
 55
55
-
 56
56
-
 57
57
-
 58
58
-
 59
59
-
 60
60
-
 61
61
-
 62
62
-
 63
63
-
 64
64
-
 65
65
-
 66
66
-
 67
67
-
 68
68
-
 69
69
-
 70
70
-
 71
71
-
 72
72
-
 73
73
-
 74
74
-
 75
75
-
 76
76
-
 77
77
-
 78
78
-
 79
79
-
 80
80
-
 81
81
-
 82
82
-
 83
83
-
 84
84
-
 85
85
-
 86
86
-
 87
87
-
 88
88
-
 89
89
-
 90
90
-
 91
91
-
 92
92
-
 93
93
-
 94
94
-
 95
95
-
 96
96
-
 97
97
-
 98
98
-
 99
99
-
 100
100
-
 101
101
-
 102
102
-
 103
103
-
 104
104
-
 105
105
-
 106
106
-
 107
107
-
 108
108
-
 109
109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본문내용
구절이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라고 되어 있는 약 30절에 달하는 경부철도창가를 지어 이것을 출판해 전국에 펼쳤다. - 작가 최남선의 말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82, p.45.
서양 악곡인 아일랜드 민요에 가사를 붙인 이 창가 박노춘, 철도를 제재로 한 개화기 문학, 한국철도 1968년 3월, pp. 11~12.
는 율격적 측면에서 가사의 44조 2음보격의 율격이 변형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전대의 정형률격의 구속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형태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신체시(행단위의 정형성에서 탈피)로 가기 이전의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육당이 스스로 털어놓았듯 이 창가는 전통적인 리듬을 버리고 일본식 리듬을 취했다. 시에 대한 개념적 이해나 시의 형태, 심지어 시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가 펼쳐 보여준 시적 실천들은 대부분 일본이라는 전범으로부터 별 고민 없이 옮겨온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함으로써 율을 만든다는 일본식 리듬의식의 도입이었다. 우리 전통시가의 경우, 가장 정형적이라 할 시조에서조차 동일 음절수를 반복함으로써 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이 지속되는 길이의 등량성에 의거해 리듬감을 얻는다. 그런데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75조 등의 음수율에 마치 우리 시의 율격적 기초가 있는 양 강조함으로써, 그는 심각한 문학사적 에너지 낭비를 초래했다. 김억, 김동환을 거쳐 김소월에 이르는 에피고넨(epigonen, 아류) 그룹의 형성이 바로 그러한 낭비의 좋은 보기일 것이다(이명찬, 근대 이행기 한국 시문학의 특성, 한국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사, 2005, p.32).
3. 신체시 ①권영민: 최남선은 신체시 명칭을 기존의 시가 형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가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씀.
②윤병로: 일본 동경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편찬한 『신체시초』에서 그대로 옮겨옴. 전통시가와 판이한 형식의 자율성. 단순한 몇 가지의 형태적 변형(연의 행 배열에 있어 정형을 지향). 개성적 차원에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노래한 근대적 서정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전달 위주의 目的성에 급급) → 근대적 서정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過渡期적 특징을 보인다고 봄 → 啓蒙的 서정시로 봄
③박철희, 한국 근대시의 전사: 근대적 감수성의 시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년대 이후의 일이다. 육당과 춘원의 1910년대 시가 1920년대(1919년 창조 발간)이후 자유시의 디딤돌로서 가치가 인정되지만 그것은 시사적 기여를 크게 인정할 만큼 個體성과 自意識이라는 自說적 구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년대 시인들의 자아의 발견 및 강조성은 타설(①外國논리, ②당대 사회적 理念)적 시가에서 볼 수 없었던 잠재적 감정의 회귀이다.
*관련 작품: 해에게서 소년에게(최남선)와 두고(이광수) 등
처……ㄹ썩,처……ㄹ썩,척,쏴……아.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태산(泰山) 같은 높은 뫼, 집채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콱.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내게는, 아무 것, 두려움 없어,
육상(陸上)에서, 아무런 힘과 권(權)을 부리던 자(者)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콱.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者)가
지금(只今)까지 있거든, 통기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秦始皇), 나팔륜, 너희들이냐.
누구 누구 누구냐. 너의 역시(亦是) 내게는 굽히도다.
나하구 겨룰 이 있건 오너라.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콱.
(중략)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저 세상(世上)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中)에서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담(膽) 크고 순정(純情)한 소년배(少年輩)들이,
재롱(才弄)처럼 귀(貴)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오너라, 소년배 입맞춰 주마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소년 창간호, 1908 부분
창가에서 일어난 율격적인 변형은 아예 행단위의 정형성에서 벗어나는 신체시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신체시는 언어의 지시적 기능을 이용하여 구시대의 억압적인 산물이 파괴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운율, 관습적 상징, 비유, 음절 분절과 말줄임표의 사용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시적 기능을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정서 전달이 아니라, 전달 위주의 목적성에 묶여 있으므로 타설적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단위의 정형성에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체시는 본격적인 근대시의 모습이 확립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로 보아야 한다.
4. 시조
1)구국시조
개화기에도 시조는 여전히 씌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대와는 다른 시형을 취하게 되었다. 개화기때의 시조는 주로 《대한매일신보》의 <사조>난에 실렸다.
三千里 돌아보니 天府金湯 이 아닌가
片片沃土 우리 江山 어이차고 남줄손가
차라리 二千萬衆 다죽어도 이 疆土를
- 自彊力(《대한매일신보》, 1908. 12. 29)
韓半島 錦繡江山 禮爲之邦 분명다
神聖새 檀君 한국민족은 단군이라는 공통조상의 후예로 표현한 것은 1908년경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단군의 자손으로 파악하여 혈연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 시기는 일제의 침략에 의해 대한 제국이 존망의 위기에 빠진 때이다.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민들의 힘을 모아야했다. 동원의 매카니즘에서는 단순하고 힘 있는 상징이 필요하다. 당시의 원초적 민족주의자들이 재발견한 것이 단군이다. 그들은 단군을 시조로 하여 혈연적으로 연결된 대가족인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다(한홍구,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서, 황해 문화, 2002 여름, 30쪽~31쪽).
서양 악곡인 아일랜드 민요
는 율격적 측면에서 가사의 44조 2음보격의 율격이 변형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전대의 정형률격의 구속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형태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신체시(행단위의 정형성에서 탈피)로 가기 이전의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육당이 스스로 털어놓았듯 이 창가는 전통적인 리듬을 버리고 일본식 리듬을 취했다. 시에 대한 개념적 이해나 시의 형태, 심지어 시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가 펼쳐 보여준 시적 실천들은 대부분 일본이라는 전범으로부터 별 고민 없이 옮겨온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함으로써 율을 만든다는 일본식 리듬의식의 도입이었다. 우리 전통시가의 경우, 가장 정형적이라 할 시조에서조차 동일 음절수를 반복함으로써 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이 지속되는 길이의 등량성에 의거해 리듬감을 얻는다. 그런데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75조 등의 음수율에 마치 우리 시의 율격적 기초가 있는 양 강조함으로써, 그는 심각한 문학사적 에너지 낭비를 초래했다. 김억, 김동환을 거쳐 김소월에 이르는 에피고넨(epigonen, 아류) 그룹의 형성이 바로 그러한 낭비의 좋은 보기일 것이다(이명찬, 근대 이행기 한국 시문학의 특성, 한국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사, 2005, p.32).
3. 신체시 ①권영민: 최남선은 신체시 명칭을 기존의 시가 형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가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씀.
②윤병로: 일본 동경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편찬한 『신체시초』에서 그대로 옮겨옴. 전통시가와 판이한 형식의 자율성. 단순한 몇 가지의 형태적 변형(연의 행 배열에 있어 정형을 지향). 개성적 차원에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노래한 근대적 서정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전달 위주의 目的성에 급급) → 근대적 서정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 過渡期적 특징을 보인다고 봄 → 啓蒙的 서정시로 봄
③박철희, 한국 근대시의 전사: 근대적 감수성의 시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년대 이후의 일이다. 육당과 춘원의 1910년대 시가 1920년대(1919년 창조 발간)이후 자유시의 디딤돌로서 가치가 인정되지만 그것은 시사적 기여를 크게 인정할 만큼 個體성과 自意識이라는 自說적 구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년대 시인들의 자아의 발견 및 강조성은 타설(①外國논리, ②당대 사회적 理念)적 시가에서 볼 수 없었던 잠재적 감정의 회귀이다.
*관련 작품: 해에게서 소년에게(최남선)와 두고(이광수) 등
처……ㄹ썩,처……ㄹ썩,척,쏴……아.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태산(泰山) 같은 높은 뫼, 집채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콱.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내게는, 아무 것, 두려움 없어,
육상(陸上)에서, 아무런 힘과 권(權)을 부리던 자(者)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콱.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者)가
지금(只今)까지 있거든, 통기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秦始皇), 나팔륜, 너희들이냐.
누구 누구 누구냐. 너의 역시(亦是) 내게는 굽히도다.
나하구 겨룰 이 있건 오너라.
처……ㄹ썩, 처……ㄹ썩, 척, 튜르릉,콱.
(중략)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저 세상(世上)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中)에서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담(膽) 크고 순정(純情)한 소년배(少年輩)들이,
재롱(才弄)처럼 귀(貴)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오너라, 소년배 입맞춰 주마
처……ㄹ썩, 처……ㄹ썩, 척, 쏴……아.
-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소년 창간호, 1908 부분
창가에서 일어난 율격적인 변형은 아예 행단위의 정형성에서 벗어나는 신체시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신체시는 언어의 지시적 기능을 이용하여 구시대의 억압적인 산물이 파괴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운율, 관습적 상징, 비유, 음절 분절과 말줄임표의 사용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시적 기능을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정서 전달이 아니라, 전달 위주의 목적성에 묶여 있으므로 타설적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단위의 정형성에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체시는 본격적인 근대시의 모습이 확립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로 보아야 한다.
4. 시조
1)구국시조
개화기에도 시조는 여전히 씌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대와는 다른 시형을 취하게 되었다. 개화기때의 시조는 주로 《대한매일신보》의 <사조>난에 실렸다.
三千里 돌아보니 天府金湯 이 아닌가
片片沃土 우리 江山 어이차고 남줄손가
차라리 二千萬衆 다죽어도 이 疆土를
- 自彊力(《대한매일신보》, 1908. 12. 29)
韓半島 錦繡江山 禮爲之邦 분명다
神聖새 檀君 한국민족은 단군이라는 공통조상의 후예로 표현한 것은 1908년경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단군의 자손으로 파악하여 혈연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 시기는 일제의 침략에 의해 대한 제국이 존망의 위기에 빠진 때이다.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민들의 힘을 모아야했다. 동원의 매카니즘에서는 단순하고 힘 있는 상징이 필요하다. 당시의 원초적 민족주의자들이 재발견한 것이 단군이다. 그들은 단군을 시조로 하여 혈연적으로 연결된 대가족인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다(한홍구,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서, 황해 문화, 2002 여름, 30쪽~31쪽).
추천자료
 한국문학사의 개념과 서술문제
한국문학사의 개념과 서술문제 한국 현대 문학사
한국 현대 문학사 한국 문학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소고
한국 문학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소고 1930년대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1930년대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작가 이상과 그의 작품「날개」의 문학사적 의의
작가 이상과 그의 작품「날개」의 문학사적 의의 1930년대 모더니즘 시와 문학사적 의의
1930년대 모더니즘 시와 문학사적 의의 현국현대시문학사 이승하편저
현국현대시문학사 이승하편저 (현대문학강독)이인직의 혈의루(혈의누) 작품의 줄거리와 문학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현대문학강독)이인직의 혈의루(혈의누) 작품의 줄거리와 문학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 [방통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 현대문학강독 공통] 이인직의 혈의 누를 읽고 작품의 줄거리와 ...
[방통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 현대문학강독 공통] 이인직의 혈의 누를 읽고 작품의 줄거리와 ... 이태준의 단편1편읽고 작품의줄거리와 문학사적의미를 적으시오oe.
이태준의 단편1편읽고 작품의줄거리와 문학사적의미를 적으시오oe. 한국문학(한국문학사) 1910년대와 1920년대 문학, 한국문학(한국문학사) 1930년대와 1940년대...
한국문학(한국문학사) 1910년대와 1920년대 문학, 한국문학(한국문학사) 1930년대와 1940년대... 한국문학사(한국문학역사) 분류, 한국문학사(한국문학역사) 구분, 한국문학사(한국문학역사) ...
한국문학사(한국문학역사) 분류, 한국문학사(한국문학역사) 구분, 한국문학사(한국문학역사) ... 김광균의 문학사적 의의
김광균의 문학사적 의의 1930년대 문학사
1930년대 문학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