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풍수지리설
Ⅱ.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Ⅲ. 풍수지리의 의미
Ⅰ. 풍수지리설
Ⅱ.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Ⅲ. 풍수지리의 의미
본문내용
인을 장사할 곳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세종의 묘를 이곳으로 옮긴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민간에선 풍수지리 때문이라 여기고 있다. 세종의 왕위를 이어받은 문종이 2년 만에 세상을 뜨고, 그 아들인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목숨을 잃는 등 변고가 잇따르자 조정의 일부 대신들은 헌인릉과 함께 있는 영릉의 부실한 터 탓이라 생각했다.
조선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낸 능의 하나인 영릉의 구조를 살펴보면 풍수지리설에 따라 주산인 칭성산을 뒤로 하고, 중허리에 봉분을 이룩하며, 그 좌우측에는 청룡, 백호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멀리 안산인 북성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세종대왕 영릉은 북성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능의 뒤쪽에서 머리를 180도로 틀어 다시 남쪽을 바라보는 산자락에 모셔졌는데, 이처럼 자기가 태어난 산을 다시 돌아보는 형국을 풍수에서는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이라 부른다. 이러한 지세는 ‘용이 회전하여 조상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혈과 명당을 이룬다.
영릉의 자리는 원래 광주이씨 3세조인 이인손의 묘소였다. 이인손은 태종 때 문과에 급제, 우의정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청백리로 유명한 이지직이요, 그의 조부 또한 고려 말에 절의와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이집이다. 이집의 묘소는 경북 영천 칡고개에 있었는데, 후손에 문장가가 나온다는 야자형국 \'也\'자는 본래 여자의 음부를 상징하는 상형자로서 본뜻은 음부에서 음수가 흘러나온다는 뜻이다. 야자 형국의 혈 앞은 \'天\'자가, 뒤에는 \'乎\'자가 있으면 길하다. \'也\'자는 천자문의 제일 끝 자일뿐 만 아니라 한문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위해 많이 쓰이고 있는 까닭으로 유종을 상징한다.
의 명당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정승(이인손)이 나왔다라고 전해지는데, 이인손 또한 이 여주의 명당에 묻혔다. 지금 영릉이 위치 한 곳은 오래전부터 “왕 터”라고 불리던 곳으로, 한자로는 왕대(王垈)라 해 왔다. 광주이씨 선산을 빼앗아 세종임금을 모셔 왕릉이장으로 조선왕조가 백년 더 지속됐다고 전한다.
Ⅲ. 풍수지리의 의미
이제 풍수지리설이 신봉되던 시대는 지나가고 점차 잊혀 가고 있다. 풍수지리설은 실제로 많은 경험과 수련이 필요하며 이론이 난삽하고 추상적이며, 다의적인 표현과 독특한 전문용어가 남발하여 비전문가로서는 그 정곡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민족의 토지사상으로 우리의 역사나 관습, 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나 풍수적 사고가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풍수지리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소의 감각을 지니게 하며, 합리적으로 자연의 질서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통계적인 환경선택의 방법론이다. 우리의 선인들이 풍수지리 이론을 따랐던 것은 바로 자연의 조건을 파악하여 이런 조건에 어울리는 생활을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공기와 수질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을 본 후에야 이의 중요성을 세삼 인식하게 된 것과 비교할 때, 풍수지리설은 이미 오늘날보다 수천 년을 앞서서 중요성을 논하였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신행정수도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만들 때 풍수지리 사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풍수지리설의 가치를 계속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부분적이나마 풍수의 합리성 속에서 조상의 슬기를 느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김광언, 『풍수지리』, 대원사, 1995
김호년, 『한국의 명당』, 동학사, 1990
박시익, 『풍수지리와 건축』, 경향신문사, 1997
이지호 『성균관과 문묘』, 두레, 2001
장영훈, 『서울 풍수』, 담디, 2004
세종의 묘를 이곳으로 옮긴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민간에선 풍수지리 때문이라 여기고 있다. 세종의 왕위를 이어받은 문종이 2년 만에 세상을 뜨고, 그 아들인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목숨을 잃는 등 변고가 잇따르자 조정의 일부 대신들은 헌인릉과 함께 있는 영릉의 부실한 터 탓이라 생각했다.
조선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낸 능의 하나인 영릉의 구조를 살펴보면 풍수지리설에 따라 주산인 칭성산을 뒤로 하고, 중허리에 봉분을 이룩하며, 그 좌우측에는 청룡, 백호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멀리 안산인 북성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세종대왕 영릉은 북성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능의 뒤쪽에서 머리를 180도로 틀어 다시 남쪽을 바라보는 산자락에 모셔졌는데, 이처럼 자기가 태어난 산을 다시 돌아보는 형국을 풍수에서는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이라 부른다. 이러한 지세는 ‘용이 회전하여 조상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혈과 명당을 이룬다.
영릉의 자리는 원래 광주이씨 3세조인 이인손의 묘소였다. 이인손은 태종 때 문과에 급제, 우의정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청백리로 유명한 이지직이요, 그의 조부 또한 고려 말에 절의와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이집이다. 이집의 묘소는 경북 영천 칡고개에 있었는데, 후손에 문장가가 나온다는 야자형국 \'也\'자는 본래 여자의 음부를 상징하는 상형자로서 본뜻은 음부에서 음수가 흘러나온다는 뜻이다. 야자 형국의 혈 앞은 \'天\'자가, 뒤에는 \'乎\'자가 있으면 길하다. \'也\'자는 천자문의 제일 끝 자일뿐 만 아니라 한문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위해 많이 쓰이고 있는 까닭으로 유종을 상징한다.
의 명당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정승(이인손)이 나왔다라고 전해지는데, 이인손 또한 이 여주의 명당에 묻혔다. 지금 영릉이 위치 한 곳은 오래전부터 “왕 터”라고 불리던 곳으로, 한자로는 왕대(王垈)라 해 왔다. 광주이씨 선산을 빼앗아 세종임금을 모셔 왕릉이장으로 조선왕조가 백년 더 지속됐다고 전한다.
Ⅲ. 풍수지리의 의미
이제 풍수지리설이 신봉되던 시대는 지나가고 점차 잊혀 가고 있다. 풍수지리설은 실제로 많은 경험과 수련이 필요하며 이론이 난삽하고 추상적이며, 다의적인 표현과 독특한 전문용어가 남발하여 비전문가로서는 그 정곡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민족의 토지사상으로 우리의 역사나 관습, 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나 풍수적 사고가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풍수지리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소의 감각을 지니게 하며, 합리적으로 자연의 질서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통계적인 환경선택의 방법론이다. 우리의 선인들이 풍수지리 이론을 따랐던 것은 바로 자연의 조건을 파악하여 이런 조건에 어울리는 생활을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공기와 수질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을 본 후에야 이의 중요성을 세삼 인식하게 된 것과 비교할 때, 풍수지리설은 이미 오늘날보다 수천 년을 앞서서 중요성을 논하였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신행정수도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만들 때 풍수지리 사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풍수지리설의 가치를 계속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부분적이나마 풍수의 합리성 속에서 조상의 슬기를 느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겠다.
< 참 고 문 헌 >
김광언, 『풍수지리』, 대원사, 1995
김호년, 『한국의 명당』, 동학사, 1990
박시익, 『풍수지리와 건축』, 경향신문사, 1997
이지호 『성균관과 문묘』, 두레, 2001
장영훈, 『서울 풍수』, 담디,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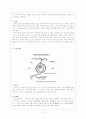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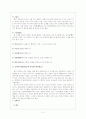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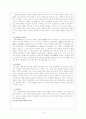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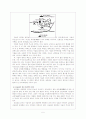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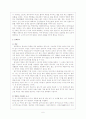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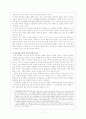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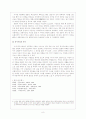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