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작가 양귀자
2. 소설『원미동 사람들』의 배경
3. 단편「원미동 시인」의 인물
4.「치숙」과의 인물 비교
5. 연작『원미동 사람들』의 이해와 한계
Ⅲ. 결론
Ⅱ. 본론
1. 작가 양귀자
2. 소설『원미동 사람들』의 배경
3. 단편「원미동 시인」의 인물
4.「치숙」과의 인물 비교
5. 연작『원미동 사람들』의 이해와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미숙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 다.
‘몽달씨’라는 호칭 역시 그러한데,‘퀭한 두 눈에 부스스한 머리칼, 사시사철 껴입고 다니 는 물들인 군용점퍼와 희끄무레하게 닳아빠진 낡은 청바지가 밤중에 보면 몽달귀신 같다 고’붙은 이 별명 역시‘형제슈퍼의 심부름꾼 꼬마처럼 다소곳이 잔심부름을 도맡는’약간 돈 사내를 조롱하기에 걸맞은 이름일 뿐이다.
그는 대학 다닐 때까진 멀쩡했지만 대학생들 다 하는 짓거릴 하다 잘린 후 곧바로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고부터 확 미쳐버리지도 못하고 언제나 중얼중얼 시만 왼다는 것이다. 그런 데 그가 주워섬기는 시 구절이란 제대로 들여다보면‘너는 나더러 개새끼, 개새끼라고만 그러는구나’하는 식으로 ‘내’가 보기엔 전혀 시적이지 않은 것이다. ‘나’는 마치 언젠가 내 가 그를 향해 ‘개새끼’라고 욕을 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그는 며칠간이나 그 시를 외우고 다녔다. 아마 그 말은 몽달씨의 지난 시절(대학 다닐 때와 군대 시절) 동 안 끊임없이 그를 향해 날아들었던 것으로, 종래에는 그를 무력화시킨 사회로부터의 ‘압제’ 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원주여자 전편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말은 몽달씨보다 무력 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던진 조소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는 김반장의 부당한 처우나 동네 건달패의 무조건적인 폭력 앞에서는‘밸도 없’ 는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면서 지나가는 수녀들을 보고서는‘열일곱 개의, 또는 스물 한 개의 단추들이 그녀를 가두었다’고 부르짖는 오지랖을 보여준다. 이것을 몽달씨의 삶 과 관련시켜 그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본다면, 그가 맞닥뜨린 세상이 그를 가두어 두려는 굴레를 의미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닌가 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부당한 폭력에 희생되어 열흘간이나 앓다 온 몽달씨는 ‘내’가 김반장 의 부당함을 고발하면서 동조를 구하자 순간 정색을 하며‘까맣고 반짝이는’눈으로 ‘나’ 를 바라보다‘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는 순 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따위의 슬픈 시를 왼다. 아마 그는 원미동 사람들의 생각처럼 살짝 돌았던 게 아니라 건달패와 김 반장이 대표하는 세계의 부당함을 인식하면서도 박해받은 후 무능력해진 지식인이기에 시 를 창작하는 것으로 세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적대화’를 통해 그 상황을 극복 또는 회피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3.3. 김 반장
우리의 대부분은 김반장의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에 비난을 하면서 이 소설을 읽었을 것이 다. 분명 그의 행동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를 이같이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이 기에는 우리들의 가슴에 뭔가가 사뭇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김반장의 처지와 동일한 상황에 있다면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게 한 근원적인 다른 원인은 없었을까.
『원미동 사람들』의 단편 중「일용할 양식」에 보면 그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 사람인지 나와 있다. 그는 ‘네 명의 어린 동생과 다리 골절로 직장을 잃은 아버지,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 또한 팔순의 할머니’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그의 형제슈퍼에 매달려 있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맥주병이 깨지는 것도, 낯선 폭력이(다행히도 자신을 비켜 간) 형제슈퍼 안에서 깽판 치는 것도 결코 원치 않았을 것이다.
김 반장으로 대표되는 원미동의 그저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폭력의 부당함이나 그에 대한 응징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그 폭력의 칼날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저쪽으로 돌아’가거나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거나’ 할 뿐이다. 따라서 경옥이를 제외한 그 누구도 김 반장을 비난하지 않는다. 물론, 사건의 전모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알았다 한들, 그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결코 그들에게는 김 반장을 비난 할 마음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공동체적 연대가 사라진 후,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된 도시의 모습을 닮아가는 도시 변두리의 꼴을 직시할 수 있다.
도시화 탓만은 아니다. 87년, 이미 형식적 민주화를 이룩했고 소시민들에게 ‘전두환의 시절’은 가장 살기 좋을 때였다. 이기주의, 비양심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에 앞서 삶에 급급한 그들은 상관없는 일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는 게, 오늘의 삶을 유지하는 왕도임을 이미 깨달은 것이다.
이처럼 원미동 시인의 인물들은 8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좌절한 지식인과 평범한 소시민의 전형을 각각 몽달씨와 김반장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그러한 형상화가 예전부터 있어왔음을, 우리는 다음 장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 찰하겠다.
4.「치숙」과의 인물 비교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상호 텍스트성 이론을 통해, 하나의 텍스트란 그 전에 나온 다른 텍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작품에서 영향을 받 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기존의 텍스트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다시 재결합한다 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방이나 표절과는 다른 것이다. 김욱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p.354
우리는 여기에 힌트를 얻어, 다른 기존의 작품 속에서 「원미동 시인」에서 보여 진 것과 같은 성격의 인물들이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은 작품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채만식의 「치숙」이다. ‘치숙’은 채만식 특유의 풍자와 비판이 들어가 있는 작품으로, 이 작품에는 ‘나’와 ‘아저씨’가 등장한다. 우리는 이 ‘나’와 ‘아저씨’의 관계 가「원미동 시인」의 ‘김 반장’과 ‘몽달씨’의 관계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몽달씨’와 ‘아저씨’는 작품 속에서 어리석은 자로 내지는 미친 자로 분류된다. 실제 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사상’이나 ‘시’에 빠져있는 그들을 ‘원미동 주민들’과 「치숙」에 등장하는 ‘나’는 어리석은 자, 미친 자라고 말하며 무시한다. 다들 제 앞가림하기도 힘든 세상에, 남을 위해 또는 자신이
‘몽달씨’라는 호칭 역시 그러한데,‘퀭한 두 눈에 부스스한 머리칼, 사시사철 껴입고 다니 는 물들인 군용점퍼와 희끄무레하게 닳아빠진 낡은 청바지가 밤중에 보면 몽달귀신 같다 고’붙은 이 별명 역시‘형제슈퍼의 심부름꾼 꼬마처럼 다소곳이 잔심부름을 도맡는’약간 돈 사내를 조롱하기에 걸맞은 이름일 뿐이다.
그는 대학 다닐 때까진 멀쩡했지만 대학생들 다 하는 짓거릴 하다 잘린 후 곧바로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고부터 확 미쳐버리지도 못하고 언제나 중얼중얼 시만 왼다는 것이다. 그런 데 그가 주워섬기는 시 구절이란 제대로 들여다보면‘너는 나더러 개새끼, 개새끼라고만 그러는구나’하는 식으로 ‘내’가 보기엔 전혀 시적이지 않은 것이다. ‘나’는 마치 언젠가 내 가 그를 향해 ‘개새끼’라고 욕을 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그는 며칠간이나 그 시를 외우고 다녔다. 아마 그 말은 몽달씨의 지난 시절(대학 다닐 때와 군대 시절) 동 안 끊임없이 그를 향해 날아들었던 것으로, 종래에는 그를 무력화시킨 사회로부터의 ‘압제’ 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원주여자 전편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말은 몽달씨보다 무력 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던진 조소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는 김반장의 부당한 처우나 동네 건달패의 무조건적인 폭력 앞에서는‘밸도 없’ 는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면서 지나가는 수녀들을 보고서는‘열일곱 개의, 또는 스물 한 개의 단추들이 그녀를 가두었다’고 부르짖는 오지랖을 보여준다. 이것을 몽달씨의 삶 과 관련시켜 그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본다면, 그가 맞닥뜨린 세상이 그를 가두어 두려는 굴레를 의미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닌가 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부당한 폭력에 희생되어 열흘간이나 앓다 온 몽달씨는 ‘내’가 김반장 의 부당함을 고발하면서 동조를 구하자 순간 정색을 하며‘까맣고 반짝이는’눈으로 ‘나’ 를 바라보다‘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는 순 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따위의 슬픈 시를 왼다. 아마 그는 원미동 사람들의 생각처럼 살짝 돌았던 게 아니라 건달패와 김 반장이 대표하는 세계의 부당함을 인식하면서도 박해받은 후 무능력해진 지식인이기에 시 를 창작하는 것으로 세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시적대화’를 통해 그 상황을 극복 또는 회피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3.3. 김 반장
우리의 대부분은 김반장의 비겁하고 치졸한 행동에 비난을 하면서 이 소설을 읽었을 것이 다. 분명 그의 행동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를 이같이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이 기에는 우리들의 가슴에 뭔가가 사뭇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김반장의 처지와 동일한 상황에 있다면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게 한 근원적인 다른 원인은 없었을까.
『원미동 사람들』의 단편 중「일용할 양식」에 보면 그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 사람인지 나와 있다. 그는 ‘네 명의 어린 동생과 다리 골절로 직장을 잃은 아버지,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 또한 팔순의 할머니’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그의 형제슈퍼에 매달려 있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맥주병이 깨지는 것도, 낯선 폭력이(다행히도 자신을 비켜 간) 형제슈퍼 안에서 깽판 치는 것도 결코 원치 않았을 것이다.
김 반장으로 대표되는 원미동의 그저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폭력의 부당함이나 그에 대한 응징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그 폭력의 칼날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저쪽으로 돌아’가거나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거나’ 할 뿐이다. 따라서 경옥이를 제외한 그 누구도 김 반장을 비난하지 않는다. 물론, 사건의 전모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알았다 한들, 그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결코 그들에게는 김 반장을 비난 할 마음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공동체적 연대가 사라진 후,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된 도시의 모습을 닮아가는 도시 변두리의 꼴을 직시할 수 있다.
도시화 탓만은 아니다. 87년, 이미 형식적 민주화를 이룩했고 소시민들에게 ‘전두환의 시절’은 가장 살기 좋을 때였다. 이기주의, 비양심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에 앞서 삶에 급급한 그들은 상관없는 일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는 게, 오늘의 삶을 유지하는 왕도임을 이미 깨달은 것이다.
이처럼 원미동 시인의 인물들은 8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좌절한 지식인과 평범한 소시민의 전형을 각각 몽달씨와 김반장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그러한 형상화가 예전부터 있어왔음을, 우리는 다음 장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 찰하겠다.
4.「치숙」과의 인물 비교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상호 텍스트성 이론을 통해, 하나의 텍스트란 그 전에 나온 다른 텍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작품에서 영향을 받 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기존의 텍스트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다시 재결합한다 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방이나 표절과는 다른 것이다. 김욱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p.354
우리는 여기에 힌트를 얻어, 다른 기존의 작품 속에서 「원미동 시인」에서 보여 진 것과 같은 성격의 인물들이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은 작품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채만식의 「치숙」이다. ‘치숙’은 채만식 특유의 풍자와 비판이 들어가 있는 작품으로, 이 작품에는 ‘나’와 ‘아저씨’가 등장한다. 우리는 이 ‘나’와 ‘아저씨’의 관계 가「원미동 시인」의 ‘김 반장’과 ‘몽달씨’의 관계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몽달씨’와 ‘아저씨’는 작품 속에서 어리석은 자로 내지는 미친 자로 분류된다. 실제 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사상’이나 ‘시’에 빠져있는 그들을 ‘원미동 주민들’과 「치숙」에 등장하는 ‘나’는 어리석은 자, 미친 자라고 말하며 무시한다. 다들 제 앞가림하기도 힘든 세상에, 남을 위해 또는 자신이
추천자료
 러시아 발레의 기원과 생성과정, 발전과정, 사회문화사적 배경, 현재 흐름, 대표적 발레인물 ...
러시아 발레의 기원과 생성과정, 발전과정, 사회문화사적 배경, 현재 흐름, 대표적 발레인물 ... 원미동 시인 독후감
원미동 시인 독후감 고2) 문학 <원미동 시인 과정안> - Ⅴ. 문학과 삶 : 1. 개인의 삶과 문학 (1) 삶의 노정
고2) 문학 <원미동 시인 과정안> - Ⅴ. 문학과 삶 : 1. 개인의 삶과 문학 (1) 삶의 노정 4)국어-6. 의견이 있어요 -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조리있게 말하기
4)국어-6. 의견이 있어요 -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조리있게 말하기 [영상미학] '피도 눈물도 없이(No Blood No Tears)'의 장소와 인물분석
[영상미학] '피도 눈물도 없이(No Blood No Tears)'의 장소와 인물분석 초등5) <(영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중안} 82 ~ 83p (2차시)> 7. How's your sister? - 안부...
초등5) <(영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중안} 82 ~ 83p (2차시)> 7. How's your sister? - 안부... 발레, 사조별로 본 발레의 역사, 발레 발전사, 발레사에 업적을 남긴 주요인물, 시대별 주요...
발레, 사조별로 본 발레의 역사, 발레 발전사, 발레사에 업적을 남긴 주요인물, 시대별 주요...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nes)의 희극 『류시스트라테 (리시스트라타, 여자의 평화 Lysistrata...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nes)의 희극 『류시스트라테 (리시스트라타, 여자의 평화 Lysistrata... 영화로 보는 역사,마이클 콜린스 Vs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두 영화의 공통질 차이점,아일랜드...
영화로 보는 역사,마이클 콜린스 Vs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두 영화의 공통질 차이점,아일랜드... 영화의상 분석 - 『스캔들 (Scandal)』, 『위험한 관계』 (원작 소설 소개, 내용 비교, 시대...
영화의상 분석 - 『스캔들 (Scandal)』, 『위험한 관계』 (원작 소설 소개, 내용 비교, 시대... 문학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한 그림책 1권을 선정하여 선정이유...
문학과 사회성발달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한 그림책 1권을 선정하여 선정이유... 인도계 미국인,인도 성공사례,인도분석,뉴파워 인도, 인도인 성공 인물 사례
인도계 미국인,인도 성공사례,인도분석,뉴파워 인도, 인도인 성공 인물 사례 충무공 이순신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모색 (문화관광정책) - 인물
충무공 이순신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모색 (문화관광정책) -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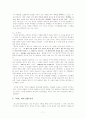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