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낮추어 군역(軍役)을 시킴
(降定)하여 병조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한 일에 대해 ‘알았다.’고 전교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대술한 죄인 정현상을 황해도 장연현(長淵縣)에 수군으로 충정(充定)하고 역자(驛子)를 정하여 압송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남의 글을 빌리는 차술이나 대신 글을 써 주는 대술(代述)은 엄히 금해서 이를 어기는 자는 장(杖) 100에 도(徒) 3년의 형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단속이 허술해지자 서울의 권세 있는 양반자제들이 글 잘하는 사람 4, 5인을 시험장에 데리고 들어가 각각 제술하게 하여 잘 된 것을 골라 제출하거나, 혹은 글 잘하는 사람이 시험장 밖에서 제술하여 시험장의 서리나 군졸의 손을 빌려 수험생에게 전하게 하였으며, 또 수험생이 시험장을 빠져 나가 집에서 제술하여 오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영조 때 면시법(面試法)을 실시하여 발표 다음날 대과와 소과의 합격자를 발표 다음날 전정에 모아 각기 지은 글귀를 암송시켜, 암송하지 못하면 차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취소를 시켰다. 그리고 차술·대술의 형벌을 강화하여 조정의 관료나 생원·진사이면 변방에 충군(充軍)하고, 유학이면 수군으로 삼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선 전기와 중기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위의 두 번째 사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는 조선 후기 까지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니, 오히려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져 위에서 열거한 부정행위들이 한꺼번에 시행되고는 했다. 사람을 사서 한 수험생이 6~7의 한 무리를 이끌고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고 앉아 책을 베끼고 대필을 하는 것이 예사로 행해졌다고 하니 실상 과거 시험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와 신분제의 붕괴 등이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과거의 부정행위는 더욱 심해져 처벌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⑧ 역서용간(易書用奸)
세도가의 자제들이 자기가 잘 아는 서리를 등록관(謄錄官)이나 봉미관의 서리로 보내어 역서 고려(高麗) 말엽(末葉)부터 과거(科擧)볼 때 응시자(應試者)의 글씨체를 고시관이 알면 사정(事情)을 둔다 하여, 이를 막고자 다른 사람을 시켜 응시자(應試者)의 답안지(答案紙)를 다른 종이에 다시 옮겨 쓰게 하던 법. 이것은 여러 가지 폐단(弊端)이 있어 없애자는 의논(議論)이 많이 있었으나 조선(朝鮮) 말엽(末葉)까지 계속(繼續)되었다가 고종(高宗) 때 없어졌음
할 때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시험지를 잘 고치게 하는 방법이다.
위에서 살펴본 과거의 폐단을 지적하여 1818년(순조18년) 성균관 사성 이영하가 올린 상소를 계기로 조정에서는 그 해 과거에 과장구폐절목(科場救弊節目)이라고 하여 과거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감독관들이 과거장을 돌아다니면서 시험지에 도장을 찍는 것 이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고반: 답안지를 훔쳐보려다가 들키면 눈동자를 굴린다는 뜻인 \'고반\'이란 도장을 찍는다.
② 음아: 옆 사람이 듣게끔 중얼거리면 \'음아\'란 도장을 찍는다.
③ 낙지: 과거장에는 문장의 초를 잡는 초지들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초지를 일부러 떨어트리는 등의 부정을 자행하면 이 도장이 찍힌다.
④ 이석: 우수한 수험생 곁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면 예비 컨닝 행위로 간주 도장이 찍혔다. 또 허락 받지 않고 물을 마신다거나 소변을 보러 간다거나하는 등의 이유로 자리를 떠도 이석 낙인을 피할 수 없었다.
⑤ 항거: 감독관 지시에 제대로 응하질 않거나 말대꾸를 할 경우 찍힌다. 물론 도장찍는 것을 변명하거나 항변하면 \'항거\'라는 도장이 가중되었다.
⑥ 불완: 시간이 다 됐는데도 미완성일 때 찍는다. 부정한 수법으로 덧붙여 써넣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 외 다른 방안으로는 과거 시험장을 1소(所) 2소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게 했다. 부자나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이 한 곳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다. 또 시관도 가까운 친척이 응시할 경우에는 이를 피하게 했다. 이를 상피제(相避制)라 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폐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조정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한 과거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폐단에 일조했기 때문이다. 임란이후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흔들리면서 양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응시자의 수 또한 크게 늘어나 시관들이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매우 시간에
(降定)하여 병조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한 일에 대해 ‘알았다.’고 전교하여 명을 내리셨습니다. 대술한 죄인 정현상을 황해도 장연현(長淵縣)에 수군으로 충정(充定)하고 역자(驛子)를 정하여 압송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남의 글을 빌리는 차술이나 대신 글을 써 주는 대술(代述)은 엄히 금해서 이를 어기는 자는 장(杖) 100에 도(徒) 3년의 형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단속이 허술해지자 서울의 권세 있는 양반자제들이 글 잘하는 사람 4, 5인을 시험장에 데리고 들어가 각각 제술하게 하여 잘 된 것을 골라 제출하거나, 혹은 글 잘하는 사람이 시험장 밖에서 제술하여 시험장의 서리나 군졸의 손을 빌려 수험생에게 전하게 하였으며, 또 수험생이 시험장을 빠져 나가 집에서 제술하여 오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영조 때 면시법(面試法)을 실시하여 발표 다음날 대과와 소과의 합격자를 발표 다음날 전정에 모아 각기 지은 글귀를 암송시켜, 암송하지 못하면 차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취소를 시켰다. 그리고 차술·대술의 형벌을 강화하여 조정의 관료나 생원·진사이면 변방에 충군(充軍)하고, 유학이면 수군으로 삼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선 전기와 중기의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위의 두 번째 사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는 조선 후기 까지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니, 오히려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져 위에서 열거한 부정행위들이 한꺼번에 시행되고는 했다. 사람을 사서 한 수험생이 6~7의 한 무리를 이끌고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고 앉아 책을 베끼고 대필을 하는 것이 예사로 행해졌다고 하니 실상 과거 시험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와 신분제의 붕괴 등이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과거의 부정행위는 더욱 심해져 처벌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⑧ 역서용간(易書用奸)
세도가의 자제들이 자기가 잘 아는 서리를 등록관(謄錄官)이나 봉미관의 서리로 보내어 역서 고려(高麗) 말엽(末葉)부터 과거(科擧)볼 때 응시자(應試者)의 글씨체를 고시관이 알면 사정(事情)을 둔다 하여, 이를 막고자 다른 사람을 시켜 응시자(應試者)의 답안지(答案紙)를 다른 종이에 다시 옮겨 쓰게 하던 법. 이것은 여러 가지 폐단(弊端)이 있어 없애자는 의논(議論)이 많이 있었으나 조선(朝鮮) 말엽(末葉)까지 계속(繼續)되었다가 고종(高宗) 때 없어졌음
할 때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시험지를 잘 고치게 하는 방법이다.
위에서 살펴본 과거의 폐단을 지적하여 1818년(순조18년) 성균관 사성 이영하가 올린 상소를 계기로 조정에서는 그 해 과거에 과장구폐절목(科場救弊節目)이라고 하여 과거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감독관들이 과거장을 돌아다니면서 시험지에 도장을 찍는 것 이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고반: 답안지를 훔쳐보려다가 들키면 눈동자를 굴린다는 뜻인 \'고반\'이란 도장을 찍는다.
② 음아: 옆 사람이 듣게끔 중얼거리면 \'음아\'란 도장을 찍는다.
③ 낙지: 과거장에는 문장의 초를 잡는 초지들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초지를 일부러 떨어트리는 등의 부정을 자행하면 이 도장이 찍힌다.
④ 이석: 우수한 수험생 곁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면 예비 컨닝 행위로 간주 도장이 찍혔다. 또 허락 받지 않고 물을 마신다거나 소변을 보러 간다거나하는 등의 이유로 자리를 떠도 이석 낙인을 피할 수 없었다.
⑤ 항거: 감독관 지시에 제대로 응하질 않거나 말대꾸를 할 경우 찍힌다. 물론 도장찍는 것을 변명하거나 항변하면 \'항거\'라는 도장이 가중되었다.
⑥ 불완: 시간이 다 됐는데도 미완성일 때 찍는다. 부정한 수법으로 덧붙여 써넣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 외 다른 방안으로는 과거 시험장을 1소(所) 2소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게 했다. 부자나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이 한 곳에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다. 또 시관도 가까운 친척이 응시할 경우에는 이를 피하게 했다. 이를 상피제(相避制)라 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폐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조정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한 과거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폐단에 일조했기 때문이다. 임란이후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흔들리면서 양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응시자의 수 또한 크게 늘어나 시관들이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매우 시간에
추천자료
 [부정부패 방지][반부패 정책][부정부패][반부패]부정부패 방지와 반부패 정책(부정부패의 개...
[부정부패 방지][반부패 정책][부정부패][반부패]부정부패 방지와 반부패 정책(부정부패의 개... [부정부패][감사원][감사체계][공직사회][청렴도][반부패정책]부정부패와 감사원의 감사체계 ...
[부정부패][감사원][감사체계][공직사회][청렴도][반부패정책]부정부패와 감사원의 감사체계 ... [공무원][공무원 부정부패][공무원부패][공무원 범죄][부정부패][범죄][반부패정책][교정행정...
[공무원][공무원 부정부패][공무원부패][공무원 범죄][부정부패][범죄][반부패정책][교정행정... [부정부패][부정부패 방지체계][반부패정책]부정부패의 실태와 부정부패 방지체계 및 정부의 ...
[부정부패][부정부패 방지체계][반부패정책]부정부패의 실태와 부정부패 방지체계 및 정부의 ... [부정부패][부정부패 개혁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 개혁정책과 반부패운동 심층 분석(부정...
[부정부패][부정부패 개혁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 개혁정책과 반부패운동 심층 분석(부정... [부정부패][부정부패개혁][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의 이론적 배경, 부정부패가 야기하는 ...
[부정부패][부정부패개혁][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의 이론적 배경, 부정부패가 야기하는 ... [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와 시민성,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일반의...
[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와 시민성,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일반의... [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방지전략][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억제]부정부패에 대...
[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방지전략][부정부패방지정책][부정부패억제]부정부패에 대... [부정부패개혁]부정부패의 개념 분석, 부정부패의 원인, 부패방지전략의 문제점, 감사원의 임...
[부정부패개혁]부정부패의 개념 분석, 부정부패의 원인, 부패방지전략의 문제점, 감사원의 임... [부정부패][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의 변화, 부정부패와 신뢰의 위기...
[부정부패][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의 변화, 부정부패와 신뢰의 위기... [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의 기능, 반부패 ...
[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의 기능, 반부패 ... [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반부패][반부패정책][부정부패방지정책][반부패정책]한국사회 부정...
[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반부패][반부패정책][부정부패방지정책][반부패정책]한국사회 부정... [거버넌스][부정부패방지]거버넌스의 대두배경, 거버넌스의 특징, 거버넌스의 분류, 거버넌스...
[거버넌스][부정부패방지]거버넌스의 대두배경, 거버넌스의 특징, 거버넌스의 분류, 거버넌스... [행정통제론] 부정부패의 요인과 방지방안 - 부정부패에 관한 기초적 논의와 부정부패의 요인...
[행정통제론] 부정부패의 요인과 방지방안 - 부정부패에 관한 기초적 논의와 부정부패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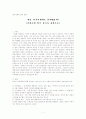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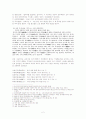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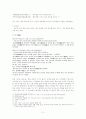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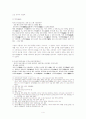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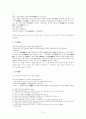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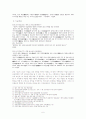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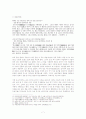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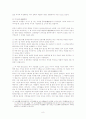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