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1. 고구려 멸망의 원인
1) 대내외의 정세변동
1-1) 국외 - 국제 정세의 변동
1-2) 국내 - 내부분열과 연개소문의 독재, 후계구도의 붕괴
2) 나 당 연합군의 공격
2. 고구려멸망 이후 유민들의 동향
1) 신라로의 이주와 유민들이 세운 나라
1-1) 신라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들
1-2) 고구려국(高句麗國)과 보덕국(報德國)
2) 당으로의 흡수
3) 그 밖에 지역으로의 이동
3.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1) 발해의 건국세력
2) 발해의 건국과정
3) 발해의 의의
맺음말
참고문헌
1. 고구려 멸망의 원인
1) 대내외의 정세변동
1-1) 국외 - 국제 정세의 변동
1-2) 국내 - 내부분열과 연개소문의 독재, 후계구도의 붕괴
2) 나 당 연합군의 공격
2. 고구려멸망 이후 유민들의 동향
1) 신라로의 이주와 유민들이 세운 나라
1-1) 신라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들
1-2) 고구려국(高句麗國)과 보덕국(報德國)
2) 당으로의 흡수
3) 그 밖에 지역으로의 이동
3.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1) 발해의 건국세력
2) 발해의 건국과정
3) 발해의 의의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of Koguryo』,코리아쇼케이스, 2004, p.328.
이후 돌궐은 수나라에 복속되었고 돌궐은 683년까지 독립하지 못하였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과 돌궐의 여러 부족들은 당에 대한 항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683년 독립에 성공한 돌궐은 동으로 남실위와 흑수말갈에까지 세력을 뻗쳤고, 이에 따라 당에 저항하던 요동지방의 고구려 유민들도 돌궐에 대량 이주했다. 이윤섭, 위의책, p.329.
690년 후반 돌궐이 영주까지 세력을 확장하자, 이 지역으로 강제 이주됐던 고구려 유민들이 돌궐로 이주했으며 만리장성 부근의 당제국 변경지대로 끌려왔던 유민도 일부 북쪽의 돌궐로 갔다. 이윤섭, 위의책, p.329.
돌궐의 고구려 유민의 이주는 인솔자가 있었다. 고문간(高文簡)과 고공의(高拱毅), 고정부(高定傅) 등이다. 성이 고(高)씨인 것으로 보아 왕족이나 귀족 출신으로 보인다.
돌궐의 묵철가한의 딸 아사나씨와 결혼한 고문간은 <책부원구>에서 ‘고려왕 막리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외에도 고정부와 고공의는 고려대수령이라 불렸다. 이들은 각기 자기 세력을 가지고서 일정하게 돌궐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으며 유민들을 이끌었다. 돌궐은 이들을 통합하지 않고 고구려인의 고유한 생활과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집단별로 간접적인 통치를 했다. 단지, 고구려 유민 집단에게 공납과 군사적 도움을 받는 정도였다. 고문간과 고정부 등이 막리지, 고려대수령과 같은 고구려 고유의 관직명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돌궐은 690년경 다시 강성해져 당나라와 잦은 전쟁을 했는데, 고구려 유민집단들도 당과의 전쟁에 참여한다. 이 때 고문간 집단이 당에게 굴복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당나라에 속한 이후에도 당으로부터 일정한 벼슬과 자치권을 부여받으며 존속하게 된다.
3-2) 일본으로 이주한 유민들
고구려 유민 중에는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로 안전한 거주지를 찾아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다. 《일본서기》에는 고구려가 망한 668년 이후 684년까지 고구려인이 왜와 교류한 사건을 15회나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712년, 지금의 동경지방에 고마군(고려군)을 설치하여 고구려인 1,799명을 집단 안치시켰다는 기록이《속일본기》에 전해지고 있다. 이들 고구려인들은 본래 중부 일본 동쪽의 쯔루가(시즈오까 현), 가히(야마나시 현), 가즈사(지바 현), 히따지 (이마나끼 현) 등에 흩어져 살았다. 동해에 건너와 동해 연안의 일본 열도에 거주하다가 이때에 동경지방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주한 것이다. 이 때 옮겨간 고마군은 1896년 사이다마현 이라마군에 병합되기 전까지 무려 1,180년이나 존재했다.
고마군을 다스린 사람은 고구려 왕족으로 알려진 약광(若光)이었다. 그는 고구려가 망하자 일본에 와서 벼슬을 받고 살면서 고구려 유민들을 잘 통솔하고 다스렸다. 지금도 고마신사에서는 약광에게 제사를 올리고 있다.
약광을 비롯한 고마군의 고구려 유민들 외에도 상당한 숫자의 고구려인이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로 건너갔다. 이들은 일본 곳곳에 고구려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8세기 초, 고구려 양식 고분 벽화로 잘 알려진 일본 나라현에 있는 다까마쯔쯔까는 고구려계 유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특이한 사례로는 혼슈섬 중부 내륙지방의 시나노지방에 살던 고구려인들이다. 『일본후기』에 의하면 799년에도 고구려 후손들이 하부, 전부, 후부, 상부 등의 고구려 5부 행정단위 이름을 성씨로 삼아 살고 있었다. 이들은 7세기초반에 일본열도로 이주해온 사람들인데 고구려가 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고구려 방식대로 살고 있었다.
3-3) 요동 방면에 거주했던 사람들
이들은 당나라의 지배하에 일단 들어갔으나, 뒤에 변동이 있었던 집단이다. 670년, 당은 요동지역을 당나라의 통치조직인 주현으로 구획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여 유민사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도모했다. 이러한 당의 정책은 고구려 유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왔고, 검모잠 일파의 부흥운동과 안시성 등지에서 반당 봉기가 일어났다. 또 신라와 고구려 고연무가 이끄는 연합군이 압록강을 건너 당나라를 공격했다. 그러나 당의 적극적인 공세로 부흥군은 진압되었고, 한반도 지역에서 쫓겨난 당의 안동도호부가 요동반도에 옮겨온 이후부터 이 지역은 당의 직접 지배를 받았다.
당시, 당은 신라의 진출을 저지하고, 말갈 등의 세력 확대를 방지하며 다시 한반도 지역으로 진출해야했다. 그래서, 요동지역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676년 보장왕을 내세워 고구려 유민들을 다스리도록 한다. 따라서 당의 요동 지배는 보장왕에 의한 고구려인의 자치와 당나라 관리에 의한 안동도호부의 지배로 나누어진 이원적인 지배 구조가 되었다.
이후에, 보장왕이 당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독립운동을 꾀했으나, 실패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당나라는 요동의 고구려 구지배층을 다시 당의 내지로 옮긴다. 이에 따라 가난한 백성들만이 요동에 남게 되어 유민사회가 크게 약화되었다.
8세기에 들어서 요동지역의 유민들은 소고구려국을 세워 실질적인 독립 소국을 형성했다.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이곳은 발해에게 병합되었고, 그들은 발해인이 되었다. 요동지역의 유민들은 끝까지 당에 동화되지 않고 자치와 독립을 실현했으며, 결국 발해에 귀속되어 고구려인의 계통을 올바로 이어갔다.
3.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1) 발해의 건국 참여 세력
발해의 건국은 계통적으로는 고구려계와 말갈계의 다양한 집단으로 말할 수 있다. 발해 건국과정에 참여한 집단은 영주로부터의 동주 집단, 천문령 전투 전후에 참여한 집단, 건국 직후에 참여한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동쪽으로 탈출할 때의 집단은 고려별종 집단과 말갈 걸사비우의 무리, 그리고 고려여종이라는 고구려 유민집단이다. 고려별종 집단은 669년에 당의 내륙 지역으로 끌려간 집단의 일부로서 영주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대조영 집단도 이런 부류에 속하였다. 걸사비우 집단은 최치원의 「사불허북국거상표 詞不許北國居上表」에 의하면
고구려 멸망 이전에 보잘 것 없는 부락이었던 말갈의 족속인 속말부의 작은 무리였는데
고구려를
이후 돌궐은 수나라에 복속되었고 돌궐은 683년까지 독립하지 못하였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과 돌궐의 여러 부족들은 당에 대한 항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683년 독립에 성공한 돌궐은 동으로 남실위와 흑수말갈에까지 세력을 뻗쳤고, 이에 따라 당에 저항하던 요동지방의 고구려 유민들도 돌궐에 대량 이주했다. 이윤섭, 위의책, p.329.
690년 후반 돌궐이 영주까지 세력을 확장하자, 이 지역으로 강제 이주됐던 고구려 유민들이 돌궐로 이주했으며 만리장성 부근의 당제국 변경지대로 끌려왔던 유민도 일부 북쪽의 돌궐로 갔다. 이윤섭, 위의책, p.329.
돌궐의 고구려 유민의 이주는 인솔자가 있었다. 고문간(高文簡)과 고공의(高拱毅), 고정부(高定傅) 등이다. 성이 고(高)씨인 것으로 보아 왕족이나 귀족 출신으로 보인다.
돌궐의 묵철가한의 딸 아사나씨와 결혼한 고문간은 <책부원구>에서 ‘고려왕 막리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외에도 고정부와 고공의는 고려대수령이라 불렸다. 이들은 각기 자기 세력을 가지고서 일정하게 돌궐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으며 유민들을 이끌었다. 돌궐은 이들을 통합하지 않고 고구려인의 고유한 생활과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집단별로 간접적인 통치를 했다. 단지, 고구려 유민 집단에게 공납과 군사적 도움을 받는 정도였다. 고문간과 고정부 등이 막리지, 고려대수령과 같은 고구려 고유의 관직명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돌궐은 690년경 다시 강성해져 당나라와 잦은 전쟁을 했는데, 고구려 유민집단들도 당과의 전쟁에 참여한다. 이 때 고문간 집단이 당에게 굴복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당나라에 속한 이후에도 당으로부터 일정한 벼슬과 자치권을 부여받으며 존속하게 된다.
3-2) 일본으로 이주한 유민들
고구려 유민 중에는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로 안전한 거주지를 찾아 건너간 사람들도 있었다. 《일본서기》에는 고구려가 망한 668년 이후 684년까지 고구려인이 왜와 교류한 사건을 15회나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712년, 지금의 동경지방에 고마군(고려군)을 설치하여 고구려인 1,799명을 집단 안치시켰다는 기록이《속일본기》에 전해지고 있다. 이들 고구려인들은 본래 중부 일본 동쪽의 쯔루가(시즈오까 현), 가히(야마나시 현), 가즈사(지바 현), 히따지 (이마나끼 현) 등에 흩어져 살았다. 동해에 건너와 동해 연안의 일본 열도에 거주하다가 이때에 동경지방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주한 것이다. 이 때 옮겨간 고마군은 1896년 사이다마현 이라마군에 병합되기 전까지 무려 1,180년이나 존재했다.
고마군을 다스린 사람은 고구려 왕족으로 알려진 약광(若光)이었다. 그는 고구려가 망하자 일본에 와서 벼슬을 받고 살면서 고구려 유민들을 잘 통솔하고 다스렸다. 지금도 고마신사에서는 약광에게 제사를 올리고 있다.
약광을 비롯한 고마군의 고구려 유민들 외에도 상당한 숫자의 고구려인이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로 건너갔다. 이들은 일본 곳곳에 고구려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8세기 초, 고구려 양식 고분 벽화로 잘 알려진 일본 나라현에 있는 다까마쯔쯔까는 고구려계 유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특이한 사례로는 혼슈섬 중부 내륙지방의 시나노지방에 살던 고구려인들이다. 『일본후기』에 의하면 799년에도 고구려 후손들이 하부, 전부, 후부, 상부 등의 고구려 5부 행정단위 이름을 성씨로 삼아 살고 있었다. 이들은 7세기초반에 일본열도로 이주해온 사람들인데 고구려가 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고구려 방식대로 살고 있었다.
3-3) 요동 방면에 거주했던 사람들
이들은 당나라의 지배하에 일단 들어갔으나, 뒤에 변동이 있었던 집단이다. 670년, 당은 요동지역을 당나라의 통치조직인 주현으로 구획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여 유민사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도모했다. 이러한 당의 정책은 고구려 유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왔고, 검모잠 일파의 부흥운동과 안시성 등지에서 반당 봉기가 일어났다. 또 신라와 고구려 고연무가 이끄는 연합군이 압록강을 건너 당나라를 공격했다. 그러나 당의 적극적인 공세로 부흥군은 진압되었고, 한반도 지역에서 쫓겨난 당의 안동도호부가 요동반도에 옮겨온 이후부터 이 지역은 당의 직접 지배를 받았다.
당시, 당은 신라의 진출을 저지하고, 말갈 등의 세력 확대를 방지하며 다시 한반도 지역으로 진출해야했다. 그래서, 요동지역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676년 보장왕을 내세워 고구려 유민들을 다스리도록 한다. 따라서 당의 요동 지배는 보장왕에 의한 고구려인의 자치와 당나라 관리에 의한 안동도호부의 지배로 나누어진 이원적인 지배 구조가 되었다.
이후에, 보장왕이 당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독립운동을 꾀했으나, 실패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당나라는 요동의 고구려 구지배층을 다시 당의 내지로 옮긴다. 이에 따라 가난한 백성들만이 요동에 남게 되어 유민사회가 크게 약화되었다.
8세기에 들어서 요동지역의 유민들은 소고구려국을 세워 실질적인 독립 소국을 형성했다.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이곳은 발해에게 병합되었고, 그들은 발해인이 되었다. 요동지역의 유민들은 끝까지 당에 동화되지 않고 자치와 독립을 실현했으며, 결국 발해에 귀속되어 고구려인의 계통을 올바로 이어갔다.
3.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1) 발해의 건국 참여 세력
발해의 건국은 계통적으로는 고구려계와 말갈계의 다양한 집단으로 말할 수 있다. 발해 건국과정에 참여한 집단은 영주로부터의 동주 집단, 천문령 전투 전후에 참여한 집단, 건국 직후에 참여한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동쪽으로 탈출할 때의 집단은 고려별종 집단과 말갈 걸사비우의 무리, 그리고 고려여종이라는 고구려 유민집단이다. 고려별종 집단은 669년에 당의 내륙 지역으로 끌려간 집단의 일부로서 영주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대조영 집단도 이런 부류에 속하였다. 걸사비우 집단은 최치원의 「사불허북국거상표 詞不許北國居上表」에 의하면
고구려 멸망 이전에 보잘 것 없는 부락이었던 말갈의 족속인 속말부의 작은 무리였는데
고구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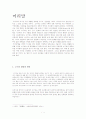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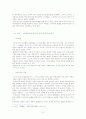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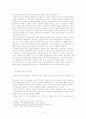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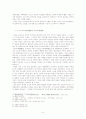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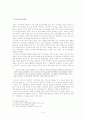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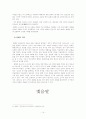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