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보성의 한 중요한 분야는 조직신학과 이야기 신학이다. 식민주의 시대는 조직 신학을 강조했다. 반식민주의 시대에는 특수한 이야기 신학을 선호하면서 조직 신학에 대항하여 반동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 신학들을 읽음에 있어서 보편적이며 체계적인 실재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깨닫는다. 한편 조직신학이 이야기의 실재로부터 분리된다면 무미건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개개의 특정 이야기가 그 자체로는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32. 히버트는 \"하나님이 사물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다는\" 의미로 대문자로 시작하는 Theology, \"성경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실재(reality)를 인간이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지칭할 때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theology를 썼다. 폴 히버트,「선교와 문화인류학」 죠이선교회출판부 1996, 282를 참고하라. -역자 주
이야기 신학은 창조와 함께 시작하고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포함하여 영원 안에서 끝나는 하나의 신성한 역사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어떻게 신학적인 절대성과 신학적인 다원주의 사이의 긴장, 즉 “신학” 과 \"신학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풀 수 있는 그 대답은 부분적으로 신학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에 놓여 있다. 이 신학은 성서를 다르게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과 문화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신학은 그들에게 성서의 진리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학연구란 성경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신학연구란 하나님의 계시이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성찰이 아니다.(비록 신학연구가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신학연구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인간의 곤경 외부로부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다. 신학 연구란 진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성령이 다른 상황에서 믿는 신자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성서를 해석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문화적 편협주의와 인간의 이성 위에만 기초를 두는 신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신학이란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만 한다.33 신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기 때문이다. 성서 해석학의 이러한 협력적인 본질은 신앙을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것과 성경을 자기기호대로 잘못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마치 우리가 우리자신의 죄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보듯이, 마찬가지로 타문화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문화적 편견과 이편견이 우리 신학에 미친 영향을 잘 보게 된다.
인식론
쿤(Kuhn)의 주관주의에 대응하여 래리 로우던(Larry Laudan)34과 다른 이들은 인간지식의 객관성과 주관성 모두를 고려하는 비판적 실재론을 대변했다. 그들은 인간 인식이 외부의 실재와 연관되어 있지만 사진 찍듯이 상호 일대 일로 상응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차라리 그 관계성은마치 지도와 청사진처럼 제한된 상응과 유비이다. 게다가 여러 가지 지도들이 실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필요한 것과 같이 서로 상보적인이론은 실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판적 실재론은 실재와 관련하여 유일한 진리(the Truth)를 말한다. 또한 어떤 진리(a truth), 즉 더 큰 진리에 대한 우리의 부분적인 이해를 말한다. 우리의 이해
는 객관적이며(그것이 실재에 의하여 검증되는 범위에서)주관적(그 이해는 특수한
33. C. Norman Kraus, Ther Authentic Witness: Credibility and Authority (Grand Rapids: Eerdmans, 1979)
문화적,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의 우리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이다.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대립하지는 않는다. 한편 우리는 대립에 흥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들 사이의 대화는 주관적인 헤겔의 종합(synthesis)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와 진리에 더 가까운 지도 혹은 모델을 결정하는 연구로 인도한다. 만약 우리의 지도가 여러 가지로 서로다르다면 어느 것이 옳은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운전을 해보아야 한다.
결론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독교에 도전하는 근대성(Modernity)에 대하여 많은 것이 쓰여 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 그리스도의 신성,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부인하는 세속주의로 이끌었다. 세속주의는 종교적 확신을 계속해서 고수하려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격하시켰다. 왜냐하면 세속주의는 종교를 개인적인 의견과 감정이란 사적인 영역으로 격하시켰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ty)이다. 여기에 영적인 체험은 더 이상 부인되지 않는다. 영적인 체험은 모두 인정받는다. 이제 문제는 세속주의가아니라 상대주의와 실용주의이다. 그 논쟁은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유일한구원의 길이라는 그리스도의 선포(요14:6)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독특성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와 주로서 선포할 때 종교적 교만이라고 우리를 고소한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역의 독특성을 단언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표준이 되려는 모든 문화의 교만에 대항하는 굳건한 성채다\"31 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 문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엡 4:15). 성서적인 사랑은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깊은 헌신이다. 우리는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충분히 존경하지만, 그가 틀렸다고 확신될 때는 맞서서 싸우는 것이 그를 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계속 제시해야 한다.
32. 히버트는 \"하나님이 사물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다는\" 의미로 대문자로 시작하는 Theology, \"성경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실재(reality)를 인간이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지칭할 때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theology를 썼다. 폴 히버트,「선교와 문화인류학」 죠이선교회출판부 1996, 282를 참고하라. -역자 주
이야기 신학은 창조와 함께 시작하고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포함하여 영원 안에서 끝나는 하나의 신성한 역사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어떻게 신학적인 절대성과 신학적인 다원주의 사이의 긴장, 즉 “신학” 과 \"신학들\" 사이의 긴장관계를 풀 수 있는 그 대답은 부분적으로 신학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에 놓여 있다. 이 신학은 성서를 다르게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과 문화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신학은 그들에게 성서의 진리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학연구란 성경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신학연구란 하나님의 계시이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성찰이 아니다.(비록 신학연구가 이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신학연구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인간의 곤경 외부로부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다. 신학 연구란 진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성령이 다른 상황에서 믿는 신자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성서를 해석할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문화적 편협주의와 인간의 이성 위에만 기초를 두는 신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신학이란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만 한다.33 신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기 때문이다. 성서 해석학의 이러한 협력적인 본질은 신앙을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것과 성경을 자기기호대로 잘못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마치 우리가 우리자신의 죄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보듯이, 마찬가지로 타문화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문화적 편견과 이편견이 우리 신학에 미친 영향을 잘 보게 된다.
인식론
쿤(Kuhn)의 주관주의에 대응하여 래리 로우던(Larry Laudan)34과 다른 이들은 인간지식의 객관성과 주관성 모두를 고려하는 비판적 실재론을 대변했다. 그들은 인간 인식이 외부의 실재와 연관되어 있지만 사진 찍듯이 상호 일대 일로 상응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차라리 그 관계성은마치 지도와 청사진처럼 제한된 상응과 유비이다. 게다가 여러 가지 지도들이 실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에 필요한 것과 같이 서로 상보적인이론은 실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판적 실재론은 실재와 관련하여 유일한 진리(the Truth)를 말한다. 또한 어떤 진리(a truth), 즉 더 큰 진리에 대한 우리의 부분적인 이해를 말한다. 우리의 이해
는 객관적이며(그것이 실재에 의하여 검증되는 범위에서)주관적(그 이해는 특수한
33. C. Norman Kraus, Ther Authentic Witness: Credibility and Authority (Grand Rapids: Eerdmans, 1979)
문화적,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의 우리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이다.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대립하지는 않는다. 한편 우리는 대립에 흥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들 사이의 대화는 주관적인 헤겔의 종합(synthesis)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와 진리에 더 가까운 지도 혹은 모델을 결정하는 연구로 인도한다. 만약 우리의 지도가 여러 가지로 서로다르다면 어느 것이 옳은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운전을 해보아야 한다.
결론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독교에 도전하는 근대성(Modernity)에 대하여 많은 것이 쓰여 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 그리스도의 신성,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부인하는 세속주의로 이끌었다. 세속주의는 종교적 확신을 계속해서 고수하려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격하시켰다. 왜냐하면 세속주의는 종교를 개인적인 의견과 감정이란 사적인 영역으로 격하시켰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ty)이다. 여기에 영적인 체험은 더 이상 부인되지 않는다. 영적인 체험은 모두 인정받는다. 이제 문제는 세속주의가아니라 상대주의와 실용주의이다. 그 논쟁은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유일한구원의 길이라는 그리스도의 선포(요14:6)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독특성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와 주로서 선포할 때 종교적 교만이라고 우리를 고소한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역의 독특성을 단언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표준이 되려는 모든 문화의 교만에 대항하는 굳건한 성채다\"31 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 문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엡 4:15). 성서적인 사랑은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깊은 헌신이다. 우리는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충분히 존경하지만, 그가 틀렸다고 확신될 때는 맞서서 싸우는 것이 그를 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계속 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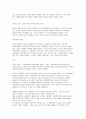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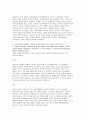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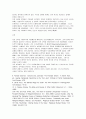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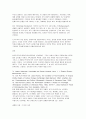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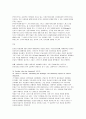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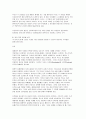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