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오장환의 생애)
2.본론
1)오장환과 고향
2)시를 통해 본 오장환과 고향
3.결론
<참고문헌>
2.본론
1)오장환과 고향
2)시를 통해 본 오장환과 고향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또한 그의 관심은 시적 사실주의를 탐구하는 데에도 미쳐 독특한 성취를 남겼다. 그의 시는 전통의 거부, 나그네 의식, 허무주의 등으로 나타났으나 광복 직후에는 현실문제에 관한 시를 썼다.
2.본론
1) 오장환과 고향.
오장환의 시에는 고향에 대한 시적인식이 매우 많다. 고향에 대한 시적 인식은 초기시부터 드러난다.
초기시에 드러나는 고향은 「종가」,「성씨보」,「정문」에서 나타나듯 봉건적 유습에 의한 소수 권력층의 허욕과 이기, 거짓이 팽배한 곳이다. 그리하여 오장환은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인해주는 가계보까지 부정하면서 전통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한다.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실(개인적 현실에서 확대된 세계) 역시 절망 투성이였다. 일제 식민지배 속의 현실은 굴욕과 가난 투성이였다. 「우기」나「모촌」,「북방의 길」에 나타나는 빈민, 유랑민의 처지는 당시 우리 민족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원규, 「오장환 시 연구 :비판적 인식과 잠재적 인식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p.123
고향을 떠나 그가 찾은 곳은 도시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지향할 만한 새로운 어떤 것보다는 물질문명에 휘둘려 타락한 모습들을 발견한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곳, 향락과 퇴폐의 불빛이 넘실대는 곳이 도시였으며 오장환은 그 속에서 함께 동화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산책자가 된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그를 여수에 잠기게 한다. [앞의 논문], p.127
도시와 항구 등에서 자신의 지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폐적 생활에 빠지면서 극도의 좌절과 비애에 싸이게 된 오장환은 급기야 자신을 자학하는 시를 쓰면서 죽음을 탐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 그의 고향은 죽음의 의미를 지니고서 관념적 회귀 공간으로 등장한다. [앞의 논문], p.132
자신이 고향의 한 부분임을 확인하기 위해 오장환은 고향의 모습을 유토피아적 공간에서 현실적 공간으로 전환한다. [앞의 논문], p.139
2) 시를 통해 본 오장환과 고향
눈 덮인 철로는 더욱이 싸늘하였다
소반 귀퉁이 옆에 앉은 농군에게서는 송아지의 냄새가 난다
힘없이 웃으면서 차만 타면 북으로 간다고
어린애는 운다 철마구리 울 듯
차창이 고향을 지워버린다
어린애가 유리창을 쥐어뜯으며 몸부림친다
-「北方의 길」전문-
「우기」의 “막벌이꾼”이 극빈의 상태를 나타내고, 「모촌」의 “양주”가 그 가난 때문에 싸워 “썩어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 작별하였다”면, 인용시는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농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소반 귀퉁이”에 앉은 농군의 초라한 모습과 그의 심경을 대변해주듯 우는 “어린애”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알 수는 없지면,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그 여행이 결코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눈 덮인 철로”의 풍경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농민 들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글이 쓰여졌던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의 시기는 식민지 조선경제가 일본제국주의의 병참기지
2.본론
1) 오장환과 고향.
오장환의 시에는 고향에 대한 시적인식이 매우 많다. 고향에 대한 시적 인식은 초기시부터 드러난다.
초기시에 드러나는 고향은 「종가」,「성씨보」,「정문」에서 나타나듯 봉건적 유습에 의한 소수 권력층의 허욕과 이기, 거짓이 팽배한 곳이다. 그리하여 오장환은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인해주는 가계보까지 부정하면서 전통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한다.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실(개인적 현실에서 확대된 세계) 역시 절망 투성이였다. 일제 식민지배 속의 현실은 굴욕과 가난 투성이였다. 「우기」나「모촌」,「북방의 길」에 나타나는 빈민, 유랑민의 처지는 당시 우리 민족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원규, 「오장환 시 연구 :비판적 인식과 잠재적 인식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논문, p.123
고향을 떠나 그가 찾은 곳은 도시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지향할 만한 새로운 어떤 것보다는 물질문명에 휘둘려 타락한 모습들을 발견한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곳, 향락과 퇴폐의 불빛이 넘실대는 곳이 도시였으며 오장환은 그 속에서 함께 동화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산책자가 된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그를 여수에 잠기게 한다. [앞의 논문], p.127
도시와 항구 등에서 자신의 지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폐적 생활에 빠지면서 극도의 좌절과 비애에 싸이게 된 오장환은 급기야 자신을 자학하는 시를 쓰면서 죽음을 탐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 그의 고향은 죽음의 의미를 지니고서 관념적 회귀 공간으로 등장한다. [앞의 논문], p.132
자신이 고향의 한 부분임을 확인하기 위해 오장환은 고향의 모습을 유토피아적 공간에서 현실적 공간으로 전환한다. [앞의 논문], p.139
2) 시를 통해 본 오장환과 고향
눈 덮인 철로는 더욱이 싸늘하였다
소반 귀퉁이 옆에 앉은 농군에게서는 송아지의 냄새가 난다
힘없이 웃으면서 차만 타면 북으로 간다고
어린애는 운다 철마구리 울 듯
차창이 고향을 지워버린다
어린애가 유리창을 쥐어뜯으며 몸부림친다
-「北方의 길」전문-
「우기」의 “막벌이꾼”이 극빈의 상태를 나타내고, 「모촌」의 “양주”가 그 가난 때문에 싸워 “썩어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 작별하였다”면, 인용시는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농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소반 귀퉁이”에 앉은 농군의 초라한 모습과 그의 심경을 대변해주듯 우는 “어린애”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알 수는 없지면,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그 여행이 결코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눈 덮인 철로”의 풍경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농민 들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글이 쓰여졌던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의 시기는 식민지 조선경제가 일본제국주의의 병참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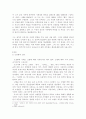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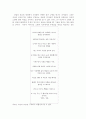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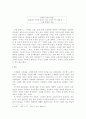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