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본문내용
이’,‘적다-적이’
④같은 말이 겹쳐진 첩어로 뒤에 ‘-하다’가 오지 못하는 경우
예) ‘겹겹-겹겹이’, ‘일일-일일이’, ‘틈틈-틈틈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곱배기 →곱빼기
곱빼기: 두 배를 가리키는 고유어
짜장면 곱배 기 주세요?
교수님→선생님
선생님: 직업이나 직급을 나타내는 말
‘님’을 붙여 호칭어로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호칭어로 쓰는 것
교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구경당하다→구경거리가 되었다
-당하다: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
사람들에게 구경당했다?
구구절절히 →구구절절이
구구절절: 모든 구절을 뜻하는 명사
구구절절하다: 편지 글 따위의 내용이나 사연이 매우 상세하고 간곡하다는 의미
구구절절히 옳다?
구렛나루 →구레나룻
구레나룻: ‘굴레+날’의 어원으로 연달아 있는 수염이라는 뜻
구렛나루를 멋지게 기른 남자?
-구만→ -구먼
-구먼: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컴퓨터가 맛이 갔구만?
구원되다→구조되다
구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구조: 실제의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구제: 자연 재해나 사회적인 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 준다
무너진 굴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열흘 만에 구원되었다?
구좌→계좌
구좌: 일어본 ‘고자’에서 온 것으로 일본식 한자어 이므로 계좌로 바꿔 써야 한다.
이 구좌로 입금해 주세요?
굴삭기→굴착기
굴삭기: 상용한자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변형한 일본 한자어
굴삭기로 땅을 파내다?
굼뱅이 →굼벵이
굼벵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의 관심을 끌 만한 행동을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에서 쓰이는 굼벵이
굼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궁시렁거리다→구시렁거리다, 구시렁대다
구시렁거리다, 구시렁대다: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듣기 싫어 자꾸 말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구시렁’을 어근으로 하여 ‘-거리다’가 붙은 형태의 동사
뒤에서 궁시렁거리다?
귀걸이⊃귀고리
귀고리: 여자들이 귓불에 다는 장식품만을 가리키는 것
귀걸이: 귓불에 매다는 장식품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귀마개나 귀걸이 안경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말
귀걸이와 귀고리는 같은 말이다?
귀뜸/뀌띰→귀띔
귀뜨다: 사람이나 동물이 난 뒤에 처음으로 듣기를 비롯하다
뀌뜨이다: 들리는 소리에 선뜻 정신이 끌리다
뀌띔: ‘뀌뜨이-+-ㅁ’의 결합형 ‘뀌뜨임’에서 준 말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귀지개→귀이개
귀이개: ‘귀+우의-+개’가 귀우개를 거쳐 귀이개로 변천된 것
귀지개로 귀를 파다?
귀하→귀중
귀하: 편지 글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름 다음에 붙여 쓰는 말
귀중: 단체나 기관의 이름 다음에 붙여 쓰는 말
국립국어연구원 귀하?
귓밥→귀지
귓밥: ‘귓바퀴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인 귓불을 뜻한다.
귓밥을 판다?
귓속말과 귀엣말은 둘 다 맞는 표현이다.
즉, 의미는 똑같이 ‘남의 귀에 입을 대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으로 사용 빈도에서는 귀속말이 귀엣말보다 월등히 높다.
‘귀속말’은 틀리고, ‘귀엣말’이 맞다?
그리고 나서→그러고 나서
-고 나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앞말은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그리하다+-고 나서’의 결합으로 줄어든 말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갔다?
그제서야→그제야
그제야: ‘그제야’에서 ‘-야’는 강세의 의미를 지니는 접사이다.
그제서야: ‘그제서야’에서 ‘-서’는 아마도 ‘-에서’가 생략된 형태이다.
그제서야 일어섰다?
금새→금세
금세: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입말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사이다.
금새: 명사. 물건의 값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를 가리킨다.
뭘 들으면 금새 잊어버려요?
금슬→금실
금실: 부부 사이의 화락한 즐거움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금슬 좋은 부부?
금자탑→피라미드
금자탑: 길이 후세에 남을 뛰어난 업적을 이르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찬란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금자탑은 금으로 만든 탑이다?
긋다: 자동사일 때 ‘비가 잠시 그치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비가 긋는 것도 잠깐이었다
타동사일 때 ‘비를 피하여 잠시 기다린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처마 밑에서 비를 그었다
‘비를 긋다’는 맞고 ‘비가 긋다’는 틀리다?
기도→문지기
기도: 극장이나 유흥업소 따위에서 출입문을 지키는 덩치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일본어이다. 그러므로 문지기란 단어로 순화해서 사용하되 기도가 주는 어감의 효과를 보고자 할 때에는 종종 사용해도 된다.
나이트클럽의 ‘기도’를 ‘문지기’로?
기라성→‘빛나는 별’로 순화하는 것이 권유되지만 이런 주장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기라성: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이라는 의미로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대단한 사람을 가리킬 때 긍정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기라성 같은 선배를 배출한 학교다?
기집애→계집애
계집애: 시집가지 않은 어린 여자 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맹랑한 기집애?
기차길→기찻길
기찻길은 ‘기차+길’의 형태로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경음화)가 일어나면서 [기て낄~기차낄]이 되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규정(30항):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
1)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①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날갯짓, 고랫재,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등
②뒷말의 첫소리‘ㄴ,ㅁ’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등
③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윷, 두렛일 등
2)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①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등굣길, 귓병, 머릿방, 뱃병, 봇둑, 사잣밥 등
②뒷말의 첫소리 ‘ㄴ,ㅁ’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곗날, 제삿날, 훗날 등
③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등
3)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에만 사이시옷을 쓴다.
1)‘날갯짓’은 둘 다 순 우리말인데도 [날개
④같은 말이 겹쳐진 첩어로 뒤에 ‘-하다’가 오지 못하는 경우
예) ‘겹겹-겹겹이’, ‘일일-일일이’, ‘틈틈-틈틈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곱배기 →곱빼기
곱빼기: 두 배를 가리키는 고유어
짜장면 곱배 기 주세요?
교수님→선생님
선생님: 직업이나 직급을 나타내는 말
‘님’을 붙여 호칭어로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호칭어로 쓰는 것
교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구경당하다→구경거리가 되었다
-당하다: 행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
사람들에게 구경당했다?
구구절절히 →구구절절이
구구절절: 모든 구절을 뜻하는 명사
구구절절하다: 편지 글 따위의 내용이나 사연이 매우 상세하고 간곡하다는 의미
구구절절히 옳다?
구렛나루 →구레나룻
구레나룻: ‘굴레+날’의 어원으로 연달아 있는 수염이라는 뜻
구렛나루를 멋지게 기른 남자?
-구만→ -구먼
-구먼: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컴퓨터가 맛이 갔구만?
구원되다→구조되다
구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구조: 실제의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구제: 자연 재해나 사회적인 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 준다
무너진 굴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열흘 만에 구원되었다?
구좌→계좌
구좌: 일어본 ‘고자’에서 온 것으로 일본식 한자어 이므로 계좌로 바꿔 써야 한다.
이 구좌로 입금해 주세요?
굴삭기→굴착기
굴삭기: 상용한자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변형한 일본 한자어
굴삭기로 땅을 파내다?
굼뱅이 →굼벵이
굼벵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의 관심을 끌 만한 행동을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에서 쓰이는 굼벵이
굼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궁시렁거리다→구시렁거리다, 구시렁대다
구시렁거리다, 구시렁대다: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듣기 싫어 자꾸 말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구시렁’을 어근으로 하여 ‘-거리다’가 붙은 형태의 동사
뒤에서 궁시렁거리다?
귀걸이⊃귀고리
귀고리: 여자들이 귓불에 다는 장식품만을 가리키는 것
귀걸이: 귓불에 매다는 장식품을 가리키는 것은 물론, 귀마개나 귀걸이 안경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말
귀걸이와 귀고리는 같은 말이다?
귀뜸/뀌띰→귀띔
귀뜨다: 사람이나 동물이 난 뒤에 처음으로 듣기를 비롯하다
뀌뜨이다: 들리는 소리에 선뜻 정신이 끌리다
뀌띔: ‘뀌뜨이-+-ㅁ’의 결합형 ‘뀌뜨임’에서 준 말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귀지개→귀이개
귀이개: ‘귀+우의-+개’가 귀우개를 거쳐 귀이개로 변천된 것
귀지개로 귀를 파다?
귀하→귀중
귀하: 편지 글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름 다음에 붙여 쓰는 말
귀중: 단체나 기관의 이름 다음에 붙여 쓰는 말
국립국어연구원 귀하?
귓밥→귀지
귓밥: ‘귓바퀴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인 귓불을 뜻한다.
귓밥을 판다?
귓속말과 귀엣말은 둘 다 맞는 표현이다.
즉, 의미는 똑같이 ‘남의 귀에 입을 대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으로 사용 빈도에서는 귀속말이 귀엣말보다 월등히 높다.
‘귀속말’은 틀리고, ‘귀엣말’이 맞다?
그리고 나서→그러고 나서
-고 나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앞말은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그리하다+-고 나서’의 결합으로 줄어든 말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갔다?
그제서야→그제야
그제야: ‘그제야’에서 ‘-야’는 강세의 의미를 지니는 접사이다.
그제서야: ‘그제서야’에서 ‘-서’는 아마도 ‘-에서’가 생략된 형태이다.
그제서야 일어섰다?
금새→금세
금세: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입말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사이다.
금새: 명사. 물건의 값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를 가리킨다.
뭘 들으면 금새 잊어버려요?
금슬→금실
금실: 부부 사이의 화락한 즐거움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금슬 좋은 부부?
금자탑→피라미드
금자탑: 길이 후세에 남을 뛰어난 업적을 이르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찬란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금자탑은 금으로 만든 탑이다?
긋다: 자동사일 때 ‘비가 잠시 그치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비가 긋는 것도 잠깐이었다
타동사일 때 ‘비를 피하여 잠시 기다린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처마 밑에서 비를 그었다
‘비를 긋다’는 맞고 ‘비가 긋다’는 틀리다?
기도→문지기
기도: 극장이나 유흥업소 따위에서 출입문을 지키는 덩치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일본어이다. 그러므로 문지기란 단어로 순화해서 사용하되 기도가 주는 어감의 효과를 보고자 할 때에는 종종 사용해도 된다.
나이트클럽의 ‘기도’를 ‘문지기’로?
기라성→‘빛나는 별’로 순화하는 것이 권유되지만 이런 주장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기라성: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이라는 의미로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대단한 사람을 가리킬 때 긍정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기라성 같은 선배를 배출한 학교다?
기집애→계집애
계집애: 시집가지 않은 어린 여자 아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맹랑한 기집애?
기차길→기찻길
기찻길은 ‘기차+길’의 형태로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경음화)가 일어나면서 [기て낄~기차낄]이 되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규정(30항):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
1)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①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날갯짓, 고랫재,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등
②뒷말의 첫소리‘ㄴ,ㅁ’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등
③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윷, 두렛일 등
2)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①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등굣길, 귓병, 머릿방, 뱃병, 봇둑, 사잣밥 등
②뒷말의 첫소리 ‘ㄴ,ㅁ’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곗날, 제삿날, 훗날 등
③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가욋일, 사삿일, 예삿일 등
3)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에만 사이시옷을 쓴다.
1)‘날갯짓’은 둘 다 순 우리말인데도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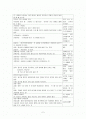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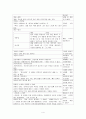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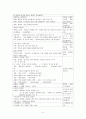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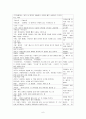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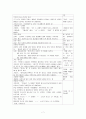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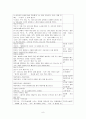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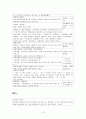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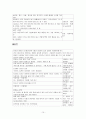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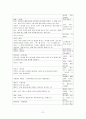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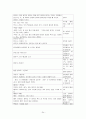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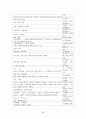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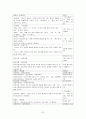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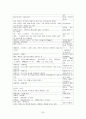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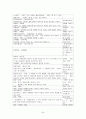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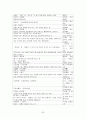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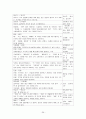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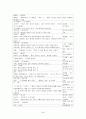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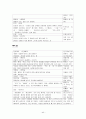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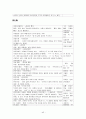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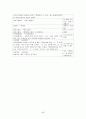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