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다(I cry...that he may answer, RSV). 그러나 원문상을 볼 때 \'카라티\'는 완료형이며 \'야아네니\'는 미완료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동사를 특정한 시제에만 한정시키기보다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현재와 장래에도 계속 체험하기를 바라고 또 확신하는 기자의 고백으로 봄이 나을 것 같다.
=====120:2궤사(詭詐)한 혀(라숀 레미야) - 문자적인 뜻은 \'속이는 혀\'이며 속임수와 이중성이 가득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이다. 여기서는 앞의 \'거짓된 입술\'과 동의어적으로 쓰였다.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본 용어를 생략하거나 중시하지 않는데(Gunkel, Oesterley) 맛소라 사본의 한 구절, 한 글자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로서는 그들을 따를 수 없다. 오히려 동의적 내용의 반복은 강조로 본다. 다윗은 흔히 이런 식의 고통을 털어놓는데 특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시련을 묘사할 때 \'속이는 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Barnes). 한편,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혀가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어 있는 바이다(34:13;잠 13:3;21:23;약 1:26;3:6;4:11;벧전 2:1;3:10).
=====120:3너 궤사한 혀여...주며...더 할꼬 - 본 구절의 의미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저의 위에 쌓여질 재앙은 무엇일까? 네가 도대체 어떤 징벌을 받게 될까?\'이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저주의 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삼상 3:17;20:13). 문법상으로는 본문의 동사들의 주격을 반드시 여호와로 간주하는 일이 필연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궤사한 혀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Alexander).
=====120:4장사의...숯불이리로다 - 본절의 표현은 (1)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의 57:4이나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의 64:3과 같은 반역적인 혀에 대한 묘사이거나, (2) 그러한 죄악된 성향에 적합한 징벌, 즉 혀에 대한 징벌로 볼 수 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혀는 날카로운 검, 혹은 날카로운 화살과 같으며 지옥의 불을 쌓는 것 같아서(약 3:6) 그러한 식으로 혀를 사용하는 자는 전능자 하나님의 불과 화살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나를 에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140:9, 10). 우선 자신은 인애를 베풀지만 대적과 반역을 만날 뿐인 상황을 불평하듯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는 전자의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후자의 해석을 따를 경우는 바로 그러한 반역적 이웃의 머리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내용이 되는데, 본 문맥에서는 궤사한 혀를 놀리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무서운 형벌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봄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로뎀나무 - 제롬(Jerome)이 노간주나무(juniper)로 칭했던 이 나무의 학명은 제니스타 모노스페르마(아랍어로는 레템)이며 저명 학자에 따르면 이 나무의 뿌리는 사막에서 연료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불을 붙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열기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Burckhardt). 동일 수목이 왕상 19:4과 욥 30:4에도 언급되어 있다. 후반절은 이 나무의 뿌리가 양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사실 그 뿌리는 몹시 써서 양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오히려 몸을 덥히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된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사 44:15과 비교하라). 제롬은 이 나무에 관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한 무리의 여행객들은 바로 이 나무로 불을 때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곳을 떠난 지 일년후 동일한 장소에 다시 와보니 그때까지 꺼지지 않은 불씨를 잔화(殘火)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De mansion-ibus Israel ad Fabiolam 15장). 숯불은 불태우는 듯한, 삼킬 듯한 혀에 대한 혹은 그 같은 혀에 대한 징벌을 묘사하기 위한 이미지이다.
=====120:5메섹 - 이는 \'두발\'과 함께 거멍되었던 인물의 이름인데(창 10:2;겔 27:13) 여기서는 그의 후손으로서 흑해와 아락시스 사이에 위치한 코카사스의 남동쪽에 거주했던 야만족을 가리킨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창 25:13) 아라비안 반도를 누비며 약탈을 일삼던 무리들이다. 이 두 족속들은 각각 팔레스틴의 북쪽과 남쪽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기자는 본 시편 저작 당시 자신을 둘러 싸고있던 자들의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성격을 드러내려고 이 두 민족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특히 \'메섹\'은 겔 38:2에서 이스라엘을 침고하는 이방 연합군의 지도자들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한다. 유하며(가르티) - 이 단어는 영구적인 거주가 아니라 마치 여행객이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체류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메섹, 게달과 같은 야만 이방족 사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여행자처럼 잠시 머물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어떤 학자들은 본 시편의 저작 시기를 바벧론 포로 이후로 보고 있으나 다윗이 황망히 피난 다니던 시절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120:6 화평을 미워하는 자(소네 솰롬) - 여기서 \'소네\'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고려할 때 의미는 복수형으로 이해해야 한다. 말하자면 대표 단수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70인역, 시리아역 등은 복수형으로 번역하고 있다.
=====120:7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아니 솰롬) - 문자적인 뜻은 \'나는 평화\'이다. 유사한 예로 개역 성경 109:4에서는 \'나는 기도\'를 \'나는 기도할 뿐이라\'로 번역하고 있다. 이 두 구절에서 공히 대명사 \'아니\'(* )는 강조형으로 쓰였다
=====120:2궤사(詭詐)한 혀(라숀 레미야) - 문자적인 뜻은 \'속이는 혀\'이며 속임수와 이중성이 가득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이다. 여기서는 앞의 \'거짓된 입술\'과 동의어적으로 쓰였다.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본 용어를 생략하거나 중시하지 않는데(Gunkel, Oesterley) 맛소라 사본의 한 구절, 한 글자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로서는 그들을 따를 수 없다. 오히려 동의적 내용의 반복은 강조로 본다. 다윗은 흔히 이런 식의 고통을 털어놓는데 특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시련을 묘사할 때 \'속이는 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Barnes). 한편,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혀가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어 있는 바이다(34:13;잠 13:3;21:23;약 1:26;3:6;4:11;벧전 2:1;3:10).
=====120:3너 궤사한 혀여...주며...더 할꼬 - 본 구절의 의미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저의 위에 쌓여질 재앙은 무엇일까? 네가 도대체 어떤 징벌을 받게 될까?\'이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저주의 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삼상 3:17;20:13). 문법상으로는 본문의 동사들의 주격을 반드시 여호와로 간주하는 일이 필연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궤사한 혀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Alexander).
=====120:4장사의...숯불이리로다 - 본절의 표현은 (1)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의 57:4이나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의 64:3과 같은 반역적인 혀에 대한 묘사이거나, (2) 그러한 죄악된 성향에 적합한 징벌, 즉 혀에 대한 징벌로 볼 수 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혀는 날카로운 검, 혹은 날카로운 화살과 같으며 지옥의 불을 쌓는 것 같아서(약 3:6) 그러한 식으로 혀를 사용하는 자는 전능자 하나님의 불과 화살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나를 에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140:9, 10). 우선 자신은 인애를 베풀지만 대적과 반역을 만날 뿐인 상황을 불평하듯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는 전자의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후자의 해석을 따를 경우는 바로 그러한 반역적 이웃의 머리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내용이 되는데, 본 문맥에서는 궤사한 혀를 놀리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무서운 형벌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봄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로뎀나무 - 제롬(Jerome)이 노간주나무(juniper)로 칭했던 이 나무의 학명은 제니스타 모노스페르마(아랍어로는 레템)이며 저명 학자에 따르면 이 나무의 뿌리는 사막에서 연료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불을 붙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열기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Burckhardt). 동일 수목이 왕상 19:4과 욥 30:4에도 언급되어 있다. 후반절은 이 나무의 뿌리가 양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사실 그 뿌리는 몹시 써서 양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오히려 몸을 덥히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된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사 44:15과 비교하라). 제롬은 이 나무에 관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한 무리의 여행객들은 바로 이 나무로 불을 때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곳을 떠난 지 일년후 동일한 장소에 다시 와보니 그때까지 꺼지지 않은 불씨를 잔화(殘火)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De mansion-ibus Israel ad Fabiolam 15장). 숯불은 불태우는 듯한, 삼킬 듯한 혀에 대한 혹은 그 같은 혀에 대한 징벌을 묘사하기 위한 이미지이다.
=====120:5메섹 - 이는 \'두발\'과 함께 거멍되었던 인물의 이름인데(창 10:2;겔 27:13) 여기서는 그의 후손으로서 흑해와 아락시스 사이에 위치한 코카사스의 남동쪽에 거주했던 야만족을 가리킨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창 25:13) 아라비안 반도를 누비며 약탈을 일삼던 무리들이다. 이 두 족속들은 각각 팔레스틴의 북쪽과 남쪽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기자는 본 시편 저작 당시 자신을 둘러 싸고있던 자들의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성격을 드러내려고 이 두 민족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특히 \'메섹\'은 겔 38:2에서 이스라엘을 침고하는 이방 연합군의 지도자들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한다. 유하며(가르티) - 이 단어는 영구적인 거주가 아니라 마치 여행객이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체류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메섹, 게달과 같은 야만 이방족 사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여행자처럼 잠시 머물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어떤 학자들은 본 시편의 저작 시기를 바벧론 포로 이후로 보고 있으나 다윗이 황망히 피난 다니던 시절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120:6 화평을 미워하는 자(소네 솰롬) - 여기서 \'소네\'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고려할 때 의미는 복수형으로 이해해야 한다. 말하자면 대표 단수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70인역, 시리아역 등은 복수형으로 번역하고 있다.
=====120:7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아니 솰롬) - 문자적인 뜻은 \'나는 평화\'이다. 유사한 예로 개역 성경 109:4에서는 \'나는 기도\'를 \'나는 기도할 뿐이라\'로 번역하고 있다. 이 두 구절에서 공히 대명사 \'아니\'(* )는 강조형으로 쓰였다
키워드
추천자료
 Theme for English B
Theme for English B 이상의 종생기 작품분석
이상의 종생기 작품분석 열분석 실험(DTA)
열분석 실험(DTA) 정밀기계공학 실험 -광탄성, 관성모멘트, 초음파탐상
정밀기계공학 실험 -광탄성, 관성모멘트, 초음파탐상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초기 기독교의 교육사상
초기 기독교의 교육사상 [유치환][유치환의 생애][유치환의 시 바위][유치환의 시 행복][유치환의 시 깃발][유치환의 ...
[유치환][유치환의 생애][유치환의 시 바위][유치환의 시 행복][유치환의 시 깃발][유치환의 ... [보들레르][시][시사상][보들레르의 시사상][보들레르의 산문시][보들레르와 들라크르의 관계...
[보들레르][시][시사상][보들레르의 시사상][보들레르의 산문시][보들레르와 들라크르의 관계... (기계공학)기계재료 응용및 실험, 마찰시험, 미끄럼마찰및 구름저항 실험 최신버전!!
(기계공학)기계재료 응용및 실험, 마찰시험, 미끄럼마찰및 구름저항 실험 최신버전!! 인장시험 레포트(실험)
인장시험 레포트(실험) 성공적인 목회상담(서평)
성공적인 목회상담(서평)  구약성서입문 1장
구약성서입문 1장 1~7에대한답변
1~7에대한답변 구약성서 속에서 노닐다
구약성서 속에서 노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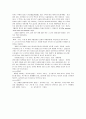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