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유럽연합(EU)의 형성
1.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2. 유럽연합의 성립
Ⅲ. 유럽연합(EU)통합 및 형성과정의 특징
1. 점진적인 통합
2. 목적은 정치, 수단은 경제
3. 충실한 제도화
4. 현실주의
Ⅳ.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
1. 유럽연합(EU) 조약이 정한 대외관계
2. 국제기관과의 관계
3. 확장(신규가입)
Ⅴ.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각 비교
1. 미국
2. 러시아
3. 캐나다
4. 중국
5. 일본
6. 한국
Ⅵ. 결 론
[참고 문헌]
Ⅱ. 유럽연합(EU)의 형성
1.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2. 유럽연합의 성립
Ⅲ. 유럽연합(EU)통합 및 형성과정의 특징
1. 점진적인 통합
2. 목적은 정치, 수단은 경제
3. 충실한 제도화
4. 현실주의
Ⅳ.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
1. 유럽연합(EU) 조약이 정한 대외관계
2. 국제기관과의 관계
3. 확장(신규가입)
Ⅴ.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각 비교
1. 미국
2. 러시아
3. 캐나다
4. 중국
5. 일본
6. 한국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문제에 관해 EU는 주연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나 EU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KEDO 회원국으로서 EU는 이 지역 핵확산 방지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에게 (1995년 이후 2억 4천만 유로에 달하는) 식량 원조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양자 간 정치대화에 있어 가장 큰 중요성을 띠고 있기는 하나, 양자 간 정치대화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개발 문제는 양자가 공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문제이다. 양자 간 대화와 함께 (아시아 10개국과 EU 15개 회원국, 집행위원회의 지도자들이 2년에 한번 한 자리에 모이는 아셈 회의에서 그 이름을 빌려온) 아셈 프로세스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 정치, 문화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유럽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인식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양측은 각료급 연례 협의회를 개최해왔다. 브뤼셀과 서울을 오가며 번갈아 개최되고 있는 이 협의회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9년 이후부터는 고위급 회담의 연례 개최로 더욱 보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국과 EU는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례 각료급 회담을 별도로 개최하였다. 이 대화는 전통적으로 아세안 지역 포럼(ARF) 기간 중에 개최되었다.
Ⅵ. 결 론
유럽통합의 성격은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에 대항하는 지역화임과 동시에 유럽 차원에서 새로운 경쟁 블럭을 형성하여 역내 국가들을 통합해 나감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작은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두고 타경제권의 세계화 전략에 경쟁하고 저항하면서 역내에서는 또 다른 세계화를 추진하는 현상인 것이다.
유럽의 지역적 ‘작은 세계화’는 이미 상당부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는 적지 않게 유럽차원으로 이전될 것이며, 국가나 역내 지역 단위의 문화적 다양성도 새로운 영역의 민주주의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유럽 차원의 사회 정책적 형평성을 기하려는 유럽사민주의 정당들의 명분과 가능성이 여기에서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통합과정은 어디까지나 관세동맹에서 공동시장으로, 공동시장에서 다시 단일시장으로 전환되는 자본과 시장의 흐름을 주요 목표로 전개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 2차 대전 이전의 이상주의적 전망이 세계화의 공세와 경쟁 속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로 정형화되어 온 것이다. 유럽 내부의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기존 회원국들 간의 유럽 연합적 정체성을 수립하기보다 중ㆍ동유럽으로의 확대를 통해 시장논리를 더욱 확대해가는 최근의 모습도 그 하나의 방증이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시된 사회 정책적 형평성과 민주성의 보장은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 국내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EU 자유무역협정(FTA)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EU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EU 중국 등으로 다극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EU는 우선 경제 규모 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유럽 27개국의 연합체로서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다. 인구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제 3위에 해당하는 5억 명으로 미국보다 2억 명이 더 많다. 국내 총생산은 14조 달러로 세계전체의 30%에 해당한다.
상품 수입은 세계의 39%로 5조 달러에 이른다. 더욱이 회원국은 조만간 30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있어 지속 성장이 예견된다. 한국과 EU는 서로의 통상 이익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 역할도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자원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얻는다.
물론 EU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의 6자 회담 등에 직접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EU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 뿐 만 아니라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정치 외교 문제를 풀어가는 데 EU와 연대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 앞으로 EU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올해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EU대통령이 선출된다. 정치적 리더십이 강화되고 세계의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리라 여겨진다. 이미 EU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표출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승자독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장치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과 EU의 경제 관계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 2수출국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EU다.
관계를 더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한 EU FTA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영어 일변도의 어학교육을 보완하고 미국 중국 일본만큼 유럽과의 청소년 교류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종서, 유럽연합(EU).국가.신자유주의, 한국학술정보, 2006
김명섭, 유럽연합체제의 이해, 백산서당, 2005
김시홍, 유럽연합의 이해, 높이깊이, 2005
이갑수, EU경제정책, 대명, 2009
박이도, 유럽연합시대, 한국문화사, 2003
Belke, A./Hebler, M.: EU-Osterweiterung, Euro und Arbeitsmarkte. Oldenbourg 2002.
Griller, S./Hummer, W.: Die EU nach Nizza. Springer 2002.
Hartmann, J.: Das politische system der EU. Campus 2001.
Herz, D.: Die Europaische Union. C. H. Beck 2002.
한반도 정세가 양자 간 정치대화에 있어 가장 큰 중요성을 띠고 있기는 하나, 양자 간 정치대화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개발 문제는 양자가 공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문제이다. 양자 간 대화와 함께 (아시아 10개국과 EU 15개 회원국, 집행위원회의 지도자들이 2년에 한번 한 자리에 모이는 아셈 회의에서 그 이름을 빌려온) 아셈 프로세스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 정치, 문화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유럽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인식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양측은 각료급 연례 협의회를 개최해왔다. 브뤼셀과 서울을 오가며 번갈아 개최되고 있는 이 협의회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9년 이후부터는 고위급 회담의 연례 개최로 더욱 보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국과 EU는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례 각료급 회담을 별도로 개최하였다. 이 대화는 전통적으로 아세안 지역 포럼(ARF) 기간 중에 개최되었다.
Ⅵ. 결 론
유럽통합의 성격은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에 대항하는 지역화임과 동시에 유럽 차원에서 새로운 경쟁 블럭을 형성하여 역내 국가들을 통합해 나감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작은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두고 타경제권의 세계화 전략에 경쟁하고 저항하면서 역내에서는 또 다른 세계화를 추진하는 현상인 것이다.
유럽의 지역적 ‘작은 세계화’는 이미 상당부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는 적지 않게 유럽차원으로 이전될 것이며, 국가나 역내 지역 단위의 문화적 다양성도 새로운 영역의 민주주의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유럽 차원의 사회 정책적 형평성을 기하려는 유럽사민주의 정당들의 명분과 가능성이 여기에서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통합과정은 어디까지나 관세동맹에서 공동시장으로, 공동시장에서 다시 단일시장으로 전환되는 자본과 시장의 흐름을 주요 목표로 전개되어 온 것이 분명하다. 2차 대전 이전의 이상주의적 전망이 세계화의 공세와 경쟁 속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로 정형화되어 온 것이다. 유럽 내부의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기존 회원국들 간의 유럽 연합적 정체성을 수립하기보다 중ㆍ동유럽으로의 확대를 통해 시장논리를 더욱 확대해가는 최근의 모습도 그 하나의 방증이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시된 사회 정책적 형평성과 민주성의 보장은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 국내에서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EU 자유무역협정(FTA)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EU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EU 중국 등으로 다극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EU는 우선 경제 규모 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유럽 27개국의 연합체로서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다. 인구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제 3위에 해당하는 5억 명으로 미국보다 2억 명이 더 많다. 국내 총생산은 14조 달러로 세계전체의 30%에 해당한다.
상품 수입은 세계의 39%로 5조 달러에 이른다. 더욱이 회원국은 조만간 30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있어 지속 성장이 예견된다. 한국과 EU는 서로의 통상 이익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 역할도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자원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얻는다.
물론 EU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의 6자 회담 등에 직접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EU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 뿐 만 아니라 북핵 문제 등 다양한 정치 외교 문제를 풀어가는 데 EU와 연대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 앞으로 EU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올해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EU대통령이 선출된다. 정치적 리더십이 강화되고 세계의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리라 여겨진다. 이미 EU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표출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승자독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장치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과 EU의 경제 관계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국에 이은 한국의 제 2수출국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EU다.
관계를 더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한 EU FTA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영어 일변도의 어학교육을 보완하고 미국 중국 일본만큼 유럽과의 청소년 교류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종서, 유럽연합(EU).국가.신자유주의, 한국학술정보, 2006
김명섭, 유럽연합체제의 이해, 백산서당, 2005
김시홍, 유럽연합의 이해, 높이깊이, 2005
이갑수, EU경제정책, 대명, 2009
박이도, 유럽연합시대, 한국문화사, 2003
Belke, A./Hebler, M.: EU-Osterweiterung, Euro und Arbeitsmarkte. Oldenbourg 2002.
Griller, S./Hummer, W.: Die EU nach Nizza. Springer 2002.
Hartmann, J.: Das politische system der EU. Campus 2001.
Herz, D.: Die Europaische Union. C. H. Beck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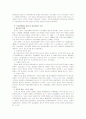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