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동랑 유치진(東郞 柳致眞)은 누구인가?
-유치진의 개작 희곡, ‘소’
-1,2,3막 분석
-캐릭터 분석
-공연의 의의
-주요 소품 이미지와 설명
동랑 유치진(東郞 柳致眞)은 누구인가?
-유치진의 개작 희곡, ‘소’
-1,2,3막 분석
-캐릭터 분석
-공연의 의의
-주요 소품 이미지와 설명
본문내용
를 당초의 모습인 비통한 연극으로 되돌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의 역사성에 비추어 당연한 처사인 듯 했다.’
유치진은 ‘지난날의 기막힌 현실’에는 비극적 결말이 타당함으로 다시금 비통한 연극으로 되돌렸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와 연관된 작품만을 고집했던 그의 태도를 감안할 때, 그가 처한 해방기의 현실이 개작된 희극적 현실과 들어맞지 않았다는 것을 암암리에 노출한다. 물론 해방은 일제의 질곡을 벗어난 희망의 장이다. 그러나 실제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분열과 혼란이 난무하니, 그의 <소>는 다시금 초기의 암울함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늘 시대적인 변화에 민감했던 작가의 성향이 개작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작가의 작품이란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거듭 새로운 단계로 변모해 가게된다. 그러므로 각 작품들은 서로 변별된 자질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한 작가의 작품들 사이에는 되풀이 발견되는 공통분모가 있다. 50년대 작품에서도 전대와 달리 소극장 지향에서 대극장 지향의 무대를 설정하고 있다든가, 사실주의극 일변도를 탈피하고자 한 여러 가지 방법론의 작품들, 다양한 기법의 극작술은 하나의 변별된 자질들로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작가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유치진의 경우는 희곡이 사회성에 바탕을 둔 장르라는 점을 떠나서도 특별히 사회문제에 민감한 작가였고, 스스로도 사회 계몽을 위해 작품을 썼다고 고백했다. 그는 철저한 계몽주의적, 공리주의적 작가라는 50년대 작품에서도 일관된 것이었다.
-1,2,3막 분석
<1막>
타작을 하는 거간꾼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절구통 뒤에서 말똥이가 가마니를 쓰고 숨어있다. 그런 말똥이를 그의 아버지 국서가 찾으러 들어온다. 그러나 말똥이는 찾을 수가 없고 우삼이 국서의 집 마당으로 와서 풍년이 됨을 이야기하곤 뒷마당으로 술을 마시러 간다. 우삼이 뒷마당으로 술을 마시러 가면 국서의 둘째 아들 개똥이가 뱃일을 하는 사람의 복장으로 들어온다. 국서는 개똥이에게 집안일이 바쁜데 어딜 쏘다니냐고 핀잔을 주고 그런 국서에게 개똥이는 자신을 핀잔만 하지 말고 소 팔아서 만주로 보내줄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한다.
소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국서는 얼토당토않는 개똥이의 이야기를 듣고 소의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외양간이나 치우라고 한다. 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개똥이는 외양간을 치우러 가고, 그런 모습이 못마땅한 말똥이는 가마니 속에서 나온다. 가마니 속에서 나온 말똥이는 타작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소연을 하고는 다시 가마니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밀린 도지와 말음을 받으러 국서네로 찾아온 사음은 뒤켠에 있는 타작마당으로 향한다. 그런 사음이 못마땅한 말똥이는 물을 마시고 절구통에 걸터 앉는다.
이때, 국진이 들어와서 국서 처에게 함지를 꿰매 달라고 청을 한다. 국서처는 함지를 꿰맬 끄나플을 찾다가 말똥이를 발견한다. 그런 말똥이에게 타작을 도우라고 하나, 말똥이는 아무 소용없는 타작은 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린다.
이때, 도리깨를 빌리려고 귀찬이 부가 들어와서 내년에 있을 농지령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또한 그는 밀린 도지 때문에 귀찬이를 일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고 말한다. 이에 국서처는 얌전한 애를 팔아서 어떻하냐며 마음 아파하고 말똥이는 자식 팔아 잘 되는 집 없다며 밖으로 나가 버린다. 그러나 국서처는 딸이라도 팔아서 밀린 도지를 면할 수 있는게 어디냐고 되려 부러워한다. 이때, 국진이 함지를 찾으러 오고 뒤이어 유자나무집 딸이 애들이 던진 돌에 깨진 상처를 어루만지며 국서네로 온다. 그녀는 개똥이를 찾지만 집에 없는 개똥이를 왜 찾느냐고 국서처에게 핀잔만 듣는다. 그런 유자나무짓 딸을 보면서 귀찬이부는 마음이 아파온다.그런 그에게 좋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국서처가 위로를 한다. 이에 아버지를 찾으러 온 귀찬이를 따라서 귀찬이부는 집으로 향하고, 그들을 지켜보던 국서처는 집에 온 개똥이에게 왜 말똥이가 그러냐고 그러자 형은 장가를 못가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똥이는 소를 팔아서 번돈을 자신의 장사밑천에 대달라고 어머니에게 때를 쓴다. 어머니는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나, 개똥이의 설명을 듣고 동조를 한다. 그런 개똥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말똥이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자 개똥이는 마당 벌어지는데 웬 솔뿌리 걱정이냐며 참견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자 화가 난 말똥이가 개똥이의 멱살을 잡자 겁을 먹은 개똥이는 도망을 치고 그런 개똥이를
유치진은 ‘지난날의 기막힌 현실’에는 비극적 결말이 타당함으로 다시금 비통한 연극으로 되돌렸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와 연관된 작품만을 고집했던 그의 태도를 감안할 때, 그가 처한 해방기의 현실이 개작된 희극적 현실과 들어맞지 않았다는 것을 암암리에 노출한다. 물론 해방은 일제의 질곡을 벗어난 희망의 장이다. 그러나 실제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분열과 혼란이 난무하니, 그의 <소>는 다시금 초기의 암울함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늘 시대적인 변화에 민감했던 작가의 성향이 개작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작가의 작품이란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거듭 새로운 단계로 변모해 가게된다. 그러므로 각 작품들은 서로 변별된 자질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한 작가의 작품들 사이에는 되풀이 발견되는 공통분모가 있다. 50년대 작품에서도 전대와 달리 소극장 지향에서 대극장 지향의 무대를 설정하고 있다든가, 사실주의극 일변도를 탈피하고자 한 여러 가지 방법론의 작품들, 다양한 기법의 극작술은 하나의 변별된 자질들로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작가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유치진의 경우는 희곡이 사회성에 바탕을 둔 장르라는 점을 떠나서도 특별히 사회문제에 민감한 작가였고, 스스로도 사회 계몽을 위해 작품을 썼다고 고백했다. 그는 철저한 계몽주의적, 공리주의적 작가라는 50년대 작품에서도 일관된 것이었다.
-1,2,3막 분석
<1막>
타작을 하는 거간꾼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절구통 뒤에서 말똥이가 가마니를 쓰고 숨어있다. 그런 말똥이를 그의 아버지 국서가 찾으러 들어온다. 그러나 말똥이는 찾을 수가 없고 우삼이 국서의 집 마당으로 와서 풍년이 됨을 이야기하곤 뒷마당으로 술을 마시러 간다. 우삼이 뒷마당으로 술을 마시러 가면 국서의 둘째 아들 개똥이가 뱃일을 하는 사람의 복장으로 들어온다. 국서는 개똥이에게 집안일이 바쁜데 어딜 쏘다니냐고 핀잔을 주고 그런 국서에게 개똥이는 자신을 핀잔만 하지 말고 소 팔아서 만주로 보내줄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한다.
소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국서는 얼토당토않는 개똥이의 이야기를 듣고 소의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외양간이나 치우라고 한다. 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개똥이는 외양간을 치우러 가고, 그런 모습이 못마땅한 말똥이는 가마니 속에서 나온다. 가마니 속에서 나온 말똥이는 타작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소연을 하고는 다시 가마니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밀린 도지와 말음을 받으러 국서네로 찾아온 사음은 뒤켠에 있는 타작마당으로 향한다. 그런 사음이 못마땅한 말똥이는 물을 마시고 절구통에 걸터 앉는다.
이때, 국진이 들어와서 국서 처에게 함지를 꿰매 달라고 청을 한다. 국서처는 함지를 꿰맬 끄나플을 찾다가 말똥이를 발견한다. 그런 말똥이에게 타작을 도우라고 하나, 말똥이는 아무 소용없는 타작은 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린다.
이때, 도리깨를 빌리려고 귀찬이 부가 들어와서 내년에 있을 농지령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또한 그는 밀린 도지 때문에 귀찬이를 일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고 말한다. 이에 국서처는 얌전한 애를 팔아서 어떻하냐며 마음 아파하고 말똥이는 자식 팔아 잘 되는 집 없다며 밖으로 나가 버린다. 그러나 국서처는 딸이라도 팔아서 밀린 도지를 면할 수 있는게 어디냐고 되려 부러워한다. 이때, 국진이 함지를 찾으러 오고 뒤이어 유자나무집 딸이 애들이 던진 돌에 깨진 상처를 어루만지며 국서네로 온다. 그녀는 개똥이를 찾지만 집에 없는 개똥이를 왜 찾느냐고 국서처에게 핀잔만 듣는다. 그런 유자나무짓 딸을 보면서 귀찬이부는 마음이 아파온다.그런 그에게 좋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국서처가 위로를 한다. 이에 아버지를 찾으러 온 귀찬이를 따라서 귀찬이부는 집으로 향하고, 그들을 지켜보던 국서처는 집에 온 개똥이에게 왜 말똥이가 그러냐고 그러자 형은 장가를 못가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똥이는 소를 팔아서 번돈을 자신의 장사밑천에 대달라고 어머니에게 때를 쓴다. 어머니는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나, 개똥이의 설명을 듣고 동조를 한다. 그런 개똥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말똥이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자 개똥이는 마당 벌어지는데 웬 솔뿌리 걱정이냐며 참견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자 화가 난 말똥이가 개똥이의 멱살을 잡자 겁을 먹은 개똥이는 도망을 치고 그런 개똥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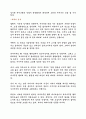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