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리가 가능하나, 그것으로 그치고, 상호 작용하는 인간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 여러 가지 것이 그의 눈앞을 지나간다. 그는 팔짱을 끼고 그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술하고 체계를 세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 그것들은 지나가 버리고 그는 여전한 그로서 남아 있다. 이 같은 자기 자신을 그는 아메바에 비유한다. 아메바는 먹이를 발견하면 그 주위로 흘러가서 그것을 흡수하고 동화한다. 그리고 동화한 후에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또 다른 새로운 먹이를 찾아 흐느적거리며 흘러간다. 자기는 그와 같이 그때그때 읽고 있는 책이나 접촉하고 있는 친구에 따라 풍자가가 되기도 하고 신비가가 되었다가는 인도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경멸적인 인간기피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어느 것도 그의 참모습이 아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그를 가리켜 \"떠돌아다니며 정착할 줄 모르는 인생의 방관자\"라고 평한다. 참으로 그는 인생의 나그네요, 방관자이다. 따라서 그는 고독하다. 결코 자신을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고독하다. 그는 밀폐된 세계다. 그는 마이크 램피언과 같이 강렬한 전인적인 삶을 상상하기도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으로 이해된 삶으로, 관념과 현실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다는 것을 그는 절감한다.
이러한 필립의 인생 태도가 곧 <실제 행동을 싫어하는> 헉슬리의 태도라고 본다면, 그가 대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모럴리스트의 입장에 섰을 때 사회주의가 아닌 신비주의적인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으로, 실천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도 아무에게도 변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 역시 관념적 피상적인 것이었던 것 같다. 1954년 그는 스스로 메스카린이라는 일종의 마약의 실험체가 되어 그 복용 경험을 기록, 《지각의 문(Doors of perception)》을 발표했다. 그가 메스카린의 힘을 빌어 신비한 경험을 직접 체험하려고 시도한 것은 종교적인 신비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직가의 문》 이후의 작품으로는 장편 《천재와 여신》,《섬(The Island)》, 평론 《지성에의 포학(The Tyranny over the Mind)》등이 있으며, 1963년 11월 22일, 안질의 치료를 위해 1938년 이래 정주한 캘리포니아 남부의 헐리웃 교외의 자택에서 암으로 사망했다.
이러한 필립의 인생 태도가 곧 <실제 행동을 싫어하는> 헉슬리의 태도라고 본다면, 그가 대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모럴리스트의 입장에 섰을 때 사회주의가 아닌 신비주의적인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으로, 실천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도 아무에게도 변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 역시 관념적 피상적인 것이었던 것 같다. 1954년 그는 스스로 메스카린이라는 일종의 마약의 실험체가 되어 그 복용 경험을 기록, 《지각의 문(Doors of perception)》을 발표했다. 그가 메스카린의 힘을 빌어 신비한 경험을 직접 체험하려고 시도한 것은 종교적인 신비주의에 대한 그의 이해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직가의 문》 이후의 작품으로는 장편 《천재와 여신》,《섬(The Island)》, 평론 《지성에의 포학(The Tyranny over the Mind)》등이 있으며, 1963년 11월 22일, 안질의 치료를 위해 1938년 이래 정주한 캘리포니아 남부의 헐리웃 교외의 자택에서 암으로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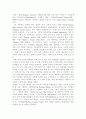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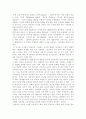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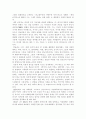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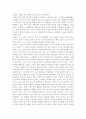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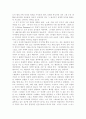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