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문학(漢文學)>
한문학의 정의와 범위
시문학의 사적(史的) 전개
한시의 종류와 특징
근체시
고시
악부
시문학의 사적(史的) 전개 양상
한문학의 발전 [麗初 ~ 仁宗] ~ 한문학의 난숙 [毅宗 ~ 麗末] (고려시대)
한문학의 정화 [鮮初 ~ 任亂], 한문학의 융성 [任亂 ~ 景宗],僞學의 승리 [英祖 ~ 甲更 ] (조선시대)
참고문헌
한문학의 정의와 범위
시문학의 사적(史的) 전개
한시의 종류와 특징
근체시
고시
악부
시문학의 사적(史的) 전개 양상
한문학의 발전 [麗初 ~ 仁宗] ~ 한문학의 난숙 [毅宗 ~ 麗末] (고려시대)
한문학의 정화 [鮮初 ~ 任亂], 한문학의 융성 [任亂 ~ 景宗],僞學의 승리 [英祖 ~ 甲更 ] (조선시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우며, 우리 나라에서도 정확히 언제 한시가 도입되어 창작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현전하고 있는 을지문덕의 〈유수장우중문시>가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한국 한문학의 독자성
이것은 우리 동방의 문(文)이 송, 원의 문도 아니고 또 한, 당의 문도 아니며 바로 우리나라의 문인 것입니다. 마땅히 중국 역대의 문과 나란히 천지간에 행할 것이어늘, 어찌 민멸하여 전함이 없겠습니까?
- 서거정 <동문선서(東文選序)>
지금 무관 이덕무는 조선 사람이다. 산천과 지리가 중국과 다르고 언어와 요속의 시대가 한 당이 아니다. 만약 중국의 수법을 본뜨고 한 당의 문체를 답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수법이 고상할수록 뜻은 실제로 비속하게 되고, 문체가 한 당과 비슷할수록 말은 더욱 거짓이 되는 결과를 볼 뿐이다.
…….
우리나라의 방언을 문자로 옮기고 우리나라의 민요를 운율에 맞추기만 하면 자연히 문장이 이루어지고 진기가 발현된다. 답습을 일삼지 않고, 남의 것을 빌어오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온갖 것을 표현해 낼 수 있다.
…….
- 박지원 <영처고서(瓔處稿序)>
나는 나의 시가 당시와 비슷하다느니 송시와 비슷하다느니 하게 될까 두렵고, 오직 사람들이 허균의 시라고 말하게 하고 싶다.
- 허균 <여이손곡(與李蓀谷)>
- 우리 민족의 글에 대한 자주성과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한시의 독자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도 했고, 중국시의 형태에 맞추어 쓰려고 애쓸 필요 없이 우리의 생활 감정을 우리 나름의 소재와 시어로 표현하는 시임을 지칭하고 있다.
노정승의 시에 “길은 ‘평구역’에 그치고 강물은 ‘판사정’에 깊다. 버들 침침하니 ‘청파역’이 저물었고 / 하늘 개이니 ‘백악산’에 봄이로다.”란 것은 아주 좋다. 그 풀무질해서 만들어 낸 묘함이 있을뿐더러, 쇠를 넣어서 금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 해로우랴.
- 허균 <성수시화(惺詩話)>
- 쓸모없는 쇠로 여겨지던 조선의 지명, 물명이 문학 속에 들어가면 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우리말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조선의 시, 문을 추구한 것은 한문학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한문학이 현대문학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시의 종류와 특징
근체시금체시(今體詩)라고도 하며, 율시, 배율, 절구가 근체시에 속한다. 이 시체가 완성된 것은 당대(唐代)이며 심전기와 송지문에 이르러 오언율시의 격식이 확정되었다. 근체시는 먼저 매 구가 5~7자의 정형을 유지한 제언시(薺言時)가 되어야 하며, 동일한 글자를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기시된다. 이 외에 형식적 특징으로 압운법과 평측법, 대우법 등이 바르게 지켜져야 한다.(1) 근체시의 형식적 특징
① 압운법 : 짝수 구 마지막 글자에 반드시 동일한 운자를 쓰는 것을 뜻한다.
○○○○○
○○○○●
○○○○○
○○○○●
採藥忽迷路 (채약홀미로) 약캐다 홀연히 길을 잃고서
千峰秋葉裡 (천봉추엽리) 천봉을 휘감은 단풍속에 섰네.
山僧汲水歸 (산승급수귀) 스님이 물길어 돌아 들더니
林末茶煙起 (임말차연기) 수풀속 차연기 피어 오르네.
율곡 - 山中 (산중)
② 평측법 : 평측은 한자에 있는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매 글자의 평성과 측성을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뜻한다. 매우 복잡하고 예외적인 법칙도 다양한 규칙이다.
○○○●●
●●●○◎
○●○○●
○○○●◎
山中相送罷 (산중상송파) 그대를 보내고 홀로 돌아와
日暮掩柴扉 (일모엄시비) 사립문을 닫으니 해가 저문다
春草明年綠 (춘초명년녹) 봄오면 풀은 해마다 푸르지만
王孫歸不歸 (왕손귀불귀) 떠난 친구는 다시 올지 어떨지
○:평성 ●:측성
왕유 - 送別 (송별)
- 한자의 평측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성을 제외하고 상성, 거성, 입성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측성(仄聲)이라고 한다.
③ 대우법(대구법) : 율시에서 한 연의 상-하구가 서로 짝이 되게 하는 수사법
林亭秋己晩 (임정추기만)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騷客意無窮 (소객의무궁) 시인의 생각이 한이 없어라
遠水連天碧 (원수연천벽) 먼 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霜楓向日紅 (상풍향일홍) 서리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붉구나
山吐孤輪月 (산토고륜월)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 내고,
↕
江含萬里風 (강함만리풍) 강은 만리 바람을 머금는다
塞鴻何處去 (새홍하처거) 변방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聲斷暮雲中 (성단모운중) 외마디 소리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
율곡 - 花石亭 詩 (화석정 시)
(2) 근체시의 종류
① 절구 : 4구로써 완결되는 최소의 시편으로, 5자로 된 것은 오언절구라고 하며 7자로 된 것은 칠언절구라고 한다. 서술 형식이 율시의 반과 같다고 하여 소율시(小律詩), 반율시(半律詩)라고도 한다.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성법을 취하며, 현전하는 작품으로는 7언의 작품이 5언보다 우세에 있다.
7언 절구
이규보 - 春日訪山寺 (춘일방산사)
風和日暖鳥聲喧 (풍화일난조성훤) 바람 부드럽고 햇볕 따뜻해 새소리 시끄러운데
垂柳陰中半掩門 (수류음중반엄문) 수양버들 그늘 속에 반쯤 문이 닫혀있네
滿地落火僧醉臥 (만지낙화승취와) 뜰 가득 떨어진 꽃에 스님은 취해 누워있고
山家猶帶太平痕 (산가유대태평흔) 절에는 아직 그대로 태평스런 흔적 남아있구나
② 율시 : 한 편이 4운 8구로 된 근체시로, 대우와 압운, 평측 등의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두 구절을 1연으로 하여 제 1연을 수련(首聯), 제 2연을 함련(聯), 제 3연을 경련(頸聯), 제 4연을 미련(尾聯)이라고 한다. 율시는 수련과 미련을 제외한 함련과 경련에서 반드시 대우를 이루어야 한다.우리나라에는 오언율시보다 칠언율시가 더 많이 전하고 있다.
7언 율시_
두보 - 登高 (등고)
風急天高猿嘯哀,(풍급천고원소애)
渚淸沙白鳥飛蛔.(저청사백조비회)
無邊落木蕭蕭下,(무변낙목소소하)
不盡長江滾滾來.(부진장강곤곤내)
萬里悲秋常作客,(만리비추상작객)
百年多病獨登臺.(백년다병독등태)
艱難苦恨繁霜,(간난고한번상빈)
倒新停濁酒杯.(요도신정탁주배)
바람은 빠르고 하늘은 높아 원숭이 휘파람 소리 애
한국 한문학의 독자성
이것은 우리 동방의 문(文)이 송, 원의 문도 아니고 또 한, 당의 문도 아니며 바로 우리나라의 문인 것입니다. 마땅히 중국 역대의 문과 나란히 천지간에 행할 것이어늘, 어찌 민멸하여 전함이 없겠습니까?
- 서거정 <동문선서(東文選序)>
지금 무관 이덕무는 조선 사람이다. 산천과 지리가 중국과 다르고 언어와 요속의 시대가 한 당이 아니다. 만약 중국의 수법을 본뜨고 한 당의 문체를 답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수법이 고상할수록 뜻은 실제로 비속하게 되고, 문체가 한 당과 비슷할수록 말은 더욱 거짓이 되는 결과를 볼 뿐이다.
…….
우리나라의 방언을 문자로 옮기고 우리나라의 민요를 운율에 맞추기만 하면 자연히 문장이 이루어지고 진기가 발현된다. 답습을 일삼지 않고, 남의 것을 빌어오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온갖 것을 표현해 낼 수 있다.
…….
- 박지원 <영처고서(瓔處稿序)>
나는 나의 시가 당시와 비슷하다느니 송시와 비슷하다느니 하게 될까 두렵고, 오직 사람들이 허균의 시라고 말하게 하고 싶다.
- 허균 <여이손곡(與李蓀谷)>
- 우리 민족의 글에 대한 자주성과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한시의 독자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도 했고, 중국시의 형태에 맞추어 쓰려고 애쓸 필요 없이 우리의 생활 감정을 우리 나름의 소재와 시어로 표현하는 시임을 지칭하고 있다.
노정승의 시에 “길은 ‘평구역’에 그치고 강물은 ‘판사정’에 깊다. 버들 침침하니 ‘청파역’이 저물었고 / 하늘 개이니 ‘백악산’에 봄이로다.”란 것은 아주 좋다. 그 풀무질해서 만들어 낸 묘함이 있을뿐더러, 쇠를 넣어서 금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 해로우랴.
- 허균 <성수시화(惺詩話)>
- 쓸모없는 쇠로 여겨지던 조선의 지명, 물명이 문학 속에 들어가면 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우리말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조선의 시, 문을 추구한 것은 한문학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한문학이 현대문학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시의 종류와 특징
근체시금체시(今體詩)라고도 하며, 율시, 배율, 절구가 근체시에 속한다. 이 시체가 완성된 것은 당대(唐代)이며 심전기와 송지문에 이르러 오언율시의 격식이 확정되었다. 근체시는 먼저 매 구가 5~7자의 정형을 유지한 제언시(薺言時)가 되어야 하며, 동일한 글자를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기시된다. 이 외에 형식적 특징으로 압운법과 평측법, 대우법 등이 바르게 지켜져야 한다.(1) 근체시의 형식적 특징
① 압운법 : 짝수 구 마지막 글자에 반드시 동일한 운자를 쓰는 것을 뜻한다.
○○○○○
○○○○●
○○○○○
○○○○●
採藥忽迷路 (채약홀미로) 약캐다 홀연히 길을 잃고서
千峰秋葉裡 (천봉추엽리) 천봉을 휘감은 단풍속에 섰네.
山僧汲水歸 (산승급수귀) 스님이 물길어 돌아 들더니
林末茶煙起 (임말차연기) 수풀속 차연기 피어 오르네.
율곡 - 山中 (산중)
② 평측법 : 평측은 한자에 있는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매 글자의 평성과 측성을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뜻한다. 매우 복잡하고 예외적인 법칙도 다양한 규칙이다.
○○○●●
●●●○◎
○●○○●
○○○●◎
山中相送罷 (산중상송파) 그대를 보내고 홀로 돌아와
日暮掩柴扉 (일모엄시비) 사립문을 닫으니 해가 저문다
春草明年綠 (춘초명년녹) 봄오면 풀은 해마다 푸르지만
王孫歸不歸 (왕손귀불귀) 떠난 친구는 다시 올지 어떨지
○:평성 ●:측성
왕유 - 送別 (송별)
- 한자의 평측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성을 제외하고 상성, 거성, 입성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측성(仄聲)이라고 한다.
③ 대우법(대구법) : 율시에서 한 연의 상-하구가 서로 짝이 되게 하는 수사법
林亭秋己晩 (임정추기만)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騷客意無窮 (소객의무궁) 시인의 생각이 한이 없어라
遠水連天碧 (원수연천벽) 먼 물은 하늘에 닿아 푸르고,
↕
霜楓向日紅 (상풍향일홍) 서리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붉구나
山吐孤輪月 (산토고륜월) 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 내고,
↕
江含萬里風 (강함만리풍) 강은 만리 바람을 머금는다
塞鴻何處去 (새홍하처거) 변방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聲斷暮雲中 (성단모운중) 외마디 소리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
율곡 - 花石亭 詩 (화석정 시)
(2) 근체시의 종류
① 절구 : 4구로써 완결되는 최소의 시편으로, 5자로 된 것은 오언절구라고 하며 7자로 된 것은 칠언절구라고 한다. 서술 형식이 율시의 반과 같다고 하여 소율시(小律詩), 반율시(半律詩)라고도 한다.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성법을 취하며, 현전하는 작품으로는 7언의 작품이 5언보다 우세에 있다.
7언 절구
이규보 - 春日訪山寺 (춘일방산사)
風和日暖鳥聲喧 (풍화일난조성훤) 바람 부드럽고 햇볕 따뜻해 새소리 시끄러운데
垂柳陰中半掩門 (수류음중반엄문) 수양버들 그늘 속에 반쯤 문이 닫혀있네
滿地落火僧醉臥 (만지낙화승취와) 뜰 가득 떨어진 꽃에 스님은 취해 누워있고
山家猶帶太平痕 (산가유대태평흔) 절에는 아직 그대로 태평스런 흔적 남아있구나
② 율시 : 한 편이 4운 8구로 된 근체시로, 대우와 압운, 평측 등의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두 구절을 1연으로 하여 제 1연을 수련(首聯), 제 2연을 함련(聯), 제 3연을 경련(頸聯), 제 4연을 미련(尾聯)이라고 한다. 율시는 수련과 미련을 제외한 함련과 경련에서 반드시 대우를 이루어야 한다.우리나라에는 오언율시보다 칠언율시가 더 많이 전하고 있다.
7언 율시_
두보 - 登高 (등고)
風急天高猿嘯哀,(풍급천고원소애)
渚淸沙白鳥飛蛔.(저청사백조비회)
無邊落木蕭蕭下,(무변낙목소소하)
不盡長江滾滾來.(부진장강곤곤내)
萬里悲秋常作客,(만리비추상작객)
百年多病獨登臺.(백년다병독등태)
艱難苦恨繁霜,(간난고한번상빈)
倒新停濁酒杯.(요도신정탁주배)
바람은 빠르고 하늘은 높아 원숭이 휘파람 소리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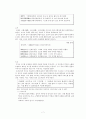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