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성의 오류’에 빠진 부동산 정책
균형잃은 국가균형 발전정책
수도권 발전 가로막는 균형발전 정책
균형잃은 국가균형 발전정책
수도권 발전 가로막는 균형발전 정책
본문내용
쏟고 있다. (효율성) 교육정책은 우수한 학생의 학습 의욕을 꺾고, 주택정책은 비싼 주택을 소유한 자를 죄악시하고 있다. 성적이 나쁜 학생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고,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복지를 높이는 일이 진정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데도 말이다.
◆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는 균형발전 정책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도 수도권 규제를 통해 앞서 나가는 자의 발목을 잡는 데 주력해 왔다. 이에 비해 제2기 국가균형 발전정책은 뒤처진 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에 의존했던 과거의 간접적
인 방법에 비하면, 낙후지역 입지 기업에 직접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명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해 수도권의 손발을 묶어 놓았던 각종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반쪽짜리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이중 차별을 감수해야만 한다.(형평성)
더욱 가관인 것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정도를 결정하는 지역 분류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9월19일 공청회를 통해 전국의 234개 시·군·구를 지역 발전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한 시안을 발표하고, 낙후 지역일수록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계 일부에서선 지역 발전이나 낙후 정도를 시·도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차기 대통령이 재검토해야
차기 대통령은 행복도시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서울의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면서 행복도시를 지을 필요가 있는지 더 늦기 전에 다시 살펴야 한다. 이미 토지 보상이 끝난 해당 부지는 교육·과학도시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하면 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오히려 교육·과학도시가 더 높다.
혁신도시 건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저하를 무릅쓰고 혁신도시를 지어 공공기관을 분산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지방도시 인근에 신도시 형태로 지어지는 혁신도시는 오히려 기존 도시를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굳이 공공기관을 몇 개라도 옮기겠다면 꼭 필요한 기관만 기존 지방 도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적합성)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은 ‘국토균형 개발’이란 시대착오적인 목표부터 버려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개발이 아니라 전 국민이 잘사는 일이다. 전 국민이 잘살기 위해 온 국토가 모두 도시로 개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은 농촌으로, 전원은 전원으로 남겨 나름대로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로 개발할 곳은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방에 과감하게 세원(稅源)을 이전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장소’에 초점을 맞춘 균형개발 이론은 이미 20세기에 흘러간 지역발전론이다. 지나간 이론에 매달려 21세기에도 국토균형개발에 집착하는 동안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은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다.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도권은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혀 그나마 있던 경쟁력조차 잃어 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장소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집중억제책을 펴던 영국·프랑스도 이제는 런던과 파리의 경쟁력이 다른 지역까지 먹여 살린다고 시각을 바꾼 지 오래까지
◆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는 균형발전 정책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도 수도권 규제를 통해 앞서 나가는 자의 발목을 잡는 데 주력해 왔다. 이에 비해 제2기 국가균형 발전정책은 뒤처진 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에 의존했던 과거의 간접적
인 방법에 비하면, 낙후지역 입지 기업에 직접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명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해 수도권의 손발을 묶어 놓았던 각종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반쪽짜리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이중 차별을 감수해야만 한다.(형평성)
더욱 가관인 것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정도를 결정하는 지역 분류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9월19일 공청회를 통해 전국의 234개 시·군·구를 지역 발전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한 시안을 발표하고, 낙후 지역일수록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계 일부에서선 지역 발전이나 낙후 정도를 시·도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차기 대통령이 재검토해야
차기 대통령은 행복도시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서울의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면서 행복도시를 지을 필요가 있는지 더 늦기 전에 다시 살펴야 한다. 이미 토지 보상이 끝난 해당 부지는 교육·과학도시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하면 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오히려 교육·과학도시가 더 높다.
혁신도시 건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저하를 무릅쓰고 혁신도시를 지어 공공기관을 분산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지방도시 인근에 신도시 형태로 지어지는 혁신도시는 오히려 기존 도시를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굳이 공공기관을 몇 개라도 옮기겠다면 꼭 필요한 기관만 기존 지방 도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적합성)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은 ‘국토균형 개발’이란 시대착오적인 목표부터 버려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개발이 아니라 전 국민이 잘사는 일이다. 전 국민이 잘살기 위해 온 국토가 모두 도시로 개발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은 농촌으로, 전원은 전원으로 남겨 나름대로 특성을 살리면서 도시로 개발할 곳은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방에 과감하게 세원(稅源)을 이전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장소’에 초점을 맞춘 균형개발 이론은 이미 20세기에 흘러간 지역발전론이다. 지나간 이론에 매달려 21세기에도 국토균형개발에 집착하는 동안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은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다.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도권은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혀 그나마 있던 경쟁력조차 잃어 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장소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집중억제책을 펴던 영국·프랑스도 이제는 런던과 파리의 경쟁력이 다른 지역까지 먹여 살린다고 시각을 바꾼 지 오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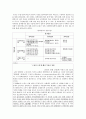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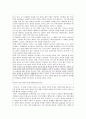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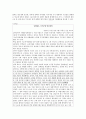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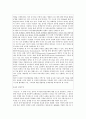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