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속, 아우성 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요점 정리>
성격-서경적, 서정적
어조-부재 대상을 그리는 간절한 어조
제재-푸른 산의 모습
주제-건강한 세계 도래에의 열망
출전-<해>(1949)
<어휘와 구절>
너멋 골 : 저 너머의 골짜기.
만나도질 : 만나질지도 모르는
보고지운 : 보고싶은.
티어 : 환히 비치어.
*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너멋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 시적 자아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인 \'청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연이다. 열거법, 은유법, 활유법, 반복법 등을 통해 산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 산아, 푸른 산아. 네가슴 ~ 난혼자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청산\'속에서 \'볼이 고운 사람\'의 부재를 절감하고 있다. 이는 \'청산\'이 아름다움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자각을 표현한 구절이라 할 수있다.
*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티끌 부는 세상\'과 \'벌레 같은 세상\'은 \'청산\'밖의 현실 공간을 가리키는데, 이는 이 시의 창작 시기와 연관시켜 보면,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에 \'불이 고운 사람\'이 살고 있고 언제간는 그가 \'나\'의 \'청산\'으로 와 줄 것 같다는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였다.
* 누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속 ~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물결 같은 사람\'은 해방의 감격에 들뜬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 연의 \'티끌 부는 세상\',\'벌레 같은 세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철도 없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에서 \'볼이 고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철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행 구분은 없고 연 구분만 있는 4연 구성의 산문시이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다양한 구사와 반복적 어구를 통해 형성된 유장하면서도 운치 있는 산문 율조 속에는 자연의 생명력을 표상하는 시어들과 비관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부정적 어사의 시어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두진의 초기시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비관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좌절하지 않고 시인 특유의 미래 지향적인 낙원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특징을 갖는다. 이 작품 역시 그러한 특징을 시어 사용에서부터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안 오고\'·\'안 불고\'·\'가버린\'·\'잊어버린\'·\'오지 않는\' 등의 부정적 의미의 시어들이 빈번히 나타나 있는 한편, 시간적 배경도 \'밤\'·\'어둠\'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자연의 생명력이 강하게 분출됨으로써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현실 상황을 상대적으로 상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결국 \'청산\'에서 발견한 소멸과 생성으로서의 자연의 원리를 상실과 회복으로서의 역사, 인간사의 원리로 승화시킴으로써 비관적 현실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자는 소멸과 생성의 주기적 순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는 \'청산\'을 통해, 현실은 비록 \'어둠\', \'밤\'과 같이 비관적이지만, 그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 머지않아 \'밝은 하늘 빛난 아침\'이 찾아올 것이라는 미래 지향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소멸과 생성으로서의 자연의 원리를 표층 구조로, 상실과 회복으로서의 역사의 원리를 심층 구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연에서는 주로 \'청산\'의 생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우뚝 솟은 푸른 산\',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 \'숱한 나무가 무성히 우거진 산\', \'금빛 햇살이 내려오는 산\'에서 드러나듯 \'청산\'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명력의 표상으로 제시된다. 이렇듯 자연은 소멸과 생성의 주기적 순환의 과정을 통해 영원한 생명력을 의미하게 된다. \'철철철\'은 산의 푸르름을 드러내는 표면적 의미 외에 나무의 무성함, 금빛 햇살의 순수함까지도 함축하는 복합적 의미이며, \'둥둥\'은 구름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한편, 산과 화자를 연결시켜 정중동(靜中動)의 술렁임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멋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뻐꾸기\'와 같은 구절을 통해 비관적 현실의 일단을 나타내기도 한다.
2연에서는 이러한 비관적 현실 인식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산의 생명력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제시된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잊어버린 하늘\'과 \'볼이 고운 사람\'으로, 비관적인 현실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동경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줄줄줄\'은 눈물과 물소리에서 비롯된 의태어로 산의 가슴과 화자의 가슴을 동일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3연에서는 비관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미래 지향적 태도가 제시된다.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에서 알 수 있듯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화자는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틔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이 오듯, 그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렇게 화자는 청산에서 발견한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인간사, 역사에서의 상실과 회복의 원리로 승화시킴으로써 비관적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4연에서는 \'너\'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표명되고 있다.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서 \'혼자서 철도 없이\' \'너\'만 그리겠다는 동경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시상(詩想)의 전개
이 시는 모두 4연으로 이루어진 서정 서경성을 띤 작품이다. 이 시의 특이한 점은 청산을 배경으로 하여 소망스런 대상의 출현을 반복 어법과 다양한 표현에 의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
<요점 정리>
성격-서경적, 서정적
어조-부재 대상을 그리는 간절한 어조
제재-푸른 산의 모습
주제-건강한 세계 도래에의 열망
출전-<해>(1949)
<어휘와 구절>
너멋 골 : 저 너머의 골짜기.
만나도질 : 만나질지도 모르는
보고지운 : 보고싶은.
티어 : 환히 비치어.
*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너멋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 시적 자아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인 \'청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연이다. 열거법, 은유법, 활유법, 반복법 등을 통해 산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 산아, 푸른 산아. 네가슴 ~ 난혼자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청산\'속에서 \'볼이 고운 사람\'의 부재를 절감하고 있다. 이는 \'청산\'이 아름다움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자각을 표현한 구절이라 할 수있다.
*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티끌 부는 세상\'과 \'벌레 같은 세상\'은 \'청산\'밖의 현실 공간을 가리키는데, 이는 이 시의 창작 시기와 연관시켜 보면,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에 \'불이 고운 사람\'이 살고 있고 언제간는 그가 \'나\'의 \'청산\'으로 와 줄 것 같다는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였다.
* 누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속 ~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물결 같은 사람\'은 해방의 감격에 들뜬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 연의 \'티끌 부는 세상\',\'벌레 같은 세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철도 없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티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에서 \'볼이 고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철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행 구분은 없고 연 구분만 있는 4연 구성의 산문시이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다양한 구사와 반복적 어구를 통해 형성된 유장하면서도 운치 있는 산문 율조 속에는 자연의 생명력을 표상하는 시어들과 비관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부정적 어사의 시어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두진의 초기시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비관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좌절하지 않고 시인 특유의 미래 지향적인 낙원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특징을 갖는다. 이 작품 역시 그러한 특징을 시어 사용에서부터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안 오고\'·\'안 불고\'·\'가버린\'·\'잊어버린\'·\'오지 않는\' 등의 부정적 의미의 시어들이 빈번히 나타나 있는 한편, 시간적 배경도 \'밤\'·\'어둠\'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자연의 생명력이 강하게 분출됨으로써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현실 상황을 상대적으로 상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결국 \'청산\'에서 발견한 소멸과 생성으로서의 자연의 원리를 상실과 회복으로서의 역사, 인간사의 원리로 승화시킴으로써 비관적 현실 인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자는 소멸과 생성의 주기적 순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는 \'청산\'을 통해, 현실은 비록 \'어둠\', \'밤\'과 같이 비관적이지만, 그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 머지않아 \'밝은 하늘 빛난 아침\'이 찾아올 것이라는 미래 지향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소멸과 생성으로서의 자연의 원리를 표층 구조로, 상실과 회복으로서의 역사의 원리를 심층 구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연에서는 주로 \'청산\'의 생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우뚝 솟은 푸른 산\',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 \'숱한 나무가 무성히 우거진 산\', \'금빛 햇살이 내려오는 산\'에서 드러나듯 \'청산\'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명력의 표상으로 제시된다. 이렇듯 자연은 소멸과 생성의 주기적 순환의 과정을 통해 영원한 생명력을 의미하게 된다. \'철철철\'은 산의 푸르름을 드러내는 표면적 의미 외에 나무의 무성함, 금빛 햇살의 순수함까지도 함축하는 복합적 의미이며, \'둥둥\'은 구름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한편, 산과 화자를 연결시켜 정중동(靜中動)의 술렁임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멋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뻐꾸기\'와 같은 구절을 통해 비관적 현실의 일단을 나타내기도 한다.
2연에서는 이러한 비관적 현실 인식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산의 생명력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제시된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잊어버린 하늘\'과 \'볼이 고운 사람\'으로, 비관적인 현실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동경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줄줄줄\'은 눈물과 물소리에서 비롯된 의태어로 산의 가슴과 화자의 가슴을 동일화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3연에서는 비관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미래 지향적 태도가 제시된다.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에서 알 수 있듯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화자는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틔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이 오듯, 그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렇게 화자는 청산에서 발견한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인간사, 역사에서의 상실과 회복의 원리로 승화시킴으로써 비관적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
4연에서는 \'너\'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표명되고 있다.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서 \'혼자서 철도 없이\' \'너\'만 그리겠다는 동경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시상(詩想)의 전개
이 시는 모두 4연으로 이루어진 서정 서경성을 띤 작품이다. 이 시의 특이한 점은 청산을 배경으로 하여 소망스런 대상의 출현을 반복 어법과 다양한 표현에 의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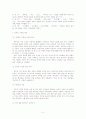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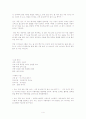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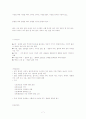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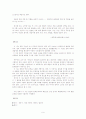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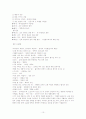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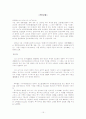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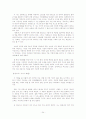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