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문
Ⅱ. 본론
1. 4~6C 고대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2. 임나일본부란 무엇인가?
3. 임나일본부에 관한 제학설
4. 역사 자료 근거
Ⅲ. 결론
Ⅱ. 본론
1. 4~6C 고대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2. 임나일본부란 무엇인가?
3. 임나일본부에 관한 제학설
4. 역사 자료 근거
Ⅲ. 결론
본문내용
식민지배 하였다는 쪽으로만 주장하였다. 한국 역시도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에 대한 논의를 터부시 하고,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 나감으로 해서 고대 한반도 남부에 왜가 미친 영향을 덮어두려는 경향까지 있었다.
이제 과연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4C~6C까지의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고자 한다.
1.임나일본부 명칭에 대한 의견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란 명칭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만 존재하는 단어로서, 『일본서기』에 있어서 임나(任那)라는 단어는 총215회, 일본부(日本府)라는 단어는 35회에 걸쳐 나타난다. 이 임나일본부의 존재여부 또는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당시(4C~6C)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임나(任那) 라는 명칭은 임나일본부 기사를 싣고 있는 일본의『일본서기』뿐만 아니라, 한국측 기록에서도 나타난다.『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46 (열전 제6) 강수편』에 臣本任那加良人 名牛頭(신은 본래 임나가량인으로 이름은 우두입니다)이라는 기록과,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의 任那加羅從拔城(임나가라의 종발성), 그리고 진경대사탑비문(眞鏡國師塔碑文)에 임나왕족(任那王族)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본측 사료와, 한국측 사료를 종합하였을때 임나일본부의 존재여부를 떠나 당시 임나라는 명칭이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임나라는 지역이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구야국(狗倻國)또는 금관가야(金官伽倻)라 불리우던 지금의 경남 김해(金海)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임나라는 것이 존재하였음은 부정할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임나일본부의 일본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뒤따른다. “일본(日本)”이란 국호가 7C 이후에나 등장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문무왕(文武王)』에도 “왜국(倭國)이 이름을 고쳐 일본(日本)이라 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해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붙였다고 하였다(倭國更號日本 自言近日所出以爲名)”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도 일본이란 국호는 7C 후기에나 등장하는 단어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왜(倭), 또는 대화(大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임나와 일본이란 단어의 출처를 종합하여 볼때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에 있어서 임나라는 명칭은 4~5C 한반도 남부의 일부분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하나, 당시 일본이란 국호가 없었으므로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것은 당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8C 일본서기가 편찬되면서 만들어진, 창작된 용어라 추정 할 수 있다.
2. 고대 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왜의 존재
하지만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명칭이 부정된다고 하여, 고대 한반도 남부에 왜세력이 정치적군사적으로 미친 영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막연한 민족감정에 의해 느끼는 바대로 왜세력이 미개하고, 미약한 존재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기사가 나오는 일본서기를 이외의 한중일(韓中日) 삼국의 여러 기록에 왜가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계속해서 개입했던 것이 드러나고 당시 왜의 세력역시, 한반도에 개입할 정도의 세력이었음을 유물로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중국 송서(宋書)
중국 송서(宋書)에 보면은 송 태조 원가이년(宋 太祖 元嘉二年)에 왜왕 찬(讚)이 사신을 보내어 스스로 사지절도독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육국제군사안동대장국왜국왕(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를 칭하자, 이후 송나라에서는 사지절도독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육국제군사안동대장국왜국왕(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로 봉한 기사가 있다. 왜왕이 고구려를 제외한 한반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관작을 요청하자, 송나라에서는 백제를 제외하고 가라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당시 북조(北朝)와 대치하고 있던 송나라가 우군(友軍)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왜에 이러한 관작을 내린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에서 관작을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왜가 百濟, 新羅, 任那, 秦韓, 慕韓등의 한반도 남부의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元嘉15年 珍, 昇明元年 武, 昇明2年 등 총3차례)하였다는 것이다. 왜 왜는 계속해서 한반도 남부의 영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 것일까? 그것은 왜가 단순히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고 싶어하는 영토적 욕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즉 왜가 한반도 남부의 지역과 모종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를 송나라에 관작을 맺는 형태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했다고 추정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왜가 계속해서 임나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멸망한 임나의 땅을 되찾고자 갈망하는 여러 기사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광개토대왕비문(廣開土大王碑文)”
광개토대왕비의 한일관계 기사를 생각하면 “백제와 신라는 원래 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등을 깨고 신민으로 삼았다(百殘新羅 是屬民由來朝貢 倭以辛卯年 渡□破百殘□□ 新羅以爲臣民)”는 내용의 신묘년 기사를 떠올리곤 하는데, 이 기사의 해석에 관해서는 “띄어쓰기를 새롭게 하는 주장”에서부터 심지어 “석회조작설(이진희)”까지 여럿 주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만을 가지고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과 왜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기사의 내용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자년 기사와 경진년 기사이다. 경자년 기사는 “영락 10년(400)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男居城)을 거쳐 신라성(新羅城)에 이르니, 그 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관군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의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구려 군에
이제 과연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4C~6C까지의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고자 한다.
1.임나일본부 명칭에 대한 의견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란 명칭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만 존재하는 단어로서, 『일본서기』에 있어서 임나(任那)라는 단어는 총215회, 일본부(日本府)라는 단어는 35회에 걸쳐 나타난다. 이 임나일본부의 존재여부 또는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당시(4C~6C)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임나(任那) 라는 명칭은 임나일본부 기사를 싣고 있는 일본의『일본서기』뿐만 아니라, 한국측 기록에서도 나타난다.『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46 (열전 제6) 강수편』에 臣本任那加良人 名牛頭(신은 본래 임나가량인으로 이름은 우두입니다)이라는 기록과,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의 任那加羅從拔城(임나가라의 종발성), 그리고 진경대사탑비문(眞鏡國師塔碑文)에 임나왕족(任那王族)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본측 사료와, 한국측 사료를 종합하였을때 임나일본부의 존재여부를 떠나 당시 임나라는 명칭이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임나라는 지역이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구야국(狗倻國)또는 금관가야(金官伽倻)라 불리우던 지금의 경남 김해(金海)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임나라는 것이 존재하였음은 부정할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임나일본부의 일본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뒤따른다. “일본(日本)”이란 국호가 7C 이후에나 등장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문무왕(文武王)』에도 “왜국(倭國)이 이름을 고쳐 일본(日本)이라 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해뜨는 곳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붙였다고 하였다(倭國更號日本 自言近日所出以爲名)”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도 일본이란 국호는 7C 후기에나 등장하는 단어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왜(倭), 또는 대화(大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임나와 일본이란 단어의 출처를 종합하여 볼때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에 있어서 임나라는 명칭은 4~5C 한반도 남부의 일부분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하나, 당시 일본이란 국호가 없었으므로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것은 당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8C 일본서기가 편찬되면서 만들어진, 창작된 용어라 추정 할 수 있다.
2. 고대 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왜의 존재
하지만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명칭이 부정된다고 하여, 고대 한반도 남부에 왜세력이 정치적군사적으로 미친 영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막연한 민족감정에 의해 느끼는 바대로 왜세력이 미개하고, 미약한 존재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기사가 나오는 일본서기를 이외의 한중일(韓中日) 삼국의 여러 기록에 왜가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 계속해서 개입했던 것이 드러나고 당시 왜의 세력역시, 한반도에 개입할 정도의 세력이었음을 유물로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중국 송서(宋書)
중국 송서(宋書)에 보면은 송 태조 원가이년(宋 太祖 元嘉二年)에 왜왕 찬(讚)이 사신을 보내어 스스로 사지절도독왜백제신라임나진한모한육국제군사안동대장국왜국왕(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를 칭하자, 이후 송나라에서는 사지절도독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육국제군사안동대장국왜국왕(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로 봉한 기사가 있다. 왜왕이 고구려를 제외한 한반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관작을 요청하자, 송나라에서는 백제를 제외하고 가라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당시 북조(北朝)와 대치하고 있던 송나라가 우군(友軍)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왜에 이러한 관작을 내린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에서 관작을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왜가 百濟, 新羅, 任那, 秦韓, 慕韓등의 한반도 남부의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元嘉15年 珍, 昇明元年 武, 昇明2年 등 총3차례)하였다는 것이다. 왜 왜는 계속해서 한반도 남부의 영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 것일까? 그것은 왜가 단순히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고 싶어하는 영토적 욕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즉 왜가 한반도 남부의 지역과 모종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를 송나라에 관작을 맺는 형태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했다고 추정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왜가 계속해서 임나의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멸망한 임나의 땅을 되찾고자 갈망하는 여러 기사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광개토대왕비문(廣開土大王碑文)”
광개토대왕비의 한일관계 기사를 생각하면 “백제와 신라는 원래 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등을 깨고 신민으로 삼았다(百殘新羅 是屬民由來朝貢 倭以辛卯年 渡□破百殘□□ 新羅以爲臣民)”는 내용의 신묘년 기사를 떠올리곤 하는데, 이 기사의 해석에 관해서는 “띄어쓰기를 새롭게 하는 주장”에서부터 심지어 “석회조작설(이진희)”까지 여럿 주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만을 가지고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과 왜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기사의 내용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자년 기사와 경진년 기사이다. 경자년 기사는 “영락 10년(400)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男居城)을 거쳐 신라성(新羅城)에 이르니, 그 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관군이 막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의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구려 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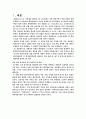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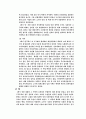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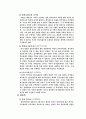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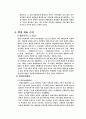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