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김소희제 춘향가의 소리대목 구성
3. 김소희제 춘향가의 음악적 특징
4. 김소희제 춘향가의 미 : 결론
2. 김소희제 춘향가의 소리대목 구성
3. 김소희제 춘향가의 음악적 특징
4. 김소희제 춘향가의 미 : 결론
본문내용
누구나 경복(敬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병욱, 「김소희 춘향가 음반 해설서」 서울음반, 1995
위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소희는 천부적인 목을 타고났는데, 그 음색은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고운 목으로 흔히 평가되었다. 또한 그녀의 소리는 남성판소리와 구분되는 여성판소리의 진수로 평가되는데, 박봉술의 소리와 비교하여 보면 김소희의 아기자기함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김소희의 음반을 들어봐도 그의 성음이 얼마나 여성스러운지를 금새 확인할 수 있으며, 그녀의 제자인 신영희에게도 너무 남자처럼 힘주어 부르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스러움과는 달리, <군로사령> 대목의 경우에는 김소희 역시 매우 씩씩하고 거뜬거뜬히 설렁제를 구사하면서 남성스러운 씩씩함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잦은 기교가 들어가기 보다는 매우 간결하면서 힘차게 부르는데, 다음 [악보5]와 같이 길게 음을 끌 때에도 요성을 사용하지 않고 쭉쭉 뻗어나가며, [악보6]의 제1장단에서는 “사령이” 의 “이” 부분에서 목을 뒤집는 기교를 사용하며, 옛 명창들이 흔히 사용하였던 뒤집는 목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
[악보5] 김소희 <군로사령> 제17-18장단
[악보6] 김소희 <군로사령> 제1장단
또한 [악보7]에서처럼 소리 지르며 끝을 짧게 끊는 다던지, [악보8]에서처럼 정확한 음을 짚지 않으면서 크게 소리지르듯 외치는 기법들이 흔히 사용되는데, 이처럼 김소희는 각 대목의 상황에 따라서 남성적인 힘찬 소리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악보7] 김소희 <군로사령> 제25장단
[악보8] 김소희 <군로사령> 제39장단
즉, 그녀는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운 소리를 추구하면서도 각 대목의 상황에 맞게 힘찬 남성소리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의 만정제 춘향가를 구성함에 있어서 각 대목의 사설 분위기에 맞는 소리들을 선택하여 구성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소희가 즐겨 사용하였던 소리 기교들을 살펴보면, “포깍목”과 “방울목”을 들 수 있다. 신영희 대담. (일시:2004.9.2/ 장소:송파구 방이동 신영희 국악연구소/ 진행:신은주)
“포깍목”은 “서자침”, “서대침”, “혀대침” 등으로도 불리는데, “ㅎ” 발음을 내면서 소리를 짧게 끊으며 쳐 올리는 기교를 말한다. 다음 [악보9]는 김소희의 <비맞인 제비같이>의 제7장단으로, 김소희는 포깍목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승희의 경우에는 이 대목에서 포깍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 이외에도 제18, 44장단 등에서 최승희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포깍목을 사용한다.
[악보9] 김소희 <비맞인 제비같이> 포깍목 사용 부분 : 제7장단
김소희가 “방울목”을 자주, 잘 사용했다는 신영희의 설명에 의하면, 방울목이란 “똥글똥글하게 빠돌처럼 만들어 내는 목으로, “목으으으을” 처럼, 야무지게 두개를 똑같이 채는 목”을 말한다. 『명인명창』의 「판소리 용어풀이집」331쪽에 의하면, 방울목은 둥글둥글 굴려내는 목소리로 설명되고 있다.
이 목은 다음 [악보10,11]에서처럼 소리를 둥그렇게 밀어 올리면서 채는 목을 빠르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인데, 실제로 김소희 소리를 채보해 보면, 이 목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10] 김소희 <비맞인 제비같이> 방울목 사용 부분 : 제23장단
[악보11] 김소희 <옥중가> 방울목 사용 부분 : 제25장단
이상, 김소희 춘향가의 음악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김소희는 박봉술에 비하여서는 조금 느린 속도로 소리를 부르면서 다양한 기교들을 사용하며 여성스럽게 소리를 꾸며 부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승희의 복잡한 붙임새나 선율 진행에 비하여서는 간단하게 부르고 있는데, 정정렬제 춘향가의 특징인 엇붙임의 경우 그 사용을 조금 절제하고, 자진모리로 거뜬거뜬 넘어가는 대목에서는 선율의 도약 진행 사용을 절제하며 평평하고 간결하게 선율을 이끌어 나갔다. 즉, 고제이면서 남성적인 소리인 박봉술 춘향가에 비하면 선율에 여러 기교들과 장식들을 섞고 서편소리의 특징인 소리를 길게 늘이는 특성이 나타나나, 복잡한 기교가 뛰어난 정정렬제 최승희 춘향가에 비하여서는 좀 더 절제하여 소리하면서 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음악 비교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결과는, 김소희 명창이 오랜 시간 정정렬에게 소리를 배워 서편소리에 훨씬 익숙하였으나 그가 선호한 소리는 송만갑의 고제 스타일 소리였다는 신영희의 증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목기교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포깍목이나 방울목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거친 느낌의 포깍목과 둥글게 굴리며 야무지게 쳐올리는 방울목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강하고 부드러운 소리 느낌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목을 뒤집는 발성이라던지, 그 외에도 판소리에서 잘 사용되는 목의 기교들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군로사령> 대목과 같이 설렁제 대목으로 남성적인 호기로움이 살려져야 하는 대목에서는 거뜬거뜬하고 힘차게 설렁제의 느낌을 아주 잘 살려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맑고 고운 목을 지녀서 부드러운 여성소리로 소리하면서도, 각 대목에 맞게 때로는 남성적으로 소리를 내지르기도 한 것으로 보아, 김소희는 소리의 맛을 적절히 살릴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그러한 능력들이 춘향가에서 훌륭히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4. 김소희제 춘향가의 미 : 결론
만정제 춘향가는 김소희가 자신이 배운 소리들을 재편집하여 새롭게 구성한 춘향가 바디로, 스승인 송만갑 정정렬 정응민의 소리 대목들이 적절하게 섞여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김소희 명창은 자신의 소리제인 만정제 춘향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배운 스승들의 소리 중 각 대목의 상황에 적절한 소리들을 변화 없이 그대로 따오는 방식을 취했다. 만남의 부분에서는 젊은 청춘 남녀의 만남이 아기자기 하면서도 예에 맞게 그려져 있는 정응민제를 주로 따오고, 이별의 부분에서는 그 슬픈 느낌이 짙은 서름조를 통해 매우 잘 드러나 있는 정정렬제를, 갈까부다 이후의 옥중가 장면에서는 춘향의 절개가 고제의
위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소희는 천부적인 목을 타고났는데, 그 음색은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고운 목으로 흔히 평가되었다. 또한 그녀의 소리는 남성판소리와 구분되는 여성판소리의 진수로 평가되는데, 박봉술의 소리와 비교하여 보면 김소희의 아기자기함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김소희의 음반을 들어봐도 그의 성음이 얼마나 여성스러운지를 금새 확인할 수 있으며, 그녀의 제자인 신영희에게도 너무 남자처럼 힘주어 부르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스러움과는 달리, <군로사령> 대목의 경우에는 김소희 역시 매우 씩씩하고 거뜬거뜬히 설렁제를 구사하면서 남성스러운 씩씩함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잦은 기교가 들어가기 보다는 매우 간결하면서 힘차게 부르는데, 다음 [악보5]와 같이 길게 음을 끌 때에도 요성을 사용하지 않고 쭉쭉 뻗어나가며, [악보6]의 제1장단에서는 “사령이” 의 “이” 부분에서 목을 뒤집는 기교를 사용하며, 옛 명창들이 흔히 사용하였던 뒤집는 목을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
[악보5] 김소희 <군로사령> 제17-18장단
[악보6] 김소희 <군로사령> 제1장단
또한 [악보7]에서처럼 소리 지르며 끝을 짧게 끊는 다던지, [악보8]에서처럼 정확한 음을 짚지 않으면서 크게 소리지르듯 외치는 기법들이 흔히 사용되는데, 이처럼 김소희는 각 대목의 상황에 따라서 남성적인 힘찬 소리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악보7] 김소희 <군로사령> 제25장단
[악보8] 김소희 <군로사령> 제39장단
즉, 그녀는 전체적으로 여성스러운 소리를 추구하면서도 각 대목의 상황에 맞게 힘찬 남성소리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의 만정제 춘향가를 구성함에 있어서 각 대목의 사설 분위기에 맞는 소리들을 선택하여 구성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소희가 즐겨 사용하였던 소리 기교들을 살펴보면, “포깍목”과 “방울목”을 들 수 있다. 신영희 대담. (일시:2004.9.2/ 장소:송파구 방이동 신영희 국악연구소/ 진행:신은주)
“포깍목”은 “서자침”, “서대침”, “혀대침” 등으로도 불리는데, “ㅎ” 발음을 내면서 소리를 짧게 끊으며 쳐 올리는 기교를 말한다. 다음 [악보9]는 김소희의 <비맞인 제비같이>의 제7장단으로, 김소희는 포깍목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승희의 경우에는 이 대목에서 포깍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 이외에도 제18, 44장단 등에서 최승희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포깍목을 사용한다.
[악보9] 김소희 <비맞인 제비같이> 포깍목 사용 부분 : 제7장단
김소희가 “방울목”을 자주, 잘 사용했다는 신영희의 설명에 의하면, 방울목이란 “똥글똥글하게 빠돌처럼 만들어 내는 목으로, “목으으으을” 처럼, 야무지게 두개를 똑같이 채는 목”을 말한다. 『명인명창』의 「판소리 용어풀이집」331쪽에 의하면, 방울목은 둥글둥글 굴려내는 목소리로 설명되고 있다.
이 목은 다음 [악보10,11]에서처럼 소리를 둥그렇게 밀어 올리면서 채는 목을 빠르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인데, 실제로 김소희 소리를 채보해 보면, 이 목을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10] 김소희 <비맞인 제비같이> 방울목 사용 부분 : 제23장단
[악보11] 김소희 <옥중가> 방울목 사용 부분 : 제25장단
이상, 김소희 춘향가의 음악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김소희는 박봉술에 비하여서는 조금 느린 속도로 소리를 부르면서 다양한 기교들을 사용하며 여성스럽게 소리를 꾸며 부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승희의 복잡한 붙임새나 선율 진행에 비하여서는 간단하게 부르고 있는데, 정정렬제 춘향가의 특징인 엇붙임의 경우 그 사용을 조금 절제하고, 자진모리로 거뜬거뜬 넘어가는 대목에서는 선율의 도약 진행 사용을 절제하며 평평하고 간결하게 선율을 이끌어 나갔다. 즉, 고제이면서 남성적인 소리인 박봉술 춘향가에 비하면 선율에 여러 기교들과 장식들을 섞고 서편소리의 특징인 소리를 길게 늘이는 특성이 나타나나, 복잡한 기교가 뛰어난 정정렬제 최승희 춘향가에 비하여서는 좀 더 절제하여 소리하면서 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음악 비교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결과는, 김소희 명창이 오랜 시간 정정렬에게 소리를 배워 서편소리에 훨씬 익숙하였으나 그가 선호한 소리는 송만갑의 고제 스타일 소리였다는 신영희의 증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목기교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포깍목이나 방울목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거친 느낌의 포깍목과 둥글게 굴리며 야무지게 쳐올리는 방울목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강하고 부드러운 소리 느낌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목을 뒤집는 발성이라던지, 그 외에도 판소리에서 잘 사용되는 목의 기교들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군로사령> 대목과 같이 설렁제 대목으로 남성적인 호기로움이 살려져야 하는 대목에서는 거뜬거뜬하고 힘차게 설렁제의 느낌을 아주 잘 살려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맑고 고운 목을 지녀서 부드러운 여성소리로 소리하면서도, 각 대목에 맞게 때로는 남성적으로 소리를 내지르기도 한 것으로 보아, 김소희는 소리의 맛을 적절히 살릴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그러한 능력들이 춘향가에서 훌륭히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4. 김소희제 춘향가의 미 : 결론
만정제 춘향가는 김소희가 자신이 배운 소리들을 재편집하여 새롭게 구성한 춘향가 바디로, 스승인 송만갑 정정렬 정응민의 소리 대목들이 적절하게 섞여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김소희 명창은 자신의 소리제인 만정제 춘향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배운 스승들의 소리 중 각 대목의 상황에 적절한 소리들을 변화 없이 그대로 따오는 방식을 취했다. 만남의 부분에서는 젊은 청춘 남녀의 만남이 아기자기 하면서도 예에 맞게 그려져 있는 정응민제를 주로 따오고, 이별의 부분에서는 그 슬픈 느낌이 짙은 서름조를 통해 매우 잘 드러나 있는 정정렬제를, 갈까부다 이후의 옥중가 장면에서는 춘향의 절개가 고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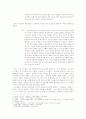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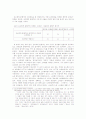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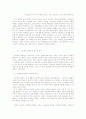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