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1920년대 시문학
1. 시문학 개관
2. 특징
3. 시문학의 양상
Ⅱ. 이상화
1. 들어가며
2. 생애
3. 작품분석
4. 문학사적 의의
참고문헌
1. 시문학 개관
2. 특징
3. 시문학의 양상
Ⅱ. 이상화
1. 들어가며
2. 생애
3. 작품분석
4. 문학사적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개벽』70호 1926.6
라) 의미적 측면에서
1연에서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을 때 봄은 자연적인 계절의 하나로서의 봄인데 11연의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의 봄은 이미 자연현상으로서의 봄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을 뜻하는 보다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봄은 빼앗긴 들과 연관될 때 일제에 대한 항쟁으로서 민족소생이고 항거의 의미를 지닌다.
1연에서의 ‘봄은 오는가?’라는 물음은 11연의 ‘그러나’라는 역접부사어에 의하여 배비 시켜 주어지는데, 이는 2연에서 10연의 내용은 자연으로서의 봄은 이미 와 있어서 일종의 흥겨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런 흥겨움은 흥겨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연과 10연을 대비시켜 봄으로써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자연의 봄을 맞이하는 기쁨에서 출발하여 민족의식을 상징하는 봄으로의 전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2연
10연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 처음들로 나설 때의 상황은 10연에 오면 좀 더 비판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늘과 들의 푸른 모습은 푸른 서러움이 되고 꿈속처럼 걸어가던 것이 다리를 절며 걷게 된다. 이 때 다리를 전다는 것은 다리가 피로하기 때문이 아니라 빼앗긴 들을 걷는 심리적 아픔의 표현인 것이다.
마) 구조와 조직적 측면에서
전체가 11연으로 첫 연과 끝 연이 서로 문답하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고 2연 ~ 10연은 부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각 3행씩으로 되어 있고 1행보다는 2행이, 2행보다는 3행이 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미상으로 볼 때 복합적 이라 할 수 있다. 즉, 봄의 기쁨에서 걸어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걸어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걸어간다는 차츰 깊어지는 세 가지 의미 층을 가지고 있어서 걸어가면서 계속 느끼는 울분 그리고 항거의 의지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
소재로 취하고 있는 ‘들’은 구루마꾼이나 거러지, 엿장수처럼 개별적인 시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개방적이며, 국토 전체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그 내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즉, 이 시는 이상화 시에 있어서의 공간 변모의 귀결점이 된다.
4) 후기 시 - 1930년 이후의 민족적 비애를 담은 우국 시 정재익, 『이상화 전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구문인협회,1998), P.278~288
가) 후기 시 경향
이상화 시인은 1927년 이후 사실상 창작을 통한 저항의 길을 포기하고 절망감에 젖어 폭음으로 나날을 보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나 개인사적인 엄성원 ‘이상화 시 연구 - “식민지 주체”의 세계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 논문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시는 1924년 이전의 감상적 현실 도피적 낭만주의 시와는 달리 한국의 지리 풍토 자연에 대한 사랑과 예찬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속에서는 항상 우리 민족의 주체적 자세가 담겨져 있다. 또한 왕성했던 상화 시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국토 찬미 내지 비애스런 식민지 현실을 풍자해 보이는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 조병춘 ‘저항 시인 이상화론’ (한국국어교육학회, 1979) - 논문
저항의 열기가 가라앉은 대신 상징성을 띠며 암울한 시대에 대한 우회적인 접근 효과를 취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풍이 「곡자사」「대구 행진곡」「역천」등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나) 작품 하나 - 「곡자사」
감옥에 갇힌 아비가 어린 자식한테 도리를 못 했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 간접적인 민족 항거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
곡자사
웅희야! 너는 갔구나
엄마가 뉜지 아비가 뉜지
너는 모르고 어디로 갔구나!
불쌍한 어미를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아비를 두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네가 갔구나.
달보다 잘났던 우리 웅희야
부처님보다도 착하던 웅희야
너를 언제나 안아나 줄고
그러께 팔월에 네가 간 뒤
그 해 시월에 내가 갇히어
네 어미 간장을 태웠더니라.
지나간 오월에 너를 얻고서
네 어미가 정신도 못 차린 첫 칠날
네 아비는 또 다시 갇히었더니라.
그런 뒤 오은 한해도 못 되어
갖은 꿈 온갖 힘 다 쓰려던
이 아비를 버리고 너는 갔구나.
불쌍한 속에서 네가 태어나
불쌍한 한숨에 휩쌔고 말 것
어미 아비 두 가슴에 못이 박힌다.
말 못하던 너일망정 잘 웃기따에
장차는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사내답게 한평생을 마칠 줄 알았지.
귀여운 네 발에 흙도 못 묻혀
몹쓸 이런 변이 우리에게 온 것
아, 마른 하늘 벼락에다 어이 견주랴.
너 위해 얽던 꿈 어디 쓰고
네게만 쏟던 사랑 뉘게다 줄고
웅희야 제발 다시 숨쉬어다오
하루해를 네 곁에서 못 지내 본 것
한가지도 속시원히 못 해준 것
감옥방 판자벽이 얼마나 울었던지.
웅희야! 너는 갔구나
웃지도 울지도 꼼짝도 않고,
불쌍한 선물로 설움을 끼고
가난한 선물로 몹쓸 병 안고
오자마자 네가 갔구나.
하늘보다 더 미덥던 우리 웅희야
이 세상엔 하나밖에 없던 웅희야
너를 언제나 안아나 줄고 --
『조선문예』2호 1929
다) 작품 둘 - 「대구 행진곡」
대구 행진곡
앞으로는 비슬산, 뒤로는 팔공산
그 복판을 흘러가는 금호강 물아
쓴 눈물 긴한숨에 얼마나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개벽』70호 1926.6
라) 의미적 측면에서
1연에서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을 때 봄은 자연적인 계절의 하나로서의 봄인데 11연의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의 봄은 이미 자연현상으로서의 봄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을 뜻하는 보다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봄은 빼앗긴 들과 연관될 때 일제에 대한 항쟁으로서 민족소생이고 항거의 의미를 지닌다.
1연에서의 ‘봄은 오는가?’라는 물음은 11연의 ‘그러나’라는 역접부사어에 의하여 배비 시켜 주어지는데, 이는 2연에서 10연의 내용은 자연으로서의 봄은 이미 와 있어서 일종의 흥겨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런 흥겨움은 흥겨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연과 10연을 대비시켜 봄으로써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자연의 봄을 맞이하는 기쁨에서 출발하여 민족의식을 상징하는 봄으로의 전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2연
10연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 처음들로 나설 때의 상황은 10연에 오면 좀 더 비판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늘과 들의 푸른 모습은 푸른 서러움이 되고 꿈속처럼 걸어가던 것이 다리를 절며 걷게 된다. 이 때 다리를 전다는 것은 다리가 피로하기 때문이 아니라 빼앗긴 들을 걷는 심리적 아픔의 표현인 것이다.
마) 구조와 조직적 측면에서
전체가 11연으로 첫 연과 끝 연이 서로 문답하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고 2연 ~ 10연은 부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각 3행씩으로 되어 있고 1행보다는 2행이, 2행보다는 3행이 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미상으로 볼 때 복합적 이라 할 수 있다. 즉, 봄의 기쁨에서 걸어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걸어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걸어간다는 차츰 깊어지는 세 가지 의미 층을 가지고 있어서 걸어가면서 계속 느끼는 울분 그리고 항거의 의지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
소재로 취하고 있는 ‘들’은 구루마꾼이나 거러지, 엿장수처럼 개별적인 시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개방적이며, 국토 전체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그 내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즉, 이 시는 이상화 시에 있어서의 공간 변모의 귀결점이 된다.
4) 후기 시 - 1930년 이후의 민족적 비애를 담은 우국 시 정재익, 『이상화 전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구문인협회,1998), P.278~288
가) 후기 시 경향
이상화 시인은 1927년 이후 사실상 창작을 통한 저항의 길을 포기하고 절망감에 젖어 폭음으로 나날을 보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나 개인사적인 엄성원 ‘이상화 시 연구 - “식민지 주체”의 세계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 논문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시는 1924년 이전의 감상적 현실 도피적 낭만주의 시와는 달리 한국의 지리 풍토 자연에 대한 사랑과 예찬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속에서는 항상 우리 민족의 주체적 자세가 담겨져 있다. 또한 왕성했던 상화 시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국토 찬미 내지 비애스런 식민지 현실을 풍자해 보이는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 조병춘 ‘저항 시인 이상화론’ (한국국어교육학회, 1979) - 논문
저항의 열기가 가라앉은 대신 상징성을 띠며 암울한 시대에 대한 우회적인 접근 효과를 취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풍이 「곡자사」「대구 행진곡」「역천」등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나) 작품 하나 - 「곡자사」
감옥에 갇힌 아비가 어린 자식한테 도리를 못 했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 간접적인 민족 항거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
곡자사
웅희야! 너는 갔구나
엄마가 뉜지 아비가 뉜지
너는 모르고 어디로 갔구나!
불쌍한 어미를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아비를 두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네가 갔구나.
달보다 잘났던 우리 웅희야
부처님보다도 착하던 웅희야
너를 언제나 안아나 줄고
그러께 팔월에 네가 간 뒤
그 해 시월에 내가 갇히어
네 어미 간장을 태웠더니라.
지나간 오월에 너를 얻고서
네 어미가 정신도 못 차린 첫 칠날
네 아비는 또 다시 갇히었더니라.
그런 뒤 오은 한해도 못 되어
갖은 꿈 온갖 힘 다 쓰려던
이 아비를 버리고 너는 갔구나.
불쌍한 속에서 네가 태어나
불쌍한 한숨에 휩쌔고 말 것
어미 아비 두 가슴에 못이 박힌다.
말 못하던 너일망정 잘 웃기따에
장차는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사내답게 한평생을 마칠 줄 알았지.
귀여운 네 발에 흙도 못 묻혀
몹쓸 이런 변이 우리에게 온 것
아, 마른 하늘 벼락에다 어이 견주랴.
너 위해 얽던 꿈 어디 쓰고
네게만 쏟던 사랑 뉘게다 줄고
웅희야 제발 다시 숨쉬어다오
하루해를 네 곁에서 못 지내 본 것
한가지도 속시원히 못 해준 것
감옥방 판자벽이 얼마나 울었던지.
웅희야! 너는 갔구나
웃지도 울지도 꼼짝도 않고,
불쌍한 선물로 설움을 끼고
가난한 선물로 몹쓸 병 안고
오자마자 네가 갔구나.
하늘보다 더 미덥던 우리 웅희야
이 세상엔 하나밖에 없던 웅희야
너를 언제나 안아나 줄고 --
『조선문예』2호 1929
다) 작품 둘 - 「대구 행진곡」
대구 행진곡
앞으로는 비슬산, 뒤로는 팔공산
그 복판을 흘러가는 금호강 물아
쓴 눈물 긴한숨에 얼마나
키워드
추천자료
 극장의 4종류의 장점과 단점
극장의 4종류의 장점과 단점 한국 기독교의 연구사적 검토 -한말에서 일제시기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의 연구사적 검토 -한말에서 일제시기를 중심으로- 소련의 체육의 목적 및 진흥과 방법
소련의 체육의 목적 및 진흥과 방법 남북한 문학사의 대비적 접근 -현대문학사를 중심으로
남북한 문학사의 대비적 접근 -현대문학사를 중심으로 한국 ,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한국 ,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현대음악 1학기 분량 압축 자료
현대음악 1학기 분량 압축 자료 2009년 2학기 현대문학사 기말시험 핵심체크
2009년 2학기 현대문학사 기말시험 핵심체크 2009년 1학기 문학비평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2009년 1학기 문학비평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91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현대문학사를 연대별
91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현대문학사를 연대별 한국문학사_5
한국문학사_5 2011년 하계계절시험 현대문학사 시험범위 핵심체크
2011년 하계계절시험 현대문학사 시험범위 핵심체크 한용운
한용운 [한국민족운동사] 6·10 만세 운동 - 610 만세, 6·10 만세시위 투쟁의 전개와 시대적 배경, 6·...
[한국민족운동사] 6·10 만세 운동 - 610 만세, 6·10 만세시위 투쟁의 전개와 시대적 배경, 6·... 한국영화 흥행분석 - 과속스캔들과 워낭소리
한국영화 흥행분석 - 과속스캔들과 워낭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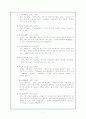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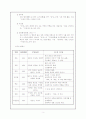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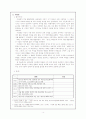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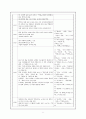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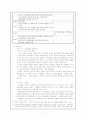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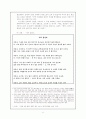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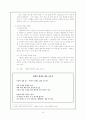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