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언간(諺簡)으로 알아본 조선시대 생활사
Ⅰ. 서론
Ⅱ. 본론
1. 언간(諺簡)이란 무엇인가
2. 한글 편지의 양식
3. 언간의 내용을 통해 엿보는 생활상
① 언간을 통해 보는 정(情)
② 언간을 통해 보는 출산 이야기
③ 언간을 통해 보는 사랑 이야기
④ 언간을 통해 보는 관제
Ⅲ. 결론
◆ 참고자료 ◆
Ⅰ. 서론
Ⅱ. 본론
1. 언간(諺簡)이란 무엇인가
2. 한글 편지의 양식
3. 언간의 내용을 통해 엿보는 생활상
① 언간을 통해 보는 정(情)
② 언간을 통해 보는 출산 이야기
③ 언간을 통해 보는 사랑 이야기
④ 언간을 통해 보는 관제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단순히 여성끼리만 주고받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른 시기의 언간인 16, 17세기의 언간은 수신자가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문 서간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면 한글로 씌어진 언간은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
2. 한글 편지의 양식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격식이 필요하다. 즉, 자신과의 관계와 상대방의 현재 처지, 연령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그 내용 전달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오늘날에도 편지를 쓸 때, 부르는 말, 인사말, 안부 묻기, 본론, 끝 인사, 날짜, 쓴 사람 등의 양식을 갖추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옛날 한글편지도 마찬가지이다. 옛날에는 이러한 한글편지 양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간행된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간독(諺簡牘)이다.
언간독은 집안에서 필사본으로만 전해져 오던 규식을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19~20세기 초에 방각본(坊刻本)의 형태로 간행된 것이다. 언간독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의 한글 문헌들과 같이 그 당시 국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그 대상에 따라 격식을 쓴 맺음말의 예는 높임법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어휘적인 면으로 본다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지 투식과 관련된 친족 용어와 이두어(吏讀語)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언간독의 대부분은 특정한 상대를 향해 써 보내는 규식으로 겉봉투 쓰는 법, 상대방에 대한 호칭, 상대방의 안부, 보내는 사람의 안부, 용건, 축원 등이 나타난다.
언간독은 상·하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편에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답장의 서식으로부터 아버지, 조카, 삼촌, 아우, 형, 외삼촌, 장인 등 주로 일가친척 중 남성에게 보내는 편지 서식과 답교날, 화류, 관등날, 복날, 가을에 놀자고 청하는 편지 서식, 새해 인사의 편지 서식등을 볼 수 있다. 하편에는 혼례와 관련지어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내는 문안 편지와 답장을 시작으로 시삼촌, 시삼촌댁, 시아주머니, 시누이, 동서 등 시댁식구들과의 왕복 언간 규식 등이 나타나 있다.
3. 언간의 내용을 통해 엿보는 생활상
① 언간을 통해 보는 정(情)
편지에는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솔직함과 애틋함이 묻어난다.
보물 1220호로 지정되어 있는 숙종임금이 시집간 누이 명안공주에게 보낸 안부편지에서 이러한 솔직함과 애틋함을 볼 수 있다.
“새집에 가서 밤에 잠이나 잘 잤느냐? 어제는 그리 덧없이 내어 보내고 섭섭무료하기 가이 없어 하노라. 너도 우리를 생각하느냐. 이 병풍은 오늘 보내마 하였던 것이다. 마침 아주 만든 것이 있으매 보내니 치고 놓아라. 날 춥기 심하니 몸 잘 조리하여 기운이 충실하면 장래 자주 들어올 것이니 밥에 나물 것 하여 잘 먹어라.”
숙종임금의 누이에 대한 사랑과 걱정을 엿볼 수 있는 편지이다.
다음으로는 딸이 친정 부모님께 드린 편지인데, 이것은 특이하게 버선본 한 쌍에 써서 전하는 것이 눈에 띄인다.
<버선본1>
무슐 쥬영 계유 윤오월 념오일 호시에 환지여스니 이 의 맛긔 긔워 신으시고 내외분 풍식화낙의 년로여 붕인손 계계승승고 부녕옥 문호의 가득야 일속이 우러 류복할지어다
(무술년 생인 주영이가 계유년 윤5월 5일 좋은 때에 변변치 못한 종이로 버선본을 떠서 드리니 이 본에 맞게 버선을 만들어 신으시고 내외분 풍식화락(豊殖和樂)하고 백년해로하시어 훌륭한 자손 계계승승하고 부재영옥이 집안에 가득하여 한 가족이 모두 유복하기를 바랍니다)
<버선본2>
계유 윤오월 념오일 호시에 을을
2. 한글 편지의 양식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격식이 필요하다. 즉, 자신과의 관계와 상대방의 현재 처지, 연령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그 내용 전달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오늘날에도 편지를 쓸 때, 부르는 말, 인사말, 안부 묻기, 본론, 끝 인사, 날짜, 쓴 사람 등의 양식을 갖추어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옛날 한글편지도 마찬가지이다. 옛날에는 이러한 한글편지 양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간행된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간독(諺簡牘)이다.
언간독은 집안에서 필사본으로만 전해져 오던 규식을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19~20세기 초에 방각본(坊刻本)의 형태로 간행된 것이다. 언간독을 통해 우리는 이 시기의 한글 문헌들과 같이 그 당시 국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그 대상에 따라 격식을 쓴 맺음말의 예는 높임법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어휘적인 면으로 본다면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지 투식과 관련된 친족 용어와 이두어(吏讀語)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언간독의 대부분은 특정한 상대를 향해 써 보내는 규식으로 겉봉투 쓰는 법, 상대방에 대한 호칭, 상대방의 안부, 보내는 사람의 안부, 용건, 축원 등이 나타난다.
언간독은 상·하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편에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답장의 서식으로부터 아버지, 조카, 삼촌, 아우, 형, 외삼촌, 장인 등 주로 일가친척 중 남성에게 보내는 편지 서식과 답교날, 화류, 관등날, 복날, 가을에 놀자고 청하는 편지 서식, 새해 인사의 편지 서식등을 볼 수 있다. 하편에는 혼례와 관련지어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내는 문안 편지와 답장을 시작으로 시삼촌, 시삼촌댁, 시아주머니, 시누이, 동서 등 시댁식구들과의 왕복 언간 규식 등이 나타나 있다.
3. 언간의 내용을 통해 엿보는 생활상
① 언간을 통해 보는 정(情)
편지에는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솔직함과 애틋함이 묻어난다.
보물 1220호로 지정되어 있는 숙종임금이 시집간 누이 명안공주에게 보낸 안부편지에서 이러한 솔직함과 애틋함을 볼 수 있다.
“새집에 가서 밤에 잠이나 잘 잤느냐? 어제는 그리 덧없이 내어 보내고 섭섭무료하기 가이 없어 하노라. 너도 우리를 생각하느냐. 이 병풍은 오늘 보내마 하였던 것이다. 마침 아주 만든 것이 있으매 보내니 치고 놓아라. 날 춥기 심하니 몸 잘 조리하여 기운이 충실하면 장래 자주 들어올 것이니 밥에 나물 것 하여 잘 먹어라.”
숙종임금의 누이에 대한 사랑과 걱정을 엿볼 수 있는 편지이다.
다음으로는 딸이 친정 부모님께 드린 편지인데, 이것은 특이하게 버선본 한 쌍에 써서 전하는 것이 눈에 띄인다.
<버선본1>
무슐 쥬영 계유 윤오월 념오일 호시에 환지여스니 이 의 맛긔 긔워 신으시고 내외분 풍식화낙의 년로여 붕인손 계계승승고 부녕옥 문호의 가득야 일속이 우러 류복할지어다
(무술년 생인 주영이가 계유년 윤5월 5일 좋은 때에 변변치 못한 종이로 버선본을 떠서 드리니 이 본에 맞게 버선을 만들어 신으시고 내외분 풍식화락(豊殖和樂)하고 백년해로하시어 훌륭한 자손 계계승승하고 부재영옥이 집안에 가득하여 한 가족이 모두 유복하기를 바랍니다)
<버선본2>
계유 윤오월 념오일 호시에 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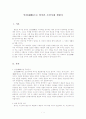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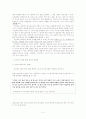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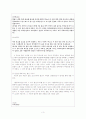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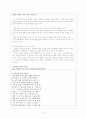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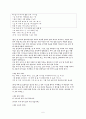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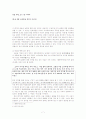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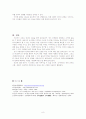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