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어의 음운
(1) 모음과 자음
(2)소리의 길이
음 절
음운의 변동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자음 동화
(3) 구개음화
(4) 모음동화 (Umlaut 현상)
(5) 모음조화
(6) 음운의 축약과 탈락
(7) 된소리 되기 (경음화)
사잇소리 현상
(1) 사잇소리 현상
(2) 사잇소리 현상의 특징
어감의 분화
(1) 어감(語感)의 분화
두음법칙
(1) 두음법칙
동화 방향에 따른 갈래
(1) 음운의 동화
(1) 모음과 자음
(2)소리의 길이
음 절
음운의 변동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자음 동화
(3) 구개음화
(4) 모음동화 (Umlaut 현상)
(5) 모음조화
(6) 음운의 축약과 탈락
(7) 된소리 되기 (경음화)
사잇소리 현상
(1) 사잇소리 현상
(2) 사잇소리 현상의 특징
어감의 분화
(1) 어감(語感)의 분화
두음법칙
(1) 두음법칙
동화 방향에 따른 갈래
(1) 음운의 동화
본문내용
-ㅈ,ㅉ,ㅊ
3>소리의 울림에 따라 ;
㈀울림 소리(유성음) - 비음(ㅁㄴㅇ), 유음(ㄹ)모든 모음은 유성음
㈁안울림 소리(무성음) - 나머지 15개 자음
4>어감에 따라 ;예사 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 소리(격음)
자음의 제약
①‘ㄹ’과 ‘ㅇ[ ]’은 단어의 첫소리로 쓰이지 않음.
②단어 첫머리에 오는 ‘ㄴ’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단 서양 외래어와 ‘녀석’은 예외이다.
③모음과 모음 사이에 세 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예)값도[갑또→ ㅅ탈락], 않고[안코→ ㅎ+ㄱ :축약]
④첫소리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온다.(ㄲ,ㅋ은 하나의 자음이다.)
예)stick →스티크, trunk →트렁크
⑤‘므,브,쁘,프 + 자음’인 형태소는 없다.
⑥두 개의 모음 사이에서 옛말에 있었던 ‘ㅎ’은 모두 탈락했다.
예) 가히 > 가이 > 개
(2)소리의 길이 - 말 뜻을 분별하는 구실을 한다.
1)긴소리 -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 나타남.
예) 밤(夜) - 밤:(栗), 발(足) - 발:(簾), 굴(貝類) - 굴:(窟)
솔(松) - 솔:(옷솔), 눈(目) - 눈:(雪), 벌(罰) - 벌:(蜂)
배(梨) - 배:(倍), 거리(街) - 거:리(距離),
말다(卷) - 말:다(勿), 업다(包) - 없:다
걷다(치우다) - 걷:다(두 다리로) (교과서 p.158 참고)
2)짧은 소리 - 본래 길게 나던 단어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
음되는 경향이 있다.
예) 밤: → 알밤, 말: → 한국말, 솔: → 옷솔
음 절
1)음절 - 모음과 자음이 결합되어 이루는 가장 작은 발음의 단위.
한 뭉치로 적힌 소리의 덩어리로, 말 소리의 한 단위일 뿐, 꼭 뜻
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집 앞으로 맑은 물이 흐른다.
[지바프로 말근 무리 흐른다]→음절의 중심은 모음으로 11개 음절.
2)음절의 구조
㈀‘모음 하나’로 된 것 → 이, 어, 애, 왜, 야, …
㈁‘모음 하나 + 자음 하나’로 된 것 → 알, 악, 옷, 열, 엿, …
㈂‘자음 하나 + 모음 하나’로 된 것 → 가, 너, 도, 묘, 배, …
㈃‘자음 하나 + 모음 하나 + 자음 하나’로 된 것 → 각, 랄, 밭, 넋, …
3)음절의 형태
㈀첫소리 - 모음 앞에 오는 자음.
㈁가운뎃소리 - 음절의 가운데 오는 모음.
㈂끝소리 - 음절의 가운데 오는 모음 다음에 붙는 자음.
음운의 변동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국어 음절의 끝소리는 ‘ㄱ,ㄴ,ㄷ,ㄹ,ㅁ,ㅂ,ㅇ’의 7개 자음 뿐이다.
이 밖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뀐다.
1)끝소리가 바뀌는 자음
/ㅍ/ → /ㅂ/
/ㅅ,ㅆ,ㅈ,ㅊ,ㅌ/ → /ㄷ/
/ㄲ,ㅋ/ → /ㄱ/
2)겹 받침의 발음 : 겹받침 하나만 발음된다.
1>ㅄ,ㄳ,ㄽ,ㄾ,ㄵ은 첫째 자음만 남는다.
예)값[갑], 몫[목], 외곬[외골], 핥고[할꼬], 앉고[안꼬]
2>ㄺ,ㄻ,ㄿ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둘째 자음이 남는다.
단 ㄺ은 ㄱ앞에서는 앞자음 ㄹ로 발음한다.
예)읽지[익지], 삶[삼], 닭[닥], 흙[흑], 읊다[읖다→읍따]
읽고[일꼬], 맑게[말께], 묽고[물꼬]
3>ㄼ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첫째 자음 ㄹ로 발음하되,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넓-’은 넓쭉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로 발음한다.
예)넓다[널따], 섧다[설따]
밟다[밥:따], 밟소[밥:쏘], 밟는[밥:는→밤는]
3)자음 끝소리 +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형태소는, 자음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예)옷이[오시], 옷을[오슬]
4)자음 끝소리 +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형태소는, 일곱 자음의 하나로
발음된다. 예)옷+안[
3>소리의 울림에 따라 ;
㈀울림 소리(유성음) - 비음(ㅁㄴㅇ), 유음(ㄹ)모든 모음은 유성음
㈁안울림 소리(무성음) - 나머지 15개 자음
4>어감에 따라 ;예사 소리(평음), 된소리(경음), 거센 소리(격음)
자음의 제약
①‘ㄹ’과 ‘ㅇ[ ]’은 단어의 첫소리로 쓰이지 않음.
②단어 첫머리에 오는 ‘ㄴ’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단 서양 외래어와 ‘녀석’은 예외이다.
③모음과 모음 사이에 세 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
예)값도[갑또→ ㅅ탈락], 않고[안코→ ㅎ+ㄱ :축약]
④첫소리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온다.(ㄲ,ㅋ은 하나의 자음이다.)
예)stick →스티크, trunk →트렁크
⑤‘므,브,쁘,프 + 자음’인 형태소는 없다.
⑥두 개의 모음 사이에서 옛말에 있었던 ‘ㅎ’은 모두 탈락했다.
예) 가히 > 가이 > 개
(2)소리의 길이 - 말 뜻을 분별하는 구실을 한다.
1)긴소리 -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 나타남.
예) 밤(夜) - 밤:(栗), 발(足) - 발:(簾), 굴(貝類) - 굴:(窟)
솔(松) - 솔:(옷솔), 눈(目) - 눈:(雪), 벌(罰) - 벌:(蜂)
배(梨) - 배:(倍), 거리(街) - 거:리(距離),
말다(卷) - 말:다(勿), 업다(包) - 없:다
걷다(치우다) - 걷:다(두 다리로) (교과서 p.158 참고)
2)짧은 소리 - 본래 길게 나던 단어도,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게 발
음되는 경향이 있다.
예) 밤: → 알밤, 말: → 한국말, 솔: → 옷솔
음 절
1)음절 - 모음과 자음이 결합되어 이루는 가장 작은 발음의 단위.
한 뭉치로 적힌 소리의 덩어리로, 말 소리의 한 단위일 뿐, 꼭 뜻
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집 앞으로 맑은 물이 흐른다.
[지바프로 말근 무리 흐른다]→음절의 중심은 모음으로 11개 음절.
2)음절의 구조
㈀‘모음 하나’로 된 것 → 이, 어, 애, 왜, 야, …
㈁‘모음 하나 + 자음 하나’로 된 것 → 알, 악, 옷, 열, 엿, …
㈂‘자음 하나 + 모음 하나’로 된 것 → 가, 너, 도, 묘, 배, …
㈃‘자음 하나 + 모음 하나 + 자음 하나’로 된 것 → 각, 랄, 밭, 넋, …
3)음절의 형태
㈀첫소리 - 모음 앞에 오는 자음.
㈁가운뎃소리 - 음절의 가운데 오는 모음.
㈂끝소리 - 음절의 가운데 오는 모음 다음에 붙는 자음.
음운의 변동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국어 음절의 끝소리는 ‘ㄱ,ㄴ,ㄷ,ㄹ,ㅁ,ㅂ,ㅇ’의 7개 자음 뿐이다.
이 밖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뀐다.
1)끝소리가 바뀌는 자음
/ㅍ/ → /ㅂ/
/ㅅ,ㅆ,ㅈ,ㅊ,ㅌ/ → /ㄷ/
/ㄲ,ㅋ/ → /ㄱ/
2)겹 받침의 발음 : 겹받침 하나만 발음된다.
1>ㅄ,ㄳ,ㄽ,ㄾ,ㄵ은 첫째 자음만 남는다.
예)값[갑], 몫[목], 외곬[외골], 핥고[할꼬], 앉고[안꼬]
2>ㄺ,ㄻ,ㄿ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둘째 자음이 남는다.
단 ㄺ은 ㄱ앞에서는 앞자음 ㄹ로 발음한다.
예)읽지[익지], 삶[삼], 닭[닥], 흙[흑], 읊다[읖다→읍따]
읽고[일꼬], 맑게[말께], 묽고[물꼬]
3>ㄼ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첫째 자음 ㄹ로 발음하되,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넓-’은 넓쭉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로 발음한다.
예)넓다[널따], 섧다[설따]
밟다[밥:따], 밟소[밥:쏘], 밟는[밥:는→밤는]
3)자음 끝소리 +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형태소는, 자음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예)옷이[오시], 옷을[오슬]
4)자음 끝소리 +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형태소는, 일곱 자음의 하나로
발음된다. 예)옷+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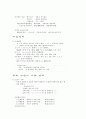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