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재정 안정을 위한 모색
2. 양전사업
3. 비총제로의 전환
4. 도결(都結)로의 변화
5. 조선후기의 역동성
2. 양전사업
3. 비총제로의 전환
4. 도결(都結)로의 변화
5. 조선후기의 역동성
본문내용
선 후기의 역동성
조선 후기 사회상을 하나의 경제정책적 제도사의 측면에 국한하여 살펴봄으로써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근대 사회의 특성상 제도의 목적과 그 시행의 실태가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로 인해 사회상을 그려보는데 공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생명력이 넘쳤던 조선 후기의 경제사회적 사회상을 탐구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었던 전정과 관련한 변화들은 이후 근대를 예비해가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먼저 양전사업, 특히 근대 이전의 마지막 대규모 양전이었던 숙종대의 경자양전을 통해 원래 의도했던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전정의 이정이라는 목적을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었음을 보았다. 따라서 남은 방법은 수세제의 변동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고, 18세기 전반 전세수취제도 변화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것은 비총제로 이어졌다. 비총제는 기존의 경차관담험제에 의한 비율급재방식의 문제가 드러나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지는 가운데 실시되던 비년급재방식을 정부가 공인한 것이었다. 이는 곧 더 이상 중앙정부가 조선후기 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현실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상업과 화폐경제의 발달 속에서 도결의 실시로 이어지면서 전정 및 부세제도 전반이 중앙의 통제 하에 있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던 것이다. 폐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고, 곧 민중의 폭발로 이어졌다.
현재의 시선에서 조선 후기를 바라본다면 모순과 폐단이 점철된 사회상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전근대적이고 봉건적 체제인 정부가 근대로 전환해가는 시대를 감당해낼 수 없었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가 가진 역동성과 진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참고자료]
邊太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2008)
이철성, 『17-18세기 전정운영론과 전세제도 연구』, (선인, 2004)
鄭善男, “18-19세기 田結稅의 收取制度와 그 運營”, 「한국사론」22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도결”,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26513&v=42
한국민족대백과, “비총법”,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K&i=240068
조선 후기 사회상을 하나의 경제정책적 제도사의 측면에 국한하여 살펴봄으로써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근대 사회의 특성상 제도의 목적과 그 시행의 실태가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로 인해 사회상을 그려보는데 공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생명력이 넘쳤던 조선 후기의 경제사회적 사회상을 탐구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었던 전정과 관련한 변화들은 이후 근대를 예비해가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먼저 양전사업, 특히 근대 이전의 마지막 대규모 양전이었던 숙종대의 경자양전을 통해 원래 의도했던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전정의 이정이라는 목적을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었음을 보았다. 따라서 남은 방법은 수세제의 변동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고, 18세기 전반 전세수취제도 변화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것은 비총제로 이어졌다. 비총제는 기존의 경차관담험제에 의한 비율급재방식의 문제가 드러나 다양한 시도들이 행해지는 가운데 실시되던 비년급재방식을 정부가 공인한 것이었다. 이는 곧 더 이상 중앙정부가 조선후기 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현실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상업과 화폐경제의 발달 속에서 도결의 실시로 이어지면서 전정 및 부세제도 전반이 중앙의 통제 하에 있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던 것이다. 폐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고, 곧 민중의 폭발로 이어졌다.
현재의 시선에서 조선 후기를 바라본다면 모순과 폐단이 점철된 사회상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전근대적이고 봉건적 체제인 정부가 근대로 전환해가는 시대를 감당해낼 수 없었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가 가진 역동성과 진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참고자료]
邊太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2008)
이철성, 『17-18세기 전정운영론과 전세제도 연구』, (선인, 2004)
鄭善男, “18-19세기 田結稅의 收取制度와 그 運營”, 「한국사론」22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도결”,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26513&v=42
한국민족대백과, “비총법”,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K&i=240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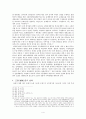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