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
(1) 불교의 유입
(2) 신라 불교의 특징
本
(1) 풍요
(2) 도솔가
(3) 안민가
(4) 제망매가
(5) 원앙생가
(6) 도천수대비가
(7) 찬기파랑가
(8) 혜성가
(9) 우적가
結
♧ 참고문헌
(1) 불교의 유입
(2) 신라 불교의 특징
本
(1) 풍요
(2) 도솔가
(3) 안민가
(4) 제망매가
(5) 원앙생가
(6) 도천수대비가
(7) 찬기파랑가
(8) 혜성가
(9) 우적가
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고 믿어 왕에게 이런 노래를 지어 바쳤던 것이다. 이런 가정은 미륵의 현신으로 보이는 한 동자가 나타나 왕과 월명사에게 실증적 증거를 보였다는 설화 후반부의 내용에 근거를 둔 것이다. 하늘의 두 해 중 하나는 현재의 왕에 도전할 세력의 출현을 예견해준다. 이러한 세력의 출현은 혼돈을 빚고, 그래서 이 혼돈을 조정할 행위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왕권에 도전하려는 세력들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조정하기 위하여 행해진 의식이 산화공덕이고, 이 의식에서 불려진 노래가 <도솔가>이다. 그러나 이 산화공덕은 순수한 불교적인 관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재래의 천신숭배사상이 미륵하생관념(彌勒下生觀念)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변용되어 미륵좌주로 나타나, 계를 지으라고 함에 향가로 대신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이 <도솔가>는 미륵사상에 바탕을 둔 향가라 할 수 있다.
(3) 안민가
君隱父也 君은 아비요
臣隱愛賜尸母史也 臣은 사랑하시는 어미요,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실진댄
民是愛尸知古如 民이 사랑을 알리라.
窟理叱大 生以支所音物生 大衆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此 惡支治良羅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
此地 捨遺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國惡支持以支知古如 할진댄 나라 保全할 것을 알리라.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 아아, 君답게 臣답게 民답게 한다면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가 태평을 지속하느니라 김완진의 해독 -『鄕歌解讀法硏究』, 서울대 출판부, 1980.
<안민가>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이를 주술로 보는 견해 林基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 불교로 보는 견해, 유교로 보는 견해, 그리고 불교와 유교의 접합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물론 유교적인 색채가 강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안민가>의 어디에서도 불교적인 용어를 찾아볼 수는 없을뿐더러 불교 계통의 범주를 확보하는 데 천착한 나머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명백한 사실까지 왜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민가>의 사상적 기저를 불교에서 찾는 논의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지으라고 명한 경덕왕이 전제왕권 강화책으로서 화엄사상을 신봉하였으며 경덕왕 집권기가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과 같은 佛事를 일으켰던 신라문화의 절정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민가>에 내재되어 있을 불교관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경덕왕이 경덕왕 19년(760)에 월명사에게 <도솔가>를 짓게 하고, 24년에는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짓게 한 사실을 보면 당시의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경덕왕은 그 타개책을 불교적 세계관에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충담사가 승려라는 사실과 관련지어 신라 護國佛敎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彌勒信仰의 佛國土思想을 이념적 기반으로 볼 수가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4) 제망매가
生死路隱 生死 길은
此矣有阿米次 兮伊遣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는 간다는 말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3) 안민가
君隱父也 君은 아비요
臣隱愛賜尸母史也 臣은 사랑하시는 어미요,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실진댄
民是愛尸知古如 民이 사랑을 알리라.
窟理叱大 生以支所音物生 大衆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此 惡支治良羅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
此地 捨遺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國惡支持以支知古如 할진댄 나라 保全할 것을 알리라.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 아아, 君답게 臣답게 民답게 한다면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가 태평을 지속하느니라 김완진의 해독 -『鄕歌解讀法硏究』, 서울대 출판부, 1980.
<안민가>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이를 주술로 보는 견해 林基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 불교로 보는 견해, 유교로 보는 견해, 그리고 불교와 유교의 접합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물론 유교적인 색채가 강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안민가>의 어디에서도 불교적인 용어를 찾아볼 수는 없을뿐더러 불교 계통의 범주를 확보하는 데 천착한 나머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명백한 사실까지 왜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민가>의 사상적 기저를 불교에서 찾는 논의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지으라고 명한 경덕왕이 전제왕권 강화책으로서 화엄사상을 신봉하였으며 경덕왕 집권기가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과 같은 佛事를 일으켰던 신라문화의 절정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민가>에 내재되어 있을 불교관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경덕왕이 경덕왕 19년(760)에 월명사에게 <도솔가>를 짓게 하고, 24년에는 충담사에게 <안민가>를 짓게 한 사실을 보면 당시의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경덕왕은 그 타개책을 불교적 세계관에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충담사가 승려라는 사실과 관련지어 신라 護國佛敎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彌勒信仰의 佛國土思想을 이념적 기반으로 볼 수가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4) 제망매가
生死路隱 生死 길은
此矣有阿米次 兮伊遣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는 간다는 말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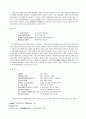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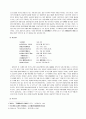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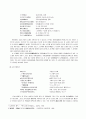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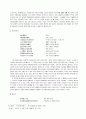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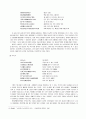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