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요소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여 현대사회의 다각적인 측면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기에 있어서도 그는 스타니슬랍스키와 달리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동일시(identification)하기보다 맡은 역할을 제3자의 시각으로 객관화해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브레히트 역시 메이어홀드처럼 평생동안 연극적 실험에 몰두했으며 끊임없는 수정을 가했고 말년에 가서는 그의 연극을 서사연극이라기보다 변증법적 연극(dialectic theatre)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며 종전의 이론을 상당부분 철회하기도 했지만 브레히트는 오늘날까지 비단 연극뿐 아니라 문예의 전반에 걸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브레히트와 함께 현대연극의 양대 조류를 형성케 하는데 이바지한 또 한 사람의 이론가가 프랑스의 아르또(Antonin Artaud, 1896-1948)이다. 그는 배우와 연출을 겸했으나 실천가라기보다는 아피아와 크래이그처럼 몽상가(visionary)에 가까웠다. 그 자신의 희곡『쌍씨』(Les Cenci, 1935)를 연출하여 그가 주창한 \'잔혹연극\'을 실험해 보였으나 그보다는 그가 정신병동에 수용되어 있을 때 저작한 이론서인 『연극과 그 복제』(Theatre and its Double, 1938)를 통하여 더 널리 후대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 아르또에 의하면 서양의 연극은 인간의 개인적 심리의 문제나 집단의 사회적 문제에 집착하여 보다 넓은 영역인 무의식의 세계를 놓쳤다. 따라서 그의 연극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감각에 직접 호소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전통적인 극장 공간을 버리고 창고나 공장을 개조해서 공연장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고 거기에서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철폐해야 하며 배우들의 연기는 사방 어디서나 행해져도 상관없으며 요동치는 조명과 고막을 울리는 음향 등으로 관객을 습격(assault)함으로서 문명에 의해 경직된 자의식을 허물고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르또는 아피아나 크래이그와는 달리 연극예술의 목적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한 (art for art\'s sake)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salvation)에 있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는 브레히트를 닮았다. 둘은 성향을 달리 하지만 그들의 연극이 교훈주의(didacticism)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리고 둘 다 환각주의를 거부하며 극장성을 강조하고 관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의 참여(audience participation 또는 involvement)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는 것은 이미 지적했다. 그러나 서사연극은 이성을 중시하고 객관주의를 지향한다면 아르또의 영향을 받아 1960년대 미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 제의의 연극은 이성을 거부하고 본능과 감각을 중시하며 따라서 비합리주의를 지향한데서 양자의 성향은 판이하다.
오늘날의 연극은 19세기 말에 등장한 사실주의가 여전히 기본적인 연극의 이디엄(idiom)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계속 수정하면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연극의 저류를 형성해 오고 있으면서 반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적 세력으로서 서사연극과 제의의 연극이 대안연극(alternative theatre)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파를 낳으면서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연극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1970년대 이후에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는 새로운 연극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가고 있다. 당연히 이같은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간단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세대의 연출가들이며 이들에 의해 20세기의 연극은 연출가의 시대로 규정지어졌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세기 연극의 흐름을 주도해 나간 주요 연출가들의 개별적 면모는 이 책의 제3부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대안연극이 기성의 사실주의 연극과 구별되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제1부를 마치기로 한다.
대안연극(alternative theatre)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성의 연극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출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일 뿐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각 대안연극들이 제출하는 해답은 다양하기 이를데 없다. 다만 이들이 기성연극(conventional theatre, 곧 사실주의적 연극을 가리킴)과 비교하여 가지는 몇가지 공통점을 통해서 대안연극이 제출하는 새로운 연극의 패러다임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안연극은 첫째, \'비합리적, 비직설적, 비언어적\'(non-rational, non-literal, non-verbal)이란 말로 요약될 수 있는 대안연극은 종전의 플롯, 또는 이야기 구조를 해체하고 이를 시청각적인 이미지나 행위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은 평가 절하되고 극작가의 지위는 낮아진다. 둘째, 관객의 역할에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공연이 더 이상 \'관객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something done to an audience)이 아니라 관객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바뀐다. 관객은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니라 창조적 참여자의 일원이 되며 공연의 의미에 대하여도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 배우의 연기에 대한 관념에도 혁신이 일어나서 배우는 자기 아닌 타인의 역할을 \'연기하는 자\'(actor)가 아니라 극중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performer)로 바뀐다. 다시 말해서 배우는 배우로서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지 극중인물로 변신하여 그 역을 연기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넷째, 기성연극이 프로씨니엄 극장의 틀 안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반면에 대안연극은 프로씨니엄을 벗어나 다양한 극장공간을 실험하여 무대와 관객간의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며 그도 모자라서 아예 극장을 버리고 생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임의의 공간(found space)에서 공연을 펼친다. 시장이나 길거리나 지하철역이나 집회장 같은데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공연을 벌임으로써 연극과 실생활의 거리를 부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브레히트와 함께 현대연극의 양대 조류를 형성케 하는데 이바지한 또 한 사람의 이론가가 프랑스의 아르또(Antonin Artaud, 1896-1948)이다. 그는 배우와 연출을 겸했으나 실천가라기보다는 아피아와 크래이그처럼 몽상가(visionary)에 가까웠다. 그 자신의 희곡『쌍씨』(Les Cenci, 1935)를 연출하여 그가 주창한 \'잔혹연극\'을 실험해 보였으나 그보다는 그가 정신병동에 수용되어 있을 때 저작한 이론서인 『연극과 그 복제』(Theatre and its Double, 1938)를 통하여 더 널리 후대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 아르또에 의하면 서양의 연극은 인간의 개인적 심리의 문제나 집단의 사회적 문제에 집착하여 보다 넓은 영역인 무의식의 세계를 놓쳤다. 따라서 그의 연극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감각에 직접 호소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전통적인 극장 공간을 버리고 창고나 공장을 개조해서 공연장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고 거기에서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철폐해야 하며 배우들의 연기는 사방 어디서나 행해져도 상관없으며 요동치는 조명과 고막을 울리는 음향 등으로 관객을 습격(assault)함으로서 문명에 의해 경직된 자의식을 허물고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르또는 아피아나 크래이그와는 달리 연극예술의 목적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한 (art for art\'s sake)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salvation)에 있다고 믿었다. 이 점에서는 브레히트를 닮았다. 둘은 성향을 달리 하지만 그들의 연극이 교훈주의(didacticism)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리고 둘 다 환각주의를 거부하며 극장성을 강조하고 관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의 참여(audience participation 또는 involvement)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는 것은 이미 지적했다. 그러나 서사연극은 이성을 중시하고 객관주의를 지향한다면 아르또의 영향을 받아 1960년대 미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 제의의 연극은 이성을 거부하고 본능과 감각을 중시하며 따라서 비합리주의를 지향한데서 양자의 성향은 판이하다.
오늘날의 연극은 19세기 말에 등장한 사실주의가 여전히 기본적인 연극의 이디엄(idiom)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계속 수정하면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연극의 저류를 형성해 오고 있으면서 반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적 세력으로서 서사연극과 제의의 연극이 대안연극(alternative theatre)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파를 낳으면서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연극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1970년대 이후에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는 새로운 연극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가고 있다. 당연히 이같은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간단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세대의 연출가들이며 이들에 의해 20세기의 연극은 연출가의 시대로 규정지어졌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세기 연극의 흐름을 주도해 나간 주요 연출가들의 개별적 면모는 이 책의 제3부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대안연극이 기성의 사실주의 연극과 구별되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제1부를 마치기로 한다.
대안연극(alternative theatre)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성의 연극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출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일 뿐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각 대안연극들이 제출하는 해답은 다양하기 이를데 없다. 다만 이들이 기성연극(conventional theatre, 곧 사실주의적 연극을 가리킴)과 비교하여 가지는 몇가지 공통점을 통해서 대안연극이 제출하는 새로운 연극의 패러다임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안연극은 첫째, \'비합리적, 비직설적, 비언어적\'(non-rational, non-literal, non-verbal)이란 말로 요약될 수 있는 대안연극은 종전의 플롯, 또는 이야기 구조를 해체하고 이를 시청각적인 이미지나 행위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언어의 기능은 평가 절하되고 극작가의 지위는 낮아진다. 둘째, 관객의 역할에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공연이 더 이상 \'관객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something done to an audience)이 아니라 관객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바뀐다. 관객은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니라 창조적 참여자의 일원이 되며 공연의 의미에 대하여도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 배우의 연기에 대한 관념에도 혁신이 일어나서 배우는 자기 아닌 타인의 역할을 \'연기하는 자\'(actor)가 아니라 극중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performer)로 바뀐다. 다시 말해서 배우는 배우로서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지 극중인물로 변신하여 그 역을 연기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넷째, 기성연극이 프로씨니엄 극장의 틀 안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반면에 대안연극은 프로씨니엄을 벗어나 다양한 극장공간을 실험하여 무대와 관객간의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며 그도 모자라서 아예 극장을 버리고 생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임의의 공간(found space)에서 공연을 펼친다. 시장이나 길거리나 지하철역이나 집회장 같은데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공연을 벌임으로써 연극과 실생활의 거리를 부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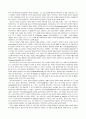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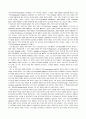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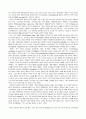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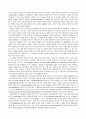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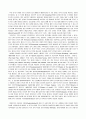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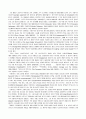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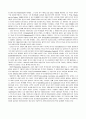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