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1. 3 부속성분
11. 3. 1 관형어
11.3.2 부사어
11. 4 독립성분
◎ 연습문제
11. 3. 1 관형어
11.3.2 부사어
11. 4 독립성분
◎ 연습문제
본문내용
듯하다.
(나) 그 여자가 남편의 인도를 받아 조용하고 청조한 부인이 되었다.
(다) 깊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뼈가 연하고 살이 단단하다.
(라) 여러분은 초식동물이 소화기가 발달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마) 오늘 저녁에 쓸 물건이 아직도 배달되지 않았네.
4. 다음의 밑줄 그은 말을 꾸며 주는 부사어를 찾아 보라.
(가) 뜻하지 않는 불행을 당한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 네가 본 대로 말해 보렴.
(다) 요즘은 그가 왜 저토록 일을 서두르지?
(라) 함박눈이 소리 없이 내려서 쌓인다.
(마) 바둑이는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바)그들은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5. 다음 각 문장에는 서술어가 한 개 이상 있다. 그 각각의 주어를 찾아 짝을 지으라.
(가) 잔디가 깔린 광장 뒤에 현충문이 있고 그 뒤에 현충탑이 서 있다.
(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오늘이 있기까지 그토록 가슴(이) 아픈 희생이 있었던가?
(다) 우리가 한 뜻으로 뭉칠 때 굳건한 사회가 이룩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라) 여름철이 더위가 심하고 장마가 계속되어 건강을 해치기가 쉽다.
(마) 선생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어렵게 살았지마는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부유했고
나라 사랑의 정열은 식지 않았다.
6. 여러 문법책에서 ‘보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조사해 보라.
(양명희, 보어와 학교문법, 『한국어학』32, pp. 170~171. 참고. )
⇒ ‘보어’라고 하는 문법 용어는 전통 문법에 이미 등장한다. 안확(1923), 이규방(1923), 박승빈(1931), 최현배(1937), 홍기문(1947), 이희승(1949) 등은 용어와 범주는 다르지만 주어, 목적어 외에 필수 성분으로서 보어를 문장 성분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전통문법의 보어의 개념은 김민수(1971), 성광수(1974/1999), 서정수(1994), 최호철(1995), 임홍빈 장소원(1995), 정유진(1995), 이홍식(2000), 최형강(2004) 등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의 보어는 1985년에 마련된 대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만을 보어로 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몇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현배의 경우 ‘기움말’이라는 용어를 썼으며 잡음씨 ‘이다’와 ‘아니다’의 잡음의 목적이 되는 성분이라 하였고, 홍기문(1947)은 ‘보족어’라는 용어로 주어, 객어 의외의 성분을 가리켰다. 이희승은 ‘보충어’라고 하여 ‘되다, 하다, 않다, 못하다, 말다’ 앞에 쓰이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김민수는 “불완성술어(不完性述語)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에 의미상 보충될 대상으로 귀결되는 요소(要素)”라고 정의하였으며, 성광수는 “주어, 목적어 이외, 문내 필수성분으로서 문의 뜻을 보완하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최호철은 “서술을 완성시키는 말”이라 하였고, 임홍빈 장소원은 “주어나 목적어 이외에 서술어가 통사적 구성을 이룰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유진은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되는 논항으로 주어, 목적어 이외 한 문장의 의미 완결에 기여하는 필수 요소”라고 개념을 정의하였다.
7. 감탄사는 그 화용론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간투사”라 부르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과 함께 감탄사의 화용론적인 기능을 잘 음미해 보라.
(신지연, 간투사의 화용론적 특성, 주시경학보3, 1989, pp. 165~169. 참고. )
⇒ 국어 단어의 품사 분류에 있어서 ‘감탄사’로 불리는 어류는 국어 문법 연구에서 가장 소홀한 대접을 받아온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감탄사’에는 ‘아, 아이구, 어머나’ 등 진정한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것들과 함께, 감탄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단지 문장과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뜻에서 ‘감탄사’로 분류되어온 것들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네, 아니오’ 등의 대답하는 소리, ‘여보, 이봐, 얘, 야’ 등의 부르는 소리, ‘구구, 워리’ 등의 동물을 부르는 소리, ‘자, 쉿, 아서라’ 등의 명령적인 뜻을 담은 소리 외에, ‘음, 저어, 저기요, 있잖아요’ 등 말의 첫머리나 도중에 머뭇거리는 소리들이 있다. 그래서 전통 문법서에는 이들 어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첫째, 강한 정서를 외침의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것과 둘째 문장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어류 모두를 포괄하려 지칭하는 말로 ‘감탄사’보다는 ‘간투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간투사(間投詞)라는 용어는 유길준(1909)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영어의 interjection에 꼭 대당하는 말이다. 이들 어류가 대개는 문두에 나타나지만 그 위치가 꼭 문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화의 중간에라도 외침의 형식으로 끼어 들어갈 수 있다는, 문장과 독립적인 기능이 ‘간투사’라는 용어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먼저 그것의 사용이 통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통보 의사 없이 단순한 감정 표현만을 위한 것인가가 분류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를 〔±communicative〕로 나타낸다. 이는 바꾸어서 청자를 상정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상관적 장면이냐 아니냐로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또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감동성을 갖느냐, 갖지 않으냐이다. 이는 〔±emotive〕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의해서 통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의 강렬한 표현을 위해 청자를 상정하지 않은 단독적 장면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emotive, -communicative〕) ‘감정적 간투사’라 하고 상관적 장면에서 청자를 상정하고 감정의 표현보다는 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통보의 목적으로 발화되는 것을 (〔-emotive, +communicative〕) ‘의지적 간투사’라 한다.
간투사의 의미는 그 어휘에 고유하지 않는다. 감정적 감투사의 하나인 ‘아이구’는 최현배(1971)에 따르면 ‘슬픔, 놀람, 가엾음,
(나) 그 여자가 남편의 인도를 받아 조용하고 청조한 부인이 되었다.
(다) 깊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뼈가 연하고 살이 단단하다.
(라) 여러분은 초식동물이 소화기가 발달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마) 오늘 저녁에 쓸 물건이 아직도 배달되지 않았네.
4. 다음의 밑줄 그은 말을 꾸며 주는 부사어를 찾아 보라.
(가) 뜻하지 않는 불행을 당한 그는 할 말을 잃은 채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 네가 본 대로 말해 보렴.
(다) 요즘은 그가 왜 저토록 일을 서두르지?
(라) 함박눈이 소리 없이 내려서 쌓인다.
(마) 바둑이는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바)그들은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5. 다음 각 문장에는 서술어가 한 개 이상 있다. 그 각각의 주어를 찾아 짝을 지으라.
(가) 잔디가 깔린 광장 뒤에 현충문이 있고 그 뒤에 현충탑이 서 있다.
(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오늘이 있기까지 그토록 가슴(이) 아픈 희생이 있었던가?
(다) 우리가 한 뜻으로 뭉칠 때 굳건한 사회가 이룩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라) 여름철이 더위가 심하고 장마가 계속되어 건강을 해치기가 쉽다.
(마) 선생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어렵게 살았지마는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부유했고
나라 사랑의 정열은 식지 않았다.
6. 여러 문법책에서 ‘보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조사해 보라.
(양명희, 보어와 학교문법, 『한국어학』32, pp. 170~171. 참고. )
⇒ ‘보어’라고 하는 문법 용어는 전통 문법에 이미 등장한다. 안확(1923), 이규방(1923), 박승빈(1931), 최현배(1937), 홍기문(1947), 이희승(1949) 등은 용어와 범주는 다르지만 주어, 목적어 외에 필수 성분으로서 보어를 문장 성분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전통문법의 보어의 개념은 김민수(1971), 성광수(1974/1999), 서정수(1994), 최호철(1995), 임홍빈 장소원(1995), 정유진(1995), 이홍식(2000), 최형강(2004) 등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의 보어는 1985년에 마련된 대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만을 보어로 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몇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현배의 경우 ‘기움말’이라는 용어를 썼으며 잡음씨 ‘이다’와 ‘아니다’의 잡음의 목적이 되는 성분이라 하였고, 홍기문(1947)은 ‘보족어’라는 용어로 주어, 객어 의외의 성분을 가리켰다. 이희승은 ‘보충어’라고 하여 ‘되다, 하다, 않다, 못하다, 말다’ 앞에 쓰이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김민수는 “불완성술어(不完性述語)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에 의미상 보충될 대상으로 귀결되는 요소(要素)”라고 정의하였으며, 성광수는 “주어, 목적어 이외, 문내 필수성분으로서 문의 뜻을 보완하는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최호철은 “서술을 완성시키는 말”이라 하였고, 임홍빈 장소원은 “주어나 목적어 이외에 서술어가 통사적 구성을 이룰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유진은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되는 논항으로 주어, 목적어 이외 한 문장의 의미 완결에 기여하는 필수 요소”라고 개념을 정의하였다.
7. 감탄사는 그 화용론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간투사”라 부르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과 함께 감탄사의 화용론적인 기능을 잘 음미해 보라.
(신지연, 간투사의 화용론적 특성, 주시경학보3, 1989, pp. 165~169. 참고. )
⇒ 국어 단어의 품사 분류에 있어서 ‘감탄사’로 불리는 어류는 국어 문법 연구에서 가장 소홀한 대접을 받아온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감탄사’에는 ‘아, 아이구, 어머나’ 등 진정한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것들과 함께, 감탄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단지 문장과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뜻에서 ‘감탄사’로 분류되어온 것들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네, 아니오’ 등의 대답하는 소리, ‘여보, 이봐, 얘, 야’ 등의 부르는 소리, ‘구구, 워리’ 등의 동물을 부르는 소리, ‘자, 쉿, 아서라’ 등의 명령적인 뜻을 담은 소리 외에, ‘음, 저어, 저기요, 있잖아요’ 등 말의 첫머리나 도중에 머뭇거리는 소리들이 있다. 그래서 전통 문법서에는 이들 어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첫째, 강한 정서를 외침의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것과 둘째 문장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어류 모두를 포괄하려 지칭하는 말로 ‘감탄사’보다는 ‘간투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간투사(間投詞)라는 용어는 유길준(1909)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영어의 interjection에 꼭 대당하는 말이다. 이들 어류가 대개는 문두에 나타나지만 그 위치가 꼭 문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화의 중간에라도 외침의 형식으로 끼어 들어갈 수 있다는, 문장과 독립적인 기능이 ‘간투사’라는 용어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먼저 그것의 사용이 통보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통보 의사 없이 단순한 감정 표현만을 위한 것인가가 분류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를 〔±communicative〕로 나타낸다. 이는 바꾸어서 청자를 상정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상관적 장면이냐 아니냐로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또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감동성을 갖느냐, 갖지 않으냐이다. 이는 〔±emotive〕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의해서 통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의 강렬한 표현을 위해 청자를 상정하지 않은 단독적 장면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emotive, -communicative〕) ‘감정적 간투사’라 하고 상관적 장면에서 청자를 상정하고 감정의 표현보다는 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통보의 목적으로 발화되는 것을 (〔-emotive, +communicative〕) ‘의지적 간투사’라 한다.
간투사의 의미는 그 어휘에 고유하지 않는다. 감정적 감투사의 하나인 ‘아이구’는 최현배(1971)에 따르면 ‘슬픔, 놀람, 가엾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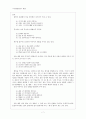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