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특징
Ⅱ.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표기
Ⅲ.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음운변화
1. 파찰음(된소리)
2. 마찰음 -*γ
3. 유음(3단계)
Ⅳ.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파생형용사
1. 어기와 그 성격
2. 접미사와 그 성격
Ⅴ.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의문어미
Ⅵ.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ㄱ탈락
참고문헌
Ⅱ.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표기
Ⅲ.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음운변화
1. 파찰음(된소리)
2. 마찰음 -*γ
3. 유음(3단계)
Ⅳ.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파생형용사
1. 어기와 그 성격
2. 접미사와 그 성격
Ⅴ.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의문어미
Ⅵ.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ㄱ탈락
참고문헌
본문내용
. 유음(3단계)
Ⅳ.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파생형용사
1. 어기와 그 성격
2. 접미사와 그 성격
Ⅴ.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의문어미
Ⅵ.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ㄱ탈락
참고문헌
Ⅰ.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특징
근대국어 표기법상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근대국어 시기의 국어 표기법들이 어간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分綴表記의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세국어에서 ‘사미’로 표기되었던 것이 근대국어에 와서 ‘사이’로 분철표기 되었고 용언에서도 ‘머거’가 ‘먹어’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대국어 시기의 국어 표기자들의 어간 의식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分綴表記는 重綴表記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중세구어의 표기원리가 音素的 표기인데 비하여 근대국어에 와서 形態音素的 表記를 거쳐 형태적 표기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철표기의 방법은 모든 단어의 표기에 그대로 다 통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분철표기는 어간말 자음을 지니고 있는 단어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간말 자음을 가진 단어라고 해서 또한 일률적으로 다 분철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국어 표기법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국어의 형태소 중 그 異形態들이 自動的 交替를 보이는가 隨意的交替를 보이는가에 따라 그 표기의 방법을 달리 정했다고 하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단어들의 표기이다. 근대국어에서 語幹末子音群을 가진 것들은 ‘ㄳㄵㄶㄺㄻㄼㅀㅲㄿㄺㅺㄾ’의 12개인데 ‘ㄺ’과 ‘ㄼ’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이형태들이 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것들이다. 이 둘만이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하려는 분철표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다른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것들은 모두 연철표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어간들은 모음이 후행하든 자음이 후행하든 거의 모두 분철로 나타난다. 현대국어의 정서법에 의하면 그 이형태들이 자동적 교체를 보이든 수의적 교체를 보이든 어간말 자음군을 어간 아래에 모아써서 그 기본형을 표기하고 있다.
Ⅱ.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표기
근대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체계는 근대국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 훈민정음을 그대로 빌어서 썼다. 그래서 15세기의 문자체계는 근대국어에 와서 중세국어와 비교하여 음성과 문자 기호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즉 15세기 국어는 근대국어에 와서 그 언어 체계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나 그 변화된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傳來의 문자로써 변화 조니 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그 표기법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근대국어를 논의하는데 제일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근대국어시기에 근대국어를 표기하는 일정한 규범이 존재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중앙에서 간행한 문헌들 중 교정한 교정본들을 살펴보면 그 교정한 부분이 거의 모두 한자음의 교저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한글 표기에 대한 교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만약 한글 표기에 일정한 규범이 존재하였다면 한글 표기에도 틀림없이 교정이 이루어 졌을 텐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한글 표기에 일정한 규범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근대국어를 표기하는 표기법에 일정한 규칙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는 일정한 표기의 방식이 관행처럼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나 공동기관에서 정해 놓은 정서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대국어를 표기한 많은 문헌에서 일종의 표기원리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국어 표기법의 특징은 일정한 규칙 속에서 다양성을 보이는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음운변화
1. 파찰음(된소리)
破擦音 ‘ㅈ’의 된소리는 후기 중세국어 단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ㅉ’ 표기가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 된소리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變異音로서 各自竝書로 보여주었다.
마(龍飛御天歌 95章), 조더니(月印千江之曲 123章), 조와(楞嚴經諺解 1.23), 눈(佛頂心經諺解 上 4), 연고(月印釋譜 2.39), 일⒟(金剛經諺解 19), 살찌닐(法華經諺解 5.120), 살찌여(楞嚴經諺解 2.5, 法華經諺解 6.8)
각자병서가 사라지는 圓覺經諺解에 재미있는 표기가 나온다.
圓ㅈ字(上 2-2 : 31a), 者ㅈ字(上 2-2 : 51b), 見ㅈ字(上 2-2 : 69a)
이 \'ㅈ’은 ‘사이시옷’의 表記字가 아니다. 金周弼(1990)은 이에 대하여 “‘字’자가 경음으로 실현되어, 즉 ‘ㅈ’이 조음되는 위치에서 폐쇄되어 그 지속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쓰일 자리에 후행하는 ‘ㅈ’을 씀으로써 ‘ㅈ’이 내파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쓴 것”으로 이해했다. 만약 ‘ㅈ’ 대신에 ‘ㅅ’이 쓰였다면 15세기에 ‘ㅉ’ 된소리를 새로운 경음계열의 음소로 인식했다고도 볼 수 있었겠지만, 아직은 圓覺經諺解가 나온 15세기 후반에는 ‘ㅈ’ 평음의 變異音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하겠다.
捷解新語(A.D.1676)에 ‘그 ’(7.19)이 보이고, 倭語類解, 漢淸文鑑, 三譯總解, 同文類解에는 ‘ㅾ’ 표기가 나타난다.
(), 다(), (織), 다(織), 다(摘), (隻, 下33),
이렇게 어두에서 이전의 어두자음군이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중엽에는 ‘’이 된소리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겠다. 이들도 어중에서의 음성적인 未破化가 누적되다가 결국 어두에까지 나타나는 음운변화에 의해 새로운 음소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마찰음 -*γ
후기 중세국어의 ‘ㅎ’ 종성체언의 ‘ㅎ’은 화석형이 나타난 것뿐이고, 이미 15세기가 되기 이전에 未破調音로 인해 음절 말에서는 음성실현음이 약화되어 거의 소멸되어버리고 말지만, 일부는 이전 단계의 -*γ로 방언 등에서 존재하고 있던 것이 ‘ㅇ’[]으로 변한 것이 후에 표기에 나타난 것들이 있다.
복 → 배뽕(西南方言)
나랗(國) → 나랑(東北方言)
바닿(海) → 바당(濟州道方言, 東南方言, 西南方言)
놓(繩) → 농재기, 농이(西北方言)
Ⅳ.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파생형용사
1. 어기와 그 성격
2. 접미사와 그 성격
Ⅴ.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의문어미
Ⅵ.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ㄱ탈락
참고문헌
Ⅰ.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특징
근대국어 표기법상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근대국어 시기의 국어 표기법들이 어간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分綴表記의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세국어에서 ‘사미’로 표기되었던 것이 근대국어에 와서 ‘사이’로 분철표기 되었고 용언에서도 ‘머거’가 ‘먹어’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대국어 시기의 국어 표기자들의 어간 의식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分綴表記는 重綴表記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중세구어의 표기원리가 音素的 표기인데 비하여 근대국어에 와서 形態音素的 表記를 거쳐 형태적 표기로 옮겨 가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철표기의 방법은 모든 단어의 표기에 그대로 다 통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분철표기는 어간말 자음을 지니고 있는 단어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간말 자음을 가진 단어라고 해서 또한 일률적으로 다 분철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국어 표기법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국어의 형태소 중 그 異形態들이 自動的 交替를 보이는가 隨意的交替를 보이는가에 따라 그 표기의 방법을 달리 정했다고 하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단어들의 표기이다. 근대국어에서 語幹末子音群을 가진 것들은 ‘ㄳㄵㄶㄺㄻㄼㅀㅲㄿㄺㅺㄾ’의 12개인데 ‘ㄺ’과 ‘ㄼ’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이형태들이 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것들이다. 이 둘만이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표기하려는 분철표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다른 어간말 자음군을 가진 것들은 모두 연철표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어간들은 모음이 후행하든 자음이 후행하든 거의 모두 분철로 나타난다. 현대국어의 정서법에 의하면 그 이형태들이 자동적 교체를 보이든 수의적 교체를 보이든 어간말 자음군을 어간 아래에 모아써서 그 기본형을 표기하고 있다.
Ⅱ.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표기
근대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체계는 근대국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 훈민정음을 그대로 빌어서 썼다. 그래서 15세기의 문자체계는 근대국어에 와서 중세국어와 비교하여 음성과 문자 기호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즉 15세기 국어는 근대국어에 와서 그 언어 체계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나 그 변화된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傳來의 문자로써 변화 조니 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그 표기법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근대국어를 논의하는데 제일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근대국어시기에 근대국어를 표기하는 일정한 규범이 존재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중앙에서 간행한 문헌들 중 교정한 교정본들을 살펴보면 그 교정한 부분이 거의 모두 한자음의 교저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한글 표기에 대한 교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만약 한글 표기에 일정한 규범이 존재하였다면 한글 표기에도 틀림없이 교정이 이루어 졌을 텐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한글 표기에 일정한 규범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근대국어를 표기하는 표기법에 일정한 규칙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는 일정한 표기의 방식이 관행처럼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나 공동기관에서 정해 놓은 정서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대국어를 표기한 많은 문헌에서 일종의 표기원리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국어 표기법의 특징은 일정한 규칙 속에서 다양성을 보이는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근대국어(근대한국어)의 음운변화
1. 파찰음(된소리)
破擦音 ‘ㅈ’의 된소리는 후기 중세국어 단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ㅉ’ 표기가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 된소리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變異音로서 各自竝書로 보여주었다.
마(龍飛御天歌 95章), 조더니(月印千江之曲 123章), 조와(楞嚴經諺解 1.23), 눈(佛頂心經諺解 上 4), 연고(月印釋譜 2.39), 일⒟(金剛經諺解 19), 살찌닐(法華經諺解 5.120), 살찌여(楞嚴經諺解 2.5, 法華經諺解 6.8)
각자병서가 사라지는 圓覺經諺解에 재미있는 표기가 나온다.
圓ㅈ字(上 2-2 : 31a), 者ㅈ字(上 2-2 : 51b), 見ㅈ字(上 2-2 : 69a)
이 \'ㅈ’은 ‘사이시옷’의 表記字가 아니다. 金周弼(1990)은 이에 대하여 “‘字’자가 경음으로 실현되어, 즉 ‘ㅈ’이 조음되는 위치에서 폐쇄되어 그 지속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쓰일 자리에 후행하는 ‘ㅈ’을 씀으로써 ‘ㅈ’이 내파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쓴 것”으로 이해했다. 만약 ‘ㅈ’ 대신에 ‘ㅅ’이 쓰였다면 15세기에 ‘ㅉ’ 된소리를 새로운 경음계열의 음소로 인식했다고도 볼 수 있었겠지만, 아직은 圓覺經諺解가 나온 15세기 후반에는 ‘ㅈ’ 평음의 變異音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하겠다.
捷解新語(A.D.1676)에 ‘그 ’(7.19)이 보이고, 倭語類解, 漢淸文鑑, 三譯總解, 同文類解에는 ‘ㅾ’ 표기가 나타난다.
(), 다(), (織), 다(織), 다(摘), (隻, 下33),
이렇게 어두에서 이전의 어두자음군이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중엽에는 ‘’이 된소리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겠다. 이들도 어중에서의 음성적인 未破化가 누적되다가 결국 어두에까지 나타나는 음운변화에 의해 새로운 음소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마찰음 -*γ
후기 중세국어의 ‘ㅎ’ 종성체언의 ‘ㅎ’은 화석형이 나타난 것뿐이고, 이미 15세기가 되기 이전에 未破調音로 인해 음절 말에서는 음성실현음이 약화되어 거의 소멸되어버리고 말지만, 일부는 이전 단계의 -*γ로 방언 등에서 존재하고 있던 것이 ‘ㅇ’[]으로 변한 것이 후에 표기에 나타난 것들이 있다.
복 → 배뽕(西南方言)
나랗(國) → 나랑(東北方言)
바닿(海) → 바당(濟州道方言, 東南方言, 西南方言)
놓(繩) → 농재기, 농이(西北方言)
추천자료
 [한국어교육론 공통] 외국어 교수법 중 한국어 교육에 크게 영향을 끼친 교수법을 2개 골라 ...
[한국어교육론 공통] 외국어 교수법 중 한국어 교육에 크게 영향을 끼친 교수법을 2개 골라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Q. 한국어 교실 환경에서 교재가 가지는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Q. 한국어 교실 환경에서 교재가 가지는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 한국어교육론-한국어의 초분절음소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특성에대해 설명한뒤,이들요소의 교...
한국어교육론-한국어의 초분절음소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특성에대해 설명한뒤,이들요소의 교... 한국어교재론 -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와 특정 목적 한국어 교재를 1종씩 선정하여 각 교재의...
한국어교재론 -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와 특정 목적 한국어 교재를 1종씩 선정하여 각 교재의...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_한국어교육 교재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한국어교육 교재 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_한국어교육 교재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적인 한국어교육 교재 개...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자음 발음과 관련된 오류 예시를...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자음 발음과 관련된 오류 예시를...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발음과 관련된 오류 예시를 5개 ...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발음과 관련된 오류 예시를 5개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개론-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특징(교육 내...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개론-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특징(교육 내...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및교수요목설계]관광 및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3주동안 한국을...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및교수요목설계]관광 및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3주동안 한국을... [한국어교육론] 문화교육의 체계적 분류 [문화교육 문제점 세종한국어 문화교육 문화 분류 체...
[한국어교육론] 문화교육의 체계적 분류 [문화교육 문제점 세종한국어 문화교육 문화 분류 체...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자음 발음과 관련된 오류 예시를...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자음 발음과 관련된 오류 예시를... 한국어발음교육론)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발음과 관련된 오류 예시를 5개 이상 들고 이...
한국어발음교육론)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발음과 관련된 오류 예시를 5개 이상 들고 이... 한국어교재론)‘세종 한국어’시리즈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외적 특징과 내적 특징을 기술하고 ...
한국어교재론)‘세종 한국어’시리즈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외적 특징과 내적 특징을 기술하고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및교수요목설계)관광 및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3주동안 한국을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및교수요목설계)관광 및 한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3주동안 한국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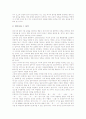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