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 생애
Ⅲ. 학문과 학통
Ⅳ. 문학 사상
Ⅴ. 제재별 한시분석
1. 기행시
2. 술회시
3. 화답시
Ⅵ. 결론
Ⅱ. 생애
Ⅲ. 학문과 학통
Ⅳ. 문학 사상
Ⅴ. 제재별 한시분석
1. 기행시
2. 술회시
3. 화답시
Ⅵ. 결론
본문내용
특히 「강릉 가는 길에 설악을 바라보며」(江陵途中望雪嶽)라는 시에서는 김시습을 회상하고 있다.
雪嶽之山高萬丈 설악산 높이가 만 길이 되어
懸空積氣連蓬瀛 봉래산과 영주까지 그 기운 이어졌네.
千峰映雪海日晴 천 봉우리 눈빛은 해일에 반사되고
群帝集玉京 저 멀리 옥경에 상제들 모였구나.
東峯老人住其間 동봉노인이 거기에 머물러
高標歷落干靑冥 거룩한 그 기상 하늘까지 뻗쳤네.
嘯風叱雨弄神怪 비바람도 꾸짖고 귀신을 희롱하며
逃空托幻藏其名 불교에 의탁하여 그 이름을 숨겼네.
乞食都門傲卿相 장안거리 걸식하며 경상을 멸시하고
縱謔飜爲市童驚 해학을 일삼아 시동을 놀라게 했다.
猖狂不獨事高潔 광태를 부림이 고결에만 국한될까
此心長與日月明 그 마음 영원히 해와 달처럼 빛나리.
이 시는 눈 덮인 설악산의 모습이 마치 신선이 사는 봉래산과 영주와 같다고 묘사하며 주위의 경관을 선적인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 이것은 그의 의식세계가 거의 노장의 사상에 공감하면서 도교사상을 내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곳에 거쳐했던 東峰老人, 곧 김시습이 그의 고결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신선의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다.
현대사회의 타락성에 회의를 느끼고 숨어 살면서 정권에 아부하며 높은 벼슬을 영위하는 친구 앞에서 서슴없이 직언을 하는 김시습의 기상은 고결한 처사, 은사로서 사회를 비추어준 등불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한편 설악산을 무척 좋아하며 설잠이라는 별호를 가지고 방외인적 삶을 살아온 김시습을 허목의「淸士列傳」에서 鄭希良, 鄭, 鄭, 鄭斗와 함께 추숭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부각시켰듯이 이 시에서도 그의 발자취를 정밀하게 되새기고 있다. 한편 김시습을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한국문학사에서 우뚝한 문장가로 생육신의 한사람이다. 그 절의의 선비정신은 유가의 귀감이며, 鍊月修鍊의 刻苦했던 모습은 道家의 異彩라고 할 수 있다.
2. 술회시
그의 시세계에서 기행시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술회시인데 詠懷詩라고도 부를 수 있는 작품을 가리킨다. 곧 시는 인간이 뜻하는 바를 말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뜻하는 바가 “志”이고, 마음속에서 충동하는 감정을 “詩”라고 할 수 있는데 지와 정의 결합을 詩라고 말한다.
미수허목의 시에서 술회시는 그의 정신을 비교적 잘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그의 상고 정신과 상통하는 그의 문학적 특징을 추출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거론될만한 「觀書三首」를 살펴본다.
洋洋慕聖謨 넓고 큰 성인 교훈 너무도 좋아하여
說讀皆孔子 평생토록 읽은 건 공자의 글 뿐
不知老之至 몸이야 늙건 말건 아랑곳없이
死而後乃已 죽은 뒤에야 그만두리라.
그는 평상시에 스스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서 도를 체득하지 않고서는 인간행위의 규범을 세워주는 문장을 지을 수 없으므로 성인의 글인 육경을 읽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시에서도 공자의 글만을 좋아하여 읽을 뿐이라고 하여 평생 고문에 심취된 상태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신세계나 사고체계를 표현한 것과는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자기 모습의 성찰을 보여주는 墨梅라는 시를 살펴본다.
墨梅何奇 묵매가 어쩌면 저렇게 기이할까
心正苦絶筆 붓을 놓기가 너무도 안타까워
摸出古梅寒 묵은 매화 언 가지를 그려 보았지.
寒折半枯半死 그 가지 꺾어져 죽살이 쳤어도
雪邊瘦疏三兩枝 눈 속에 앙상한 몇몇 가지엔
吐奇 아름다운 꽃망울 몽실 피었네.
夜如河 밤하늘 은하처럼 맑기도 한데
一輪明月上氷柯 둥근 달 언 가지에 둥실 걸렸다.
令我對此無語空長嗟 이걸 대한 내 마음 말없이 슬퍼
空長嗟出涕 긴 한숨 쉬면서 눈물짓는다.
이 시의 소재로 등장하는 매화는 고결하고 절개가 높은 충신의 상징으로 아마도 자신을 상징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슬퍼하기 보다는 역경을 딛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글자 수에는 얽매이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길고 짧은 매화 가지를 시로서 그림 그리듯 표현한 면이 특이하다. 한 폭의 설중매를 보는듯한 느낌을 통해 허목의 섬세한 표현 기교가 노정된 시라고 하겠다.
3. 화답시
시가 있기 이전에 인간과 만남이 있고 전통시대의 선비들의 만남에 필수적인 시의 교환이 있었으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주고받은 시를 흔히 화답시라고 부른다.
허목도 사대부의 한 사람으로 사교의 수단으로 창작된 시가 적지 않다. 곧 한시의 창작은 생활 속의 餘技로서의 역할과 사교 수단이기도 했다.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허목의 화답시를 살펴봄으로써 문학에 대한 그의 생각의 일단을 짚어 볼 수 있다고 본다.
미수의 시경체의 시인, 「同諸公遊三釜水石酬龍洲相公」을 살펴보자.
山曲 산모퉁이 돌무더기 많고
岫 바위 봉우리 높기도 하다.
三釜有 삼부에 물 세차게 흐르는데
白石嵯嵯 하얀 돌 삐죽삐죽 솟았도다.
山之幽可遊可樂 산 그윽하니 놀면서 즐길 만하며
溪之淸可沿可濯 시내 맑으니 오르내리며 씻을 만하네.
瞻彼山田 저 산전 바라보니
其耕澤澤 일군 땅 기름지도다.
邈矣神農 그 옛날 신농씨
肇我稼穡 맨 처음 농사일 가르쳤네.
之沮溺 높구나 장저, 걸닉
耕 짝지어 밭가는 모습 평화로웠네.
緬思故人 아득히 옛사람 생각하니
我心則怡 내 마음도 편하기만 하네.
今夕何夕 이 밤이 어떤 밤인가
同我良 좋은 벗과 함께 있네.
良孔翕 좋은 벗 마음 맞으니
如球如 구슬 같고 옥과 같네.
山有鳥水有魚 산에 새 울고 물에 고기 노네.
且詠且謳 읊고 또 노래하니
其樂徐徐 즐거움도 한가로워라.
이 작품은 藥府양식을 통하여 4언을 위주로 한 詩經體의 시로 시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첫째연의 1구에서 4구까지는 한 폭의 산수화를 감상하듯이 서경적인 묘사를 하고 있으며, 5구에서 6구에서는 樂山樂水하는 선인의 풍격을 노래하고 있다. 둘째연의 끝부분에서는 고인에 대한 동경과 태평세월이었던 그 옛날, 태고 적에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시경의 “鳶飛戾天 魚躍于淵”을 연상케 하는 셋째연의 5구에서는 “山有鳥水有魚”라 표현하여 현실을 기반으로 한 자연과의 합일, 즉 융화된 천인합일의 경지를 읊고 있다. 이것은 생각은 고인의 정신세계를
雪嶽之山高萬丈 설악산 높이가 만 길이 되어
懸空積氣連蓬瀛 봉래산과 영주까지 그 기운 이어졌네.
千峰映雪海日晴 천 봉우리 눈빛은 해일에 반사되고
群帝集玉京 저 멀리 옥경에 상제들 모였구나.
東峯老人住其間 동봉노인이 거기에 머물러
高標歷落干靑冥 거룩한 그 기상 하늘까지 뻗쳤네.
嘯風叱雨弄神怪 비바람도 꾸짖고 귀신을 희롱하며
逃空托幻藏其名 불교에 의탁하여 그 이름을 숨겼네.
乞食都門傲卿相 장안거리 걸식하며 경상을 멸시하고
縱謔飜爲市童驚 해학을 일삼아 시동을 놀라게 했다.
猖狂不獨事高潔 광태를 부림이 고결에만 국한될까
此心長與日月明 그 마음 영원히 해와 달처럼 빛나리.
이 시는 눈 덮인 설악산의 모습이 마치 신선이 사는 봉래산과 영주와 같다고 묘사하며 주위의 경관을 선적인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 이것은 그의 의식세계가 거의 노장의 사상에 공감하면서 도교사상을 내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곳에 거쳐했던 東峰老人, 곧 김시습이 그의 고결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신선의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다.
현대사회의 타락성에 회의를 느끼고 숨어 살면서 정권에 아부하며 높은 벼슬을 영위하는 친구 앞에서 서슴없이 직언을 하는 김시습의 기상은 고결한 처사, 은사로서 사회를 비추어준 등불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한편 설악산을 무척 좋아하며 설잠이라는 별호를 가지고 방외인적 삶을 살아온 김시습을 허목의「淸士列傳」에서 鄭希良, 鄭, 鄭, 鄭斗와 함께 추숭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부각시켰듯이 이 시에서도 그의 발자취를 정밀하게 되새기고 있다. 한편 김시습을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한국문학사에서 우뚝한 문장가로 생육신의 한사람이다. 그 절의의 선비정신은 유가의 귀감이며, 鍊月修鍊의 刻苦했던 모습은 道家의 異彩라고 할 수 있다.
2. 술회시
그의 시세계에서 기행시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술회시인데 詠懷詩라고도 부를 수 있는 작품을 가리킨다. 곧 시는 인간이 뜻하는 바를 말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뜻하는 바가 “志”이고, 마음속에서 충동하는 감정을 “詩”라고 할 수 있는데 지와 정의 결합을 詩라고 말한다.
미수허목의 시에서 술회시는 그의 정신을 비교적 잘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그의 상고 정신과 상통하는 그의 문학적 특징을 추출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거론될만한 「觀書三首」를 살펴본다.
洋洋慕聖謨 넓고 큰 성인 교훈 너무도 좋아하여
說讀皆孔子 평생토록 읽은 건 공자의 글 뿐
不知老之至 몸이야 늙건 말건 아랑곳없이
死而後乃已 죽은 뒤에야 그만두리라.
그는 평상시에 스스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서 도를 체득하지 않고서는 인간행위의 규범을 세워주는 문장을 지을 수 없으므로 성인의 글인 육경을 읽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시에서도 공자의 글만을 좋아하여 읽을 뿐이라고 하여 평생 고문에 심취된 상태로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신세계나 사고체계를 표현한 것과는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자기 모습의 성찰을 보여주는 墨梅라는 시를 살펴본다.
墨梅何奇 묵매가 어쩌면 저렇게 기이할까
心正苦絶筆 붓을 놓기가 너무도 안타까워
摸出古梅寒 묵은 매화 언 가지를 그려 보았지.
寒折半枯半死 그 가지 꺾어져 죽살이 쳤어도
雪邊瘦疏三兩枝 눈 속에 앙상한 몇몇 가지엔
吐奇 아름다운 꽃망울 몽실 피었네.
夜如河 밤하늘 은하처럼 맑기도 한데
一輪明月上氷柯 둥근 달 언 가지에 둥실 걸렸다.
令我對此無語空長嗟 이걸 대한 내 마음 말없이 슬퍼
空長嗟出涕 긴 한숨 쉬면서 눈물짓는다.
이 시의 소재로 등장하는 매화는 고결하고 절개가 높은 충신의 상징으로 아마도 자신을 상징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슬퍼하기 보다는 역경을 딛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글자 수에는 얽매이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길고 짧은 매화 가지를 시로서 그림 그리듯 표현한 면이 특이하다. 한 폭의 설중매를 보는듯한 느낌을 통해 허목의 섬세한 표현 기교가 노정된 시라고 하겠다.
3. 화답시
시가 있기 이전에 인간과 만남이 있고 전통시대의 선비들의 만남에 필수적인 시의 교환이 있었으니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주고받은 시를 흔히 화답시라고 부른다.
허목도 사대부의 한 사람으로 사교의 수단으로 창작된 시가 적지 않다. 곧 한시의 창작은 생활 속의 餘技로서의 역할과 사교 수단이기도 했다.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허목의 화답시를 살펴봄으로써 문학에 대한 그의 생각의 일단을 짚어 볼 수 있다고 본다.
미수의 시경체의 시인, 「同諸公遊三釜水石酬龍洲相公」을 살펴보자.
山曲 산모퉁이 돌무더기 많고
岫 바위 봉우리 높기도 하다.
三釜有 삼부에 물 세차게 흐르는데
白石嵯嵯 하얀 돌 삐죽삐죽 솟았도다.
山之幽可遊可樂 산 그윽하니 놀면서 즐길 만하며
溪之淸可沿可濯 시내 맑으니 오르내리며 씻을 만하네.
瞻彼山田 저 산전 바라보니
其耕澤澤 일군 땅 기름지도다.
邈矣神農 그 옛날 신농씨
肇我稼穡 맨 처음 농사일 가르쳤네.
之沮溺 높구나 장저, 걸닉
耕 짝지어 밭가는 모습 평화로웠네.
緬思故人 아득히 옛사람 생각하니
我心則怡 내 마음도 편하기만 하네.
今夕何夕 이 밤이 어떤 밤인가
同我良 좋은 벗과 함께 있네.
良孔翕 좋은 벗 마음 맞으니
如球如 구슬 같고 옥과 같네.
山有鳥水有魚 산에 새 울고 물에 고기 노네.
且詠且謳 읊고 또 노래하니
其樂徐徐 즐거움도 한가로워라.
이 작품은 藥府양식을 통하여 4언을 위주로 한 詩經體의 시로 시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첫째연의 1구에서 4구까지는 한 폭의 산수화를 감상하듯이 서경적인 묘사를 하고 있으며, 5구에서 6구에서는 樂山樂水하는 선인의 풍격을 노래하고 있다. 둘째연의 끝부분에서는 고인에 대한 동경과 태평세월이었던 그 옛날, 태고 적에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시경의 “鳶飛戾天 魚躍于淵”을 연상케 하는 셋째연의 5구에서는 “山有鳥水有魚”라 표현하여 현실을 기반으로 한 자연과의 합일, 즉 융화된 천인합일의 경지를 읊고 있다. 이것은 생각은 고인의 정신세계를
추천자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식생활 비교 고려시대 생활상 외래문화영향 고기음식 김치 술 양주업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식생활 비교 고려시대 생활상 외래문화영향 고기음식 김치 술 양주업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농민항쟁, 조선사림정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농민항쟁, 조선사림정치 시가(시가문학)와 삼국시대시가, 시가(시가문학)와 고려시대시가, 시가(시가문학)와 조선시대...
시가(시가문학)와 삼국시대시가, 시가(시가문학)와 고려시대시가, 시가(시가문학)와 조선시대... 한국 조선시대 조경 - 특징과 궁궐 (조선시대 정원의 특징 및 사상적 배경 & 궁궐 정원 (...
한국 조선시대 조경 - 특징과 궁궐 (조선시대 정원의 특징 및 사상적 배경 & 궁궐 정원 (... 현대의 새로운 미(美)의 해석과 조선시대의 미(美) - 기호소비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줄거...
현대의 새로운 미(美)의 해석과 조선시대의 미(美) - 기호소비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줄거... [의복의 역사] 조선시대 의복(조선시대 복식의 특징, 개짐, 서민들의 의복, 기녀들의 의복, ...
[의복의 역사] 조선시대 의복(조선시대 복식의 특징, 개짐, 서민들의 의복, 기녀들의 의복, ... [미용예술사] 화장의 기원, 시대별화장_단군신화부터 조선시대까지, 개화기부터 일제시대 이...
[미용예술사] 화장의 기원, 시대별화장_단군신화부터 조선시대까지, 개화기부터 일제시대 이... [건축역사] 조선시대 집(주택) 역사 - 조선시대 주택의 정의 및 배경, 양반주택(상류주택)과 ...
[건축역사] 조선시대 집(주택) 역사 - 조선시대 주택의 정의 및 배경, 양반주택(상류주택)과 ... [한국문학개론]조선시대 전기 악장, 시조 - 조선 전기 시대의 배경과 시조 및 악장의 이해
[한국문학개론]조선시대 전기 악장, 시조 - 조선 전기 시대의 배경과 시조 및 악장의 이해 [조선시대 재정]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 세제, 재무기관, 재정의 문란
[조선시대 재정] 조선시대의 재무행정 - 세제, 재무기관, 재정의 문란 조선시대 인사행정 -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제도 {인사기관, 과거제도, 품계 및 임용제도, 보수...
조선시대 인사행정 -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제도 {인사기관, 과거제도, 품계 및 임용제도, 보수... [조선시대행정조직체계] 조선시대의 행정조직(行政組織)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조선시대행정조직체계] 조선시대의 행정조직(行政組織)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한국역사에서의 교육철학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의 교육과 철학, 개화기 민족수난기의 ...
한국역사에서의 교육철학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의 교육과 철학, 개화기 민족수난기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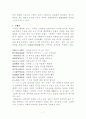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