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상장폐지의 방법
1.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2.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Ⅲ. 상장폐지를 원하지 않는 주주의 보호
1. 문제제기
2. 상장폐지로 인한 주주재산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Ⅳ.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소수파주주의 보호 가능성
1. 현행 실정법상 주식매수청구권
2. 상장폐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방안
Ⅴ. 맺음말
Ⅱ. 상장폐지의 방법
1.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2.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Ⅲ. 상장폐지를 원하지 않는 주주의 보호
1. 문제제기
2. 상장폐지로 인한 주주재산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Ⅳ.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한 소수파주주의 보호 가능성
1. 현행 실정법상 주식매수청구권
2. 상장폐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각에 쓰고 있다. 이는 주주들이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자사주 소각, 계열사 보유지분 매각 등의 요구가 높아져서 경영권을 압박하기 때문이다.20)
또한 상장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주주관리비용으로 주요한 것은 주식발행비용, 명의개서비용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비용 등을 들 수 있다. 2004년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연간 주식발행비용은 약 9억원(상장회사 평균 60만원), 명의개서 대행수수료로 연간 약 100억원(상장회사 평균 640만원)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비용으로 연간 약 145억원(상장회사 평균 921만원)이 소요되고 있다.21)
기업공시제도는 정보의 효율성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라는 명제하에 계속 강화되고 있다. 회사의 경영진은 상장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이러한 공시제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특히 수시공시제도의 도입으로 회사 측은 필요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하는 업무에 회사 규모에 따라 직원 다수를 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시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게 된다. 또한 주주들의 상장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22) 특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상장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3) 주주 입장에서 본 상장폐지의 불리한 점
상장폐지로 인한 발행회사의 장점들은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주주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상장폐지가 되면 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발행회사의 상장폐지결정이 알려진다면, 이는 거래소에서의 매각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장폐지를 원하지 않는 주주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장폐지 전에 매각하려 할 것이다.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높은 대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주식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결과 일시적인 투매현상으로 시가가 폭락하고,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재산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장폐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주주의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과 신주인수권과 같은 재산권 청구관련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간이화된 조건으로 배제하게 하는 결과를 이끄는 것도 아니다. 결국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주주의 재산권은 주식의 거래능력이라는 특성 즉, 시장에서의 주식양도자유의 보장성이다. 여기서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발행회사의 결의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거래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주식 내지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그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보상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Ⅲ. 상장폐지를 원하지 않는 주주의 보호
1. 문제제기
거래소의 직권에 의한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투자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현행 실정법 체계상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의 경우 그에 반대하는 주주의 보호에 관하여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 어디에도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단지 거래소의 상장규정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현행 상장규정은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의 경우에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한 법인으로서 주주총회의 위임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상장폐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장규정 제77조 제1항). 그리고 “거래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상장규정 제77조 제2항 본문)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회사가 상장폐지를 거래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장폐지의 신청여부는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상법 제361조). 그러나 이러한 권한사항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인지 특별결의사항인지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를 거래소에 신청하면 거래소의 재량에 의해서만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하는 상장규정은23)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여 진다. 여기서 “재산권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24) 그리고 여기서의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하고, 그 재산가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한다. 또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의 보장까지를 포함한 것이다.25)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은 당연히 주주의 재산권에도 미치는 것이다.26)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에 실제로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래소에의 상장이 주식재산권의 요소로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긍정한다면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상장으로 인한 주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상장폐지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구제수단을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상장폐지로 인한 주주재산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기본권으로서의 주주의 재산권에 관한 논의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법원의 판결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에 관한 다수의 판결을 내린바 있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 fassungsgericht)의 결정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주주재산권의 내용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해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다수파에 의하여 축출되는 소수파 주주에 대한 회사의 代償(Abfindung) 내지 補償(Ausgleich)이 독일 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주주 재산권의 보호에 충분한 것인지를 다룬 1962년 6월 7일 ‘Feldm
또한 상장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주주관리비용으로 주요한 것은 주식발행비용, 명의개서비용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비용 등을 들 수 있다. 2004년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연간 주식발행비용은 약 9억원(상장회사 평균 60만원), 명의개서 대행수수료로 연간 약 100억원(상장회사 평균 640만원)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비용으로 연간 약 145억원(상장회사 평균 921만원)이 소요되고 있다.21)
기업공시제도는 정보의 효율성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라는 명제하에 계속 강화되고 있다. 회사의 경영진은 상장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이러한 공시제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특히 수시공시제도의 도입으로 회사 측은 필요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하는 업무에 회사 규모에 따라 직원 다수를 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시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게 된다. 또한 주주들의 상장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22) 특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상장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3) 주주 입장에서 본 상장폐지의 불리한 점
상장폐지로 인한 발행회사의 장점들은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주주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상장폐지가 되면 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발행회사의 상장폐지결정이 알려진다면, 이는 거래소에서의 매각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장폐지를 원하지 않는 주주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장폐지 전에 매각하려 할 것이다.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높은 대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주식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결과 일시적인 투매현상으로 시가가 폭락하고,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재산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장폐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주주의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과 신주인수권과 같은 재산권 청구관련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간이화된 조건으로 배제하게 하는 결과를 이끄는 것도 아니다. 결국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주주의 재산권은 주식의 거래능력이라는 특성 즉, 시장에서의 주식양도자유의 보장성이다. 여기서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발행회사의 결의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거래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주식 내지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그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보상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Ⅲ. 상장폐지를 원하지 않는 주주의 보호
1. 문제제기
거래소의 직권에 의한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투자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과 달리, 현행 실정법 체계상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의 경우 그에 반대하는 주주의 보호에 관하여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 어디에도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단지 거래소의 상장규정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현행 상장규정은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의 경우에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상장한 법인으로서 주주총회의 위임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상장폐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장규정 제77조 제1항). 그리고 “거래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상장규정 제77조 제2항 본문)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회사가 상장폐지를 거래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장폐지의 신청여부는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상법 제361조). 그러나 이러한 권한사항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인지 특별결의사항인지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를 거래소에 신청하면 거래소의 재량에 의해서만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하는 상장규정은23)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여 진다. 여기서 “재산권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24) 그리고 여기서의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하고, 그 재산가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한다. 또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의 보장까지를 포함한 것이다.25)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은 당연히 주주의 재산권에도 미치는 것이다.26)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에 실제로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래소에의 상장이 주식재산권의 요소로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긍정한다면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상장으로 인한 주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상장폐지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구제수단을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상장폐지로 인한 주주재산권의 침해와 그 구제방법
기본권으로서의 주주의 재산권에 관한 논의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법원의 판결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에 관한 다수의 판결을 내린바 있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 fassungsgericht)의 결정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주주재산권의 내용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해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다수파에 의하여 축출되는 소수파 주주에 대한 회사의 代償(Abfindung) 내지 補償(Ausgleich)이 독일 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주주 재산권의 보호에 충분한 것인지를 다룬 1962년 6월 7일 ‘Feld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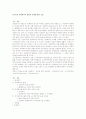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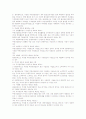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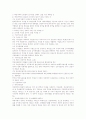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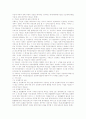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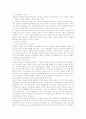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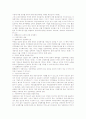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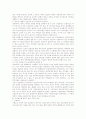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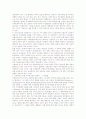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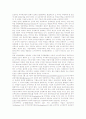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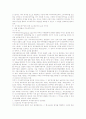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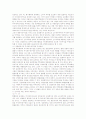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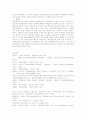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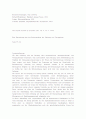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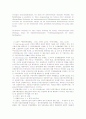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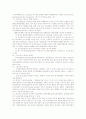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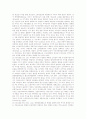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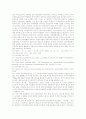










소개글